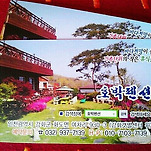<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CENTER>
<TABLE style="BORDER-RIGHT: #003366 8px ridge; BORDER-TOP: #003366 8px ridge; BORDER-LEFT: #003366 8px ridge; BORDER-BOTTOM: #003366 8px ridge; BACKGROUND-COLOR: #000033">
<TBODY>
<TR>
<TD>
<TABLE borderColor=#0 cellSpacing=0 cellPadding=40 width="35%" background=http://cfs9.blog.daum.net/image/31/blog/2008/03/15/22/32/47dbcfd83a0f9&amp;filename=04.군청색.gif border=0>
<TBODY>
<TR>
<TD><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5%" background=http://cfs9.blog.daum.net//31/blog/2008/03/15/22/32/47dbcfd83a0f9&amp;filename=04.군청색.gif border=0>
<TBODY>
<TR>
<P></P></TR></TBODY></TABLE>
<TABLE width="100%">
<TBODY>
<TR>
<TD vAlign=top>
<DIV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굴림,굴림체,Gulim,Baekmuk Dotum,Undotum,Apple Gothic,Latin font,sans-serif">
<TABLE style="BACKGROUND: none transparent scroll repeat 0% 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8pt; PADDING-LEFT: 8pt; PADDING-BOTTOM: 8pt; PADDING-TOP: 8pt" vAlign=top>
<DIV align=center>&nbsp;&nbsp;&nbsp;&nbs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height=26><B><SPAN style="FONT-SIZE: 14pt"><FONT color=white>서암정사 - 지리산의 하늘정원</FONT></SPAN></B><SPAN style="FONT-SIZE: 14pt"> </SPAN></TD></TR></TBODY></TABLE></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5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listtxt style="WIDTH: 600px; LINE-HEIGHT: 140%" vAlign=top>
<P align=center>&nbsp; </P>
<DIV align=center></DIV>
<P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여행을 다니다 보면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FONT></STRONG></SPAN></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서암정사가 그러했다. 이 날 일정은 벽송사와 금대암을 둘러 보고 지안재를 넘는 코스였다.</FONT></STRONG></SPAN></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입구 주차장에 잠시 내렸다. 가게에 들러 주인한테 벽송사 가는 길을 물으니 "벽송사요. 별로 볼 게 없을건데.... 차라리 서암정사로 가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순간 당혹스러웠다. 역사성이나 문화재적인 가치를 보면 서암정사는 나에게 낯선 사찰이었으니까. 인터넷에서 본 몇몇 사진들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주인장 말을 뒤로 하고 무작정 벽송사로 향했다. 내려 오는 길에 계속 가게 주인 말이 신경쓰였다. '시간도 빠듯한데....그래 속는 셈 치고 한 번 가보자'.&nbsp; 암자의 초입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 절이 아니라 산 속의 예쁜 정원같구나'</FONT>. </STRONG></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6.blog.daum.net/original/14/blog/2007/10/31/17/16/472839ee2b05d&amp;filename=s3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6.blog.daum.net%2Fimage%2F14%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ee2b05d%26filename%3Ds3%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이 예쁜 산중 정원에 들어서면 고목나무 한 그루가 손님을 맞이한다. 장엄한 지리능선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리라. 고목나무 위에는 아직도 새 순이 돋아나 있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담쟁이가 다 죽은 나무를 휘감은 채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다.</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1/blog/2007/10/31/17/16/472839d56a41e&amp;filename=s11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21%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56a41e%26filename%3Ds11%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white>서암정사는 인근 벽송사의 주지였던 원응 스님이 6·25전쟁 때 지리산에서 죽어간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1989년부터 조성했다고 한다. 이 산중의 정원은 기존의 절에 대한 생각을 일시에 바꾸어 버리게 한다. </SPAN><BR></FONT></STRONG><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blog/2007/10/31/17/16/472839c0a0525&amp;filename=s2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3%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c0a0525%26filename%3Ds2%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B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자연암반 곳곳에 돌을 정교하게 쪼아 불상들을 만들어 놓았다. 조성된지도 얼마되지 않았을 뿐더러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어 전혀 자연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암자는 기이하게도 자연과 퍽이나 조화롭다. </FONT></STRONG></SPAN><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6/blog/2007/10/31/17/16/472839e603d75&amp;filename=s16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gt;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36%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e603d75%26filename%3Ds16%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B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P>
<P><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9/blog/2007/10/31/17/16/472839d728b2e&amp;filename=s12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29%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728b2e%26filename%3Ds12%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1/blog/2007/10/31/17/16/472839d56a41e&amp;filename=s11복사.jpg')"></A></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놀라움은 절집 입구의 사천왕상을 지나 '대방광문'을 지나면서부터 시작된다.&nbsp;&nbsp;이 인공석굴을 지나면 하늘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본격?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FONT></STRONG></SPAN></P>
<P><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2/blog/2007/10/31/17/16/472839e25afe8&amp;filename=s15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22%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e25afe8%26filename%3Ds15%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바위가 있으면 어김 없이 불상이 새겨져 있다. 이 불상들이 자연과 하나되지 못했더라면 자연만 파괴했으리라.</FONT></STRONG></SPAN></P>
<P><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6/blog/2007/10/31/17/16/472839da6834a&amp;filename=s13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36%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a6834a%26filename%3Ds13%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STRONG></STRONG></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white>&gt;조금은 연륜이 있는 듯한 동종 하나가 무르익은 가을 햇살을 쬐고 있었다.</FONT></STRONG></SPAN></P>
<P><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19/blog/2007/10/31/17/16/472839d00d549&amp;filename=s8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19%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00d549%26filename%3Ds8%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화장실이 현대적이다. 나무로 지은 해우소가 아니라 붉은 벽돌로 만들었다. 이 현대적인 화장실은 지붕 위의 풀들로 인해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18/blog/2007/10/31/17/16/472839bdd4c15&amp;filename=s1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18%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bdd4c15%26filename%3Ds1%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nbsp;<FONT color=white> 연못으로 가는 길에 굴뚝 두 개가 연기룰 품어내고 있었다. 자연의 흙과 돌로 얼기설기 만들었나 보다.</FONT></STRONG></SPAN></P>
<P align=center><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blog/2007/10/31/17/16/472839c0a0525&amp;filename=s2복사.jpg')"><STRONG><FONT color=#0099ff></FONT></STRONG></A></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0099ff>&nbsp;</FONT></STRONG></SPAN><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5/blog/2007/10/31/17/16/472839de83c56&amp;filename=s14복사.jpg')"><FONT color=#333333 size=2><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5%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e83c56%26filename%3Ds14%EB%B3%B5%EC%82%AC.jpg" border=0></SPAN></STRONG></FONT></A></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10/blog/2007/10/31/17/16/472839c2cf4e1&amp;filename=s3복사.jpg')"><FONT size=2><STRONG></STRONG></FONT></A></P>
<P align=left><FONT size=2></FON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수양버들이 연못에 머리를 감고 있었다. 이 깊은 지리산중의 연못이라. 인공적이긴 마찬가지지만 독특한 느낌을 준다</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9/blog/2007/10/31/17/16/472839c561080&amp;filename=s4복사.jpg')"><STRONG></STRONG></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7/blog/2007/10/31/17/16/472839d1c3d4f&amp;filename=s9복사.jpg')"><FONT color=#333333 size=2><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27%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1c3d4f%26filename%3Ds9%EB%B3%B5%EC%82%AC.jpg" border=0></SPAN></STRONG></FONT></A></P>
<P align=left><FONT size=2></FON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탑으로 가는 길은 벼랑 위로 난간이&nbsp;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벼랑 아래의 나무판으로 지붕을 이은 너와집이 정겹다.</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3/blog/2007/10/31/17/16/472839c786f9f&amp;filename=s5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33%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c786f9f%26filename%3Ds5%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9/blog/2007/10/31/17/16/472839c561080&amp;filename=s4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9%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c561080%26filename%3Ds4%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법당인 극락전은 석굴로 조성되어 있었다.</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9.blog.daum.net/original/4/blog/2007/11/01/10/37/47292de4f118e&amp;filename=s17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9.blog.daum.net%2Fimage%2F4%2Fblog%2F2007%2F11%2F01%2F10%2F37%2F47292de4f118e%26filename%3Ds17%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극락전 내부의 화려한 조각</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10.blog.daum.net/original/13/blog/2007/11/01/10/43/47292f269ddb4&amp;filename=s18복사.jpg')"><SPAN style="FONT-SIZE: 12pt"><STRONG><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sapphier88" target=_blank>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10.blog.daum.net%2Fimage%2F13%2Fblog%2F2007%2F11%2F01%2F10%2F43%2F47292f269ddb4%26filename%3Ds18%EB%B3%B5%EC%82%AC.jpg" border=0></STRONG></SPAN></A></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nbsp;</P>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ize=+0><FONT color=white>극락전 앞의 샘</FONT></STRONG></SPAN></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19/blog/2007/10/31/17/16/472839cb310c8&amp;filename=s6복사.jp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19%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cb310c8%26filename%3Ds6%EB%B3%B5%EC%82%AC.jpg" border=0></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4/blog/2007/10/31/17/16/472839cd7b012&amp;filename=s7복사.jp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4%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cd7b012%26filename%3Ds7%EB%B3%B5%EC%82%AC.jpg" border=0></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5/blog/2007/10/31/17/16/472839d3f2525&amp;filename=s10복사.jpg')">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25%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d3f2525%26filename%3Ds10%EB%B3%B5%EC%82%AC.jpg" border=0></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1/blog/2007/10/31/17/16/472839d56a41e&amp;filename=s11복사.jpg')"></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9/blog/2007/10/31/17/16/472839d728b2e&amp;filename=s12복사.jpg')"></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6/blog/2007/10/31/17/16/472839da6834a&amp;filename=s13복사.jpg')"></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5/blog/2007/10/31/17/16/472839de83c56&amp;filename=s14복사.jpg')"></A></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22/blog/2007/10/31/17/16/472839e25afe8&amp;filename=s15복사.jpg')"></A></P>
<P align=left>&nbsp;<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10/blog/2007/10/31/17/16/472839c2cf4e1&amp;filename=s3복사.jpg')"><FONT color=#333333 size=2> </FONT>
<IMG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7.blog.daum.net%2Fimage%2F10%2Fblog%2F2007%2F10%2F31%2F17%2F16%2F472839c2cf4e1%26filename%3Ds3%EB%B3%B5%EC%82%AC.jpg" border=0></A></P>
<P align=left><A href="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36/blog/2007/10/31/17/16/472839e603d75&amp;filename=s16복사.jpg')"></A></P>
<P align=left>
<TABLE width="100%">
<TBODY>
<TR>
<TD vAlign=top>
<DIV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굴림,굴림체,Gulim,Baekmuk Dotum,Undotum,Apple Gothic,Latin font,sans-serif">
<TABLE style="BACKGROUND: none transparent scroll repeat 0% 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8pt; PADDING-LEFT: 8pt; PADDING-BOTTOM: 8pt; PADDING-TOP: 8pt" vAlign=top><!EMBED src=http://bejuri.byus.net/music/mabangbooseuk.wma width="300" height="46" volume="0" loop="true" autostart="-1"><FONT face=Verdana color=#0080ff><BR><BR></FONT></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P></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CENTER>&nbsp;</CENTER><!EMBED style="FILTER: gray alpha(opacity=60)" align=center src=http://pds46.cafe.daum.net/original/6/cafe/2007/08/31/23/58/46d82c9fd4ea3&amp;.wma width=450 height=47 hidden=true type=audio/x-m volume="0" LOOP="TRUE" enablecontextmenu="0" AllowScriptAccess="never" s-wma><!--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P></P></FONT></A>
<CENTER></CENTER></TD></TR></TBODY></TABLE></TD></TR></TBODY></TABLE></CENTER></TD></TR></TBODY></TABLE><EMBED style="FILTER: (); WIDTH: 300px; HEIGHT: 43px" src=http://pds44.cafe.daum.net/original/2/cafe/2007/08/01/09/09/46afcf4d6a93e&amp;.mp3 hidden=true type=audio/x-ms-wma volume="0" loop="-1"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 <!-- end clix_content --><!-- end clix_content --></P>
<!-- -->
카페 게시글
여행정보
(퍼온글)지리산의 하늘정원
꼬지예지
추천 0
조회 19
09.05.22 16:3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