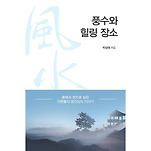<p><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span></span><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주에는 양남 외에도 주상절리 지형이 하나 더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악지구의 선도산 주상절리가 그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악서원 위 선도산 입구에서 구멍바위 유적지를 지나 용작계곡에 들어서면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0m</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걸쳐 주상절리와 계곡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남 주상절리는 규모가 크고 및 접근성이 좋아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은 규모가 작고 접근성 또한 다소 어려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나 알려져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압력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암석 표면에 수직 또는 수평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균열된 틈이나 선들을 절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join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주상절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columnar join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화산폭발 시 분출한 용암이 식어서 굳을 때 암석 표면의 수축점을 따라서 균열이 발생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균열선을 따라 기둥 모양의 특이한 바위가 형성된 것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도산에 주상절리가 있다는 것은 곧 선도산이 아주 오래전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말해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13F455C3F294627" class="txc-image" width="10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00" exif="{}" data-filename="지질도(축척200).jpg" id="A_99E13F455C3F294627D21E"/></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1&gt; 선도산 일대 지질도</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도산 일대 지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생성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퇴적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산암 및 규장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성 퇴적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충적층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장 먼저 생성된 것은 산사면 일대 넓게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당시 경주를 포함한 경상도 일대 곳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호수들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퇴적암은 그 호수 속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로부터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만년이 흘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때까지만 해도 호수였던 이곳에 화산폭발이 일어나 화산지형을 만들어 놓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산폭발로 땅속의 용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그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지표 위로 흘러나와 식은 것이 안산암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마그마가 땅 속을 뚫고 올라오다가 땅 위로 분출하지 않고 지하 얕은 곳에서 그대로 식은 것이 규장암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때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기존의 퇴적암을 꿰뚫고 올라오면서 그 주위 퇴적암에 엄청난 열을 가해 구워버려 변성 퇴적암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지막으로 충적층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침식된 산정 부위의 암석들이 잘게 부서진 상태로 운반 및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층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nbsp;&nbsp; </span></span></p><p><br></p></span><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3BA455C3F294A21" class="txc-image" width="943"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943" exif="{}" data-filename="지질도지형도겹침.jpg" id="A_99B3BA455C3F294A214B0B"/></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2&gt; 선도산 일대 지질도 세부</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선도산 일대의 지질적 구성에서 주상절리는 규장암 지대에서 생성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p></span><p><p style="text-align: center;"><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BE9455C3F294C30"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IMG_0039.jpg" id="A_991BE9455C3F294C3095AF"/><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3&gt;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상절리가 시작되는 지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A)</span></span></p><p><br></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은 시멘트 다리에서 오른쪽 오솔길로 접어들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수 십 미터의 밋밋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이내 무언가 신비롭기도 하면서 조금은 오싹한 기운이 감도는 주상절리 초입부가 눈에 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p><p><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A30455C3F294D2C"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20181208_144353.jpg" id="A_996A30455C3F294D2CAD26"/><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4-1&gt; 주상절리들의 모습</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226455C3F294F31"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20181208_144547.jpg" id="A_990226455C3F294F31772F"/></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4-2&gt; 주상절리들의 모습</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DE1455C3F295135"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IMG_0055.jpg" id="A_997DE1455C3F295135B58D"/></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4-3&gt; 주상절리들의 모습</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계곡이 깊어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각종 형상의 주상절리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만 년 전 자신이 만들어지던 모습을 드러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1~3). </span></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DB7455C3F295335"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20181208_144845.jpg" id="A_997DB7455C3F295335D875"/></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5&gt;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장암과 퇴적암의 경계지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지점)</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span></p><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tartFragment--><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0m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를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사이 조금씩 경사가 가팔라지다가 계곡 좌우측으로 색깔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지점이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은 규장암과 퇴적암의 경계 지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왼쪽이 규장암이고 오른쪽이 퇴적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성 퇴적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nbsp;</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nbsp;</span></p></span><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65F455C3F295427" class="txc-image" width="94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949" exif="{}" data-filename="규장암퇴적암경계면.jpg" id="A_99165F455C3F2954277D5A"/></span></span></p></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span><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text-indent: 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g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장암이 퇴적암을 뚫고 올라온 경계지점</span></p><p><br></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span></span><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지점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번에는 규장암이 퇴적암을 뚫고 올라왔던 경계 지점의 모습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진 왼쪽이 퇴적암이고 오른쪽이 규장암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작은 경계선 하나에 수 천 만년의 시간 간극이 있음을 생각하며 보면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함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46B455C3F29562D"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IMG_0065.jpg" id="A_99546B455C3F29562D3746"/></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lt;그림 7&gt; 다시 퇴적암 지대로 접어들면서 밋밋한 골짜기가 이어진다<br></span></p><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br></span></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erif; font-size: 14pt;"><!--StartFragment--><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퇴적암 지대가 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부터는 자연이 선물한 한편의 드라마가 끝이 나고 다시 밋밋하고 평범한 골짜기가 이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span><p><br></p>
<!-- -->
카페 게시글
풍수로 읽는 경주
화산폭발로 생성된 경주 선도산과 주상절리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