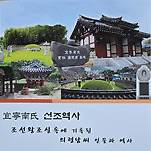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23">◆ 남지(南贄) - 우상절제사공파&#160; 5세</span></p><p>&#160;</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0">▲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 남을번(南乙番)의 4남 &#8211; 남지(南贄)</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남지(南贄, 1360년?~1398년,태조 7년) 여말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우상절제사공(右廂節制使公)파 파조이다. 부친은 고려 밀직부사를 지냈으며 조선개국으로 익대보조찬화공신으로 보국숭록대부 문하시중(門下侍中)에 특진되었다.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경렬(敬烈)의 시호를 받으신 남을번(南乙番)이다. 모친은 계림최씨 최강(崔&#33587;)의 딸이시다. 형제는 4남 3녀중 4남으로 조선개국공신 충경공 남재(南在), 강무공 남은(南誾)이 있으며 문의공 남실(南實)이 있다. </span></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18">&#160; 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출생연도 기록은 없으나 </span><span data-ke-size="size18">136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전후로 추측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1393</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장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將軍</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중국 사신으로 간 주문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奏聞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게 어명을 받아 하사품을 전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1395</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 </span><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2</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3</span><span data-ke-size="size18">일 부친인 검교 시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檢校侍中</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을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乙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께서 타계하셨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후 우상절도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右廂節度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지냈으며 그의 둘째 형 남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誾</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과 뜻을 같이 하다 </span><span data-ke-size="size18">1398</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 </span><span data-ke-size="size18">7</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8</span><span data-ke-size="size18">월 무인정사</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차 왕자의 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휘말려 이방원의 일파에게 남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誾</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도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심효생</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沈孝生</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박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유만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장지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변중량</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노석주과 함께 살해 당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큰 형인 남재는 평소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은과 뜻이 같지 않아 거리를 두어 화를 피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방원은 왕자의 난 이후에도 그의 삼족을 멸하지 않고 자식들도 살려두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형 남은의 차남 남경우는 판중추원사</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병조판서에 이르고 봉조청이 된 후 안호라는 시호까지 받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자식들 또한 멸하지 않았으며 그 후 후손들이 번창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 </span><span data-ke-size="size18">사후 </span><span data-ke-size="size18">1455</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세조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원종 공신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등에 녹</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훈 받으셨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160;</p><p>&#160;</p><p>&#160;</p><hr data-ke-style="style7"><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0">◆ 남지(南贄)의 가계도 </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91.0467%; height: 307px;" border="1" data-ke-style="style6"><tbody><tr style="height: 50px;"><td style="width: 82.8497%; height: 50px; text-align: center;" colspan="6"><span data-ke-size="size18">군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君甫</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령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령남씨 관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td><td style="width: 8.19676%; height: 50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세</span></td></tr><tr style="height: 42px;"><td style="width: 82.8497%; height: 42px; text-align: center;" colspan="6"><span data-ke-size="size18">익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益&#32989;</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사공</span></td><td style="width: 8.19676%; height: 42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세</span></td></tr><tr style="height: 49px;"><td style="width: 82.8497%; height: 49px; text-align: center;" colspan="6"><span data-ke-size="size18">천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天老</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중공</span></td><td style="width: 8.19676%; height: 49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세</span></td></tr><tr style="height: 60px;"><td style="width: 12.3581%; height: 60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을경</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乙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td><td style="width: 13.6191%; height: 60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을진</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乙診</span><span data-ke-size="size18">)</span></td><td style="width: 56.8725%; height: 60px; text-align: center;" colspan="4"><span data-ke-size="size18">을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乙番</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경렬공</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령부원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宜寧府院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td><td style="width: 8.19676%; height: 60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세</span></td></tr><tr style="height: 52px;"><td style="width: 12.3581%; height: 106px; text-align: center;" rowspan="2"><span data-ke-size="size18">좌찬성공</span></td><td style="width: 13.6191%; height: 106px; text-align: center;" rowspan="2"><span data-ke-size="size18">사천백공</span></td><td style="width: 19.1677%; height: 52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td><td style="width: 16.7717%; height: 52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實</span><span data-ke-size="size18">)</span></td><td style="width: 10.7189%; height: 52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誾</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의성군</span></td><td style="width: 10.2142%; height: 52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의령군</span></td><td style="width: 8.19676%; height: 52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5</span><span data-ke-size="size18">세</span></td></tr><tr style="height: 54px;"><td style="width: 19.1677%; height: 54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우상절제사공</span></td><td style="width: 16.7717%; height: 54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보문각제학공</span></td><td style="width: 10.7189%; height: 54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강무공</span></td><td style="width: 10.2142%; height: 54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충경공</span></td><td style="width: 8.19676%; height: 54px; 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파</span></td></tr></tbody></table></div><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9724;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친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을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乙番</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령부원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宜寧府院君</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호 </span><span data-ke-size="size18">경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敬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9724; </span><span data-ke-size="size18">모친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인최씨 계림최씨 최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崔&#33587;</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딸</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983804; </span><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남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 </span><span data-ke-size="size18">?~1398</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우상절제사</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983804;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인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8729; </span><span data-ke-size="size18">장자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계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季彦</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 &#160;- </span><span data-ke-size="size18">손자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세웅</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世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983804; </span><span data-ke-size="size18">장남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在</span><span data-ke-size="size18">, 1351</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1419</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충경공</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봉호 의령부원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宜寧府院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983804; </span><span data-ke-size="size18">차남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誾</span><span data-ke-size="size18">, 1354</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1398</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강무공</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봉호 </span><span data-ke-size="size18">의성부원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宜城府院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983804;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동생</span><span data-ke-size="size18">) :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實</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보문각제학공 목재공</span></p><p>&#160;</p><p>&#160;</p><p>&#160;</p><hr data-ke-style="style7"><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20">▲ 태조실록의 기록 남지(南贄)</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65517; </span><span data-ke-size="size18">1393</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6</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일 주문사 남재에게 의복과 술을 내리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장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將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보내어 주문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奏聞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게 의복과 술을 내리게 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65517; </span><span data-ke-size="size18">1395</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 </span><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2</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3</span><span data-ke-size="size18">일 검교 시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檢校侍中</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을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乙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卒</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을번의 본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本貫</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진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晉州</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령</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宜寧</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영광 군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靈光郡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천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天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아들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천성이 순후하고 근신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조에 벼슬하여 밀직 부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密直副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이르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들 넷이 있으니 남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誾</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남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實</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개국 당초에 재와 은이 개국 공신이 되었으므로 검교 시중을 받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향년이 </span><span data-ke-size="size18">76</span><span data-ke-size="size18">세이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諡號</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경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敬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라 하고 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장사를 치렀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65517; </span><span data-ke-size="size18">1398</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 </span><span data-ke-size="size18">7</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8</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26</span><span data-ke-size="size18">일 제</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차 왕자의 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도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심효생 등이 숙청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중략</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 등이 이미 우리 무리를 제거하게 된다면 너도 또한 마침내 면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너를 부른 것인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너는 어찌 따르지 않았는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금 비록 외방에 나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잘 가거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잘 가거라</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p><p><span data-ke-size="size18">장차 통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通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안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安置</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하려고 하여 양화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楊花渡</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건너 도승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渡丞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유숙하고 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방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芳幹</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이백경</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伯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등과 더불어 또 도당</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都堂</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의논하여 사람을 시켜 방번을 죽이게 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안군이 방석과 방번이 죽었단 말을 듣고 비밀히 이숙번에게 일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중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군사들이 변중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노석주와 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등을 잡아 가지고 나오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변중량이 정안군을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게 뜻을 기울이고 있은 지가 지금 벌써 두서너 해 되었습니다</span><span data-ke-size="size18">.&quot; </span><span data-ke-size="size18">정안군이 말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저 입도 또한 고기덩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p><p><span data-ke-size="size18">또 남지는 남은의 아우로서 이때 우상 절도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右廂節度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가 되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모두 순군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巡軍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가두었다가 뒤에 길에서 목을 베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濟</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가 나오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안군이 이제에게 일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본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本家</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돌아가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중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span data-ke-size="size18">&#65517; </span><span data-ke-size="size18">1455</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세조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중략</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사직 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 2</span><span data-ke-size="size18">등에 녹</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2</span><span data-ke-size="size18">등에게는 각각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후세에까지 유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宥罪</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자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資級</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더하여 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사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자급을 더하여 준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160;</p><p>&#160;</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의령남씨 <span data-ke-size="size18">남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贄</span><span data-ke-size="size18">), 우상절도사 남지, 우상절제사 남지, 강무공 남은, 충경공 남재, 문의공 남실</span></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data-ke-size="size18">보문각제학공 남실, 1차왕자의 난 남지, 이방원, 무인정사 남지, 정도전, 심효생, 남지, 변중량</span></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data-ke-size="size18">남을번, 의령부원군, 장군 남지, 원종공신 남지</span></span></p><hr data-ke-style="style6"><p><span data-ke-size="size14">&lt;참고문헌&gt;</span></p><p><span data-ke-size="size14">의령남씨 족보</span></p><p><span data-ke-size="size14">태조실록</span></p><p><span data-ke-size="size14">세조실록</span></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