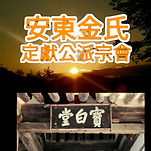<p style="line-height: 0.5;"></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2pt; mso-bidi-font-family: 바탕;"><font color="#000000">국역삼구정판상시문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國譯三龜亭板上詩文集</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font color="#000000" size="2" face="맑은 고딕">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12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부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附錄</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선고사헌부장령공부군행장</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先考司憲府掌令公府君行狀</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 </font></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公姓金諱永銖字積翁世爲安東大姓新羅苗裔也其先曰金宣平在高麗初有大功於太祖德加于民府人思之世世祀之不絶公卽其後也</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공성김휘영수자적옹세위안동대성신라묘예야기선왈김선평재고려초유대공어태조덕가우민부인사지세세사지불절공즉기후야</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高祖諱得雨中顯大夫典農正曾祖諱革修義校尉虎勇巡衛司右領卽將兼閤門奉禮郞祖諱三近宣敎郞比安縣監考朝散大夫漢城判官</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고조휘득우중현대부전농정증조휘혁수의교위호용순위사우령즉장겸합문봉례랑조휘삼근선교랑비안현감고조산대부한성판관</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諱係權娶崇政大夫藝文館大提學諡齊平公權孟孫女以正統十一年丙寅八月十九日生公于漢陽第公幼而魁偉寡言簡重人多奇之年</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휘계권취숭정대부예문관대제학시제평공권맹손녀이정통십일년병인팔월십구일생공우한양제공유이괴위과언간중인다기지년</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十三判官公捐&#33304;公早孤隨慈氏就養于安東豊山里舍旣冠業武一擧不中蔭補軍職尋除義禁府都事時宣城君盧思愼爲判事益城君洪</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십삼판관공연관공조고수자씨취양우안동풍산리사기관업무일거부중음보군직심제의금부도사시선성군노사신위판사익성군홍</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應爲知事公性精敏練達吏事凡獄詞供牒裁之如流嘗具案以進于堂上則二公必曰此莫是金都事供牒乎不復加省卽上聞其信重如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응위지사공성정민연달리사범옥사공첩재지여유상구안이진우당상칙이공필왈차막시김도사공첩호불복가성즉상문기신중여차</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常以公事謁于益城迎入臥內公事畢留與之飮歡甚無厭公之甥曰花川君權&#29770;會于朝二公詣花川譽之甚自喜其下官之得人也由是名</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상이공사알우익성영입와내공사필유여지음환심무염공지생왈화천군권감회우조이공예화천예지심자희기하관지득인야유시명</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著于朝擢爲司憲府監察居數月以親老乞外調尙州判官尙卽慶尙一道之衝也使華賓客之來踰嶺以南咸道于是而之他州地大人衆公</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저우조탁위사헌부감찰거수월이친노걸외조상주판관상즉경상일도지충야사화빈객지래유영이남함도우시이지타주지대인중공</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務甚&#22821;公應待賓客裁決公事咸善處之無怠益虔又日一朝于慈堂間起居具甘旨以養志焉治三年民順而容頌屬軍籍中有一字舛誤朝</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무심과공응대빈객재결공사함선처지무태익건우일일조우자당간기거구감지이양지언치삼년민순이용송속군적중유일자천오조</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廷擧法貶官時廣陵君李克培爲觀察使餞證考使達城君徐居正于州宴&#37219;貶其自京至二公咸罷席曰失一賢守也歎惜無巳公卽辭于二</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정거법폄관시광릉군이극배위관찰사전증고사달성군서거정우주연감폄기자경지이공함파석왈실일현수야탄석무사공즉사우이</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公將還鄕里二公留之飮一日明日又留之公單騎馳來二公不得强一州皆涕爭願留焉公就壟畝奉養大夫人力耕而食年三十有二矣居</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공장환향리이공유지음일일명일우유지공단기치래이공부득강일주개체쟁원유언공취롱무봉양대부인역경이식년삼십유이의거</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二年歸京師時天使鄭通來公主餉具周旋措置有善譽復除義禁府經歷俄遷都摠府都事又中樞府都事復乞外出爲盈德縣令盈之爲邑</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이년귀경사시천사정통래공주향구주선조치유선예복제의금부경력아천도총부도사우중추부도사복걸외출위영덕현령영지위읍</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岸大海地僻民&#22170;吏又驕悍難治觀察使之按行歲一至焉以故縣令布政嚴則吏民伺過訴于觀察使觀察使莫知令之賢否考當殿由是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안대해지벽민은리우교한난치관찰사지안행세일지언이고현령포정엄칙리민사과소우관찰사관찰사막지영지현부고당전유시령</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之嚴明者無全庸愚者畏懦因循不治者幾四十餘年公始至吏雁鶩行進退俯伏不中禮慢不加敬令出民不奉行公廉以持身信以示民賦</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지엄명자무전용우자외나인순불치자기사십여년공시지이안목행진퇴부복불중예만불가경영출민불봉행공염이지신신이시민부</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斂均平威惠幷著吏民莫敢動得吏民之尤無良不聽令者罪之大修鄕校又設黨庠聚童蒙敎訓之吏民始而怪之中而化之終而翕然大和</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렴균평위혜병저리민막감동득리민지우무량불청령자죄지대수향교우설당상취동몽교훈지리민시이괴지중이화지종이흡연대화</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時値乙巳凶斂餓&#27533;相望至有人相食公不遑暇食巡行部內道遇餓人以&#31964;粥飮之若父母之保護赤子一色全活莫有餓死者賑恤使八境</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시치을사흉렴아표상망지유인상식공불황가식순행부내도우아인이미죽음지약부모지보호적자일색전활막유아사자진휼사팔경</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按之以聞於朝廷朝廷陞階褒之及期滿超遷內瞻寺僉正將還吏民父老皆垂涕至今稱頌不置來京師一年朝廷將修鍾樓衆議擧公敏於</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안지이문어조정조정승계포지급기만초천내첨시첨정장환리민부로개수체지금칭송불치래경사일년조정장수종루중의거공민어</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事移拜繕工監僉正俄陞司憲府掌令又轉爲司饔院僉正尙衣院僉正尋移通禮院奉禮又求外補拜永川郡守&#33669;政廉公吏民稱平治未究</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사이배선공감첨정아승사헌부장령우전위사옹원첨정상의원첨정심이통례원봉례우구외보배영천군수리정염공리민칭평치미구</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以罪罷官復居豊山日侍大夫人以相娛樂時大夫人年八十餘矣公朝夕侍膳衣不解帶先是宅之東有茅茨架亭下瞰洛水景物無比公一</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이죄파관복거풍산일시대부인이상오락시대부인년팔십여의공조석시선의불해대선시택지동유모자가정하감낙수경물무비공일</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日登陟回望&#24832;然曰是我奉親之所今親老不樂後雖有華屋列鼎無與爲娛徒悔恨無窮也然茅茨不稱又狹小難居卽以書告于伯兄伯兄</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일등척회망초연왈시아봉친지소금친노불락후수유화옥열정무여위오도회한무궁야연모자불칭우협소난거즉이서고우백형백형</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曰是吾志也多與錢助之乃大闢營治五彩以華極&#38286;敞名三龜其下循溪以南植柳數十株又於閒曠地種栗以侈之每佳節以板輿扶侍大</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왈시오지야다여전조지내대벽영치오채이화극굉창명삼구기하순계이남식유수십주우어한광지종율이치지매가절이판여부시대</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夫人日遊於此諸伯氏仲氏姉妹耆舊皆從烹羔&#28848;鮮擊鼓鳴琴迭起爲壽鄕黨榮之道路過者瞻仰咨嗟時&#21445;判金克儉爲府使聞而美之時</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부인일유어차제백씨중씨자매기구개종팽고포선격고명금질기위수향당영지도로과자첨앙자차시참판김극검위부사문이미지시</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登玆亭爲壽畢歌詠其事以頌之歲丙辰冬大夫人捐館舍公哀毁過禮居廬三年計供喪事外未嘗一至于家旣服&#38347;二年朝廷以西方置傳</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등자정위수필가영기사이송지세병진동대부인연관사공애훼과례거려삼년계공상사외미상일지우가기복결이년조정이서방치전</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殘弊爲憂僉曰撫存蘇服非公莫可復起公秩正三品爲察訪金郊道公曰西方地卑濕&#30260;&#30296;侵加人壽不長南人莫宜居然吾廢棄多年</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잔폐위우첨왈무존소복비공막가복기공질정삼품위찰방김교도공왈서방지비습장려침가인수불장남인막의거연오폐기다년</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主上幸擢爲高秩以寵榮之今若辭焉是&#24541;辱</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君命也&#20917;事不辭難臣之職也敢不蚤夜匪懈以勉乃事卽馳赴旣至按驛之故凡弊於事者</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주상행탁위고질이총영지금약사언시첨욕<span><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군명야황사불사난신지직야감불조야비해이면내사즉치부기지안역지고범폐어사자</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盡革去之先是西方戌&#24508;武將歲一相代凡往來所過諸驛具芻糧食飮之國之故也由是武將年少豪悍不畏法亂擊驛吏豊其供具以威劫</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진혁거지선시서방술요무장세일상대범왕래소과제역구추양식음지국지고야유시무장년소호한불외법난격역리풍기공구이위겁</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脅之吏卒困若逃遁流亡所過騷然察訪不能禁又赴京使臣一歲中正朝</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聖節千秋凡三度往過焉其子弟軍官多持貨寶依憑國之貢獻</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협지이졸곤약도둔유망소과소연찰방불능금우부경사신일세중정조<span><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성절천추범삼도왕과언기자제군관다지화보의빙국지공헌</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濫發驛馬竊載無數雖臺官從以&#25791;劾不能止公下令諸驛曰凡所過賓客有不如法濫暴驛吏者卽報于我我將上聞衆訴然諾之得犯法者</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람발역마절재무수수대관종이검핵불능지공하령제역왈범소과빈객유불여법람폭역리자즉보우아아장상문중소연낙지득범법자</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數人聞于朝罪之過賓恐懼加敬莫敢犯驛路按堵流亡稍復又黃海一道地瀕海山多獸居民鮮少原陸川澤之間草木叢蔚&#40587;鹿豹&#32646;熊&#40597;</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수인문우조죄지과빈공구가경막감범역로안도유망초복우황해일도지빈해산다수거민선소원륙천택지간초목총울미록표비웅균</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獐狐兎之屬千百爲群&#20831;&#20831;林野是故前此爲察訪者樂於獵獸之娛廢棄公事&#39368;驛卒騁逸騎馳&#39446;山阪擊逐禽獸由是馬極人弊公始至聞</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장호토지속천백위군신신림야시고전차위찰방자락어렵수지오폐기공사구역졸빙일기치무산판격축금수유시마극인폐공시지문</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之卽罷之吏卒懷樂馬肥且大賓客騰頌是年秋大水饑公啓于朝日年饑賓客供用不足驛人將不堪奈何</font><span style="color: blue;"> <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font color="#000000">上乃下其啓戶曹其賜豆三百</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지즉파지이졸회락마비차대빈객등송시년추대수기공계우조일년기빈객공용부족역인장불감내하 <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상내하기계호조기사두삼백</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石又鹽百石又</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啓于朝日大同道三戶出馬一匹一&#33304;馬凡五十匹是故馬多而人力&#32019;臣所管之道一戶出馬一匹一站馬凡二十五匹是</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석우염백석우<span><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계우조일대동도삼호출마일필일관마범오십필시고마다이인력서신소관지도일호출마일필일참마범이십오필시</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故馬少而人力困加以頻年凶荒&#30296;疫相尋流亡殆盡請如大同道館軍例</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詔曰可以故宗簿寺正李世傑承</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命而往括民丁以實之又報</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고마소이인력곤가이빈년흉황려역상심유망태진청여대동도관군예<span><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조왈가이고종부시정이세걸승<span><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명이왕괄민정이실지우보</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于觀察使曰館舍僻陋無以待賓客明年王臣來其何以館接乃伐材陶瓦將治之未幾觀察使公&#25791;沿海鹽&#31427;公&#20006;海以西中&#30260;毒以壬戌七</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우관찰사왈관사벽누무이대빈객명년왕신래기하이관접내벌재도와장치지미기관찰사공검연해염조공병해이서중장독이임술칠</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月二十日來于金郊站年五十七四隣聞之哭之慟弔其孤賻贈有加諸孤奉柩達于京師所過郡縣皆於路祭之朝廷贈米豆十石紙二十卷</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월이십일래우김교참년오십칠사인문지곡지통조기고부증유가제고봉구달우경사소과군현개어노제지조정증미두십석지이십권</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又使禮官祭之八月賃船將發京師京師之大夫士多來祭之乃沂于漢泊忠州南踰鳥嶺還豊山故里權&#21405;於驛洞先塋之側明年三月三日</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우사예관제지팔월임선장발경사경사지대부사다래제지내기우한박충주남유조령환풍산고리권조어역동선영지측명년삼월삼일</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庚午葬于祖墓白虎東向之原公爲人性寬裕且毅美鬚髥善儀容身長八尺與人言笑侃侃不厭仁於親戚信於朋友處大事決大疑勇以敏</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경오장우조묘백호동향지원공위인성관유차의미수염선의용신장팔척여인언소간간불염인어친척신어붕우처대사결대의용이민</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33669;職謹昧爽&#30437;濯早衙親事日入乃罷又善射御圍&#26826;音律以至烹&#39146;工匠之事靡不精諸書畵亦有楷法嘗得晉帖法而書之數千餘度少時</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리직근매상관탁조아친사일입내파우선사어위기음율이지팽임공장지사미불정제서화역유해법상득진첩법이서지수천여도소시</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雖不讀書筮仕以來耳聞目見輒得不忘記聞甚&#24893;凡簡牘吏文衆咸不及以故其所交遊盡文人長者公之自永貶歸也伯兄曰爾無患人不</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수불독서서사이래이문목견첩득불망기문심박범간독리문중함불급이고기소교유진문인장자공지자영폄귀야백형왈이무환인불</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我用當大吾所修利其器而竣其時爾學不廣此天&#35416;爾以大其所受乎爾可讀吏未久而有用爾者矣公聞敎卽得綱目通鑑閱之無數公之</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아용당대오소수이기기이준기시이학불광차천굴이이대기소수호이가독이미구이유용이자의공문교즉득강목통감열지무수공지</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兄弟五人姉妹六人公居未焉伯兄出家爲</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世廟師名振一世名學祖仲叔皆有名於世家有大事諸兄咸屬公處之嘗誡諸子曰吾蚤孤&#35938;</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형제오인자매육인공거미언백형출가위<span><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세묘사명진일세명학조중숙개유명어세가유대사제형함속공처지상계제자왈오조고환</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養未能讀書習文不達於政以至於老爾曺無若乃翁然日加訓飭皆就法度又嘗語諸子曰吾仕宦三十年未嘗有愆德俯仰無&#24589;吾子孫必</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양미능독서습문불달어정이지어노이조무약내옹연일가훈칙개취법도우상어제자왈오사환삼십년미상유건덕부앙무작오자손필</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有建門戶者治家嚴且雍每&#38622;鳴整襟而坐終日無怠色堂室&#34894;&#34894;婢僕欣欣子弟敦詩書女婦務織&#32029;力農奉祭祝享賓客斥其餘以與隣里</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유건문호자치가엄차옹매계명정금이좌종일무태색당실간간비복흔흔자제돈시서녀부무직임역농봉제축향빈객척기여이여린리</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貧乏者雖愚賤之人未嘗慢易之鄕黨推以爲長以糾正風俗爲長數年一鄕大治每於春秋令節大會不老于鄕射堂以講信如古之鄕射禮</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빈핍자수우천지인미상만역지향당추이위장이규정풍속위장수년일향대치매어춘추영절대회부노우향사당이강신여고지향사예</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焉衆以爲美談公年二十五娶中直大夫綾城縣令金&#24893;之女生四男四女男長曰瑛中乙卯進士娶金光礪女生二男幼次曰&#29856;中戊午進士</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언중이위미담공년이십오취중직대부능성현령김박지녀생사남사녀남장왈영중을묘진사취김광여녀생이남유차왈번중무오진사</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娶判官洪傑女生一女幼次曰&#29862;曰&#29778;&#29862;未娶&#29778;年十三能通詩書善書法先公一歲而死女長適金磁子延孫生三男一女皆幼次適縣監金</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취판관홍걸녀생일녀유차왈애왈창애미취창년십삼능통시서선서법선공일세이사녀장적김자자연손생삼남일녀개유차적현감김</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禮生子胤宗生一女幼次適縣監琴啓子元壽餘幼</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예생자윤종생일녀유차적현감금계자원수여유</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홍치십육년계해삼월 일</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고자 영</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번 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弘治十六年癸亥三月 日</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孤子 瑛</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29856; 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선고 사헌부 장령부군 행장</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先考司憲府掌令公府君行狀</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성은 김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 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영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永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요 자는 적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積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니 대대로 안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대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신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후손이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선조는 김선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宣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니 고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高麗</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초에 있어서 태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太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큰 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세웠고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서</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마을 사람들이 사모하여 대대로 끊이지 않고 제사 지내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은 곧 그의 후손이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고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高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득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得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니 중현대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中顯大夫</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전농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典農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증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曾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신 수의교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修義校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호용순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虎勇巡衛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우영낭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右領郎將</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겸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합문봉예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閤門奉禮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할아버지의 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삼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三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니 선교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宣敎郞</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권맹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權孟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따님에게 장가 가시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정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正統</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십일년 병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丙寅</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팔월 십구일에 서울 집에서 공을 낳으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은 어려서부터 출중하시고 말이 적었으며 간결 중후하시어 사람들이 거의 기특하게 여겼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십삼세에 판관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判官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돌아가시어 어머니를 따라 안동 풍산리 집에서 자랐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성인이 되어 무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武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익혔으나 한번의 과거에 합격이 되지 않아서 음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蔭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군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軍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보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補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되셨다가</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곧 의금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義禁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都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받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때 선성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宣城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노사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盧思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판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判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되었고 익성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益城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홍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洪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지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知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되어 있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의 천성이 정밀하고 민첩하여 관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官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일에 통달하시어 모든 재판 서류에는 물 흐르듯 척척 결재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일찍이 안건을 갖추어서 당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堂上</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올리면 두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二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반드시 이렇게 말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것은 김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都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올린 안건이 아니냐』하고는 더 살피지도 않고 위에 보고하였으니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 두터운 신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信任</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이와 같았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일찍이 공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公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익성군을 뵈러 가니 내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內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맞아드리어 일이 끝나매 머물게 하여 술을 마시며 매우 즐거워하여</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싫은 빛이 없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의 생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甥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화천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花川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권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權&#29770;</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조회에 모여 있습니다』함에 두 분이 화천군에게 나아가니 하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下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쓸만한 사람 얻은 것을 기뻐하여 매우 칭찬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로부터 이름이 조정에 드날려 사헌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司憲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감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監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발탁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몇 달이 지나 어버이의 늙으심으로 해서 외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外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원하여 상주판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尙州判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되셨으니</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경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慶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한 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요충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要衝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사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使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나 빈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賓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이 새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조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鳥嶺</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모두가 여기를 지나서 딴 고을로 가야하기</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때문에 땅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공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公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매우 많은 곳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은 손님의 대접이나 공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公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결재에 있어서 모두 잘 처리하여 게으름 없이 더욱 경건하게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 하루에 한 번씩 꼭 어머니를 뵙고 거처의 편안함이나 음식의 맛을 물어 뜻으로 봉양하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다스리기 삼년에 백성이 순종하고 빈객들은 칭송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런데 군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軍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계실 때에 한 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잘못된 것이 있어서 조정에서는 법에 따라 관직을 물러나도록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때 광릉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廣陵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극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李克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관찰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觀察使</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되어 있었고 달성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達城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서거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徐居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증고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證考使</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와서</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서거정을 전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餞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려고 상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尙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서 전별연을 베풀고 있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술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면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免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소식이 서울에서 왔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두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二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함께 자리를 물리고『현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賢哲</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한 군수 하나 잃었다』하면서 애석해 마지 않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곧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두 분이 만류하여 하루를 더 마시고 다음날 또 만류하니</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단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單騎</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달려 가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두 분이 억지로 말릴 수가 없었고 한 고을이 모두 울면서 다투어 더 머물러 달라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전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田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며 힘써 농사하여 생활하니 나이 삼십이세 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년이 지나 서울로 돌아오니 그때 중국의 사신 정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鄭通</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왔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에게 식사나 모든 주선을 조치하심이 잘되었다는 칭찬을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래서 다시 의금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義禁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경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經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받으셨고 얼마 되지 않아 도총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都摠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都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옮기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시 중추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中樞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도사로 전직되셨다가 외직을 원하여 영덕현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盈德縣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되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영덕은 큰 바다에 접해 있고 땅이 궁벽하여 백성은 어리석고 아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衙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은 교만하여 다스리기 매우 어려웠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관찰사의 순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巡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한 해 한 번 정도였으니 현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縣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통치가 엄하면 아전이나 백성들이 잘못을 캐내어 관찰사에게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고소하고 관찰사는 현령의 현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賢否</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알지도 못하면서 추궁하니 이래서 현명한 현령은 온전히 견디지 못하고 용열하고</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어리석은 이는 두려워 인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仁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해서 다스려지지 않은지가 사십여년이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처음 오니 아전들의 태도나 질서가 제도와 예법에 맞지않고 오만하여 공손한 데가 없으며 명령이 내려도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백성들이 받들어 시행하려 하지 않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청렴된 몸가짐을 하며 신의로 백성을 대하고 수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水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균등하게 하여 권위와 혜택이 고루 드러나게 하니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아전이나 백성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吏民</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중에서도 아주 불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不良</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스러워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죄를 주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향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鄕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크게 수리하고 또 학교를 개설하여 어린이들을 모아서 가르쳤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아전이나 백성들이 처음에는 괴상히 여기더니 다음에는 감화되고 끝내는 흐뭇하게 어울렸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때마침 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乙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의 흉년을 만나서 굶주려 죽는 자가 계속되어 심하면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수도 있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은 자신이 식사할 사이도 없이 부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府內</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순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巡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다가 길에서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죽이라도 먹이기를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부모가 어린 아기 보호하듯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럼으로써 한 읍이 온전히 살아남아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진휼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賑恤使</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경내에 들어와 살펴보고 조정에 알리니 조정에서는 승급으로 초상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임기가 끝나 내첨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內瞻寺</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첨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僉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불러들이매 돌아가려 하니 이민의 부노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지금까지 칭송해 마지 않는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서울로 온지 일년만에 조정에서 장차 종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鍾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수리하려 하는데 중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衆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공이 일 처리에 민첩하다 하여 천거함에</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선공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繕工監</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첨정으로 옮겼다가 곧 사헌부장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司憲府掌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승진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시 사옹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司饔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첨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상의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尙衣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첨정으로 전직되었다가 곧 통례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通禮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봉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奉禮</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옮기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시 외직을 원하여 영천군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永川郡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보직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정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政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임하는 것이 청렴공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淸廉公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니 이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吏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태평스러운 정치를 칭송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얼마 안되어서 죄로 파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罷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됨에 다시 풍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豊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돌아와서 거처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날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서로 즐거워하시니 그때 어머니 나이는 팔십여세이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아침 저녁으로 모셔 음식이나 의복을 손수 살피어 게을리 함이 없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보다 먼저 집 동쪽에 띠로 지은 정자가 하나 있어 아래로는 낙동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洛東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굽어 볼 수가 있으니 경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景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더 이상 비할 데가 없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하루는 이 정자에 올라 바라보고 쓸쓸히 여겨『여기가 바로 내가 어버이를 모시던 곳인데 이제는 어버이가 늙으시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즐기지 못하니 비록 화려하고 큰 집이 있다 하더라도 즐길것이 없으니 한갖 한스럽기 그지없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런데 띠로 이음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협소하여 거처하기가 어렵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고는 곧 맏형님에게 편지로 알렸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맏형님도 이것이 바로 내 뜻이었다 하여 많은 돈을 주어 도왔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에 넓혀짓고 오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五色</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단청하니 호화스러운 큰 집이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삼구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三龜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라 이름하고 그 밑 시내에 따라 남쪽으로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심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 빈 땅에다 밤나무를 심어 사치를 피웠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계절이 좋은 때에는 가마로 어머니를 모시고 날마다 여기를 노니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백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伯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중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仲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자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姉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고기를 삶고 풍류를 알리며 서로 헌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獻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니</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온 마을이 영화로이 여겼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길을 지나가던 이들도 우러러 보고 부러워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당시에 참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1445;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극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克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부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府使</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와 있으면서 소문을 듣고 찬미하여 가끔 이 정자에 올라 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빌며</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 사실을 노래하여 칭송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병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丙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공의 슬퍼하심이 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禮</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지나칠 정도로 여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廬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계시며 삼년을 지내되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상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喪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외의 일로는 한 번도 집에 가신 일이 없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삼년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三年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마친 뒤 이년 후에 조정에서 서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西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잔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殘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있음을 염려하여 모두 말씀하시기를</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산 사람을 매만져 주고 다시 소생하게 하려면 공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여 다시 공을 기용하고</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정삼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正三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품계를 주어 금교찰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郊察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삼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이르되『서방은 땅이 비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卑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고 유행병이 많아서 사람의 수명이 길지 못하여 남쪽지방 사람으로는 살기가</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마땅하지 않지만은 내가 버려졌던 지가 여러 해이었는데 주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主上</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께서 높은 품계로 발탁하시니 은총과 영화가 크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만약 이제 사양하면 이는 임금님의 명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더구나 사리가 신하노릇 하기 어려운 직책은 사양할 수가 없는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감히 밤낮으로 힘써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되겠는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고 곧 달려가서 임소에 이르러 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옛 폐단을 살피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잘못된 일은 모두 개혁해 없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보다 앞서 서방의 수자리로 가는 무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武將</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이 일년에 한 번씩 교대하니 오고 가며 역마다 말 먹이나 음식을 갖추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내라면서 이것은 국가의 일이라 하여 나이 어린 무장들이 거세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마구 다잡아서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행장의 장비를 풍족하게 하니 위협을 느낀 이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吏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은 괴로워 도망가 숨어 버린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지나는 곳마다 이렇듯 시끄러워도 찰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察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금하지를 못하고 또 중국으로 왕래하는 사신들이 한 해에도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정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正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성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聖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천추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千秋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등 무릇 세 번을 왕래하니 그 자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子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나 군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軍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이 재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財寶</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소지하고서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국가의 공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貢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라 빙자하면서 역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남발하여 무수히 훔쳐 싣고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비록 대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臺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따라 가기는 하나 검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檢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여 막지 못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모든 역에 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내려『지나는 손님이 법대로 하지 않고 역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난폭하게 하는 자는 곧 나에게 알리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내 임금님께 알리리라』하니 대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衆</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은 좋아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리고 법을 범한 자 및 그런 사실을 조정에 알려 죄를 주니 지나는 빈객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역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路</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에 있던 유망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流亡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도 점차 되돌아 왔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 황해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黃海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땅이 바다에 접하고 산에 짐승이 많아 거주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居住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적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산과 들 강이나 못 사이에 초목이 울창하여 사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호랑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표범</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노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토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여우등 수천 수백의 짐승들이 떼지어 숲을누볐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전에 찰방이 된 사람은 짐승 사냥만 좋아하여 공사는 돌보지도 않고 폐하다 싶이 하니 역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은 산으로 말을 몰아</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짐승만을 쫓고 있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래서 말도 지치고 사람도 시달리게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오자마자 이 소문을 듣고 곧 폐지시키니 이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吏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은 좋아했고 말이 살찌게 되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칭송하게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해 가을 홍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洪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흉년이 듬에 공이 조정에 알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흉년이 들어 빈객의 대접이 부족하여 역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하리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였더니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임금께서 그 상계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上啓文</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호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戶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내려 보내어 콩 삼백섬과 소금 백섬을 내리게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 조정에 아뢰되『대동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同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세 집에 말 한 필씩을 내어 한 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모두 오십필이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러므로 말이 많아 사람의 힘이 넉넉하나 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관할하는 한 집에 한 필이요</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한 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는 이십오필이니 그래서 말은 적고 사람의 힘이 고달픔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게다가 자주 흉년이 들고 돌림병이 찾아 들어 유망민이 거의 다 되어가니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청컨데 대동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同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관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館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예에 따르겠습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였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임금께서『좋다』하시고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종부시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宗簿寺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세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李世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하여금 왕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王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받들어 가서 민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民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살펴서 채우도록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 관찰사에게 알려서 이르되『관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館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누추하여 빈객을 접대할 수가 없으니 명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明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사신이 오게되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어떻게 대접해야 하겠는가』하고 이에 재목을 베고 기와를 구어 장차 수리하려 하는데 얼마 안되어 관찰사가 공에게</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바다를 따라 염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鹽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살려 보라』하니 공은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가 바다 풍토의 독기에 걸려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임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壬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 칠월 십이일 금교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郊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서 돌아가시니 나이 오십칠세이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사방에서 이 비보를 듣고 통곡하며 상제들을 조위하여 부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賻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많이들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여러 자제들이 운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運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여 서울로 오니 지나는 군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郡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마다 모두 노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路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지내 주었으며</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조정에서 쌀과 콩 열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종이 스무권을 내리시고 또 예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禮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보내어 조위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팔월에 배를 세내어 서울을 떠나려 하니 서울의 사대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士大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이 많이 와서 조위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이에 한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漢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따라 충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忠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닿아서 남쪽으로 새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조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鳥嶺</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넘어 풍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豊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땅 고향으로 내려와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역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驛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선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先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곁에 임시로 모셨다가 다음 해 삼월 초하루 경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庚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할아버지 묘소 오른쪽 능선 동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東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언덕에 장례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은 성품이 너그러우시고 강인하시며 보기 좋은 수염에 용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容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근엄 하시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팔척의 키에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정성껏 하시어 실증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친척들에게는 인자하시고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으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큰 일을 처리하고 큰 의혹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疑惑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판결함에 있어 용기가 있으시면서 민첩하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직책에 있어서는 근엄하셔서 새벽에 세수를 마치시고 일찍이 관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官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나와 사무를 보시며 해가 져야 끝내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한 활쏘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말타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바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음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音律</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심지어 제물이나 공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工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의 일까지도 정통하게 알지 못함이 없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서화</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書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도 정확한 법도가 있어 일찍이 왕희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王羲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법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法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얻어 수천번을 쓰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어려서 비록 책을 읽지 않았으나 벼슬에 나간 뒤로 듣고 본 것은 곧 잊지 않으니 견문이 대단히 넓으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모든 편지나 공문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公文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같은 것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래서 교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交遊</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한 사람이 모두 문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文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뛰어난 분이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이 영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永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서 면직되어 돌아오매 맏형님이 이르시되</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너는 남이 나를 써 주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지말고 모름지기 네가 닦아야 할 것을 키우고 그릇을 갈아서 때를 기다려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네 학문이 넓지 못한 것은 하늘이 너를 굽히게한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네가 태인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를 읽어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오래지 않아서 너를 쓰게 될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니 공은 가르침을 받고 곧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강목통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綱目通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무수히 읽으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은 형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兄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다섯이고 자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姉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여섯인데 공은 막내이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맏형은 출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出家</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시어 세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世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스승이 되어 명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名聲</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한 세대에 드날려 이름난 자이시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둘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셋째도 모두 유명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집에 큰일이 있므면 형들이 공에게 부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일찍이 모든 아들들에게 훈계하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나는 일찍이 부모의 부양을 잃어 공부를 하지 못하여 정사에 통달하지 못하고 늙음에 이르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너희는 이 늙은이처럼 되지 말아라』하고 날로 훈계를 가하여 모두 법도에 맞게 하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또 일찌기 아들들에게 말씀 하시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내가 벼슬살이 삼십년에 일찌기 덕을 편 것은 없지만 하늘과 땅에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내 자손에는 반듯이 문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門戶</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세울 자가 있을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시고 집 다스림이 엄하고도 화하시어 닭이 울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의관을 정제하고 앉으셔서 종일토록 게으른 빛이 없으시니 집안이 단란하고 종들도 화합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자제들은 시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詩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힘쓰고 여자들은 길쌈에 힘썼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농사에 힘써 제사 받들고 손님 접대하고 남은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쾌척하시며 비록 어리석고 천한 사람에게라도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없신여기지 않으시니 마을에서는 큰 어른으로 추대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것은 풍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風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바로 잡는 사람이라야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몇 해만에 한 마을이 크게 다스려져 항상 봄 가을의 명절에는 향사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鄕射堂</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나이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옛날의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향사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鄕射禮</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와 같이 하니 모든 사람들이 미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美談</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여겼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의 나이 이십오세에 중직대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中直大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능성현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綾城懸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24893;</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따님에게 장가드셔서 사남 사녀를 두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맏이는 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니 을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乙卯</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 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進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합격하였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김광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光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이남을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음은 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9856;</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니 무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戊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 진사에 합격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판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判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홍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洪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일녀를 두니 아직 어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음은 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9862;</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와 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16091;</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인데 애는 아직 미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未婚</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역은 나이 열세살에 시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詩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능통하고 글씨를 잘 썼는데 공보다 일년 앞서 갔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딸 맏이는 김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아드님 연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延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출가하여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음은 현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縣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예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禮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아드님 윤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胤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출가하여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직 어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음은 현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縣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금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琴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아들 원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元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출가했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음은 아직 어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홍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弘治</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십육년 계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癸亥</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삼월 일</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고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孤子</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9856;</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짓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숙인강릉김씨행장</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淑人江陵金氏行狀</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 </font></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金氏新羅宗姓遠祖周元太宗王之孫護國不嗣退居溟州因封溟州郡王子孫以爲貫郡今之江陵其後曰宗基曰貞茹曰陽曰仁孝德業文章</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김씨신라종성원조주원태종왕지손호국불사퇴거명주인봉명주군왕자손이위관군금지강릉기후왈종기왈정여왈양왈인효덕업문장</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史不絶書高祖諱光乙高麗侍中封溟原府院君曾祖諱錘工曹判書祖諱從南抱川監務考諱&#24893;綾城縣令娶縣監柳&#29809;女以景泰壬申生夫人</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사불절서고조휘광을고려시중봉명원부원군증조휘추공조판서조휘종남포천감무고휘박능성현령취현감유전녀이경태임신생부인</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少而敬順綾城愛之嘗曰福哉此兒旣&#31492;配掌令性純淑容儀端正喜&#24909;不形於色解文曉理事姑奉祭克盡誠孝治家有法訓子有方侍婢御以</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소이경순능성애지상왈복재차아기계배장령성순숙용의단정희온불형어색해문효리사고봉제극진성효치가유법훈자유방시비어이</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禮宗族咸稱其仁長子瑛登丙寅科爲藝文奉敎司諫院正言吏曹正郞司憲府掌令弘文館應敎政府舍人出爲密陽金堤邑宰仲子&#29856;登癸酉</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禮宗族咸稱其仁長子瑛登丙寅科爲藝文奉敎司諫院正言吏曹正郞司憲府掌令弘文館應敎政府舍人出爲密陽金堤邑宰仲子&#29856;登癸酉</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甲科爲兵曹佐郞京畿都事承文判敎工曹正郞出爲安陰宰夫人自失所天從二子享其養者十有五年歲庚辰六月十七日終于安陰衙年六</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갑과위병조좌랑경기도사승문판교공조정랑출위안음재부인자실소천종이자향기양자십유오년세경진육월십칠일종우안음아년육</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十九其年九月七日&#31060;葬掌令公塋後瑛生二男一女曰生洛生漢女幼&#29856;一男一女曰生海女適進士金義貞珣生二男曰生河生溟長女&#23167;金</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십구기년구월칠일부장장령공영후영생이남일녀왈생낙생한녀유번일남일녀왈생해녀적진사김의정순생이남왈생하생명장녀서김</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延孫進士次金儒癸酉武科與&#29856;同榜一時遊街鄕里榮之今宣傳官次琴元壽次金胤宗別坐安恁李水南</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color: blue; 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연손진사차김유계유무과여번동방일시유가향리영지금선전관차금원수차김윤종별좌안임이수남</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중종신사수비부인행장병각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中宗辛巳竪碑夫人行狀幷刻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숙인강릉김씨행장</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淑人江陵金氏行狀</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김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신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종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宗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며 원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遠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주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周元</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태종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太宗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손자로서 나라를 사양하고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명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溟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떨어져 살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따라서 명주군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溟州郡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봉해져 자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子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관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貫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삼았으니 지금의 강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江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 뒤 종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宗基</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정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貞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인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仁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덕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德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문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文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끊기지 않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고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高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광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光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고려의 시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侍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명원부원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溟原府院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봉했고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증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曾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추</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공조판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工曹判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고 할아버지 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종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從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포천감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抱川監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며</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아버지 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4893;</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능성현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綾城縣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시니 현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縣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류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柳&#29809;</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경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景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임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壬申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明 代宗 三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조선 문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文宗二年</font><span><font color="#000000">1452)</font></span><font color="#000000">에 부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夫人</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낳으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부인은 어려서부터 공순하셔서 능성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綾城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께서 사랑하시며 말하기를『복 스럽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아이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시더니</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성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成禮</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여 장령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掌令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배필이 되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성품이 순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純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시고 용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容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단정하시며 기쁘거나 노여웁거나 그 빛이 얼굴에 들어나지 않으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문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文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이해하고 이치를 터득하셨으며 시어머님을 섬기거나 제사를 받드는데 있어서 효성을 다하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법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法度</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의 교육에도 방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方便</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있었으며 예의로 시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侍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들을 다스리니 종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宗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모두</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의 인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仁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심을 칭찬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맏아들 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병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丙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의 과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科擧</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올라 예문관봉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藝文館奉敎</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사간원정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司諫院正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조정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吏曹正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사헌부장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司憲府掌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홍문관응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弘文館應敎</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정부사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政府舍人</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되었다가 외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外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나아가</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밀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密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읍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邑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둘째 아들 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9856;</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계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癸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의 갑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甲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올라 병조좌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兵曹佐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되고 경기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京畿都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승문원판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承文院判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공조좌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工曹佐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안음군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陰郡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부인께서 부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夫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여윈 뒤로 두 아들을 따라 여생을 사시다가 십오년만인 경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庚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 유월 십칠일에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안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관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館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서 돌아가셨으니 나이 예순아홉이셨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그 해 구월 칠일에 장령공의 묘소 뒤에 부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31060;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이남 일녀를 두니 생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生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생한</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요 딸은 아직 어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9856;</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일남 일녀를 두니 생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生海</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요 딸은 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進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의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義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게 출가 하였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이남을 두니 생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生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생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生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큰 사위는 진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進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연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延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작은 사위는 김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니 계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癸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년에 무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武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여 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29856;</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동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同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합격하여 함께 유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遊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니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모두 영광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선전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宣傳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다음은 금원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琴元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 그 다음은 김윤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胤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 또 다음은 별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別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안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이수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李水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br style="mso-special-character: line-break;"></font><font color="#000000"><br style="mso-special-character: line-break;"></font><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중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中宗</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신사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辛巳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비를 세우고 부인의 행장도 함께 새겼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아들 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瑛</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지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苟全公</font><span><font color="#000000">14</font></span><font color="#000000">世孫 金 台東 옮겨씀</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serif"; mso-bidi-font-family: 새굴림;'><font color="#000000" size="2">풍수지리적삼구정</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風水地理的三龜亭</font><span><font color="#000000" size="2">)</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 땅에서 거북처럼 오래도록 사소서</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본 원고는 이완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李完揆</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문경여자중학교 교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님이 지은 『안동풍수기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돌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突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땅과 인물』의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책</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문예서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서 가려 뽑은 글입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P 131~216)</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풍수지리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風水地理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고 사실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史實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인 면에 이르기까지 양택과 음택으로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다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多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한 소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素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재미있게 쓴 문장입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특히 오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吾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알려주는 가치있는 인양도서입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우리 마을에 관한 지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知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넓힐 수 있는 자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資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주신 저자 이완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편집자 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성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지금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어엿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아마 우리 나라만큼 내남없이 성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따지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흔히 성과 씨를 합하여 『성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라고 하는데 사실 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중국에서 시작된 성과 씨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춘추좌씨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春秋左氏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해설이 가장 일반 적이므로</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잠간 살펴 보도록 하겠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춘추</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春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노나라 은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隱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팔년 《겨울 십이월에 무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無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冬十有二月무해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無駭卒</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라는</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경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經文</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무해가 세상을 떠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우보가 무해의 시호와 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청하므로 은공이 중중에게 씨에관하여 물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에 중중이 대답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천자께서 덕이 높은 사람을 제후로 삼으심에 그가 태어난 땅의 지명을 가지고『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주시고 봉토로써 보답하여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봉토의 지명으로써『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삼습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성은 조상이</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태어난 땅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러므로 성에서 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나뉘고 족에서 다시 씨로 나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원칙적으로 성은 고칠 수 없지만 씨는 바꿀 수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예를 들면 안동을 성으로 하는</font><span><font color="#000000"> A</font></span><font color="#000000">씨가 많은 경우</font><span><font color="#000000"> A</font></span><font color="#000000">씨 중의 누군가가 자신의 직계를 다른 일족과 구별하기 위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B</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렇게 해서 안동</font><span><font color="#000000">A</font></span><font color="#000000">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안동</font><span><font color="#000000">B</font></span><font color="#000000">씨가 생겨난 것인데 이런 경우를 바로 성은 같고 씨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러나 이 원칙은 중국에서도 그대로 지켜진 예가 드물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보통은 성과 씨를 합하여 성씨라 하고</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그 개념의 차이도 별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우리 나라는 성을 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본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本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혹은 관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貫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라 불러 성과 씨를 구별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런데 본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본관은 바꾸고 씨는 구대로 유지하는 일이 아주 흔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즉 성은 바꾸면서 씨는 바꾸지 않는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렇게 되면 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보다 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안동김씨 가운데 소산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素山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거주하는 김씨들은 자신들을 소산 김씨라 부르는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는 김씨를 유지하면서 성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 경우 소산 김씨는 안동김씨 중에서 안동의 소산리 출신의 김씨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엄밀하게 보아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본관이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산을 본관이라 생각하게 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註</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산리 김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옛날 이름은 금산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山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인데 소산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素山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고쳐졌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병자호란 때 청음선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淸陰先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낙향하여 고쳐 부르게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쇠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음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音韻</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변화되면서 「시미」로 변해서 「시미김씨」라 부르기도 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후안동김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後安東金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김씨 중 다른 하나는 구안동 김씨와 구별하기 위해『후안동김씨』또는『신안동김씨』라 불리는</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신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혹은『후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後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인데 고려 개국공신 대광태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匡太師</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김선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宣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그 시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始祖</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 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흔히 안동김씨라고 하면 이 두 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김선평은 통칭 안동 삼태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三太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중 한 분으로 고려 초기의 공신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는 고창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古昌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토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土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자 성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城主</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서 고려 태조 십삼년</font><span><font color="#000000">(930)</font></span><font color="#000000">에 권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權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장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張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더불어</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태조를 도와 고창군에서 후백제의 경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甄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대파하여 대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되었으며 고창군은 안동부로 승격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는 권행</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장길과 함께 나란히 안동을 성으로 받아 신안동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신증동국여지승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增東國輿地勝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안동대도호부 총묘』조에는 삼태사의 묘만이 언급되어 있는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김선평의 묘는 부의 서쪽 고태장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또 『영가지』『총묘』조에는</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김선평의 묘는 부의 서쪽 고태장리에 있으며 지금 그 것에 단소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문중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숙종 십이년</font><span><font color="#000000">(1686)</font></span><font color="#000000">에 김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縯</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등이 지금의 안동 서후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西後面</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태장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台庄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서</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산소를 찾아 숙종 이십일년에 묘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廟壇</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건립하고 제사인 이상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履霜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세우고 입구에 조령각</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肇寧閣</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지어</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신도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神道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세웠다고 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일설에는 묘지석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자리가 확실하게 산소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하나 내 판단으로는 그 자리가</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음택풍수상 보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保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꽉 짜인 확실한 명당 터임이 분명하므로 정확한 자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흔히 후김을 가리켜「금관자가 서 말」이라고 하여 큰 벼슬을 많이 낸 비유로 삼는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후김은 조선 후기의 세도 가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고려조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했던 후김이 명문의 반석 위에 오르게 된 것은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조선 중기 사미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四味堂</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극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克孝</font><span><font color="#000000">:1542~1618)</font></span><font color="#000000">의 다섯 아들 가운데 선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仙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상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尙容</font><span><font color="#000000">:1561~1637)</font></span><font color="#000000">과</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청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淸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상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尙憲</font><span><font color="#000000">:1570~1652)</font></span><font color="#000000">에 의해서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들의 자취는 오늘날 풍산읍 소상리에 남아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선안동김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先安東金氏</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상락김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上洛金氏</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안동 김씨란 안동을 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하는 김씨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안동 김씨에는 같은 본을 쓰는 두 개의 유력한 문중이 있는데 우선 역사가 오랜 경주 김씨 계열의 선안동 김씨를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잠시 살펴보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경주김씨 계열 중에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아홉 아들중 냇째인 김은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殷說</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후손이 가장 번창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김은설의 둘째 아들 김숙승</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叔承</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시조로 하는 김씨가 세핑「선안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先安東</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김씨」로</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들을 흔히『선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先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혹은『구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舊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라 칭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 선김의 중시조는 고려 원종</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元宗</font><span><font color="#000000">:1229~1274)</font></span><font color="#000000">때의 시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侍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종</font><span><font color="#000000">1</font></span><font color="#000000">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자 상락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上洛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봉해진</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충열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忠烈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김방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 方 慶</font><span><font color="#000000">:1212~13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선김은 김방경을 파조로 하는 충열공파가 가장 번성하여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체;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size="2">(</font></span><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체;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size="2">註</font><span><font size="2">)</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金氏 始祖 金 諱 宣平</font><span><font color="#000000">(901~ ?) </font></span><font color="#000000">께서는</font><span><font color="#000000"> 36</font></span><font color="#000000">세때인 서기</font><span><font color="#000000">936</font></span><font color="#000000">년에 古昌城主 로서 高麗 建國을 위한</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大功</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대공</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세워 古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고창</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安東都護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안동도호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昇格</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승격</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함과 동시에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三韓 壁上功臣 輔國大匡</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삼한벽상공신 보국대광</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光祿大夫 太師亞父</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광록대부 태사아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에 이르렀고</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그때부터 本貫</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본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安東으로 쓰게 된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권·장태사는 이때 본관을安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안동</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으로 賜姓</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사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받은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舊</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金氏의 始祖 金叔承</font><span><font color="#000000">(?~1011 </font></span><font color="#000000">고려 제</font><span><font color="#000000">7</font></span><font color="#000000">대 顯宗</font><span><font color="#000000">3</font></span><font color="#000000">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위 金宣平보다 約</font><span><font color="#000000"> 6 </font></span><font color="#000000">王朝 後의 사람인데</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그 세거지가 풍산읍 회곡리이고</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舊</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金氏 最初 族譜</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大同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庚辰譜</font><span><font color="#000000">(1580 </font></span><font color="#000000">선조</font><span><font color="#000000">13</font></span><font color="#000000">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로써</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金氏의 最初 族譜 己亥譜</font><span><font color="#000000">(1719</font></span><font color="#000000">肅宗</font><span><font color="#000000">45</font></span><font color="#000000">년</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font><span><font color="#000000">140</font></span><font color="#000000">년 뒤에 출간된 점 등을 살펴보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263.95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text-indent: -263.95pt;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mso-char-indent-count: -29.33;"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mso-bidi-font-weight: bold;"><font color="#000000">先</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舊</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font color="#000000">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安東으로 구별 호칭케 된 근원은 최초족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大同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font><span><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font color="#000000">간행순에 의한 것</fon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으로추정됨</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color="#000000"> </font></span></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line-height: 0.5; text-indent: 306pt;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mso-char-indent-count: 34.0;"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color="#000000">安東金氏漁潭公派宗會長 杜漢 編</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바탕;'><font color="#000000">三</font></span></b><font face="맑은 고딕"><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00">,</font></span></b><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b></font><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바탕;'><font color="#000000">素耀山</font></span></b><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ace="맑은 고딕">)</font></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소요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素耀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은 산 이름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사차선으로 확장된 삼십사번 국도를 따라 안동에서 예천 쪽으로 가다 보면 풍산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풍산 이정표에서 우회전하여 옛길로 들어서 풍산읍에 이르면 읍내로 들어가는 길과 왼쪽으로 읍을 우회하는 길이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우회 도로의 신호등을 지나면 왼쪽으로 풍산들이 펼쳐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곧게 쭉 뻗은 도로에서 열한시 방향을 바라보면 우뚝한 산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다</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이 주는 느낀은 어떤가</font><span><font color="#000000"> ?</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각자 보고 느낄 일이지만 네가 소요산에서 받은 느낌은 우선 매우 덕스럽고 넉넉하다는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은 마치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래서 소요산을 보고 있으면 조용히 앉아 품안의 자식을 그윽히 바라보는 모정이 느껴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풍산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어떤 산도 소요산이 주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오직 소요산만이 그렇게 후덕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고 기대고 싶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런 느낌을 주는 산은 흔하지 않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은 해발이 백삼십팔미터인 낮은 산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러나 넓은 들을 마주보고 솟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산의 높이와 크기는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산들이 주는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느낌과 아주 다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즉 소요산은 높이가 낮고 규모가 작은 산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역량과 기세를 품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크기와 역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높이와 기세가 비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사람이 그렇듯 산도 그런 법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아니 세상 만물이 모두 그렇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러나 소요산의 기세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포근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더욱이 소요산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포근한 느낌은 더욱 분명해 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즉 먼 들판에서 보는 소요산은 위엄이 강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소요산은 위엄보다는 포근함과 다정함이 먼저 느껴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은 어머니처럼 역량이 넉넉하고 기세가 안온하여 믿고 의지하고픈 산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나는 언제부터인지 소요산을 지나칠 때마다『논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論語</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자하가 말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군자는 세 번 바뀌니 멀리서 바라볼 때는 엄연하고 가까이 다가 가면 온화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은 그런 산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엄연하면서도 따뜻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래서일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은 소요산이라는 산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은『소산 마을』을 지칭하며 또한 그 마을에 뿌리내린 「가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家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러므로 소요산은 그 자체로 산이며 사람이며 문중이며 역사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四</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소산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素山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요산과 인사를 나누며 우회 도로의 끝에 있는 네거리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화회마을 쪽으로 가는 구백십육번 지방도로를 만나게 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 길을 방죽길로 시작되는데 신호등에서 일키로미터도 못 가서 만나게 되는 다리가 소산교</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素山橋</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산교에 진입하기 전부터 한시 방향으로 무성한 숲에 둘러싸인 정자가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낸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 정자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삼구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三龜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 안쪽 마을은 안동에서 소산 김씨로 통용되는 안동김씨의 세거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世居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중 하나인 소산리 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산은 안동에서 가장 이름난 마을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 과거는 문론 현재까지도 많은 인물을</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배출한 유서깊은 마을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산리는 풍산들을 한눈에 굽어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영가지』에는 금산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山村</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라 기록되어 있으며</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현의 서쪽 오리쯤에 있는데 남쪽으로 넓은 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토지는 기름지고 넉넉하여 백곡이 모두 잘 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라고 쓰여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경북 마을지』에는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마을 뒤 정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鼎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과 서쪽의 관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冠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모두 표고 백미터 정도의 구릉이며 앞과 동쪽은 확 트인 들판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마을의 전체적 형상이「소가 누운 형국」이라 하여 쇠미 또는 금산</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山</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라 불리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라고 쓰여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원래는 금산리였던 마을이 소산리가 된 까닭은 병자호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丙子胡亂</font><span><font color="#000000">:1563)</font></span><font color="#000000">때 낙향한 김상헌이</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김가</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金哥</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가 사는 곳을 금산이라 하면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모름지기 검소하다는 소산으로 바꿔야 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고</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하여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산리는 마을의 주산인 소요산이 사람을 위해 품을 연 곳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lt;</font></span><font color="#000000">소산리 지형도</font><span><font color="#000000">&gt;</font></span><font color="#000000">의 백삼십팔미터의 산이 그것인데</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한 가지 약점은 마을의 주산으로서의 크기와 기세가 조금 약하다는 점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그러나 소요산이 넓은 들을 마주하고 멀리 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요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을의 주산이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약하거나 낮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오히려 백여미터에 불과한 산이 무척 높아 보일 정도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마을의 오른쪽은 오른팔 격인 백호가 가볍게 감싸안고 왼쪽은 왼팔인 청룡이 길게 뻗어 내려 마을의 앞을 감싸서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위호하고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좌청룡 언덕을『동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東吳</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라고 하는데 동오의 끝에 삼구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三龜亭</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 세워져 있다</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학가산 산록에 흘러내리는 물은 풍산읍 만운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晩雲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앞의 만운못에서 쉬다가 매곡리</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梅谷里</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를 지나 소산 앞으로 흐른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 물이 매곡천</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梅谷川</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매곡천이 소산에 이르면 북쪽에서 흘러오는 자그마한 시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편의상 이 시내를 소산천이라 부르겠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와 만나게 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이 합쳐지는 것을 합수라 하며 바로 그 지점을 합수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合手處</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라 한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소산리 앞에서 합수한 소산천과 매곡천은 마을을 뒤로하고 풍산들을 적시며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나지막한 산이 등으로 막아주고 앞으로 품을 열어 마을을 감싸니 이른바 장풍곡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사납지 않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이 거의 없는 내명당수가 마을 바로 앞을 흐르고 그 바깥으로 펼쳐진 넓은 들의 끝에</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외명당수가 감아 흐르니 농경 마을로서는 최적의 거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소산 마을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우리 나라의 마을을 형용하는 말로 익히 알려진「배산임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背山臨水</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징검다리가 놓여 있던 자리인 합수처에 지금은 소산교가 들어섰는데 이로 인해 마을의 경관이 망가지고 말았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마을 위로 놓여진 어지러운 다리와 도로 그리고 반</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反</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풍수적인 집들이 들어서지 말아야할 용호</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龍虎</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font color="#000000">의 등에까지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흩어짐으로써 소산의 소산다움을 해치고 있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하지만 상상은 자유이므로 반풍수적인 시설물을 치워버리고 원래의 소산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마을 자리의 아름다움과</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평화로움 그리고 풍족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font><span><font color="#000000">.</font></span></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br></font></span></b></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0.5;"><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font></span></p><p style="line-height: 0.5;"><font color="#000000" size="3" face="굴림"><br></font></p><p><br></p>
<!-- -->
카페 게시글
문중문집관리
부록(附錄)
oldboy
추천 0
조회 71
15.09.07 09:4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