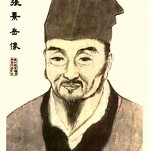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18">7-2-11) </span><span data-ke-size="size18">少陽人 表裏病結解 必觀於大便 而</span></p><p><span data-ke-size="size18">少陽人大便 頭燥尾滑 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 大便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其次 大便滑 一二次 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 病快解之大便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其次 一二次 尋常滑便者 有病者 病勢不加之大便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其次 或 過一晝夜有餘不通</span></p><p><span data-ke-size="size18">或 一晝夜間 三四五次 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양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少陽人</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표리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表裏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 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結</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거나 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은 </span><span data-ke-size="size16">반드시 대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便</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살펴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양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少陽人</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대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便</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두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頭燥</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미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尾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체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體大</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소통</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疏通</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평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平時</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 무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無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한 자의 대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便</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그 차</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次</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로 대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便</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1~2</span><span data-ke-size="size16">차</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次</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를 쾌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快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泄</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광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廣多</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는 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止</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은 유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有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한 자의 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쾌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快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는 대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便</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그 차(次)로 1~2차 심상(尋常)의 활변(滑便)을 하면 유병(有病)한 자의 병세(病勢)가 더하지는 않는 대변(大便)이니라.</p><p>그 차(次)는 하루(:一晝夜) 남짓(:有餘)을 지나도 불통(不通)하거나 하루(:一晝夜) 사이에 3~4~5차(次) 소소(小小)하게 활리(滑利)하면 장차 삽(澁)하려는 후(候)이니, 좋은 변(便)이 아니며 마땅히 미리 방(防)하여야 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2) </span><span data-ke-size="size18">少陰人 裏寒病 臍腹冷證 受病之初 已有腹鳴泄瀉之機驗而</span></p><p><span data-ke-size="size18">其機 甚顯則 病執證易見 而用藥可早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少陽人 裏熱病 胸膈熱證 受病之初 雖有胸煩悶燥之機驗而</span></p><p><span data-ke-size="size18">其機 不甚顯則 病執證難見 而用藥太晩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若使 少陽人 胸煩悶燥之驗 顯然露出 使人可覺則 其病已險 而難爲措手矣</span></p><p><span data-ke-size="size18">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則 自是表病明白 易見之初證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若復引飮 小便赤則 可畏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泄瀉 揚手擲足則 大畏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少陽人 裏病 大便 過一晝夜有餘 而不通則 自是裏病明白 易見之初證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若復 大便 過三晝夜有餘 而不通則 危險矣</span></p><p><span data-ke-size="size18">背癰 腦疽 脣&#30215; 纏喉風 咽喉 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陽毒發斑 流注丹毒 黃疸 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面 目 口 鼻 牙齒之病 成病之日 皆爲重證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則 必用 荊防敗毒散</span></p><p><span data-ke-size="size18">裏病 有大便過一晝夜不通證則 用 白虎湯</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음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少陰人</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리한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裏寒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제복</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臍腹</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냉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冷證</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은 수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受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한 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미 복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腹鳴</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설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泄瀉</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기험</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機驗</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있어서 그 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심현</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甚顯</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집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執證</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쉽게 보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용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用藥</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早</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할 수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소양인(少陽人)의 리열병(裏熱病)의 흉격(胸膈)의 열증(熱證)은 수병(受病)의 초(初)에 비록 흉번(胸煩) 민조(悶燥)의 기험(機驗)이 있어도 그 기(機)가 심현(甚顯)하지 않으니 병(病)의 집증(執證)을 보기가 어려우니, 용약(用藥)이 너무 만(晩)하느니라.</p><p>만약 소양인(少陽人)이 흉번(胸煩) 민조(悶燥)하는 험(驗)이 현연(顯然)하게 노출(露出)하여 사람이 각(覺)할 수 있으면 그 병(病)은 이미 험(險)하니 조수(措手)하기가 어려우니라.</p><p>소양인(少陽人)의 표병(表病)에 두통(頭痛)이 있으면 이는 표병(表病)임이 명백(明白)하니 쉽게 아는 초증(初證)이니라. 만약 인음(引飮)하고 소변(小便)의 적(赤)이 더하면 가히 외(畏)한 것이고, 설사(泄瀉) 양수척족(揚手擲足)하면 더 외(畏)한 것이니라.</p><p>소양인(少陽人)의 리병(裏病)에 대변(大便)이 하루(:一晝夜) 남짓(:有餘)을 지나도록 불통(不通)하다면 이는 리병(裏病)임이 명백(明白)하니 쉽게 보이는 초증(初證)이니라. 만약 더하여 대변(大便)이 삼일(:三晝夜) 남짓(:有餘)을 지나도록 불통(不通)하면 위험(危險)한 것이니라.</p><p>배옹(背癰) 뇌저(腦疽) 순종(脣&#30215;) 전후풍(纏喉風) 인후(咽喉) 등의 병(病)이면 수병(受病)한 날이 이미 위험(危險)한 증(證)이니라. 양독(陽毒)의 발반(發斑), 유주(流注)하는 단독(丹毒), 황달(黃疸) 등의 병(病)이면 수병(受病)한 날이 이미 위험(危險)한 증(證)이니라. 면목(面目) 구비(口鼻) 아치(牙齒)의 병(病)은 병(病)이 된 날로부터 모두 중증(重證)이니라.</p><p>소양인(少陽人)의 표병(表病)에 두통(頭痛)이 있으면 반드시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을 사용하여야 하고 리병(裏病)에 대변(大便)이 하루(:一晝夜)를 지나도 불통(不通)하는 증(證)이 있으면 백호탕(白虎湯)을 사용하여야 하느니라.</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3) </span><span data-ke-size="size18">王好古 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渴病有三 曰消渴 曰消中 曰消腎</span></p><p><span data-ke-size="size18">熱氣上騰 胸中煩躁 舌赤脣紅 此渴 引飮常多 小便數而少 病屬上焦 謂之消渴</span></p><p><span data-ke-size="size18">熱蓄於中 消穀善飢 飮食倍常 不生肌肉 此渴 亦不甚渴 小便數而甛 病屬中焦 謂之消中</span></p><p><span data-ke-size="size18">熱伏於下 腿膝枯細 骨節&#30176;痛 飮水不多 隨卽尿下 小便多而濁 病屬下焦 謂之消腎</span></p><p><span data-ke-size="size18">五石過度之人 眞氣旣盡 石勢獨留 陽道興强 不交精泄 謂之强中</span></p><p><span data-ke-size="size18">消渴 輕也 消中 甚焉 消腎 尤甚焉 若强中則 其斃可立而待也 </span></p><p><span data-ke-size="size16">왕호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王好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갈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渴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소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渴</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소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中</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소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腎</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열기(熱氣)가 상등(上騰)하면 흉중(胸中)이 번조(煩躁)하고 설적(舌赤)하며 순홍(脣紅)하니 이 갈(渴)은 인음(引飮)이 항상 많고 소변(小便)이 삭(數)하면서 소(少)하며 병(病)은 상초(上焦)에 속(屬)하니 소갈(消渴)이라 한다.</p><p>열(熱)이 중(中)에 축(蓄)하면 소곡(消穀)하여 선기(善飢)하고 음식(飮食)이 상(常)의 배(倍)가 되며 기육(肌肉)을 생(生)하지 않으니 이 갈(渴)은 또한 심(甚)히 갈(渴)하지 않고 소변(小便)은 삭(數)하면서 첨(甛)하며 병(病)은 중초(中焦)에 속(屬)하니 소중(消中)이라 한다.</p><p>열(熱)이 하(下)에 복(伏)하면 퇴슬(腿膝)이 고세(枯細)하고 골절(骨節)이 산통(酸痛)하고 음수(飮水)가 많지 않으나 바로 뇨(尿)로 하(下)하며 소변(小便)에 탁(濁)이 많으니 병(病)은 하초(下焦)에 속(屬)하니 소신(消腎)이라 한다.</p><p>오석(五石)을 과도(過度)하게 한 사람은 진기(眞氣)가 이미 다하고 석(石)의 세(勢)가 홀로 유(留)하여 양도(陽道)가 강(强)하게 흥(興)하니, 교(交)하지 않아도 정(精)이 설(泄)하니 강중(强中)이라 한다.</p><p>소갈(消渴)은 경(輕)하고, 소중(消中)은 심(甚)하며, 소신(消腎)은 더 심(甚)한 것이다. 만약 강중(强中)하면 그 폐(斃)를 즉시 대(待)하여야 하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4) </span><span data-ke-size="size18">朱震亨 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飮 白虎湯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中消者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 黃連猪&#32922;丸主之</span></p><p><span data-ke-size="size18">下消者 煩躁引飮 小便如膏 腿膝枯細 六味地黃湯主之 </span></p><p><span data-ke-size="size16">주진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朱震亨</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상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上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는 설상</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舌上</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적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赤裂</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대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인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引飮</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 <span data-ke-size="size16">백호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白虎湯</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主</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중소(中消)는 선식(善食)하면서도 수(瘦)하고 자한(自汗)하며 대변(大便)이 경(硬)하고 소변(小便)이 삭(數)하니 황연저두환(黃連猪&#32922;丸)으로 주(主)하여야 한다.</p><p>하소(下消)는 번조(煩躁) 인음(引飮)하고 소변(小便)이 고(膏)와 같고 퇴슬(腿膝)이 고세(枯細)하니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하였느니라.</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5) </span><span data-ke-size="size18">醫學綱目 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渴而多飮 爲上消 消穀善飢 爲中消 渴而尿數 有膏油 爲下消 </span></p><p><span data-ke-size="size16">의학강목</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醫學綱目</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다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多飮</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상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上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소곡</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穀</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선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善飢</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중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中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며</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뇨삭</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尿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고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膏油</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으면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下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6) </span><span data-ke-size="size18">危亦林 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因耽嗜色慾 或服丹石 眞氣旣脫 熱邪獨盛 飮食如湯消雪 肌膚日削 小便如膏油 陽强興盛 不交精泄 三消之中 最爲難治 </span></p><p><span data-ke-size="size16">위역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危亦林</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색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色慾</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탐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耽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거나 단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丹石</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복용</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服</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므로 인하여 진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眞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이미 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脫</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는데 열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熱邪</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홀로 성</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盛</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음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飮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마치 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湯</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雪</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과 같아 기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肌膚</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날로 삭</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削</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소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小便</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고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膏油</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와 같으며 </span><span data-ke-size="size16">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强</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흥</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성</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盛</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교</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아도 </span><span data-ke-size="size16">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精</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泄</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이는 것은 삼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三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중에서 가장 치</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治</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가 어렵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7) </span><span data-ke-size="size18">論曰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40379;突 意思艱乏則 大腸淸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生此病也</span></p><p><span data-ke-size="size18">胃局淸陽 上升 而不快足於頭面四肢則 成上消病 大腸局淸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則 成中消病</span></p><p><span data-ke-size="size18">上消 自爲重證 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 而下消 倍險於中消</span></p><p><span data-ke-size="size18">上消 宜用 凉膈散火湯 中消 宜用 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 熟地黃苦參湯</span></p><p><span data-ke-size="size18">又宜 寬闊其心 不宜 膠小其心 寬闊則 所欲必緩 淸陽上達 膠小則 所欲必速 淸陽下耗</span></p><p><span data-ke-size="size18">7-2-18) </span><span data-ke-size="size18">平心靜思則 陽氣上升 輕淸 而充足於頭面四肢也 此 元氣也 淸陽也 勞心焦思則 陽氣下陷 重濁 而鬱熱於頭面四肢也 此 火氣也 耗陽也</span></p><p><span data-ke-size="size16">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論</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건대</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소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란 병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病人</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흉차</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胸次</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관원</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寬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활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闊達</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못하고 누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陋固</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교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膠小</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보는 바가 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淺</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欲</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바가 속</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계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計策</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골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40379;突</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의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意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간핍</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艱乏</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대장</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大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청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淸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상승</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上升</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저절로 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快</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히 족</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못하고 일월</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日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따라 모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耗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이 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위국(胃局)의 청양(淸陽)이 상승(上升)하여 두면(頭面) 사지(四肢)에 쾌(快)히 족(足)하지 못하면 상소(上消)의 병(病)이 되느니라. 대장국(大腸局)의 청양(淸陽)이 상승(上升)하여 위국(胃局)을 쾌(快)히 족(足)하지 못하면 중소(中消)의 병(病)이 되느니라.</p><p>상소(上消)는 그 자체가 중증(重證)이고 중소(中消)는 상소(上消)보다 배(倍)로 중(重)하느니라.</p><p>중소(中消)는 그 자체가 험증(險證)이고 하소(下消)는 중소(中消)보다 배(倍)로 험(險)하느니라.</p><p>상소(上消)는 마땅히 양격산화탕(凉膈散火湯)을 사용하여야 하느니라.</p><p>중소(中消)는 마땅히 인동등지골피탕(忍冬藤地骨皮湯)을 사용하여야 하느니라.</p><p>하소(下消)는 마땅히 숙지황고삼탕(熟地黃苦蔘湯)을 사용하여야 하느니라.</p><p>또 마땅히 그 심(心)을 관활(寬闊)하여야 하니, 그 심(心)을 교소(膠小)하면 마땅하지 않느니라. 그 심(心)이 관활(寬闊)하면 욕(欲)하는 바가 반드시 완(緩)하여 청양(淸陽)이 상달(上達)하고, 교소(膠小)하면 욕(欲)하는 바가 반드시 속(速)하여 청양(淸陽)이 하모(下耗)하느니라.</p><p><span data-ke-size="size16">평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平心</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정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靜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양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陽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상승</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上升</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경청</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輕淸</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므로 두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頭面</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사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四肢</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를 충족</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充足</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이는 원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元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고 청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淸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노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勞心</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초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焦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양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陽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하함</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下陷</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중탁</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重濁</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므로 두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頭面</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사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四肢</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울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鬱熱</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이는 화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火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 모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耗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160;</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19) </span><span data-ke-size="size18">危亦林 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消渴 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莖花葉 可服 </span></p><p><span data-ke-size="size16">위역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危亦林</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소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반드시 옹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癰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방</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防</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인동등</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忍冬藤</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은 다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多少</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나 근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根莖</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화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花葉</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불구</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不拘</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복용할 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7-2-20) </span><span data-ke-size="size18">李&#26482; 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消渴之疾 能食者 末傳 必發腦疽 背瘡 不能食者 必傳 中滿鼓脹 </span></p><p><span data-ke-size="size16">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李&#26482;</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소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消渴</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의 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疾</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에 능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能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말</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末</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로 전</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傳</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져 반드시 뇌저</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腦疽</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배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背瘡</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불능식</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不能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반드시 전</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傳</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져 중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中滿</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고창</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鼓脹</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
<!-- -->
카페 게시글
소양인
11~20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7
24.01.01 12:3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