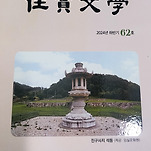<p>&#160;</p><p>&#160;</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br><br><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3"><b>What shall I do? / 어느 경비원의 회고</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카드 빚 우편물에 가슴이 철렁하는 아픔을</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견디지 못해&#160;</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26년여 살던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의정부로 떠나던 날,</span></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삶이 미워 뜨거운 눈물 가슴에 묻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24층 맨 꼭대기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24층 창 너머 땅을 내려다 보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하루하루 보내다가,&#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살아야 한다기에 택한 직업이</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경비원이었습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2005년 12월 6일 시작하여 2011년 10월 31일 그만 두었으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가는 목숨 모질게도 이어왔지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누가 그러던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경비원 하려면 간도 쓸개도 다 떼어 놓고 살아야 한다&quot; 고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간 떼고 쓸개 버리고는 살 수 없어 가지고 살았기에 그 삶이 그렇게</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힘들었었나&#160;&#160;</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봅니다.</span></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첫 면접 때 면접관 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나이가 많으셔서 규정상 안 됩니다&quot;하고 불합격을 통보였으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 때 내 나이 68세였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래도 마지막 한 마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면접관 님, 사실 저 대학 나왔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합격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quot;라고 던진 것이 머리에 남았던지</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합격자가 하루 만에 그만 두는 바람에 대신 차고 들어간 자리</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경비원이었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때부터 나의 처절한 삶이 시작되었지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 6년 사이 심장 수술을 세 번이나 받으면서도 그 삶을 살았으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내 별명처럼 쇠뭉치니까 살았나 싶습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회고컨데 아득하군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우리 부모 노년에 경비할 줄 모르셨기에&#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목숨 달랑 하나 만드셨을 건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6년이니 1100 개도 모자랄 목숨 단 한 개로 용케도 버텨온 삶의 이야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입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경비원!</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세상에 이 보다 더 천한 직업이 있을까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주민은 모두 사장 님이요, 사모 님이요, 아이들 마저 다 도련 님.</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잠시 졸기만 해도 졸았다고 그만 두어야 하는 자리.</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누가 주는 봉급으로 사는데 불친절 하느냐고 큰 소리치는 인간 관계의</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밑바닥 인생...</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살아온 삶 잠시 되돌아 보자.</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경비원 생활 첫 날.&#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같이 근무할 짝에게 불 켜는 방법 물었다가</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이러시면 안 되지요&quot; 하며 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일부터 시작,</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한 열흘쯤 지났는데 술에 잔뜩 취한 어느 주민 초소에 들어와</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이 사람 경비 잘못 서는구만&quot;하면서 반말찌거리에 횡설수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 때는 멋모르고 각목 들고 두어 번 후려치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야 이 새끼야 나가&quot;하면서 내 쫓던 내가&#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것이 정말 모가지 감이었음을</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몰랐네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분리 수거 날도 아닌데 재활용품을 버렸기에</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주민 집 찾아 갖다 놓았더니 주민 씩씩거리며 와서,</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내가 경비 잡아 먹는 귀신&#39;인데 하며 당장 목을 자르겠다 하데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허허 주민이 하는 것은 만사가 법이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목숨 걸기라는 것을 얼마나 지나고야 알았던가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경비원&#160; 생활 첫 해 왜 그리 눈은 많이 내렸던가?</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쓸고 나면 또 쌓이고 쓸고 나면 또 쌓이고&#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눈 쓸다가 꼬박 밤 새운 적이</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몇 번이던가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몸이 지쳐갔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일 주일쯤 지나자 아침 밥을 먹는데 코피가 주룩 흐릅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초등학교 3 학년 때 친구와 싸우고 코 터진 후 처음이었지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몇 개월 지나자 가슴이 조여 왔습니다. 혈관이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래서 조영 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러고도 모가지가 끊어질까 봐 나가서 근무해야 했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허지만 두 번째 수술 하고는 하루 걸러 일하는 직업인데 미안해서 스스로</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만 두었습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한 열흘쯤 쉬고 나서 두 번째 자리를 구했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거기라고 목숨이 온전 하겠겠습니까?</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더구나 42평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고 있다가 48평, 52평짜리로 옮겼는 걸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남자 주민 동대표에서 여자 주민이 동대표가 되던 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점심 한 끼 대접 한다고 자장면 한 그릇씩 돌리고 나서는 100분 가량 떠드는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이런 분은 그만 두시라는 이야기를 20 여 번 들었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내 생애 그보다 더 지독한 밥 맛이 있었을까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허허 파리 목숨이 짧다더니 경비 원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못했슴을 처음</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알았습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에어컨 켜놓고 잠깐 자리 비웠다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호강에 초 쳤구만&quot;하시던 63 세의 모진 206호 할머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겨우 방문자 방문증 끊어주는 1분이었는데...</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아주머니라니? 사모 님이라고 해요&quot; 하시며 호통치던 여인.</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에라 못된 것들 치마 만 두르면 다 사모 님이냐? 인격은 다 무엇인고.</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경고 장 붙였다고 손자 뻘도 안 되는 녀석이&#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육두 문자</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내뱉으며&#160;</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당장 모가지 자르겠다고 큰 소리치던 호로자식 놈.</span></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우리 딸 차인데 경고 장을 붙여? 당장에 떼요&quot;</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아니 어느 경비 원이 주민 딸 차인 것까지 식별할 줄 아는 초인적인 능력을</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가졌을까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택배 가져 가시라고 몇 번 연락 했더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아이 10할 나이만 안 쳐먹었으면&quot;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던 그 새 신랑.</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불친절 불친절 당장에 모가지 잘라 버려&quot;</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하루에도 얼마나 듣던 그 소리였던가요?</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러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얼마나 인간적이고 고마우셨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 치던 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차가운 손 움켜 쥐고 분리 수거 하면서 덜덜 떨고 있던 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따뜻한 커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식을 들고 오셔서</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quot; 하시며 놓고 가시던 1901호 장 여사 님!</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조용히 밤이 깊어갈 무렵 노 부부님이 작은 봉투 하나 들고 오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수고하십니다, 저녁에 야식이나 하세요&quot;하시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손에 쥐어 주시고 가시던 206호 그 할아버지 할머니.</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순찰 돌다가 차 내에 실내 등이 켜져 있어 전화를 드렸더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세세한 데 까지 신경 써 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quot; 하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메시지 보내 주신 1103호 그 새댁.</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관상 동맥 우회 술을 받고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데도 나갔더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아저씨, 며칠 더 쉬고 나오세요&quot; 하시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배려해 주신 관리 소장 변 소장 님!</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정말 당신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삶 6년이나 견디고 살았습니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아! 간도 쓸개도 다 떼어 놓고 살아야 한다는 그 경비 원 생활</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결국 목이 짧아 그만 두고 나오던 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내 반쪽이라는 동반자 왈</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 그간 수고하셨어요,&quot; 인사 대신</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quot;당신은 그 성질 때문에...둥글게 살지 못하고&quot; 하며 넋두리로</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인사하던 아내.&#160;</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돌아보니 허무할 뿐입니다.</span></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나 이제 무엇 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것 아니기에 갈 때도 내 맘대로</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못간당가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아, 정말 어쩌야 합니까?</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영어로 이런 때 &#39;WHAT SALL I DO?&quot; 한다지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가을은 깊어가고,&#160;</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가을이 남기고 가는 발 자취 낙엽도 긴긴 겨울 보낼 것</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염려하여&#160;</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등 붙일 곳 있으면 거기에 머무네요.</span></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 까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회고 하니 6년, 참으로 힘들었네요.</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74년 생애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6년을 보태고 견뎠습니다.</span></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어느 가수의 말 대로 남은 인생이나 잘해 봐야 할 텐데....</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가슴이 답답하니&#160;</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어느 선술 집에라도 들려</span></span></b></span><br><span style="color: #333333;"><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쓰디 쓴 약주나 막걸리 한 잔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160; (</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옮긴 글)</span></span></span></b></span></td></tr></tbody></table></div>
<!-- -->
카페 게시글
◆테마스토리 서울◆
What shall I do? / 어느 경비원의 회고
백암 문진남
추천 0
조회 131
24.06.30 14:1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