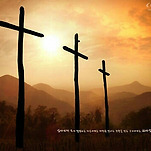<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q2q/9daa7c7b4f7d135d88111ac9fc392b2c3f1d13f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q2q/9daa7c7b4f7d135d88111ac9fc392b2c3f1d13fd"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06"></div><p>&#160;</p><p><span data-ke-size="size20">송경태: 졸혼한 어느 여인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찬바람이&#160;나뭇가지를&#160;흔드는&#160;날,&#160;움츠린&#160;채&#160;미용실을&#160;찾았다.&#160;구이읍내&#160;시골&#160;미용실이라&#160;그런지&#160;손님들은&#160;대개&#160;60대&#160;이상의&#160;여인들.&#160;순서를&#160;기다리며&#160;앉아&#160;있는데,&#160;날씬한&#160;몸매에&#160;나이보다&#160;젊어&#160;보이는&#160;한&#160;여인이&#160;들어왔다.&#160;갓&#160;60대&#160;초반쯤&#160;되어&#160;보이는&#160;그녀는&#160;능숙한&#160;말투로&#160;요양사&#160;일을&#160;하다&#160;직업을&#160;바꿔볼까&#160;고민&#160;중이라&#160;했다.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염색이&#160;시작되자&#160;대화도&#160;자연스레&#160;깊어졌다.&#160;그녀는&#160;탁자&#160;위의&#160;커피잔을&#160;매만지며&#160;조용히&#160;입을&#160;열었다.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제가&#160;작년&#160;9월에&#160;졸혼을&#160;선언하고&#160;임대&#160;아파트로&#160;이사&#160;나왔어요.&#160;남편과는&#160;7살&#160;차이인데,&#160;하루하루가&#160;사사건건&#160;트집이더라고요.&#160;이제는&#160;따로&#160;사니&#160;너무&#160;편해요.”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그녀의&#160;말은&#160;담담했지만,&#160;그&#160;속엔&#160;오래&#160;참아온&#160;세월의&#160;무게가&#160;배어&#160;있었다.&#160;자식들에게는&#160;이혼&#160;사실을&#160;숨기고,&#160;명절이면&#160;남편&#160;집으로&#160;가&#160;음식을&#160;장만한다고&#160;했다.&#160;“애들이&#160;모르게&#160;하려면&#160;어쩔&#160;수&#160;없어요.&#160;남편이&#160;음식&#160;장만하는&#160;돈을&#160;주죠.&#160;워낙&#160;스크루지&#160;영감&#160;같아서&#160;돈&#160;모으는&#160;일과&#160;자식,&#160;손주밖에&#160;모르는&#160;사람이거든요.&#160;나한테는&#160;‘네가&#160;돈&#160;벌어서&#160;쓰냐?’&#160;하면서요.”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그녀는&#160;소리&#160;없이&#160;웃었다.&#160;그러나&#160;그&#160;웃음에는&#160;씁쓸함이&#160;배어&#160;있었다. </span><br><span data-ke-size="size20">“집&#160;나와서&#160;요양사&#160;일을&#160;하니&#160;밥&#160;안&#160;해도&#160;되고,&#160;하루하루가&#160;얼마나&#160;편한지&#160;몰라요.&#160;그런데&#160;남편은&#160;내가&#160;다시&#160;돌아올&#160;줄&#160;아나&#160;봐요.&#160;전화해서&#160;‘아프면&#160;어떡하냐’고&#160;묻기도&#160;하고요.&#160;하지만&#160;전&#160;이&#160;생활이&#160;편해졌는데,&#160;왜&#160;돌아가겠어요?&#160;조카&#160;장사도&#160;도와주면서&#160;내&#160;재미를&#160;찾아&#160;살아야죠.”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그녀의&#160;이야기를&#160;들으며&#160;문득,&#160;요즘&#160;졸혼을&#160;선택하는&#160;사람들을&#160;자주&#160;보게&#160;된다는&#160;생각이&#160;들었다.&#160;어디서부터&#160;어긋난&#160;것일까?&#160;무엇이&#160;잘못된&#160;것일까?&#160;부부의&#160;인연이라는&#160;것이&#160;결코&#160;쉬운&#160;일이&#160;아니라는&#160;걸&#160;새삼&#160;깨닫는다.&#160;나이가&#160;들수록&#160;서로&#160;조금만&#160;배려하며&#160;살면&#160;좋을&#160;텐데,&#160;그조차&#160;힘든&#160;현실을&#160;보면&#160;사랑이란&#160;종이&#160;한&#160;장보다도&#160;더&#160;얇은&#160;것인가&#160;싶다.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한평생을&#160;함께&#160;산다는&#160;것은,&#160;어쩌면&#160;십자가를&#160;지고&#160;언덕을&#160;오르는&#160;일인지도&#160;모른다.&#160;더&#160;쉬운&#160;길을&#160;택할&#160;수도&#160;있지만,&#160;묵묵히&#160;걸어가는&#160;것도&#160;하나의&#160;방법일&#160;것이다. </span><br><span data-ke-size="size20">나이가&#160;들수록&#160;서로를&#160;가엾이&#160;여기고,&#160;따뜻한&#160;말&#160;한마디를&#160;건넬&#160;수&#160;있다면&#160;얼마나&#160;좋을까. </span><br><span data-ke-size="size20">부부는&#160;인생의&#160;작품을&#160;함께&#160;만들어&#160;가는&#160;예술가가&#160;아닌가. </span><br><br><span data-ke-size="size20">2025.&#160;2.&#160;11.</span></p>
<!-- -->
카페 게시글
이웃의 미담 (150)
송경태: 졸혼한 어느 여인
람미
추천 0
조회 61
25.02.11 07:3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