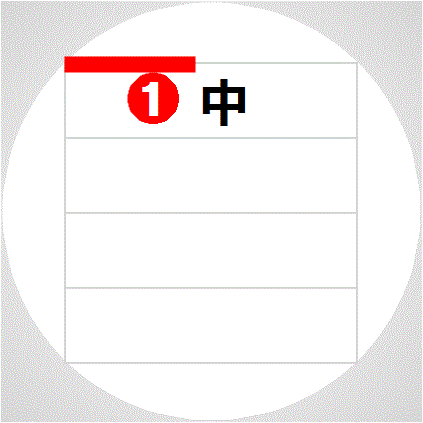<p><strong><font size="3">후기 중세국어(3)</font></strong>
</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1.
자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1)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된소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에 의해 15세기 국어의 폐쇄음과 파찰음에 평음과 유기음 계열이 있었음은 확인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신숙주는 &lt;동국정운&gt; 서문에서 국어에는 ‘탁성(濁聲)’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된소리로 해석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합용병서 ‘ㅺ, ㅼ, ㅽ’ 등의 ‘ㅅ’은 ‘된시옷’</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훈민정음 체계의 여러 문자 중에서 유독 ‘ㅅ’은 그 음가에 구애되지 않고 ‘사이시옷’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이시옷은 된소리와 깊은 관련
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15세기 후반에 ‘그&#60779;-’가 ‘&#59950;&#60779;-’로 ‘&#65533;-’이 ‘&#60150;-’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된소리가 어두에서 표현적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이미
어두에서 확고한 지반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된소리는 15세기 후반보다 앞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온당</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ㅎ’의 된소리 ‘ㆅ’은 &lt;원각경언해&gt;애서 각자병서의 전반적 폐지로 ‘ㅎ’으로 바뀌었다가 끝내 부활되지 못했는데 이는 된소리 ‘ㆅ’의
기능 부담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며 된소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님</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⑤
초성 합용병서에 ‘ㅾ’이 없는 점 등‘ㅈ’의 된소리가 어두에 존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2)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유성
마찰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ㅿ</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불청불탁의 반치음이며 그 음가는 [z]로 추정</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분포는 모음 간, ‘ㄴ’ 또는 ‘ㅁ’과 모음 사이, 모음과 ‘ㅸ’ 또는 ‘ㅇ’ 사이에 국한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기원적으로 보면 후기 중세국어의 ‘ㅿ’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lt;계림유사&gt;시대 이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13세기 이후
‘s&gt;z’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소실 : ‘i’ 모음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소실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ㅸ</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양순 유성마찰음 [β]으로 실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분포는 모음 사이, ‘ㄹ’ 또는 ‘ㅿ’과 모음 사이</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lt;조선관역어&gt;는 이 음소의 소실을 보여주지 않음. 세조대의 문헌에 극히 산발적으로 나타나므로 1450년대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보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ㅸ’은 일반적으로 w로 변하였으며 ‘&#59553;’만 wi 또는 i로 변화</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ㅇ</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문자 그대로 ‘零’이라는 것이 종래의 통념이었으나 15세기 국어의 문헌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 종류의 ‘ㅇ’이 있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소극적 기능의 ‘ㅇ’ : 어두음의 모음임을 표시하거나 어중에서 두 모음 사이에 사용되어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함을 표시</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적극적 기능의 ‘ㅇ’ : 유성 후두 마찰음 [&#614;]</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HWP-TAB: 1;"> </span><span style="HWP-TAB: 1;"> </span><span style="HWP-TAB: 1;"> </span>y, ‘ㄹ’ 또는 ‘ㅿ’과 모음 사이에만 나타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ㅇ’의 소실은 먼저 ‘ㅿㅇ’에서 일어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3)
자음 체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평
음 ㅂ ㄷ ㄱ ㅈ ㅅ ㅎ</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유기음
ㅍ ㅌ ㅋ ㅊ</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된소리
ㅽ ㅼ ㅺ ㅆ ㆅ</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유성마찰음
ㅸ ㅿ ㅇ</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비
음 ㅁ ㄴ ㆁ</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유
음 ㄹ</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4)
어두 자음군</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후기 중세국어에는 어두에 두 자음이 올 수 있었으며 ‘ㅂ’계 합용병서와 ‘ㅄ’계 합용병서는 자음군을 나타낸 것</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ㅂ’계 합용병서 : ㅳ, ㅄ, ㅶ, ㅷ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ㅄ’계 합용병서 : ㅴ, ㅵ</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5)
음절말 자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자음의 대립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해례 종성해는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종성의 사용을 규정</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음절말 위치에서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이나 ‘ㅅ’, ‘ㅈ’, ‘ㅊ’의 대립은 중화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이 중화는 음절말 자음의 미파화의 결과</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ㅿ’은 ‘ㅇ’에 선행한 위치에서 음절말에 올 수 있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⑤
15세기와 16세기의 교체기에 음절말의 ‘ㅿ’이 없어졌고 ‘ㅅ’과 ‘ㄷ’이 중화된 결과 7자음 체계에 도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2.
모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1)
단모음 체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15세기 국어에는 ‘ㆍ ㅡ ㅣ ㅗ ㅏ ㅜ ㅓ’의 일곱 단모음이 있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각 모음의 정확한 음가 결정을 위해 국어를 외국문자로 표사한 것, 외국어를 정음 문자로 표사한 것을 자료로 사용</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0px 0px 27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iㅣ
&#616;ㅡ uㅜ</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0px 0px 27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601;ㅓ
oㅗ</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0px 0px 27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aㅏ
&#652;ㆍ</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0px 0px 27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2)
이중모음 체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y가 앞선 상향 이중모음 : ㅑ, ㅛ, ㅕ, ㅠ</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7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어떤
방언에는 ‘y&#652;, y&#616;’가 존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w가 앞선 상향 이중모음 : ㅘ, ㅝ, wi</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하향 이중모음 : ㆎ, ㅐ, ㅔ, ㅚ, ㅟ, ㅢ</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상향
이중모음 : (y&#652;) ya yo y&#601; yu (y&#616;)</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wa
w&#601; wi</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하향
이중모음 : &#652;y ay oy &#601;y uy &#616;y iy</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3)
모음조화</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한 단어 안에 양모음(ㆍ ㅗ ㅏ) 또는 음모음(ㅡ ㅜ ㅓ)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공존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립 모음(ㅣ)은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는 모음조화의 일반 규칙을 따랐지만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15세기 국어에서도 모음조화 규칙은 이미 문란해져 있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3.
성조</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중세국어에는 성조가 있었으며 방점으로 표기</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평성은 無點, 거성은 1點, 상성은 2點을 찍도록 규정하였으며 입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점을 마련하지 않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상성은 저조와 고조의 복합</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중세국어의 성조 체계는 저조와 고조의 두 평판조로 이루어진 단순한 것이었으나 성조의 기능 부담량은 결코 적지 않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⑤
15세기 문헌의 방점 표기는 매우 정연하였으나 16세기 말엽으로 올수록 점차 문란해져서 &lt;소학언해&gt; 등에 오면 어떤 규칙성도 찾아볼
수 없이 소멸됨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6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6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6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5px; font-weight: bold;'>제14강
후기 중세국어(4)</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1.
조어법</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1)
복합어</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복합명사 : 복합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현대어와 별로 다름이 없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복합용언 : 용언 어간이 직접 연결되어 새로운 복합용언을 만들어내는 비통사적 복합용언의 형성이 중세국어에서 매우 생산적</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복합동사 : 빌먹-, 딕먹-, 것곶-, 듣보-</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복합형용사 : 됴&#65533;-, 놉&#58002;갑-</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2)
파생어</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파생명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명사에서 파생된 것 : 명사+‘-이’, ‘-억’, ‘-&#60935;’, ‘-&#61394;지’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예)
부&#62661;이, 그려기, 아비, 어미, 터럭, 기&#58180;, 숑&#61394;지, 강&#61394;지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용언 어간에서 파생된 것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동사
어간 + ‘-(&#61064;/으)ㅁ’ : 여름, 사&#58487;, 거름, 어름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동사
어간 + ‘-이’ : 우&#60742;우&#60799;, 죽사리, 글지&#60799;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형용사
어간+ ‘&#61092;/의’ : &#65533;, 기&#65533;, 노&#62624;, 너&#65533;, 기&#65533;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파생동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명사 어간에서 파생된 것 : &#58669;-, 자히-</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용언 어간에서 파생된 것 : 사동 어간과 피동 어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사동 접미사 : ‘-히-’, ‘-&#59559;-’, ‘-ㅎ-’, ‘-&#61064;-’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히-’ : 어간 말음이 ‘ㅂ, ㄷ, ㅈ’이면 ‘-히-’(예 : 너피-, 구티-), ‘ㅁ, ㅅ’이면 ‘-기-’(예 : 숨기-, 밧기-),
‘ㅿ, ㄹ’이면 ‘-이-’(예 : &#60975;이-, &#61937;이-, 말이-), 그 밖의 자음이나 모음이면 ‘ㅣ’(예 : 셰-, 내-)로 나타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59559;-’ :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59559;/&#59541;-’였던 것인데 그 이후에는 ‘-오/우-’로 나타남 (예 : &#57767;리&#59559;-, 모도-, 일우-
)</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피동 접미사 : 피동 어간의 용례는 중세어에 매우 적으며 접미사는 사동 어간 ‘-히-’의 경우과 거의 같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파생형용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명사 어간에서 파생된 것 : 접미사 ‘-&#58250;&#59570;-’에 의해 형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용언 어간에서 파생된 것 : 접미사 ‘-&#59559;-’, ‘-&#60853;-’, ‘-&#57567;-’ 에 의해 형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파생부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체언에서 파생된 것 : 몸&#60717;, 손&#60717;</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
용언에서 파생된 것 : 동사 및 형용사 어간 + ‘-이’, ‘-히’, ‘-오’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예)
노피, 기리, 기피, 키, 너비 / &#57767;&#58251;히, 이러히/ 도로, 나&#60717;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2.
곡용</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중세국어의
곡용에서는 체언 어간이 교체를 보여준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현대국어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체언도 비자동적 교체를 보여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1)
ㅎ말음 명사 : 중세국어에는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명사들이 있었으며 그 단독형은 ‘돌’이었지만 곡용형은 ‘돌히, 돌해, 돌&#62780;, 돌&#62775;로,
돌콰’와 같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예
: 돌, &#60017;, 하&#57992;, 길, 내, 시내, &#57767;&#60819;, 나조, 우 , 뒤, 안, 뫼, 드르, &#58720;&#60819;, 암, 수, 알, 고, 니마, &#58959;, &#59778;, 뎌, &#57992;,
밀, 조 등</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2)
비자동적 교체</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나모(木) : 나모/&#57868;</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노&#58476;(獐) : 노&#58476;/놀ㅇ</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58720;&#58476;(棟) : &#58720;&#58476;/&#58726;ㄹ</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아&#60815;(弟) : 아&#60815;/&#60855;</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3)
격조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주격 조사 : ㅣ(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는 그 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을 형성)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현대어의
주격 ‘가’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지 않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속격 조사 : ‘-&#61092;/의’는 유정물의 평칭에 ‘ㅅ’은 유정물의 존칭과 무정물에 사용</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처격 조사 : ‘-&#61092;/의’, ‘-애/에/예’</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대격 조사 : ‘-ㄹ’, ‘-&#58480;/를’</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⑤
조격 조사 : ‘-로’</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⑥
공동격 조사 : ‘-와/과’</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⑦
호격 조사 : 존칭의 ‘-하’와 평칭의 ‘-아’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4)
대명사의 곡용</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①
1인칭 대명사 : ‘나’의 주격형과 속격형은 ‘내’로 같았으나 각각 거성과 평성으로 성조의 차이가 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②
2인칭 대명사 : ‘너’의 주격형과 속격형은 ‘네’로 같았으나 각각 상성과 평성으로 성조의 차이가 있음</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③
미지칭 : ‘누’</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④
무엇 : ‘므스, 므슥’</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⑤
어느 :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대명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3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3.
특수조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br></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1)
그&#61426;, 거의, 게, 손&#58280; : 속격 ‘&#61092;’를 지배하였으며 평칭의 여격을 나타냄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2)
ㄴ : 현대국어의 ‘은/는’에 해당하는 조사의 기저형</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61066;/은’,
‘&#57989;/는’으로 나타남</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3)
&#57767;장 : 속격 ‘ㅅ’을 지배, 현대어의 ‘까지, 껏’의 두 의미로 사용</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4)
자히 : 동명사에 붙어 동작 또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5)
두고, 라와 :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6)
셔 : ‘이시-’(有)의 부동사형에서 기원</span>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7)
브터, 더브러, 조차, 조초, 조쳐 </span></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8)
다&#59553; : 고대의 어간 ‘&#58135;-’(如)에서 파생된 부사가 조사로 굳어진 것</span> 펌</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 </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070809
샛별</p><p>&nbsp;</p><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21px;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font-size: 13px;'></p><p>&nbsp;</p><div class="cContentInfo">
<div style="margin: 2px 0px 10px; clear: both;" id="cContentMemo">
<table style="margin-bottom: 3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 noWrap=""><b>출처</b> :</td>
<td style="width: 100%;">그리움이 흐르는 하얀 강 <font style="color: rgb(197, 197, 197); font-size: 11px;"> | </font> <b>글쓴이</b> : 샛별 <a class="d_4F72B3 under" href="http://blog.daum.net/jjsbtg3/11854392" target="_blank"><u>원글보기</u></a> <img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 src="https://t1.daumcdn.net/blogstatic/blog/p_img2/i_arrow01.gif" width="2" height="3">
</td></tr>
<tr vAlign="top">
<td width="40"><b>메모</b> :</td></tr></tbody></table></div></di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