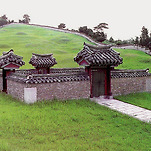<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9</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 이사회 녹음 내용 바로잡기 설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어서 동진 감사가 감사보고를 했는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 동안 감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요약해 보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동진 감사님 말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먼저 회계감사 건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 총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며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8.12.3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총무가 없으니까 회장님이 요거하고 금전출납부하고 지출결의서를 보내서 그것 보고 한 거니까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씀하셨는데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진 감사는 수불내역서를 지출결의서라고 잘 못 말씀하시고 영진 회장님도 지출결의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수불내역서를 지출결의서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상정했지만 부결 되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장복명서 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무튼 동진 감사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량권 얘기가 아니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비 지급내역은 있는데 이것들이 뭐야 저기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말해서 줄장복명서 같은 거 없이 도대체 뭘 해 해줬는지 모르겠더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설명하고 감사보고서 뒤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 자신이 회장 때 작성한 출장 복명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2012</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동진 회장님이 쓴 종산 출장복명서 일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span></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785" class="txc-image" id="A_9928C24C5E6F4D3401932A"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8C24C5E6F4D3401"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출장복명서(동진).PNG" actualwidth="785" id="A_9928C24C5E6F4D3401932A"/></p><p><!--StartFragment--></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서 재량권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비지급 할 때 공공기관처럼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 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장복명서라는 것이 사실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아랫사람이 출장을 가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관공서에서도 일부 복명서를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은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회의보고서라든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장보고서 또는 여행보고서 등 통상 보고서라고 하지 복명서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더구나 우리 종중에서는 누구의 명을 받고 회의나 시제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명서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불내역서에 참여 또는 출장근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여사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여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급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회의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복명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래 내용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8.1.19. 7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원의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수입금 수령과 정기예금 재등록을 위해 회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총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사가 관악구 기업은행에 출장했던 결과를 기재한 수불내역서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2018</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에 작성된 수불내역서 일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 </span></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807" class="txc-image" id="A_99A5F64C5E6F4D8131898F"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5F64C5E6F4D8131"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2018년 수불내역서.PNG" actualwidth="807" id="A_99A5F64C5E6F4D8131898F"/></p><p><!--StartFragment--></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위와 같이 수불내역서만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의 출장 복명서가 필요 없는데 동진 감사는 과거에 자기가 쓰던 출장복명서를 쓰자고 보여 준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장 사진은 지금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찍어서 종중 카페에 올려놓기 때문에 종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출장복명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이후 기록한 수불내역서는 영진 회장이 총무 대신 작성했기 때문에 내역이 다소 누락된 경우가 있겠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이전에 기록한 수불내역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진 감사님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2.6.2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쓴 출장복명서도 당시 동진 감사님이 회장이었는데 회장이 누구의 명을 받고 출장을 갔는지 몰라도 당시 출장비용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63,0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출 결의를 하려면 우리 종중에서는 수불내역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수불내역에는 출장일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산과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장목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장결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장비용 등이 기록 되었을 텐데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뭣 때문에 똑 같은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써서 붙였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사진이 필요하다면 수불내역서 뒷면에 사진을 한 장 붙이면 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도 출장복명서가 꼭 필요하다면 운영규정에 서식을 정하자고 안건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상정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안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규정 관리 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여기서 회장님은 제규정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옮겼으니 재미로 읽어 보세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진 회장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잠깐 여기도 나왔는데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규정</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리가 회의를 해서 어느 결정사항이 있으며는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게</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표준 말 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규정에다가 운영규정이든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제정정</span></u><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해 놓으면 쉬운데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없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렇게</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냥 해 놓으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거</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 찾으면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게</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제 어느 때 뭐가 바뀌어 가지고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됐는지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렇게</span></u><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얘기 한 거그든 원본은 하나는 놔두고 거기다가 원래 처음부터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 이런 규정</span></u><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첨부를 하던지 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본을 바꿨다든가 했으면 좋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사항</span></u><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대단한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규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제정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렇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렇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 이런 규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사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표현은 정확한 목적이나 뜻이 없어서 듣는 이사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규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동진 감사님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규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잘 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무튼 제가 이사회 설명자료 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감사보고서를 찾아 봤더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8.1.1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사보고서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9.1.1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사보고서가 거의 똑 같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2018.1.14.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사보고서 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정 관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span></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921" class="txc-image" id="A_998845485E6F4E34021BE5"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845485E6F4E3402"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2018년 감사보고서(동진).PNG" actualwidth="921" id="A_998845485E6F4E34021BE5"/></p><p><br></p><p><!--StartFragment--><br></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tartFragment--><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2019.1.13.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사보고서 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정 관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if !supportEmptyParas]--><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786" class="txc-image" id="A_9986D44D5E6F4EB0127D0B"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6D44D5E6F4EB012"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2019년 감사보고서(동진).PNG" actualwidth="786" id="A_9986D44D5E6F4EB0127D0B"/></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tartFragment--><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해서 찾아 봤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의 해석은 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정은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정 즉 여러가지 규정을 을 말 하는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종중에는 규약과 운영규정 딱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 이러지 말고 규약이나 운영규정 또는 개정사항이라고 말하면 명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동진 회장님은 우리 종중이 사단법인체로 발족했다고 하는데 우리 종중은 사단법인이 아니고 종중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에 의해 1993.8.4 전주시 덕진구에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아닌 사단 있니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때 누구의 발의로 개정되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때는 같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이고 규약이나 규정에는 개정된 날자가 부칙에 올라있으며 개정된 조항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구의 발의에 의해서 개정되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작성한 회의록이나 회의자료에 발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자 이름이 기재 되어 있지만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총무나 다수의 종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은 발의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의자 이름 없이 회의자료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8</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감사보고 때에도 동진 감사가 똑 같은 건의를 해서 당시 회의 때 발의자를 알고 싶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이사회 현장에서 설명 했으며 자세한 설명내용은 종중 카페 회의록이나 녹음내용을 들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럼에도 불구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9</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다시 지적했기 때문에 그 것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2</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이후 개정된 규약과 운영규정의 개정사유와 개정일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의자 등을 전부 발췌해서 규약이나 운영규정과 관계없이 회의자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1</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쪽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4</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쪽에 수록했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동진 감사와 영진 회장님은 규약과 규정개정에 대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8</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이사회 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했는지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진 회장님은 규약 개정 때 부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에 몇월 며칠 개정 그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야 되니까 동진 감사 말씀대로 원안은 그대로 놓고 따로 별표로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것은 규약이나 규정을 왜 만들고 왜 고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덕종중 운영규정 부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1012" class="txc-image" id="A_999BF4475E6F4F0A037D49"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BF4475E6F4F0A03"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종중 운영규정.PNG" actualwidth="1012" id="A_999BF4475E6F4F0A037D49"/></p><p><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tartFragment--><br></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약이나 규정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종원들이 쉽게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알고 지키자고 만든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 만들었는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령이나 조례도 국민이나 주민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알고 지키자고 만든 것이지 누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 만들었는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찾아 봐도 조문이나 부칙에 발의자나 발의사유가 기재된 예는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울특별시 감사 규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if !supportEmptyParas]-->&nbsp;</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898" class="txc-image" id="A_99AECC475E6F4F5E161DDD"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ECC475E6F4F5E16"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감사규칙.PNG" actualwidth="898" id="A_99AECC475E6F4F5E161DDD"/></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tartFragment--></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약에 규약이나 규정안에 개정사유나 발의자를 삽입한다면 그 동안 개정건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어디에다 일일이 삽입할 수 있으며 삽입한들 집행자나 종원 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시 발의자들이 자기가 발의해서 규정이 개정됐다는 것을 종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공명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功名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니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개정사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자치단체 감사규칙과 같이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든가 공포일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 후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종중 규약이나 규정은 개정일 즉시 이사회 때 결정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결정된 날을 기재한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법령이나 규정은 시행일이 되면 그 때부터 공포된 규정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유기체처럼 작동이 되는 것이지 개정된 부분만 시행한다든가 부칙에 기재된 것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 개정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가 왜 개정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종중은 매년 규약과 규정을 회의자료에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정사유를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지금까지 임원진은 물론 종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회의자료에 수록해 왔는데 이상하게 동진 감사님이 회장이 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9</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20</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는 개정된 규약과 운영규정이 이사회 자료에 수록 되지 않았는데 회장님&nbsp;말씀대로 혹시 가제정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가제정정이란 말은 사전에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nbsp;잘 모르겠으나 많은 법령이 수록된 법령집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법령을 &nbsp;갈아끼우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가제 작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종중에는 규약과 규정 2개&nbsp;밖에 없기 때문에 가제가 필요 없습니다.&nbsp;</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영진 회장님은 어떤 건이 개정되었는지 별표를 표시 해달라고 부탁해서 용진 이사가 인쇄한 것을 보면 일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nbsp;<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개정한 것도 없고 누가 부탁해서 그렇게 개정한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5</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6</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에 개정할 때 부칙에 단서조항을 붙인 것은 정기총회 개최시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사비 지급시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사차례 지정 등은 개정일자와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한 것이지 누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만, 부칙에 단서조항을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개정내용이 단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제1</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로&nbsp;<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것뿐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span></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별표 표시 역시 규정에 별표를 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정해져 온 것이지 누가 지시하거나 부탁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가 관공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한두 번 개정한 것도 아니고 수 없이 해 왔는데 회장이나 감사가 요구한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게 안 했겠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진 회장님이나 영진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종중의 규약이나 규정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영진 회장이나 동진 감사님이 필요하다면 본인들 생각대로 만들면 될 텐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문에다 발의 한 사람의 이름을 넣든 앞에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부칙에다 개정된 조문을 넣든</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니면 가제정정이 뭔지 몰라도 가제정정을 하든 간에 그 것이 타당하마면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에 올려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제정정 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동진 감사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규정에다가 운영규정이든 </span><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제정정</span></u><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해 놓으면 쉬운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씀 하셨는데 가제정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많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집행자를 위해 법령집을 그대그때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데 법령집에 새로 인쇄된 법령을 삽입하거나 개정조문을 갈아 끼우는 일을 가제 또는 가제 작업이라고 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민국 법령집 일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endif]--><br></p></span><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539" class="txc-image" id="A_99F64A4C5E6F4FA4051216"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64A4C5E6F4FA405"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대한 민국 법령집(가제).PNG" actualwidth="539" id="A_99F64A4C5E6F4FA4051216"/></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br></span><!--StartFragment--></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우리 종중에는 기껏해야 규약 하나에 규정 하나 밖에 없어서 규약이나 규정집이 없는데&nbsp;무슨 가제나 가제작업이 필요 하겠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제정정 얘기를 여러 번 하던데 바르게 알려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이고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말을 쓰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약이나 규정이 바뀌면 집행자를 위해서나 종원들을 위해서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종중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2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에 바뀐 규약과 규정을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함초롬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endif]--></span></p><p class="0" style="letter-spacing: -0.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루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nbsp;</span></span></p></span></span><p><br></p>
<!-- -->
카페 게시글
●―종중회의 녹음파일
2019년도 이사회 녹음 내용 바로잡기 설명(2)
이영복
추천 0
조회 555
20.03.17 17:3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