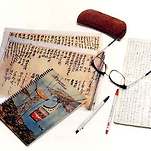<P> <A name="[문서의 처음]"></A></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벽암록 27칙 운문화상과 가을바람에 진실 드러나다</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진실은 앙상한 고목처럼 무일물의 경지”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벽암록} 제27칙에는 운문 화상의 유명한 가을바람에 진실이 모두 들어난 체로금풍(體露金風)의 법문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어떤 스님이 운문 화상에게 질문했다.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운문 화상이 대답했다.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體露金風).'</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擧. 僧問雲門, 樹凋葉落時如何. 雲門云, 體露金風.</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오는 '평창'에 이 공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사람의 경계인가? 이것은 분양 화상의 18가지 질문 가운데 선지식의 역량을 시험하는 질문(辨主問), 또는 사건을 빌린 질문(借事問)이라고 한다. 운문 화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라는 대답은 아주 훌륭하고, 또한 그 질문에 위배되지 않았다. 즉 질문한 스님도 안목이 있었고, 대답 또한 분명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운문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樹凋葉落)는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수조엽락(樹凋葉落)은 마치 겨울철에 나무에 물이 마르고 낙엽이 져서 나무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풍경을 연상하게 한다. 물론 이 질문은 그러한 앙상한 겨울나무의 자연풍경을 문제로 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질문하는 스님이 제시한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樹凋葉落)의 경지'는 사실 {대반열반경} 제35권에 부루나가 비유로 설하는 다음과 같은 고사를 토대로 한 문제제기 인 것이다. 즉 "부루나가 말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 올리니 들어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했다. '좋은 일이지. 그대 마음대로 말해보게나.' '세존이시여! 마치 큰 마을 앞에 사라나무 숲이 있고, 그 숲 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가 숲보다 먼저 생겨서 백년이 넘었습니다. 그 숲의 주인은 물을 주면서 철에 따라 가꾸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되어 껍질과 나뭇가지와 잎은 모두 다 탈락하고, 굳은 고갱이만 남아 있습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낡은 것은 모두 제거해 없어지고 오직 진실한 법만 남아 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마조어록}에 마조대사가 어느 날 약산에게 "그대 요즘 정법 안목에 대한 견해(見處)는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자, 약산이 "피부가 완전히 탈락되어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 일단도 {열반경}의 고사를 배경으로 한 선문답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가을바람에 나무 본체 드러나듯</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아상(我相), 번뇌 사라진 본래면목 비유</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이러한 내용에 {한산시}에도 {열반경}의 고사를 시로 읊고 있으며, 송대 황산곡(黃山谷.庭堅 : 1045~ 1105)은 {한산시}에 의거하여 "피부와 터럭 모두 떨쳐버리니 오직 진실만 있네"라고 시구에 응용하여 읊고 있다. {육조단경}에 "낙엽이 떨어져 근본으로 되돌아간다(葉落歸本)"고 주장하고 있는 말도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은 {노자} 16장에서 주장하는 "대개 사물은 번창하지만 각기 그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근본으로 되돌아 간 것을 정(靜)이라고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한 말이다. {신심명}에도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종지를 체득하고, 사물에 비친 대상을 따르면 근본을 잃어버린다"고 읊고 있다. 선불교에서는 '만법이 하나로 되돌아간다(萬法歸一)'는 주장처럼, 일체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인 불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환원성(還源性)의 구조이다. {대승기신론}에서 번뇌 망념의 중생심(不覺)에서 본래인 진여 자성의 불심(本覺)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회귀성(回歸性)의 종교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선어록 등장하는 피부나 나무 잎, 혹은 초목과 풀 등은 숲(사바)의 세계인 번뇌 망념(妄念)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동산양개 화상도 번뇌 망념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멀고 먼 곳에 풀이 하나도 없는 곳(萬里無寸草)을 향해 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는 절대 평등의 무일물(無一物)의 경지인 진실된 법신(法身: 불성)을 깨닫도록 지시하는 법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마저 떨어진 수조엽락(樹凋葉落)은 {열반경}에서 부루나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오래된 사라나무의 껍질과 가지와 잎이 완전히 탈락된 앙상한 고목은 본래 모습인 진실만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인데, 즉 여래의 진실한 법신은 일체의 번뇌 망념(皮膚)의 먼지가 완전히 없어진 청정한 불심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가 시들고 메말라 잎이 완전히 떨어져 없어진 것은 아상(我相) 인상(人相)과 일체의 번뇌 망념이 완전히 탈락된 본래(本來) 무일물(無一物)인 법신의 진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열반경}에 의거하여 일체의 번뇌 망념이 탈락한 불성상주(佛性常住), 혹은 법신상주(法身常住)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어떤 스님은 "번뇌 망념이 완전히 탈락된 깨달음의 경지(法身)는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즉 본래 무일물(無一物)인 열반적정인 법신 경지를 체득한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운문 화상은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體露金風)"라고 대답했다. 체로(體露)는 본래의 모습인 근본이 완전히 들러난 것으로 {광등록} 제8권에 백장이 신령스런 빛이 홀로 빛나니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의 경계를 초월하고, 법신이 그대로 드러났다(體露眞常)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가을바람에 불법의 참된 모습(實相)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의미이다. 오행(五行)에서 가을(秋)은 금(金)이기 때문에 금풍(金風)은 추풍(秋風)을 말한다. {임제록}에도 "금풍(金風)이 옥피리를 불면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듣는가?"라고 묻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운문은 늙은 피부가 남아 무상에 파괴되고 있는 육신을 통해서 법신의 지혜작용을 꿰뚫어 보고 있다. 운문은 화신이라고도 법신이라고도 말하지 않고도 확실한 자기 존재의 근본 당체(본래면목)를 체로금풍(體露金風)이라는 한마디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난 것처럼, 일체의 번뇌 망념을 초월하여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법신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법음(法音)을 울리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피부는 물론, 몸과 마음(身心)까지 완전히 탈락한 경지에 살고 있는 자신의 본래면목(법신)의 지혜작용이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전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원오는 운문의 대답에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버티고 있다"라고 착어하고 있는데, 온 천지(天地) 가득히 가을바람인데 감추고 숨길 곳이 없다는 의미이다. {화엄경}에 "법신(佛身)은 온 법계에 가득 충만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만법의 진실(법신)은 감춤이 없고, 여실하고 여법하게 이와 같은 모습(諸法實相)으로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운문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일체의 번뇌 망념을 초월한 법신의 경지에서 "가을바람에 진실이 그대로 모두 드러났다(體露金風)"는 법음을 설하고 있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두는 이 공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읊고 있다. "질문에 이미 종지가 있었고, 대답 역시 또한 그렇다" 선문답은 원래 질문 가운데 대답이 있는 법이다. 운문 화상은 스님의 질문에 충분히 종지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스님의 질문 역시 훌륭했다고 칭찬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삼구(三句)를 판별해야 한다"는 말은 운문의 삼구(三句)설법으로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운문이 대답한 체로금풍(體露金風)이라는 일구(一句)에 천지가 하나된 함개건곤(函蓋乾坤)의 구(句)와 일체의 번뇌망념을 끊은 중류절단(衆流截斷)의 구(句), 학인의 근기에 맞추어 지혜를 살리는 수피축랑(隨波逐浪)의 구(句)라는 삼구(三句)가 구비되어 있는가를 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 화살이 허공을 통과하네”라고 읊고 있는 것은 운문 화상이 체로금풍(體露金風)이라고 대답한 한마디는 하나의 화살이 되어 천지를 꿰뚫고 시방세계의 허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결코 삼구(三句)나 일구(一句)로 논의 하거나 해석하는 경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문의 대답(一句)을 운문의 선사상인 삼구(三句)로서 견주어 판별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을 체득하고는 삼구와 일구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벽암록 28칙 남전화상 설하지 않은 불법</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언어문자로 표현하면 불법 그 자체가 아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벽암록} 제28칙에는 마조 문하의 유명한 남전보원 화상과 백장열반 선사와 '설할 수 없는 불법'에 대한 선문답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남전 화상이 백장산의 열반 화상을 참문하자, 열반 화상이 질문했다. "예로부터 성인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불법이 있습니까?" 남전 화상이 말했다. "있지요" 백장 화상이 말했다. "어떤 것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불법입니까?" 남전 화상이 말했다. "마음(心)도 아니요, 부처(佛)도 아니요, 중생(物)도 아니요." 백장 화상이 말했다. "설해 버렸군!" 남전 화상이 말했다. "나는 이렇습니다만, 스님은 어떻습니까?" 백장 화상이 말했다.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닌데, 어찌 설할 수 있는 불법과 설할 수 없는 불법이 있는지 알 수 있겠소" 남전 화상이 말했다. "나도 모르겠소(不會)." 백장 화상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많이 말했군!"</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擧. 南泉參百丈涅槃和尙. 丈問, 從上諸聖, 還有不爲人說底法. 泉云, 有. 丈云, 作生是不爲人說底法. 泉云, 不是心, 不是佛, 不是物. 丈云, 說了也. 泉云, 某甲只恁, 和尙作生. 丈云, 我又不是大善知識. 爭知有說不說. 泉云, 某甲不會. 丈云, 我太爲說了也.</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공안은 {전등록} 제9권 '백장유정(百丈惟政)장'에 전하고 있으며, {무문관} 제27칙에도 수록하고 있다. 대개 백장열반 화상은 백장회해(百丈懷海)의 법을 이은 법정(法正)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항상 {열반경}을 강의하였기 때문에 열반 화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남전화상이 조카상좌가 되는 열반 화상을 참문한 것이 된다. 여기에 등장한 백장 화상은 마조의 제자 백장 유정(惟政) 화상으로 남전 화상과 법형제가 되는 선승인데, 그의 전기는 잘 알 수가 없다. {전등록}에도 백장유정과 백장열반을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혼란이 보인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남전(普願 : 748~834) 화상의 전기는 {조당집} 16권, {송고승전} 11권 등의 자료에 전하고 있다. 출가하여 여러 곳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경율론 삼장을 연마했고, {중론(中論)}, {백론(百論)} 등을 연구하여 불교학에 통달했다. 당시 마조의 선풍이 유명하여 참문하고 그의 선법을 체득하였다. 특히 마조는 그의 대표적인 제자 서당(西堂)과 백장(百丈)과 남전 화상 세 사람이 밤에 달을 보고, 마조가 "정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질문하자, 백장은 좋은 수행을, 서당은 좋은 공양을 말하자, 남전은 소매를 떨치고 밖으로 나갔다. 이러한 제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마조는 "경은 서당, 선은 백장에게 돌아갔네. 오직 홀로 남전은 일체의 경계를 초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불법은 체득해야… 설할 수 없어</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부처님의 '일자불설(一字不說)'과 같은 것</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남전 화상이 동문인 백장열반 화상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백장산을 찾아갔는데, 백장열반 화상은 남전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예로부터 부처나 조사가 중생들에게 설하지 않은 불법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부처나 조사들이 중생들에게 설하지 않은 불법'이란 '설할 수 없는 불법'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중생을 위하여 8만4천 법문으로 모든 불법을 다 설하였고 그 설법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며 어록이다. 그런데 선불교에서 제시한 문제는 8만4천의 법문은 중생을 위한 방편법문으로 불법의 진실을 언어 문자로 표현한 것이지만, 불법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도 '설할 수 없는 불법'이란 불법의 진실 그 자체를 중생들에게 설하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의 진실을 각자 본인이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전화상은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중생을 위하여 8만4천 법문을 설하고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一字不說)고 {능가경}에서 주장하고 있다. 선불교에서 이 경전을 중시하는 것은 '일자불설(一字不說)'이라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선종의 슬로건도 {능가경}의 일자불설(一字不說)이란 정신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고 가섭이 미소로 대답한 '염화미소(拈華微笑)'로서 교외별전과 이심전심으로 전법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의 증명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선불교의 새로운 출발은 세존의 일자불설(一字不說)과 교외별전(敎外別傳)으로 경전에서 언어 문자로 전하는 방편법문과 오시팔교(五時八敎)의 교판으로 주장하는 교학체계을 극복하여 불법의 진실을 본인이 직접 체득하는 실천체험의 종교를 주장한 점이다. 이 공안은 이러한 입장에서 주장된 선문답이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고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일자불설(一字不說)'이란 말이 {반야경}에는 곳곳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언어 문자에 걸림 없고(無碍), 집착 없고(無相), 머무름이 없는(無住) 반야의 논리를 말한다. 또 {반야경}에 "설사 열반의 경지를 초월하는 훌륭한 법이 있을 지라도 나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설한다"는 말을 선승들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 문자는 방편법문이지 불법의 진실 그 자체는 아닌 것이며, 불법의 진실 그 자체는 부처나 조사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여 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설불급(言說不及), 혹은 언어도단(言語道斷),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등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은 각자 본인이 직접 체험하여 깨닫고 체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듯함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냉난자지(冷暖自知)'는 선불교의 체험종교를 대변하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장 화상은 "어떤 것이 남에게 설할 수 없는 불법인가?"라고 반문하자 남전화상은 "마음(心)도 아니요, 부처(佛)도 아니요, 중생(物)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설하고 있는 말을 토대로 하여, 마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고 하고, 남전은 "마음도 아니고(不是心) 부처도 아니고(不是佛) 중생도 아니다(不是物)"라고 설하고 있다. 불법의 진실은 지금 여기서 불심(佛心)의 지혜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불심의 지혜작용(본래면목)을 "부처다, 마음이다, 중생"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표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전은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다"고 언어삼매의 경지에서 불심의 지혜작용으로 밝히고 있을 뿐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백장 화상은 "그렇게 말한 것은 설할 수 없는 불법을 설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남전 화상이 "나는 단지 이와 같이 제시했는데, 스님은 어떻게 설할 수 없는 불법을 제시하겠소?"라고 질문한 것이다. 그러자 백장 화상은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닌데, 어찌 설할 수 있는 불법과 설할 수 없는 불법이 있는지 알 수 있겠소"라고 대답했다. 즉 백장 화상은 나는 대선지식이 아니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서, '설할 수 있는 불법'과 '설할 수 없는 불법'에 대한 분별과 차별심에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안목을 '부지(不知)'라고 제시하며, 남전 화상의 지혜작용(禪機)을 점검해 보고 있다. 남전 화상도 "나도 모르겠소(不會)"라고 대답했다. 남전이 말한 '불회(不會)'는 백장이 말한 '부지(不知)'와 같이 '설할 수 있는 불법' '설할 수 없는 불법'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이해하는 중생의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고, 근원적인 불심의 경지에서 일체의 상대적인 대립을 포용한 본래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말이다. 달마가 양무제에게 말한 '불식(不識)'도 같은 의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백장 화상은 "내가 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말해 버렸군!" 하였다. 이 말은 '설할 수 없는 불법'에 대하여 남전은 "마음도 부처도 중생도 아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말해 버렸다"고 한 것이다. 백장이 '부지(不知)'라고 했는데, 남전은 '불회(不會)'라고 대답한 것처럼, 설할 수 없는 불법에 대하여 두 사람이 많은 대화로 설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설두 화상은 게송으로 읊고 있다. "조사나 부처는 예로부터 사람을 위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고금(古今)의 납승들은 다투어 언어 문자를 쫓고 있네. (남전과 백장의 본래면목) 거울(明鏡)이 비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남쪽을 향하면서 북두성을 바라본다" 남전과 백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방세계와 하나가 되어 얼굴을 남쪽으로 하면서 북두성을 보고 있는 절대(불심)의 경지에서 '설할 수 없는 불법'을 거울과 같이 무심(無心)의 대화로서 설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 -->
카페 게시글
벽암록
벽암록 上 - 선림고경총서35 (제27칙,28칙)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