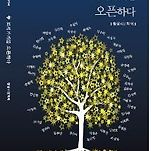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18"><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풍경의 발견외 1편</span></b></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백숙용</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내가&#160; 나를 보지 못한 강, 물안개 걷히자 보았어요</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처음의 나를 그대가 보았던 것처럼</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강물 위로 걸어가는 안개</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남긴 얼굴 쌩긋 웃던 웃음이</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낮달을 데리고 저 편으로 건너가며</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연신 머리를 헹구곤 했죠</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날개 안쪽 흠씬 밴 땀 냄새를</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씻어 내린 청둥오리 떼는</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옹기종기 바위가 되어 떠 있죠</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립지 않고, 사무치지 않는</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우리 만남이 그러해서</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것처럼</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강을 알아보지 못한 내가</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강에 묻혀 늙어가요</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이제야 누군가 나를 위해 비워둔</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몸집 긴 벤치에 앉아</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물안개처럼 발가락 꼼지릭거려요</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손짓도 없이 떠난 그대 용서하는 법을 배워요</span></p><p>&#160;</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호접몽</span></b></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모란이 내려앉은</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작은 뜰</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햇살이 일렁인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나누야 나두야</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내리는 봄비에 꽃잎 젖는 소리</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앙상한 가지가 흔들어 깨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작년에 아홉 송이 피우더니</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올해는 몇 송이 더 피우려고</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저리도 안달일까</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나보다 먼저 눈치 챈 나비는</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쉰 번째 꾼 꿈의 날개를 편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모란이 지고 말면</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떠나는 봄을 따라</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달맞이꽃에 옮겨 앉을</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작은 뜰 그 자리</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참 빠르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나비의 유연한 비행술</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감응의 구간 』(형상시학10집 )</span></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약력</span></b></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백숙용 시인</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대구문학》 등단</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형상시학회, 회원</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시집 『분홍의 방향 』</span></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서평</span></b></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160;백숙용의 상재 시 「호접몽」에서 보면 모란꽃이 핀 작은 뜰과 한 몸이 된 시인은 말 그대로&#39;호접몽&#39;이다. &quot;내리는 봄비에 꽃잎 젖는 소리/ 앙상한 가지가 흔들어 깨운다/ 작년에 아홉 송이 피우더니/ 올해는 몇 송이 더 피우려고/ 저리도 안달일까/ 나보다 먼저 눈치챈 나비는/ 쉰 번째 꾼 꿈의 날개를&quot; (백숙용 「호접몽 」부분) 펴는 과정에서 자아가 개입되고 그 자아가 대상과 뒤섞임을 통</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해 문장을 생성해내고 있다.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39;호접몽&#39;이란 자아가 사물이나 외연과의 일체를 일컫는다. 시인 자신을 비유 어법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quot;모란이 지고 말면/ 떠나는 봄을 따라/ 달맞이꽃에 옮겨 앉을/ 작은 뜰 그 자리/ 참 빠르다/ 나비의 유연한 비행술&quot;(백숙용 「호접몽」부분)이 곧 자산의 내적 변이를 촉발하여 &#39;나&#39;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은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할 자신의 페르소나를 설정하는데, 자신을 얼마나 투영하느냐에 따라 자전적 화자와 허구적 화자로 나눈다. 이런 관전에서 보면 백숙용의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 (우영규 시인의 총평)</span></p><p>&#160;</p>
<!-- -->
카페 게시글
형상시 회원발표 시
풍경의 발견 외 1편 / 백숙용
헤림지
추천 0
조회 30
22.12.26 13:1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