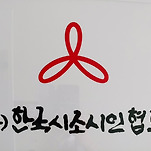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495a3e167198e172b03dc260dcd2ed25e2e7458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495a3e167198e172b03dc260dcd2ed25e2e74581" data-origin-width="2833" data-origin-height="2396"></div><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11111;">말길</span><span style="color: #111111;">(言</span><span style="color: #111111;">路</span><span style="color: #111111;">), </span><span style="color: #111111;">시의 길 </span></span></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한분옥</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고비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고비사막의 한복판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고비의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작은 오아시스를 지나고 난주를 지나니 또 고비는 계속 된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사방에 있는 산도 멀어지고 눈앞에는 대평원의 황색 바 다 고비사막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의 휴가 열사흘 여정은 황량한 고비사막 을 가로지르는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하서회랑의 여정인 열차에서의 왕복 열흘과 우루무치에서의 하루 일정을 포함해서 갈 때도 오른 쪽</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올 때도 오른쪽 창가에 앉아서 고비의 모두를 내 안에 퍼 담으면 된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어릴 때는 울지 않는 어른을 꿈꾸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어른이 되면 울지 않아도 모든 게 척척 해결이 되는 줄로만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래서 어른들은 울지 않는 줄 알았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러나 나는 지금 고비보다 더 황량한 속 뜰을 고비로 태우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내 속에 있는 사막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온통 황토색을 띤 마른 흙과 모래의 들판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달리고 있는 차창 밖으로 여전히 고비는 계속되고 있고 나는 차 속에서 있을 뿐</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는 그저 흔들리고 있으면 되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치를 찾아 떠날 때 나는 사막으로 향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아직도 내 굳게 다문 입술에 말이 열리지 않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보이는 이국 풍물에 느끼는 시선도 내 속 뜰의 겨울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상해에서 우루무치까지 꼬박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5</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일간 달린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상해를 떠나 연화차라 쓰인 침대차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신강 위그루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까지 가는 특급열차를 타고 간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동안의 세월을 살면서 무심한 세월이 던진 매를 많이도 맞았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세월에 멍들었던 상처는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내게 있어 세월은 그게 아니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온통 몸살인지 진통인지 어떤 처방으로도 나을 것 같지도 않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렇다고 단 며칠이라도 호강스럽게 누워서 이러고저러고 할 형편도 못되며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달리</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어떤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 누가 옆에 앉아 어디가 어떠하냐 얼마나 아프냐 물어주고 달래주지도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식구들이 보기에는 항상 바삐 쫓아다니니까 멀쩡하게 보일 뿐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고비의 한가운데를 달린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누런 황토의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황하의 강물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대지의 누런 황토와 모래의 빛깔 그 강물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어느 날은 아침밥 잘 먹고 나가서 남의 칼에 손베 일 때도 있었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허투루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 혀 상처받기도 상처 주기도 한 세월이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자못 어른들이 원수 같은 세월이라 하더니 세월을 향해 쥔 주먹을 풀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칠팔십 도의 여성전용 한증막에 스스로를 감금했던 적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처음에는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2</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분</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5</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분마다 탈출을 시도해 보았지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보다 더 비장한 각오를 했는지</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 열막 속에서 꼼짝 않고 좌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坐 佛</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 된 듯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마포거적을 둘러쓰고 견디어 보라고 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남에게 내 보일 수도 없는 멍 자국을 안으로 삭혀낼 수도 없어 그럴 때마다 내 속에는 사막이 자리하기 시작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숨이 턱에 닿아 말길</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言路</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을 잃어버릴 때마다 생긴 화증</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火</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 속으로 깊어갔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럴 때마다 바다 밑 같은 심연</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深淵</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한기류 타기는 스스로 택한 출구였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오뉴월에도 감기 몸살에 오슬오슬 소름이 돋고 추위는 떠나지 않았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지나가는 바람자락에도</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따뜻한 말 한마디 그 인정에 애를 태우기도 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날 때 혼자 사막을 꿈꾸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내 속에 있는 황량한 모래 바람과 열기는 고비에 와서 더욱 달달 볶이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창밖에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 나란히 가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는 어떤 경치를 찾아 나선 것도</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국 풍물 을 보고 즐기려 나선 것도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늘 존재의 중심 밖에서 서성거리던 자신이</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존재의 중심을 찾아 무의식에서 내친 걸음일 뿐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고비에 밤이 오니 암흑의 세계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민가의 불빛도</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자동차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막은 연이어 뒤로 달아난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속 시원히 울고 나면 나을 것 같은 일에도 도무지 울어지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내 설움은 눈물이 되지 못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속속들이 비단으로 치장하고 나설 때도 속 뜰은 황량한 모래벌판일 때가 많았으니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몇 날 며칠 퍼붓는 홍수 속에서도 젖지 않는 사막 같은 뜰이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럴 때마다 메마른 정서로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안과에서는 눈물샘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직도 사막으로 남아 있어 야 하는 땅 고비에 와서 나는 지금 울먹이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긴장감을 내려놓고 침묵의 세계에 단단히 졸라맨 나의 허리춤을 늦추려 왔던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365</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어쩌다 내리는 밤이슬 한 방 울 받아먹은 선인장의 가시 같은 눈물이· <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한증막 불구덕에서 나를 태우면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나의 마른 속 뜰에서</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는 오늘 고비의 황량함에 놓여져 나도 모르게 울먹이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동안 울지 않았던 울음이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오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황량한 고비에서 뜨거운 눈물</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뜨거운 세월이 누우런 황하로 흘러간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c2b563be0333b33632a39dbde47822c1d83e1f0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c2b563be0333b33632a39dbde47822c1d83e1f0f" data-origin-width="1625" data-origin-height="2424"></div>
<!-- -->
카페 게시글
회원신간
한분옥 수필집 『백년의 翟衣』(2023. 11. 25. DK출판사)
김덕남
추천 0
조회 48
24.07.27 15:1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