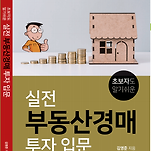<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SIZE: 10pt">경매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 </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부에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매매보다 저렴한 이유가 명도 때문이라고 농담삼아 말할 정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만큼 명도는 경매 고수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지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02</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도가 생기면서 명도 부담은 많이 줄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제집행을 통해 채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런 경우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주의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차 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6</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 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일피일 미루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P>
<P style="TEXT-ALIGN: justify; BACKGROUND: #ffffff;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 style="FONT-SIZE: 10pt">6</SPAN></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대상이 됐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을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 대상은 채무자와 소유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선순위임차인 중에서 배당을 모두 받은 임차인 내지는 가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짓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치권자 역시 모두 인도명령 대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반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누가 있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순위임차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법한 유치권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순위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사람들은 명도 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인도명령 결정은 통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고 법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대상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결정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송달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청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낙찰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도명령결정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달증명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제집행신청이 접수되면 강제집행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부서와 담당관이 배정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부분의 임차인은 인도명령 송달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이사비용 등의 문제를 다시 협상하면 보다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합의가 이뤄지면 강제집행취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득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제집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행 날짜는 강제집행신청일로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5~3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이내에 결정되고 집행일이 정해지면 담당집행관과 만나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 함께 강제집행비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용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8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간층아파트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5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원 정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예납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행 당일이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 사건접수증을 가지고 집행부에 접수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집행관이 그날 집행할 물건과 집행시간을 통보하고 그 시간에 맞춰 낙찰받은 물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인부들을 데리고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이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문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경우는 집행불능이 되어 다음 집행기일을 정하게 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미 납부한 집행비용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3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추가로 납부하고 또 다음 집행기일을 잡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번 기일에는 사람이 없을 것에 대비해 법원에 등록된 열쇠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인 증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삿짐센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관비 통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3</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9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함께 동행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제집행 처분한 이삿짐은 물류센터 등에 보내지고 해당 이삿짐 소유자에게 짐을 찾아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3</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내 이삿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신청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낙찰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법원에 강제집행한 짐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매각결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이삿짐들은 유체동산경매처럼 절차가 진행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서 발생한 매각대금으로 짐 보관비를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까지 진행되면 비로소 강제집행이 끝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BR><BR><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도에 임하는 낙찰자들 중 상당수는 강제집행 절차가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합의한 뒤 내보내는 것을 선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좋게 해결되기 힘든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염두에 둬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BACKGROUND: #ffffff;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0pt">&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BACKGROUND: #ffffff;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SIZE: 10pt">자료원</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제투데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 style="FONT-SIZE: 10pt">2013. 6. 24</SPAN></SPAN></P>
<!-- -->
카페 게시글
↬ 부동산 경매뉴스
[부동산 경매ABC]골치아픈 명도, ‘인도명령제도’가 해결사 - 명도 합의 안되면, 부득불 ‘강제집행’ 진행해야
김영준
추천 0
조회 87
13.06.24 09:2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