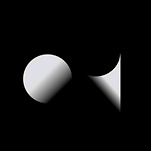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b><span data-ke-size="size20">&lt;당진&#160;난지도&gt;&#160;섬&#160;산에서&#160;느끼는&#160;가을바다의&#160;기별</span></b></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br></span><span data-ke-size="size14"><br></span><b><span data-ke-size="size18">1.&#160;일자:&#160;2024.&#160;</span></b><b><span data-ke-size="size18">10</span></b><b><span data-ke-size="size18">.&#160;</span></b><b><span data-ke-size="size18">5</span></b><b><span data-ke-size="size18">&#160;(토)</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2.&#160;섬</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소난지도,&#160;대난지도</span><span data-ke-size="size18"><br>3. 행로와 시간</span><br><span data-ke-size="size18">&#160; </span><span data-ke-size="size18">[도비도항(11:00)&#160;~&#160;소난지도(11:15)&#160;~&#160;난지대교&#160;끝단(11:35)&#160;~&#160;돌탑/산길&#160;시작(11:45)&#160;~&#160;난지도해수욕장(12:50~13:15)&#160;~&#160;망치봉(13:37)&#160;~&#160;국사봉&#160;갈림(13:53)&#160;~&#160;(해변)&#160;~&#160;대난지도항(14:45)&#160;~&#160;난지대교&#160;끝단(15:10)&#160;~&#160;소난지도&#160;선착장(15:23)&#160;/&#160;14.05km]</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오랜&#160;만에&#160;섬&#160;산행을&#160;간다.&#160;서해&#160;난지도가&#160;목적지다.&#160;충남&#160;최북단인&#160;당진시&#160;석문면에&#160;위치한&#160;난지도는&#160;난초와&#160;지초가&#160;많이&#160;자라는&#160;데서&#160;이름이&#160;유래된&#160;</span><span data-ke-size="size18">섬인데,&#160;규모가&#160;</span><span data-ke-size="size18">서울&#160;여의도&#160;</span><span data-ke-size="size18">만&#160;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두 섬이 인접해 있는데, </span><span data-ke-size="size18">대난지도는&#160;행안부가&#160;선정한&#160;&#39;한국&#160;명품&#160;10대&#160;섬&#39;&#160;중&#160;하나이다.&#160;섬&#160;둘레길(9.8km)을&#160;걷다&#160;보면&#160;동해&#160;해변을&#160;닮은&#160;고운&#160;모래사장,&#160;100m&#160;높이의&#160;야산을&#160;따라&#160;이어지는&#160;작은&#160;봉우리들,&#160;응개&#160;바닷가&#160;앞&#160;아름다운&#160;솔숲길,&#160;열린교육&#160;모델이&#160;된&#160;삼봉초등학교&#160;난지분교&#160;등을&#160;마주한다고&#160;한다.</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섬과&#160;섬길의&#160;대강을&#160;머리에&#160;넣고&#160;토요일&#160;아침을&#160;기다린다.</span><br>&#160;<br><b><span data-ke-size="size18"><br>&lt;&#160;도비도항&#160;~&#160;소난지도&#160;&gt;</span></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4854c5e910f8cea830d058297a1d2adf488bf30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4854c5e910f8cea830d058297a1d2adf488bf304" data-origin-width="2880" data-origin-height="288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7c88bd2328131046c91b018080c908e67aa743b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7c88bd2328131046c91b018080c908e67aa743bc" data-origin-width="1440" data-origin-height="1440"></div><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0시에&#160;도비도항에&#160;도착해&#160;발권을&#160;하고&#160;한&#160;시간&#160;가량&#160;선착장&#160;주변을&#160;서성이다,&#160;11시에&#160;소난지도항&#160;배에&#160;오른다.&#160;배&#160;타는&#160;시간은&#160;고작&#160;10분이다.&#160;하지만&#160;그&#160;시간</span><span data-ke-size="size18">이</span><span data-ke-size="size18">&#160;바다를&#160;느끼기에&#160;부족하진&#160;않았다.&#160;갈매기가&#160;날고&#160;도비항은&#160;점점&#160;멀어지고,&#160;바다&#160;위에는&#160;점점이&#160;떠&#160;있는&#160;작은&#160;배,&#160;다가오는&#160;소난지도의&#160;모습,&#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이</span><span data-ke-size="size18">&#160;다이나믹이&#160;내가&#160;섬을&#160;좋아하는&#160;이유다.</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섬에&#160;닿자&#160;트렝글을&#160;켜고&#160;길을&#160;나선다.&#160;도로&#160;대신&#160;마을을&#160;지나&#160;난지대교를&#160;건</span><span data-ke-size="size18">넜</span><span data-ke-size="size18">다.&#160;멀리&#160;대산</span><span data-ke-size="size18">항과&#160;인근</span><span data-ke-size="size18">산업단지가&#160;아득했다.&#160;바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160;그것도&#160;섬&#160;다리&#160;위에서&#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바라</span><span data-ke-size="size18">보는&#160;바다&#160;풍경은&#160;시원하다.&#160;막힘이&#160;없다.</span><br>&#160;<br><b><span data-ke-size="size18"><br>&lt;&#160;대난지도&#160;일주&#160;&gt;</span></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c722fdd40a818072108cde6495ef4d8759770b9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c722fdd40a818072108cde6495ef4d8759770b97"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392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1255f91f4d5df05ed8639e3bd4626b743f569ee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1255f91f4d5df05ed8639e3bd4626b743f569ee6"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6e519040346e3a7ee967c88512e42050b8dd90e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6e519040346e3a7ee967c88512e42050b8dd90e1"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a45457de1623e44b75ea4087bf6492da6571e14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a45457de1623e44b75ea4087bf6492da6571e143"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21d774bca6788bd813a7f2d5f8180381b01953f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21d774bca6788bd813a7f2d5f8180381b01953fb"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389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d5a6955f3fe814707db819a96a19235e1cbb36c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d5a6955f3fe814707db819a96a19235e1cbb36c2"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ccf0878e665fc050a3733cfaa2937bd1cf50510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ccf0878e665fc050a3733cfaa2937bd1cf505109"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d90e067dfb35fb179a414d0de21495a897b1663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d90e067dfb35fb179a414d0de21495a897b16630"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873619e579d7de67c850c5add17ae62f02520db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873619e579d7de67c850c5add17ae62f02520dbc"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c5317a4e0fd1a231bd319ee338986335730f9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c5317a4e0fd1a231bd319ee338986335730f967"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0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2fcc357f8ac9ef51d1e477fc0fe180c03569819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2fcc357f8ac9ef51d1e477fc0fe180c035698190" data-origin-width="3869" data-origin-height="2178"></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4237c76e09a962a40a2137798e8951c78f388b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4237c76e09a962a40a2137798e8951c78f388b9"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e239b568fa8cdc4f2b0b3098b4857c70e8b204e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e239b568fa8cdc4f2b0b3098b4857c70e8b204e4" data-origin-width="2152" data-origin-height="382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83f83d46e93ca118328c9b204eb55dcfd0edfcc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83f83d46e93ca118328c9b204eb55dcfd0edfcca" data-origin-width="3894" data-origin-height="219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998e7a7d5ee1b070428be89e7c14465cd14afe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998e7a7d5ee1b070428be89e7c14465cd14afe0"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a77ac79a4b3a95088821576c1d946d4899a00d8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a77ac79a4b3a95088821576c1d946d4899a00d86" data-origin-width="3694" data-origin-height="208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0fa2d4d5f498ba0fbca1cffa78f10f6092b735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0fa2d4d5f498ba0fbca1cffa78f10f6092b735ae" data-origin-width="1990" data-origin-height="314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6bb8c84727a61d103c33a170a4be36b57780cd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6bb8c84727a61d103c33a170a4be36b57780cd27"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228b3bbfd150401b738775970b044723f71a018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228b3bbfd150401b738775970b044723f71a018b" data-origin-width="2140" data-origin-height="3801"></div><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대난지도를&#160;크게&#160;돈다.&#160;</span><span data-ke-size="size18">도로를&#160;한참&#160;걷다&#160;들어선&#160;</span><span data-ke-size="size18">산&#160;입구</span><span data-ke-size="size18">의</span><span data-ke-size="size18">&#160;커다란&#160;돌비석이&#160;눈길을&#160;끈다.&#160;그&#160;놓임새가&#160;생뚱맞다.&#160;탑만&#160;보면&#160;작은&#160;사찰이라도&#160;있을&#160;분위기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주는은&#160;잡목만&#160;가득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br><br>숲길이&#160;계속된다.&#160;100미터&#160;높이지만&#160;진득한&#160;오르막은&#160;제법&#160;산행&#160;느낌을&#160;준다.&#160;곧&#160;바닷길로&#160;이어지겠지&#160;했는데&#160;작은&#160;오르내림</span><span data-ke-size="size18">은</span><span data-ke-size="size18"> 계속된다.&#160;산길을&#160;한&#160;시간&#160;넘게&#160;걸어&#160;비로소&#160;해변으로&#160;내려선다.&#160;난지도해수욕장이&#160;길게&#160;펼쳐진다.&#160;해변으로&#160;내려간다.&#160;모래를&#160;밟는다.&#160;발&#160;밑&#160;감촉이&#160;부드럽다.&#160;잠시&#160;흔들그네에&#160;앉아&#160;바다를&#160;바라본다.&#160;바다 저&#160;멀리&#160;사람들이&#160;점점이&#160;보인다.&#160;내가&#160;섬&#160;산행과&#160;트레킹에&#160;빠져드는&#160;이유는&#160;바로&#160;이&#160;여</span><span data-ke-size="size18">백과 여</span><span data-ke-size="size18">유로운&#160;풍경&#160;때문이다.</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대난지도의&#160;정상,&#160;망치봉으로&#160;오르는&#160;등로를&#160;찾아&#160;잠시&#160;헤매다&#160;이내&#160;제&#160;길에&#160;들어선다.&#160;다시&#160;오르막,&#160;중간에&#160;팔각정은&#160;눈길만&#160;주고&#160;0.2km&#160;남았다는&#160;이정표에&#160;힘을&#160;얻어&#160;망치봉&#160;정상에&#160;도착한다.&#160;높이&#160;119m,&#160;그&#160;높이에&#160;잠시&#160;허탈해진다.&#160;고작&#160;그걸&#160;오르는데도&#160;숨을&#160;헐떡였다니.&#160;ㅋㅋ길은&#160;국사봉&#160;방향으로&#160;나&#160;있다.&#160;또&#160;봉우리가&#160;있나?&#160;걱정의&#160;눈빛을&#160;보내며&#160;걸음을&#160;이어간다.&#160;받아&#160;온&#160;트랙의&#160;누적고도가&#160;꽤&#160;높더니&#160;다&#160;이유가&#160;있었다.&#160;어느&#160;순간부터&#160;주위에&#160;사람이&#160;없다.&#160;덕분에&#160;홀로&#160;호젓한&#160;걷기를&#160;즐긴다.&#160;간간이&#160;들리는&#160;</span><span data-ke-size="size18">숲의&#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바람소리와&#160;바다의&#160;파도소리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160;적막에&#160;익숙해&#160;간다.&#160;참&#160;좋다.&#160;산에선&#160;외로움&#160;따위는&#160;없다.&#160;그저&#160;</span><span data-ke-size="size18">혼자인 </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160;주인공인&#160;무대가&#160;조금&#160;길게&#160;이어질&#160;뿐이다.</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13:53,&#160;</span><span data-ke-size="size18">갈림이&#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나타난다.&#160;다행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국사봉을&#160;오르지&#160;않고&#160;해변으로&#160;떨어지는&#160;길인가&#160;보다.&#160;10여&#160;분&#160;내려서자&#160;거짓말처럼&#160;억새숲이&#160;보이고&#160;그&#160;너머로&#160;바다의&#160;기별이&#160;느껴진다.&#160;검은&#160;갯벌이&#160;넓게&#160;펼쳐진다.&#160;해변을&#160;유유히&#160;걷는다.&#160;바라보는&#160;풍경이&#160;언젠가&#160;걸었던&#160;강화도&#160;해변과&#160;닮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해변을&#160;뒤덮은&#160;검은&#160;돌들&#160;때문인가&#160;보다.&#160;</span><span data-ke-size="size18"><br><br>일을&#160;마치고&#160;집으로&#160;돌아오는&#160;어르신들과&#160;함께&#160;마을로&#160;들어선다.&#160;</span><span data-ke-size="size18">마을&#160;</span><span data-ke-size="size18">길을&#160;따라&#160;쭉&#160;가니&#160;대난지도항이&#160;멀리&#160;보인다.&#160;붉은&#160;등대와&#160;작은&#160;산&#160;밑&#160;바다에&#160;선&#160;기묘한&#160;바위가&#160;눈길을&#160;끈다.&#160;그&#160;옆으로&#160;바닷물에&#160;</span><span data-ke-size="size18">푹 </span><span data-ke-size="size18">들어가&#160;낚시를&#160;하는&#160;이의&#160;모습도&#160;눈에&#160;들어온다.&#160;그&#160;여유가&#160;부러웠다.</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소난지도로&#160;연결되는&#160;길을&#160;찾아&#160;이리&#160;저리&#160;돌다&#160;용케도&#160;아침에&#160;걸었던&#160;등로와&#160;만난다.&#160;또&#160;다행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다시&#160;난지대교를&#160;건너&#160;소난지도로&#160;들어선다.&#160;선착장에&#160;도착하자,&#160;예정보다&#160;30분&#160;일찍&#160;도비도항으로&#160;떠나는&#160;배가&#160;있다하여&#160;부리나케&#160;승선한다.&#160;해그름이&#160;느껴지는&#160;배&#160;위&#160;난간에&#160;선다.&#160;배가&#160;만드는&#160;포말&#160;뒤로&#160;소난지도가&#160;점점&#160;멀어진다.&#160;</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꽤&#160;괜찮은&#160;섬&#160;삼행이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난지도의&#160;두&#160;섬이&#160;다른&#160;섬과&#160;차별점이&#160;있다면&#160;찾기&#160;쉽고(거리),&#160;걷기에&#160;부담&#160;없고(크기),&#160;무엇보다&#160;산과&#160;바다를&#160;모두&#160;즐길&#160;수&#160;있다는&#160;점이었다.&#160;마음&#160;만&#160;먹으면&#160;언제든&#160;또&#160;찾을&#160;수&#160;있는&#160;</span><span data-ke-size="size18">친근한</span><span data-ke-size="size18">&#160;섬이다.</span><b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ffd149c2c2d7775b79bf3b44e0b41c7d79c242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ffd149c2c2d7775b79bf3b44e0b41c7d79c2421"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22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31ad39abbc684aac456202d97ad7ff0a4c577c7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31ad39abbc684aac456202d97ad7ff0a4c577c79" data-origin-width="3861" data-origin-height="217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8dc24f09baf8cde094ee90cb93d3e6024a672ea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8dc24f09baf8cde094ee90cb93d3e6024a672ea3" data-origin-width="3918" data-origin-height="2206"></div><p style="text-align: justify;"><b><span data-ke-size="size18"><br>&lt;&#160;에필로그&#160;&gt;</span></b><br><span data-ke-size="size18"><br>이름이&#160;주는&#160;이미지는&#160;강렬</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160;&#39;난지도&#39;&#160;를&#160;처음&#160;접했을&#160;때&#160;상암동&#160;하늘공원과&#160;더불어&#160;&#39;쓰레기&#160;산&#39;&#160;이란&#160;말이&#160;먼저&#160;떠올랐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바다&#160;건너&#160;찾아&#160;내&#160;발로&#160;걸어본&#160;당진&#160;난지도는&#160;꽤&#160;근사한&#160;섬이었고,&#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160;</span><span data-ke-size="size18">풍경이&#160;보물</span><span data-ke-size="size18">이었</span><span data-ke-size="size18">다.&#160;</span><span data-ke-size="size18">잠시나마&#160; </span><span data-ke-size="size18">감히&#160;쓰레기&#160;더미를&#160;떠올렸던&#160;게&#160;미안했다.&#160;섬의&#160;크기도&#160;풍경도&#160;더하거나&#160;뺄&#160;것&#160;없이&#160;적당했고,&#160;너른&#160;해변은&#160;명품&#160;섬이란&#160;명성을&#160;얻기에&#160;충분했다.<br></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오늘&#160;섬&#160;산행과&#160;트레캉이&#160;더&#160;좋았던&#160;점은&#160;들녘울&#160;노랗게&#160;물들이는&#160;황금&#160;벼가&#160;있는&#160;풍경을&#160;원&#160;없이&#160;보았다는&#160;것에서도&#160;찾을&#160;수&#160;있다.&#160;그&#160;험한&#160;여름을&#160;지나고&#160;태풍도&#160;빗겨가고&#160;바야흐로&#160;결실의&#160;계절을&#160;맞고&#160;있다.&#160;길에서&#160;맞이한&#160;가을은&#160;더&#160;풍요로웠다.</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br><br>섬&#160;산행이&#160;주는&#160;매력의&#160;또&#160;하나는&#160;배로&#160;바다를&#160;건너며&#160;바라보는&#160;탁&#160;트인&#160;풍경&#160;조망과&#160;너무&#160;넓어&#160;드는&#160;아득함,&#160;그리움,&#160;설레임&#160;등&#160;감정들의&#160;공존이다.&#160;10분의&#160;짧은&#160;시간이지만&#160;바다를&#160;느끼기에&#160;충분했다.</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처음으로&#160;죽전간이정류소&#160;부근&#160;주차장에&#160;차를&#160;세워&#160;산행&#160;후&#160;편하게&#160;집으로&#160;돌아왔다.&#160;주말과&#160;공휴일엔&#160;무료라&#160;한다.&#160;이&#160;역시&#160;아는&#160;만큼&#160;유용한&#160;경험이었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0f05dd7af7cfc93c946f930c0e0f1a49d1ddda0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0f05dd7af7cfc93c946f930c0e0f1a49d1ddda07" data-origin-width="3886" data-origin-height="2188"></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6ea3f49e87ccbb29d454a02d0bb20c8f380ac5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6ea3f49e87ccbb29d454a02d0bb20c8f380ac5c" data-origin-width="3691" data-origin-height="2199"></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d679290472bb147f8b6d423855736e998f77a67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d679290472bb147f8b6d423855736e998f77a679" data-origin-width="1962" data-origin-height="208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efa81e204f597fbb8c57910321e48d386ea84b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LzO/9efa81e204f597fbb8c57910321e48d386ea84ba" data-origin-width="1440" data-origin-height="2344"></div>
<!-- -->
카페 게시글
섬 산행과 트레킹
당진 난지도 (2024. 10. 5)
느리게
추천 0
조회 93
24.10.06 06:1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