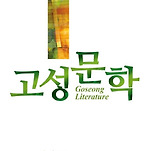<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박상순의&#160;</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내 봄날은 고독하겠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평설&#160;</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문혜원</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b><span data-ke-size="size20">내 봄날은 고독하겠음</span></b></span><br><br><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박상순</span><br><br><br><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모란에 갔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잘못 알았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그곳은 병원인데 봄날인 줄 알았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그래도 혹시나 둘러만 볼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생각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아뿔싸</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고독의 아버지가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나를 불렀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환자용 침상 아래 납작한 의자에 앉고 말았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괜찮지요</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괜찮지</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온 김에 네 집이나 보고 가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바쁜데요</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바빠요</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봐서 뭐해요</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도 나 죽으면</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알려줄 수 없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여지저기</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여기니</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찾아가보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만 쳐다봤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별도 달도 없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곧바로 내려와서 도망쳐왔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도망치다 길 잃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두어 바퀴 더 돌았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가로등만 휑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내 마음 썰렁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마침내 나 죽으면</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알려줄 수 없는 집</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여기저기 맴돌다가 빠져나왔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모란에 다시 갔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제대로 갔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길바닥에 서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내 봄날이 달려왔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한때는 내 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스무 살이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이젠</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쉰 살도 넘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도 내 봄날의 스물두 살 시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남산공원 계단을 내려오던 그날에</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내 두 눈이 번쩍 뜨이고</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내 가슴속의 쇠구슬들이 요란하게 덜커덕거렸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분홍 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남빛 치마 잊히지 않는</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계단을 내려오던 내 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앗</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아</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날 오후 내 봄날이</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여기도 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여기도 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을 속삭였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세월은 갔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모란에 갔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빛 다 지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초가을에 갔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쉰 살 넘은</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내 봄날을 다시 만났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밥 먹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차 마셨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손 내밀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내 손등</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봄날 손등</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찻잔 옆에 모아놓고 보니</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마음만 휑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그래도 내 봄날은 아름다웠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다정하고 쌀쌀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 봄날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죽기 전에 다시 올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네 죽음을 지켜줄 그 누구도 없다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봄날이 내게 말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누가 있겠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나 혼자 밥 먹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내 봄날만을 생각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푸르른 나뭇잎 하나</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억지로</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쉰 살 넘은 내 봄날의 가방 속에 넣어주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 유치원의 점심시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요리사가 된 내 봄날이 아침부터 요리를 하고</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뒤뚱대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자빠지는 아장아장 새싹들이 오물오물 점심을 다</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먹고 나면</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바닷가 빵집 지나</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섬마을 우체국 지나 쉰 살 넘은</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내 봄날이 파도 소리 들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그 길에 모란이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 길에서</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긴 총 옆에 놓고</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비탈에 누워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총알은 없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오래전 남산공원</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계단에서 덜커덕거리던 내 가슴속 쇠구슬들이 단거리 대공포</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총탄이 되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무거운 포탄이 되니</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가슴이 무거워서 누워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가을도 내 옆에</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총알 없는 빈총처럼 뻗어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가슴이 무거워서 나자빠져 있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런 모란에 갔었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잘못 알았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그곳은 병실인데 또 잘못 알았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아뿔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겨울이 왔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창밖엔 크리스마스트리 반짝이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누가 있겠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아직도 치료 중인 내 봄날</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이번엔 고독의 할아버지가 부르셔도</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환자용 침상 아래 이 끈적한</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납작한 의자엔</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앉지 않겠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내 봄날은 고독하겠음</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누가 있겠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6dd7; 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 &#160;시집&#160;</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슬픈 감자&#160;</span><span data-ke-size="size18">200</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램</span><span data-ke-size="size18">』&#160;</span><span data-ke-size="size18">2017</span><span data-ke-size="size18">년</span></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 정서적 상태를 대체하는 공간</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160;<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160;&#160;시에서 공간은 그것이 객관적인 실재라고 하더라도 주체의 의식과 관련됨으로써만 의미를 가진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나 풍경, 지역 등은 시의 정서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종종 관계 양상이나 심리적인 정황을 지시하기도 한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이 시에는 모란, 남산공원과 같은 실제 지역 이름이 등장하고, 옥상, 계단, 빵집, 우체국 같은 생활 속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들이 이 시 내용의 얼개를 형성한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시의 서술을 액면 그대로 따라가 보자. 1연, 모란에는 아버지로 짐작되는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 있고, 문병을 간 ‘나’는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 ‘집’에 들렀다가 길을 잃고 헤맨다. 2연에서 모란은 쉰 살이 넘은 내가 스물두 살의 나를 추억하는 공간이다. 남산공원 계단을 내려오는 ‘분홍신과 남빛치마’의 여자를 만나고 사랑한 시간들은 ‘봄날’이라는 단어의 반복으로 대체되어 표시된다<span data-ke-size="size16">(“그날 오후 내 봄날이, 봄날, 봄날, 봄날,/ 여기도 봄날, 여기도 봄날, 봄날을 속삭였음.”)</span>. 3~4연, 세월은 가고 봄빛도 진 초가을날 다시 찾은 모란에서 나는 기억 속의 봄날을 만나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긴다. 5연, 겨울이 오고, 봄날은 여전히 병실에 있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그러나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자주 어긋나고 사건과 인물들은 겹쳐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봄날’은 실제 계절이었다가, 병원에 누운 아버지였다가, ‘젊은 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비유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 그와 함께 한 생활이었다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된다. 그런가 하면 1연에서 병원에 있는 아버지는, 5연 “이번엔 고독의 할아버지가 부르셔도/ 환자용 침상 아래 이 끈적한, 납작한 의자엔/ 앉지 않겠음.”에서 ‘고독의 아버지’가 아닌 ‘고독의 할아버지’로 변주된다. 즉 ‘고독의 아버지’, ‘고독의 할아버지’는 실제 혈육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고독의 할애비가 불러도 안 온다’라는 식의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다. 아울러 1연에서 보호자용 의자로 여겨졌던 ‘환자용 침상’ 아래 ‘납작한 의자’ 또한, 5연에 이르면 실제 의자가 아니라 봄날과 관련된 기억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160;구체적인 지명&#160;</span>‘모란’은 집이나 병든 아버지가 있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나’에게 봄날의 기억들을 불러일으킨 상황 혹은 주변 환경이다. 발표 당시 이 시의 ‘모란’이 ‘의정부’였다는 것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시에서 ‘의정부’를 ‘모란’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 현실적인 공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시의 기억들이 대체로 쓸쓸한 정서<span data-ke-size="size16">(병원 혹은 병실로 상징되는)</span>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은 굳이 ‘모란’이 아니어도 쓸쓸하고 휑한 이미지를 주는 환경적 조건을 갖춘 공간<span data-ke-size="size16">(복잡하고 활기차거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외한)</span>이면 어디든 상관없는 것이다.</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이 공간적인 특징은 화자의 정서적 상태를 대체한다. 중간중간에 포착되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알게 하는 구절들<span data-ke-size="size16">(‘가로등만 휑하니 내 마음 썰렁했음, 마음만 휑했음, 다정하고 쌀쌀했음, 나 혼자 밥 먹었음, 가슴이 무거워서 나자빠져 있었음, 누가 알겠음?’)</span>은 결국 ‘내 봄날은 고독하겠음’이라는 구절로 집중된다. 봄날은 다정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더 고독하고, 영원히 고독할 것. 내 봄날은 고독했고, 고독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독하겠음.</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 &#160;&#8212;계간 《시인시대》 2024 겨울호</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b>문혜원 /</b><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제주 출생</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문학박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1989</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년&#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문학사상</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평론 등단</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저서&#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98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년대 한국 시인론</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한국 근현대 시론사</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존재와 현상</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98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년대 한국시인론</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비평</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문화의 스펙트럼</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등</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160;</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아주대 교수</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span></td></tr></tbody></table></div>
<!-- -->
카페 게시글
창작자료
박상순의 「내 봄날은 고독하겠음」 평설 / 문혜원
박봉준
추천 0
조회 24
25.02.22 22:4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