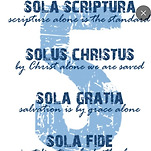<P>&nbsp;</P>
<P class=HS2><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2pt; COLOR: #000000; LINE-HEIGHT: 49px; FONT-FAMILY: 신명 순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8pt">제4장 교세 확장활동</SPAN></SPAN><SPAN style="FONT-SIZE: 18pt"> </SPAN></P>
<P class=HS2>&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Ⅰ 교회의 대 부흥 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7년 1월 평양에서 시작된 대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신앙운동으로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3년 원산에서 원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화이트(M. C. White) 여 선교사의 내한을 계기로 기도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곧 장로교 선교사 및 일부 한국 교인 그리고 동아기독교(침례교)의 인사들까지 참석한 연합기도회 모임으로 발전하여 원산 창전(倉前)교회에서 계속되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로 남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던 하디(R. A. Hardie, 河鯉泳)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통회의 기도를 하였다. 바로 이것이 부흥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과거 3년간 강원도 일대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히 털어놓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신앙적인 허물, 곧 한국인 앞에 백인으로서의 우월 의식과 자만심에 찼던 권위주의에 있었음을 고백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선교 초기만 하여도 선교사들은 한국인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985168;악취가 나는 토속적인 음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막살이에서 새우잠을 자가며&#985169; 겸허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전도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특히 서북지방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피난처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자, 선교사들의 자세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즉 1895년 이후 각 지방마다 선교기지(Mission Station)가 설립되고 교회가 자리를 잡자. 선교사들은 개인 사택에 화려한 생활도구를 들여놓고 피서지까지 확보하는 등 초기 선교사들의 겸허한 모습이 점차 사라졌던 것이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선교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자성(自省)의 빛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마침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내한한 선교사와의 기도모임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은 초기부터 용이하지 않았지만 1900년 의화단(義和團)사건 이후 외국인에 의한 선교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따라서 여간한 인내와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터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화이트 선교사로부터 들었을 때 한국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선교활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하디 선교사의 이상과 같은 고백은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과 은혜가 되는 한편 하디 선교사 자신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 선교사의 고백적인 기도가 발단이 된 이 운동은 그후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의 부흥 운동과 회개 운동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4년 1월 원산에서 다시 개최된 교파별 연합기도회에서 캐나다장로회 선교사 럽(A. F. Robb)이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고, 선교사 중심의 기도회로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1905년 8월 평양에서 다시 일기 시작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편 이러한 부흥회의 열기는 같은 해 삼남지방 목포에까지 전해져 그곳에서도 다투어 통회하고 자복 하는 기도 소리와 부흥의 불길이 솟기도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07년 1월 6일부터 10여 일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 부흥 운동의 불이 점화되었던 것이다. 장대현교회의 부홍사경회는 매년 있어 왔던 연례행사였다. 그러나 이 해의 사경회는 시작 전부터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미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길선주(吉善宙) 장로가 이 집회 준비를 위한 새벽기도회 인도에 나섰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목전에 두고 있던 길선주의 새벽기도 인도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예시해 주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에 입교하기 전 도가(道家), 선문(仙門)에 심취한 바 있는 인물로서 영적 감응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당대 대표적인 부흥사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러한 길선주의 남다른 영력으로 인도된 장대현교회의 부흥사경회는 집회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1.500명이 모인 첫 날의 정경을 &#985170;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그는 길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nbsp;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 와서 오 !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985171;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분이 술회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 하며 통회하는 참석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길 바로 그것이었다. 첫 날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평양 사경회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더욱 고양되었다. 즉 한 주일 집회가 끝나는 토요일(12일)밤,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 블레어(W. N. Blair)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와 신자 사이, 특히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교인 사이에 그간의 갈등과 반목이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적으로 설교하자 다시 한번 통회의 소리가 장내를 뒤덮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적어도 이날 밤의 열기 가운데서는 서양인과 한국인의 구분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된 모습이었다. 명실 상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한 부흥의 열기는 주일 집회 다음날(14일)로 이어지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선교사 리(G. Lee)가 강단에 올라 &#985170;나의 아버지여 ! 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으로부터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에 압도당하는&#985171;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한편 &#985168;신비한 힘의 강림&#985169;에 사로잡힌 일반 교인들의 심령을 또한 동요시켰던 것이다. 1월 15일 부흥회의 마지막 집회에서의 일이었다.&#985170;길 장로의 설교가 있은 뒤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근 6, 7백 명이 기도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라는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W. N. Blair)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또 한 교인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 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사경부흥회 기간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는 이러한 개인의 내면적 죄만을 고백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그러하듯 사회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용서를 비는 실천적인 회개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예컨대 남에게 신체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람들은 이날의 성령 체험을 계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985168;성령강림&#985169;이라는 신비적인 종교체험으로 현현(顯現)된 이와 같은 부흥운동의 열기는 여성과 학생들에게 전이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당시 평양에는 숭실대학(崇實大學)을 비롯한 숭실(崇實), 숭덕(崇德), 광성(光成) 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가 많았으며 거기에 재학중인 학생들만도 당시 2,500명에 달하였다. 바로 이들이 부홍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들에 의한 집단적인 전도운동도 전개되었다. 즉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사경회와 기도회에 참석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은 그룹을 지어 평양시내와 인근 촌락을 다니면서 전도운동에 나서는 열심을 보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편 여성들 역시 여자신도만을 위한 특별 여자 사경회를 통해 받은 은사와 기쁨을 가정으로 연결시켜 기독교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경이적인 부흥운동이 전국에 알려지자 각처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평양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동시에 길선주 장로와 같은 부흥사를 초빙하여 사경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평양 부흥회가 동년 1월 16일로 끝난 지 1개월만에 서울 승동교회(勝洞敎會)에서 길장로의 부흥회가 개최되었으며, 8월에는 의주에서 또한 성령의 열기에 찬 사경회가 길장로에 의해서 인도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대 부흥 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발견케 된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경회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철저한 회개운동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간절한 기도운동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결과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교회가 강한 영력(靈力)을 얻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국 교회는 선교 2O년의 어린 교회였고, 국난을 당하여 고통 속에 빠진 형편이었으나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력을 얻게 된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교회의 엄청난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평양을 기점으로 하여 부흥의 불길이 각지에 번졌다. 각 지방에서 연속적인 부흥 집회들이 계속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기독교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된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서로 회개하며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를 통하여 선교사나 교인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성도의 일체감을 심었고, 국난을 당한 백성으로서 신앙을 통한 일체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 초창기에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부흥 운동의 결과 교회의 조직. 연합. 그리고 선교사라는 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Ⅱ 백만 명 구령 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7년의 대 부흥 운동의 열의가 해를 넘기면서 식어지자 1909년에 개성에 있던 3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입산 기도회를 가졌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3명의 선교사중 한 명인 도 마련 목사(都瑪連&#8228;Rev. M. B. Stokes)는 자기 선교 구역의 교인들에게 그 해 안에 5만 명의 신자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자고 권하고 지방전도여행에 나섰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9년 9월 남감리교 선교회 연회가 모였을 때 도마련 목사의 제안을 받아 〈2O만 명을 그리스도세로&gt;라는 표어를 걸고 구령 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였으며. 그후 서울에서 복음주의 선교부 통합 공의회 총회가 모였을 때 20만명이 &lt;백만 심령을 그리스도께로&gt;라는 목표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것은 방대한 계획이었다. 당시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의 수효를 약2O만 명으로 치더라도 놀라운 계획이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기에 맞춰 1910년 9월 19일 선천에서 개회 된 장로회 제4회 독노회에서는 모든 안건에 앞서 백만 명 구령운동 결의안을 통과시켜 각 대리회로 하여금 적극 추진케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 편 선교사 측에서는 동양 지역 전도 순방 중이던 미국인 부흥사 윌버 차프만(Wi1bur Chapman) 목사와 찰스 알렉산더(Charles Alexander) 목사를 초빙하여 백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교파와 계층을 초월한 대 전도단이 조직되어 전국으로 순회 전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전도단이 조직되었으며 이는 다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전도집회로 확산되어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때 평양, 서울 등 전국 각 지역 기독교계 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이 대거 전도 운동에 참여하였으니 참으로 불길 같은 전도운동이었다. 교역자와 평신도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운동은 두 가지의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첫째는 문서전도이다. 이 때 수백만 매의 전도지와 7O만 부의 마가복음 쪽복음을 반포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고 호소하</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는 전도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하였다. 또 교인들은 전도의 성취를 기도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둘째는,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날을 갖도록 한 것이다. 시골 교회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 교역자를 모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교역에 헌신할 자격자가 많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온 교인이 한 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전도에 헌신하는 날로 정하고 전도하였다. 소위 날 연보라는 것을 한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고에 의하면 교인들의 전도 헌신은 연일수로 치면 1O만 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경회와 같은 집회기간에 특별히 전도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사경회가 끝나는 날에 여기에 참석한 교인들이 자비를 들여 각지로 다니며 전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전문적인 교역자 몇 명보다 더 큰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전도 운동은 비록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운동이 끼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수많은 신자들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전도운동에 시간과 물질을 바쳐 참여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보다 공고히 해 주었다는 점과 각 교파간의 연합운동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교인들에게 교파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고양시켜 주었음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Ⅲ 교회의 조직과 활동</SPAN></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장로교회의 조직</SPAN> </P>
<P class=HS4>&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독노회</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4개 장로교 선교부가 합심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키로 하고, 1907넌 9월 17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선교사 33명, 한국인 장로 36명. 찬성원(캐나다와 호주 선교사) 9명. 계 78명이 모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를 조직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나의 노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흔히 독노회(獨老會)라고 한다. 이 독노회에서 결의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신학 졸업생 7명 목사 장립</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평양 신학교 제1회 졸업생 서 경조(徐景昨), 한 석진(韓錫普), 양 전백(梁甸伯), 길 선주(吉善宙), 이 기풍(李基豊), 송린서(宋麟瑞), 방기창(邦基昌) 등이 안수를 받았다. 이들이 한국 최초의 신학사 목사들인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결의하고 7명의 목사 중 한사람인 이 기풍 목사를 파송 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것은 한국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간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를 받은 지 2O년의 교회가, 그것도 처음으로 장립하는 7명의 목사 중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l907년 부흥 운동의 결과가 이같이 확장됨을 볼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의사봉 제정이다. 의사봉을 제정하여 회의 전통을 세우는데 노력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4) 대리회의 조직이다. 전국을 한 개의 노회로 묶어 놓으니 그 지역이 너무 넓어 노회가 자주 모이기 곤란하므로 종전의 소회(小會) 대신에 경기, 충청, 평북, 평남, 함경, 경상 및 전라 지방에 대리회(代理會)를 두어 노회의 위임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5) 장로회 12신조와 장로회 정치를 채택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와 같이 독노회는 출발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는데, 1907년의 첫 졸업생 가운데서 이 기풍 목사를, 1908년에는 졸업생이 없었고, 1909년의 8명의 졸업생 중 최 관흘 목사를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파송 한 것이 좋은 예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장로회 총회의 조직</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1년까지 독노회가 모이다가 1912년부터 총회로 모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7대리회를 7노회로 조직키로 하고 독노회가 발전적으로 총회가 되도록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성경학원(女聖經學院)에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회</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집 되었는데, 회원은 목사 52인, 선교사 44인, 장로 125인 계 221명이 회집 하</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때 선출된 임원은 회장 언더우드, 부회장 길 선주, 서기 한석진, 부서기 김 필수, 회계 방 위량(W. N. Blair), 부회계 김 석창 등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총회 설립 기념으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1913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1957년에 방 지일 목사가 중공치하에서 귀국하기까지 45년 동안 선교사업을 하였다. 역대 산동성 선교사는 김 영훈(金永勳), 박 태로(朴泰魯), 사병순(史秉淳), 박 상순(朴商純), 홍 승한(洪承漢), 방 효원(方孝元), 이 대영(李大榮), 방 지일(方之日), 김 호순(金好淳) 등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것을 보면 독노회 조직 기념으로 제주도 선교를 실시하고 그후 시베리아 선교, 일본 유학생 선교에 이어 중국 선교는 첫 걸음을 딛는 한국 장로교회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쾌거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을 밖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감리교의 조직과 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884년 6월 25일에 처음으로 맥클레이 박사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사업의 윤허를 받은 것은 교육, 의료사업 뿐 이였지, 전도사업은 허락되지 않았다. 근대식 학교와 병원이 설립된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학당 옆에 정동 교회를 세웠고, 스크랜톤 선교사는 상동병원&nbsp; 옆에 상동 교회와 동대문 시약소 옆에 동대문교회를 세웠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미(북) 감리교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미 북 감리교회에서 초기 선교사로 파송 받은 아펜젤러 일행 5명은 부임 도중 1885년 3월 31일 부로&nbsp; ‘한국 선교회’를 조직하였는데 감리사에 맥클레이, 부 감리사에 아펜젤러, 회계에 스크랜톤으로 정했다. 이들은 당시, 전도금지로 배재학당</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의 교육을 통해 학원전도에 힘쓰고 의료 활동으로 선교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class=HS6><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구역회, 지방회 조직</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897년 서울 구역회를 조직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국 선교 지방 감리사에 시란돈 (스크랜톤) 이었고 제물포, 강화, 연안구역 구역장에 조원시 이었으며 평양, 삼화구역 구역장에 노보을 이었고 서울구역 (정동, 상동, 동대문) 구역장에 시란돈 이었으며 수원, 공주 구역 구역장에 서원보였고 원산 구역 구역장에 맥길 선교사 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1년부터는 교세가 확장됨으로&nbsp; 3지방회로 분활이 이뤄지게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1. 11. 1. 인천지역을 한국 서 지방회로&nbsp; 1901. 12. 1. 평양지역을 한국 북 지방회로 1902.&nbsp; 5. 1. 서울지역을 한국 남 지방회로 하여 장로사들을 두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최초로 김 창식, 김 기범이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902. 5. 18에 최 병헌 목사&nbsp;&nbsp;&nbsp; 안수, 1903. 5. 3에 이 은승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4년 5월 9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노블감리사 사회로 급변하는 사회개혁 및 정세에 관하여&nbsp; 토의하고&nbsp; 결혼문제, 노예제도, 안식일 준수, 도박과 오락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금하기로 정했다.</SPAN> </P>
<P class=HS6><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한국 연회 조직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1908년 3월 11일에 선교연회가 완전히 독립 제1회 한국연회를 일본 주재 해리스 감독이 내한하여 정동 제1예배당에서 조직되게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북 감리회의 처음 세워진 교회를 보면 다음과 같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① 정동 교회 : 아펜젤러가 1885. 8. 배재학당 세워 신교육하며 학원선교를 시작하였는데 그 곁에 1886. 10. 11. 한옥에 4명이 모여 첫 예배드리고 벧엘 교회 라고 불렀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② 상동 교회 : 1885. 9. 10. 내한한 스크랜톤이 상동병원에서 기도회를 시작. 교회 명칭을 달성교회(1900)로 하였었다. 1901년 미국 스탠포오드에 있는 ‘미이드’ 양이 자기&nbsp; 어머니를 기념하여 거액을 보내와 벽돌 예배당을 봉헌하고 상동 미이드 기념교회라 불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③ 동대문 교회 : 1892. 12. 25.&nbsp; 성탄일에 동대문 옆에 "볼드윈 기념예배당"으로 시작되었다.&nbsp; 볼드윈 박사는 뉴욕에 사는 분인데&nbsp; 그는 볼드윈 시약소와 학교를 세워 많은 후원을 하였다. 1900. 까지 "볼드윈 예배당" 1906. 까지 - "볼드윈 동대문 예배당" 으로 부르다가 1908. 이후 - "동대문 교회"라 불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④ 제물포(인천) 웨슬리 교회 : 아펜젤러 내한 1년 후 1886. 4. 25. 인천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는데 1891. 8. "제물포 웨슬리 기념 예배당"이 신축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남 감리교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895년 10월 8일 명성왕후가 시해 당한 뒤 국내 정세가 어지러울 때 헨드릭스 감독은 중국에서 선교하던 이덕 박사를 대동하고 10월 13일 래한하였느데 이 때윤 치호의 역활과 공이 컸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스크랜톤 박사의 도움으로 현재 한국은행 본점이 있는 중심지에 선교기지를 정하고 활동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후 2주간 후 헨드릭스 감독으로부터 "중국 선교연회 한국지방 장로사"로 임명받았다. 스크랜톤이 상동교회의 진실한 교우 김 주현과 김 흥순을 이덕 박사에게 추천하여&nbsp; 조력하게 하였다. 이들은 서울 근교 "고양읍 교회"를 짖게 되었는데 현재의 광희문 교회인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897년 9월 10일 "제1회 한국 선교 지방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2개 구역으로 정하여 서울구역은 구역장에 이&nbsp; 덕 박사가, 개성 구역은 구역장에 고 영복 목사가 맡기로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00. 4. 15. 부활주일, 배화학교 기도실에서 주일예배 시작한 것이 발전하여 "종교 교회"가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00년에 윌슨 감독은 서울 구역장에 무야곱, 개성구역장에 고영복, 원산구역장에 하리영을 임명하여 3개 구역으로 분할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04년에 ‘한국선교지방회’에서 김 흥순(44세)에게 전도인 허가장을 수여하여 남 감리교회의 최초 성직자가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06. 9.&nbsp; 18. 지방회 때 정&nbsp; 춘수(32세), 주 한명이 전도사 직첩을 받았고, 이때부터 미&nbsp; 감리회와 남 감리회가 모두 교회이름을 감리교회로 통칭하게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11. 10.&nbsp; 1. "제 15회 선교회"&nbsp; 개회 중에 서울 종교교회에서 머리감독으로부터 김 흥순, 정 춘수, 주 한명이 목사(집사)안수를 받으므로 남 감리교회에서 베푼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15. 10. 3. 김 홍순, 정 춘수, 양 주삼에게 장로 목사 안수가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인재 양성 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1)</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감리교 선교부에서 초창기에 세운 학교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서울 : 배재(1885년), 이화(1886년), 배화(1898년)&nbsp;&nbsp; 인천 : 영화(1892년)</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평양 : 광성(1894년), 맹아학교(1898년), 정의(1899년)</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영변 : 숭덕&nbsp;&nbsp;&nbsp;&nbsp; 원산 : 루씨(1903년)&nbsp;&nbsp;&nbsp;&nbsp; 수원 : 삼일(1902년), 매향</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개성 : 송도, 호수돈 미리흠&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공주 : 영명(1905년)</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2) 교역자 양성기관을 세워 운영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890. 1. 25. 서울에서 첫번 구역회가 개회되었는데 이때 학교형식의 기구와 제도를 갖추지 못해 "신학반" 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평양, 인천 지역에서 이동식 수업을 하다가, 1906. 11. 부터&nbsp; 남북 감리교회가 합동하여 "신학부"로 승격시켜 수강시간을 늘이고 과목과 강사진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두 번 개강하는데 한 번은 서울, 다음은 평양에서 실시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5. 6.&nbsp; 21. 미(북) 감리회 선교회가 한국 선교연회로 기구를 확대하면서 교역자 양성문제가 연회로 상정되어, 스크랜톤 박사는 이동식 신학반 보다, 영구적인 일반 신학교가 중앙에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하자 "신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통과되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907. 6. 18. 미(북) 감리회 제3회 한국 선교연회 때 "협성신학"의 구성이 통과되었고. 1907. 6. 20. 한국&nbsp; 선교회 (제11회) 때 한국인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북 감리회와 연합하여 "신학당"을 설립하기로 가결되어. 협성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10년 서울 냉동에 대지를 $ 6,000 로 구입하였고. 1911. 12. 20. 협성 신학교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제1회 졸업생 45명을 배출하였으며, 1915년 붉은 벽돌 3층 본관, 기숙사가 세워졌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9673; 과 제 &#9673;</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1907년 대 부흥운동에 대하여 설명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장로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진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남북 감리교의 활동에 대하여 약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P>
<P class=HS2><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2pt; COLOR: #000000; LINE-HEIGHT: 49px; FONT-FAMILY: 신명 순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3px;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8pt">제5장 교회의 수난과 민족운동</SPAN></SPAN><SPAN style="FONT-SIZE: 18pt">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5년 일본은 이른바 을사 보호조약을 통하여 외교권과 경찰권을 강점하고 1910년 한일 합방을 강행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이 때에는 교회가 부흥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nbsp; 특히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들이 전도한 종교이며, 기독교 세력의 배후에는 선교사들과 서구의 열강들이 있다는 점이었다.&nbsp; 그러므로 일제의 한국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은 식민지적 수탈과&nbsp; 유화정책의 양면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소위 정교 분리의 정책을 설득력 있게 내세우기도 하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기독교는 교육 기관을 통한 근대 교육으로 한국인에게 평등, 근로, 자주, 자립 정신을 고취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자신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게 일깨워 주었다.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한 민족 의식이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교육, 언론, 경제 등 각 방면에서 번져 나감으로써 일제는 위험을 실감하였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탄압정책도 불사했는데, 105인 사건, 종교법에 의한 기독교 선교 활동의 제약,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압력 등을 들 수 있다.&nbsp;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민족 운동을 펴도록 만들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Ⅰ 교회의 민족운동</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1.구국기도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5년대 기독교계 민족운동 방법은 구국기도회 운동이 대종을 이루었다. 1905년 9월 장로회 공의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발의에 따라 그 해 11월 감사절 다음날부터 일주일간에 걸친 구국기도회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폭넓게 진행되었다.&nbsp; 이러한 기도회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에서 입교한 초기 교인들에게 민족정신과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구국기도회의 대표적인 예는, 1905년 을사5조약의 체결이 알려지자 상동교회 내의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과 감리교 계통의 교회 청년 조직체였던 엡윗 청년회(Epworth League) 등이 연합하여 같은 해 11월 수 천명의 청년과 교인이 모여 가졌던 일주일간의 기도회를 들 수 있다. 이 집회는 기도회라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독교인의 정치집회 성격이 강했다. 즉 이 때 기도회를 주도한 상동교회 전도사 전덕기(全德基)와 김 구(金 九). 이동녕(李東寧). 옥관빈(玉觀彬), 조성환(曺成煥), 이지간(李志侃) 등은 기도회를 마친 후 궁궐로 나아가 도끼를 메고 조약반대의 상소문을 올렸는가하면 정순만(鄭淳萬) 등은 평안도 장사 수십 명을 모아 을사5조약의 조약 체결 자 박 제순(朴濟純) 등 소위 을사5적 암살을 모의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때 상동청년학원의 회원들은 다음에 살펴 볼 신민회(新民會)의 핵심적 회원들이었다. 이와 같이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전개되기 시작한 기독교의 기초적 민족운동은 다음에서 살펴보려는 신민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벌였던 각종 무장투쟁과 경제저항운동 등으로 발전하여 제2, 제3단계의 적극적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2. 신민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민회가 비밀리에 조직된 것은 1907년 4월 2O일경이었다. 신민회 창립을 주도한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귀국한지 2개월만에 결성된 것이다. 이렇게 짧은 준비기간에 항일비밀결사단체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상동청년학원과 같은 기존의 항일민족단체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큰 힘이 되었다. 신민회 창립시 발기인으로 참가한 인물을 보면 상동청년학원과 신민회 창립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발기인 양기탁(梁起鐸), 이 갑(李 甲), 유동열(柳東說), 이동휘(李東輝). 이동녕(李東寧). 전덕기 그리고 안창호 둥 발기인 7인은 직&#8228;간접적으로 상동청년학원과 연관을 맺고 있던 인사들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민회의 창립 목적은 &#985170;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야 국민을 유신(維新)케 하며 쇠퇴(衰頹)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야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하야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함&#985171;에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당시 실추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략으로서 부패한 구시대의 사상과 관습을 타파하여 근대적인 교육과 산업을 육성시켜 &#985170;유신한 국민을 통일 연합하여 자유 문명국을 세우라&#985171;는 것이 이 단체가 표방한 표면적인 설립취지였다. 그러나 신민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 한 목적은 상실되어가고 있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밀결사로서 내적으로는 중세적 봉건 왕조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공화정(共和政)을 설립하려는데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후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내외적인 모순을 극복한 후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의 수립을 지향한 신민회는 우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이 선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이 갑, 유동열 등은 수차에 걸친 밀회를 통해 신민회 조직을 진행시켰다. 그 결과 서울에 중앙 조직을 두는 한편 각처에 지방조직을 서둘렀다. 서북지방 중 평양, 선천, 의주, 정주, 용천 등 비교적 기독교 교세가 강했던 지역의 교회와 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토착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신민회 지방조직을 진척시켜 나갔다.&nbsp;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민회의 입회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예컨대 차균설(車均卨)의 경우 신민회에 입회하기까지 세 번에 걸친 비밀면담을 통해 &#985170;국가를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다&#985171;라는 다짐을 한 뒤에야 비로소 입회가 허락되었으며 강봉우(姜鳳弱)는 1907년 7월 보창야학교(普昌夜學校) 재학 중 동지 17명과 &#985170;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결의의 표징으로 단지동맹(斷指同盟)을 결행한 것&#985171;이 인정을 받아 신민회 입회가 허락되기도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일제가 105인 사건 이후 작성한 신민회 조직상황에 따르면 총본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맨트에 있었으며 국내총회조직 이외에 하와이(布姓)와 블라디보스톡(海棄威) 등에 해외 지부를 두고 있었고 한편 국내 조직체계도 총회산하에 각도마다 1개의 감독부(藍督部)와 5개 군 단위마다 1개의 총감소(總藍所) 및 1개 군마다 사감소(司監所)를 두고 그 가운데 평의원, 협찬원(協贊員), 이재원(理財員). 대의원(代議員), 총감(總藍),사감(司藍), 반장(班長) 등 복잡한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민회원 총수를 1911년 현재 2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 측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특히 까다로운 입회절차와 창립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올 감안할 때 1911년 현재 신민회원의 수는 400~800명을 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우리가 신민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 신민회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5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신민회원의 신력(信歷) 분석에 따르면 기소자 123명중 장로교인이 96명, 감리교인이 6명, 동학교인이 2명 그리고 천주교인이 2명 등이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05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이 물론 신민회원은 아니었으나 신민회의 지도급 인사는 물론 일반 회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음은 사실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3. 105인 사건의 조작</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05인 사건의 공식 명칭은 ‘데라우찌총독 모살 미수 사건’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9년 이또가 암살 당한 후 데라우찌(寺內)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헌법제도를 실시하고, 언론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았으며 무단 정치를 강행하였다. 그는 강압정책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려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러 형태의 항일 독립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 러시아의 잔인한 통치술과 고문 기술을 터득한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을 조선주차사령관 겸 경무총감으로 임명함으로서 엄청난 날조 조작과 압박과 고문이 휘몰아치게 된 것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당시 신민회와 교회 세력이 중추를 이루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은 반일(反日) 세력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이것을 부수기 위하여 안악 사건과 105인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안악 사건은 안 중근의 동생 안 명근(安明根)이 독립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려다가 체포되자 여기에 연루하여 황해도 일대의 지식인과 교계인사 160여 명을 검속하는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김 구(金九), 최 명식(崔切仙), 이 승길(李承吉), 도 인권(都寅權)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에 감리교 목사 도 인권을 제외하고는 1915년을 전후하여 출옥하였으나, 이것은 일본의 조작에 의한 사건으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첫 출발에 불과 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총독부는 이어서 평안도를 중심한 기독교세력을 분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건을 조작하였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지도자를 투옥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들의 날조 극은 다음과 같다.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찌(寺內)가 l9lO년 11월 5일 압록강 철교 낙성식을 위하여 선천 역에 잠시 하차하였을 때 선교사 맥큔(G. S. McCune)이 데라우찌와 악수하는 것을 암호로 하여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유수한 교계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는데 19l1년 가을까지 157명이 체포되었다. 그 중에서 감리교의 전 덕기(全德基) 목사를 비롯하여 김 근영, 정회순 둥이 고문으로 세상을 떠났고, 23명이 석방되었으며, 나머지123명이 l912년 6월 28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신자가 lO5명이었고 일본의 가공할만한 조작적 재판에서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본이 주장한 증거는 소위 공술서(供述書)인데, 이것은 일본의 잔학한 고문으로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 일본의 극심한 고문과 억지 재판을 통하여 윤 치호 둥 105인에게 5년 혹은 1O넌 징역을 언도하였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와 같은 조작극울 통하여 교회를 말살하려 하였으나 복음의 뿌리는 더욱 깊고 더욱 넓게 전파되어져 갔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본의 105인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윤 산은(尹山溫-G. S. McCune). 나부열(羅富悅 S. L. Robert). 그리고 사락수(謝樂秀-A. M. Sharrooks) 선교사들이 이 음모를 격려하여 주고 밀의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더우드, 마펫, 해리스가,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해리스 같은 이는 일본과 가장 친해서 일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까지도 연계시켰던 것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선교사들 중에는 일본총독부와 친밀하게 지내는 자도 많았으며, 교정분리 원칙을 구실로 일본에 대한 항거를 방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YMCA 총무로 있던 길레트(P.L. Gillett)는 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일본의 조작극과 한국 교회에 대한 핍박을 서신으로 외국에 알려 폭로했기 예문에 1913년에 국외로 추방되기까지 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Ⅱ 민족과 교회의 수난</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1. 종교 교육의 박해</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0년대에 와서는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기에 이르렀다. 4O여 년간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성장하여 오다가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여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교육구국(敎育救國)이라는 일념으로 교육 기관이 교회와 우국 유지들에 의하여 도처에 설립되었다. 또한 교회의 주일학교는 흥왕 되어 1913년 4월 19월 경복궁 뒤뜰에서 모인 주일학교 대회에 14.7OO여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조선 총독부로 하여금 경악케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러자 총독부는 1915년 3윌 사학(私學)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기독교 교육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본 총독부는 1911년에 소위 신 교육령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조선에 있어서의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 일본 황제가 발표한 교육 칙어(敎育勅語)의 정신에 의하여 조선 백성을 일본의 충성스러운 좋은 속국 인으로 양성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령이 제정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5년의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 의하면 특히 제2조에서 사립학교는 반드시 총독부에서 제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교수해야 하며, 교사는 부득이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말에 능통하여야 하고, 또한 일정한 교사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설립된 학교는 교육령을 즉시 실시할&nbsp; 수 없으나 10년 이내에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 의식과 성경 교육의 철폐문제였다. 이는 기독교 계통학교의 설립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결과가 되어, 종교와 교육을 기술적으로 구별하려는 일본의 책략이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하여 교회와 선교사들은 당황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합심하여 이 문제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기독교 계통학교 학생들이 계속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장기간 휴교하는 시태가 연발하였고, 공립학교 우대 현상에 따라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선교사들의 부조화이었다. 감리교의 혜리스 감독은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으며, 배재 학당을 비롯한 여러 학교들이 교명을 고등 보통학교로 바꾸고 총독부 정책을 따랐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배일 사상과 성경교육을 중요시하여 인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잡종 학교로 격하되었다. 장로교에서 인가를 신청한 학교는 비 선교사 계통인 정주 오산(五山) 학교와 함흥 영생(永生)여 학교뿐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또 다른 요인은 조선 총독부가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강요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를 만한 재력을 가진 교회 계통의 학교가 없었고 그 결과 공립학교와의 경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와 같은 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항일 전선은 와해되었으나 소망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19l7년 총독부의 압력과 학생들의 인가 신청 요구 압력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평양 숭실학교의 마펫 교장은 &lt;하나님께 맡기고 좀더 기다려 봅시다. 기한은 앞으로 몇 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학교를 해나갈 마음이 없노라고 총독부에 분명히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만 맡깁시다&gt;라고 하였다. 이렇게 맡기고 기다리던 2년 후 3&#8228;1운동이 일어나자 문화 정치를 표방한 사이또오 총독은 마펫과 만나 협의한 결과 시설 기준을 높인다는 조건하에 예배와 성경 교육을 실시하는 허락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이며, 한국에 닥쳐오는 교육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6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6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A name=#45c5ca3c></A></SPAN>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94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25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지역</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학 교 명</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설립년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nbsp;교&nbsp; 파</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지역</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학 교 명</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설립년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1>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교 파</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서울</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광혜원(제중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배재학당</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화학당</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경신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정신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공옥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군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배화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85</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85</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85</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86</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87</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6</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7</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8</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평양</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숭실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광성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숭덕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맹아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정의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평양신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숭의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4</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4</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4</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8</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9</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1</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3</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104>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북장로회</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미감리회</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미감리회</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미감리회</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미감리회</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북장로회</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선천</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성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성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6</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7</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북장로회</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북장로회</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대구</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계성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명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6</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7</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재령</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명신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8</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강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실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8</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인천</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화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2</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천</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양정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4</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수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삼일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매향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3</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4</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공주</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명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명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5</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7</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전주</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신흥하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기전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0</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2</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광주</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숭일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수피아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7</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8</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군산</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명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멜볼린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1</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1</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목포</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정명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흥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2</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3</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순천</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매산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13</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부산</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신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892</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1>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함흥</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생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영생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3</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7</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성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신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신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SPAN>&nbsp;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SPAN>&nbsp;</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원산</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광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루씨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진성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SPAN>&nbsp;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3</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4</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개성</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호수돈여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영서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미리홈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4</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6</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6</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40>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마산</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창신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의신여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6</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13</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해주</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의창학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의성학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4</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1909</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6 height=27>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
<P style="FONT-SIZE: 8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감리교</SPAN></P></TD></TR></TBODY></TABLE><SPAN>&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초기 설립 기독교 학교 (1885-1913)</SPAN><SPAN style="FONT-SIZE: 7pt; COLOR: #000000; LINE-HEIGHT: 14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nbsp;2. 3&#8228;1운동과 한국 교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국 교회는 대부홍 운동을 통하여 한국 백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일본의 압제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의 살아 있는 본산지가 되었다. 3&#8228;1운동은 천도교와 불교 둥의 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거국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교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8228;1운동의 근원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나 고종의 승하를 들 수 있으나 그보다도 근원적인 원인들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a.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 엄격한 총독부의 군정과 그 횡포</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c. 일제의 민족성 말살 기도&nbsp;&nbsp;&nbsp;&nbsp; d. 사법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의 한국인 배제 및 차별 대우&nbsp;&nbsp;&nbsp;&nbsp;&nbsp;&nbsp;&nbsp; e. 언론, 신앙, 결사 자유의 박탈 f. 종교에 대한 근절 정책</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g. 한국인의 해외 여행과 유학 금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h. 옥토(沃土)의 약탈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i. 공창 제도 및 마약 방임 등 한국 청년의 퇴폐 조장과 비도덕 화.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j. 만주에의 한국인 강제 이민&nbsp;&nbsp;&nbsp;&nbsp; k.일본인을 개선과 한국인에 대한 착취.</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1운동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국내. 외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들 수 있으며, 3.1운동의 선구로서 2.8독립 선언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8228;1운동보다 근 1개월 앞서서 일본 동경 YMCA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2&#8228;8독립선언을 YMCA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하였고, 이 독립선언문을 국내, 일본 정부, 각국 공관, 언론 기관에 발송하였던 것이다. 이 행사의 처음과 나중에 윤 창석(尹昌錫) 목사의 기도와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기독교회 내에서는 1919년 1월 말~2월 초에 걸쳐 선우학이 이승훈&#8228;양전백 등을 찾아가 독립운동을 협의한 후 평양&#8228;선천&#8228;정주 등 서북지역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조직화에 착수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러던 중 2월 7일 이승훈이 연합전선을 펴자는 천도교 측의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천도교와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이때쯤 기독교청년회 간사인 박희도, 세브란스병원 제약주임인 이갑성 등도 강기덕 &#8228;김원벽등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과 독립운동 계획을 협의하였다. 처음에 학생 단은 학생들 단독의 독립시위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천도교&#8228;기독교&#8228;불교의 연합전선을 준비하던 종교계에서 합류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합류하였다.&nbsp; 2월 24일에는 한용운&#8228;백용성 등 불교계까지 포함한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족 대 연합 전선을 이룩하고 구체적인 독립운동 추진방침을 결정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거사 일은 3월 1일로 정하고, 선언서는 최남선에게 기초하도록 하였으며, 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교단별로 선정한 것이 33인이었으며 그 대표 중에 기독교계 인사가 16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이 승훈, 양 전백, 이 명룡, 유 여대, 김 병조, 길 선주, 신 흥식, 박 희도, 오 화영, 정 춘수, 이 갑성, 최 성모, 김 창준, 이 필주, 박 동완, 신 석구 등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 다음 천도교 측의 보성사에서 선언서 21.000여장을 인쇄하여 종교계 &#8228;학생단을 통하여 각지에 배포하였다. 독립선언 장소는 파고다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예기치 않은 폭력사태나 일제 군경의 교란을 우려한 박희도의 제의에 따라 하루 전에 태화관으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당일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의 선언식과 시민, 학생들의 선언식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게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파고다 공원에 약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5</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천여 명이 모여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3</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인 대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보성 전문학생 대표 강 기덕은 태화관에 도착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3</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인 대표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강 기덕은 33인 대표가 파고다공원으로 가지 않으면 권총으로 모조리 죽이겠다고 위협할 정도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사실을 보고 있던 평양감리교 이규갑 전도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주 교회 교사 정재용을 데리고 파고다공원에 도착 팔각정에서 정재용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그리고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학생&#8228;시민들은 독립만세시위에 돌입하였다.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렇게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1</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운동은 시작되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오후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시 태화관에 모인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9</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명의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통보를 받고 출동한 일제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같은 날 독립 대표들의 선언식과 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사전 조직화가 되어 있던 평양&#8228;진남포&#8228;안주&#8228;선천&#8228;의주&#8228;원산 등지에서도 일어나, 급격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시위는 초기에는 기독교와 천도교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3월 중순경까지는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시위양태도 초기에는 독립선언서 격문 배포, 집회, 만세시위 행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군대를 동원한 일제의 폭력적 유혈 탄압에 맞서, 헌병&#8228;경찰&#8228;군청&#8228;면사무소&#8228;우편국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둥 식민통치의 말단 기관들을 습격, 파괴하는 등 폭력적 시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8228;1독립선언을 종교인들이 주도하였던 만큼 운동 전개과정에서도 종교인들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인이 시위를 주도한 사례를 몇 가지 보면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유 여대 목사의 경우 지방시위를 주도하기 위하여 서울의 선언식에는 불참하였지만, 의주지역의 김창건 목사&#8228;김이순 전도사&#8228;안석응&#8228;김두칠 등 동지를 규합하여 3월 1일 의주 서부교회당 공터에 7, 8백여 명을 모아 자신이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지휘하다가 체포당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당시 장로교 총회장이던 김선두 목사도 이일영 &#8228;김이제 &#8228;강규찬 목사, 정일선 전도사 등과 함께 평양에 있는 6교회가 연합하여 선언식과 시위를 계획하고&nbsp; 3월 1일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종소리가 교회에서 울리자 평양시민과 기독교인은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숭덕학교 운동장에 약 1천 수백 여명 회집되어 김선두 목사 사회로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찬송과 기도를 한 후 도인권이 "왜 우리는 독립을 해야하는가</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강규찬이 연설을 하고 정일선 전도사가 독립선언서를 발표</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하였다. 김선두 목사는 사회자로서 &#985170;구속되어 천년을 사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백년을 사는 것이 의의가 있다&#985171;는 뜻의 연설을 하여 군중들을 열광케 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그 해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 1O월까지도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부회장 마펫이 총회를 주재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들이 벌이는 시위에 평양 시내의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0</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만 명은 독립만세를 부르며 동참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노회의 임원들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을 동원하여 3&#8228;1운동에 참여한 사례로는 경북 노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당시 노회장이던 정재순 목사와 노회 서기이던 이만집 목사 등은 3월 8일 대구 장날을 기하여 교인들과 계성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시장의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와 독립만세라고 쓰인 태극기를 나누어주면서 &#985170;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독립할 시기인데 각자가 그 독립을 희망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독립을 위해 당연한 일이므로 만세를 고창해야 한다&#985171;고 하여 이에 호응한 7,8백 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공주에서도 공주읍 교회 목사 현석칠이 영명학교 교사 학생들을 포섭하여 4월 1일 공주 장날을 이용한 시위를 계획하여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평신도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만세시위를 벌인 경우는 강화군의 시위이다. 이 시위는 은세공을 하던 유봉진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3월 18일 강화 읍내 장날에 일으킨 것으로 시위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상회하였고 물론 평화적인 만세시위이긴 하였으나, 시위 도중 피체자가 생기자 경찰서에 몰려가 피체자를 구하고 다시 군청에 가서 군수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 시위가 대규모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교회조직을 통한 치밀한 연락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3&#8228;1운동에서 기독교는 여타 어느 종교보다도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기조직화 단계의 거의 모든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직&#8228;간접으로 관여하였으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의 조직과 지도자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사실 기독교의 조직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3&#8228;1운동이 그처럼 신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8228;1 운동으로 말미암아 받게된 교회의 피해는 격심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수원 제암리 교회는 1919년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4</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월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5</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 낮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4</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시경 일본군 아리다 중위가 제암리 교회에 도착</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교인들을 교회당에 집합시키고 일본군으로 하여금 교회를 포위케 하고 교회에 불을 질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기서 살아서 나오는 교인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교회 안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0</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 명은 불에 타 죽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런 식으로 만행을 저지른 곳이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5</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곳이나 되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l919년 5월에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교회당 전파 17동, 일부 파괴 24동, 그 외 교회당 피해 41동, 교회 재산 피해 약 3만 달러, 오산 중학교의 피해 5천 달러라고 하였다. l919년 6월3O일 현재 투옥된 사람은 기독교인 2,190명으로 유교나 천도교, 그리고 불교 신도 합계 1.556명보다 훨씬 많았고 기독교 교역자도 151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통계 자료는 사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0년 1O월의 장로교 총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장로교인 중 체포된 자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 l34명, 기독교 지도자중 수감된 자 202명, 사살된 자 41명, 총회 회집 시 현재 수감중인 자 202명, 교회당이 훼파된 곳 12개소였으며, 함북 노회 관내에서만 26명의 참살자가 있었으니, 총독부외 통계가 사실과 얼마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9년 1O월에 모인 장로교회에서는 신학생들의 피체와 지방 교회의 손실로 신학교의 속강을 중단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수감으로 말미암아 총회 임원진을 선교사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Ⅲ 반(</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反)</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교회의 도전</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일제의 문화정치</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전국적인 3.1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 수단으로만은 한국인들의 저항을&nbsp; 억누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이 표방되었다. 1919년 8월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가 물러가고, ‘사이토’가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관제개혁에 관한 시정방침훈시를 발표하여, 헌병제의 폐지와 보통경찰제의 실시, 일반관리의 패검 금지, 한국인 관리 임명 및 급여규정의 변경, 국문신문의 허가 등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대우를 개선하였다. 일제는 이를 문화정치라고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찰이 인원과 화력, 경비 등은 오히려 2-3배로 증가했고, 조선인들의 등용으로 그들을 회유. 매수하여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제는 조선 기독교에 대하여도 교묘하게 전술을 바꾸어 교회에 타격을 가하였다.&nbsp; ‘사이토’는 선교사들을 가까이 하여 회유함으로써 친일 쪽으로 만들었으며, 총독부내에 종교과를 설치하여 종교행정 및 선교사들과의 연락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포교 규칙을 개정하여 교회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으나, 그 대신 교회의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나 금지를 명령할 수가&nbsp;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교회가 독립운동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계속하므로 선교사와 교인들간을 이간시켰으며, 일본인 지주들은 소작민 중 기독교인의 토지를 박탈하여 교회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조선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소외당하였으며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지식인들의 교회 비판</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8228;1운동으로 일제의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한국 기독교는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일부 지식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미 1917년 이광수(李光洙)는 한국 기독교를 &#985170;정통(正統)의 폭군(暴君)&#985171;이라고 비판하였다.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신앙유형에 대한 지적이었다. 또한 그는 교역자들이 무식하다고 한탄하였다. 목사와 전도사들이 신학 이외의 학문에는 무지하여 교인들을 미신으로 이끌고 문명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한국 기독교가 신앙 이외의 사상이나 과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시함으로써 현실에서 유리되었다고 혹평하였다. &#985170;명예의 사(史)를 가진 조선교회의 전도(前途)는 비관 밖에 없는 줄 아오” 라는 그의 힐책에 대하여 일부 기독교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기도 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학문의 선도자라고 불리던 교회가 무식하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있었는가 하면, 지식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985170;사상적 생활을 양성&#985171;하겠다는 결심도 있었다. 이러한 자성(自省)이 한국 기독교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회의 변화에 둔감하던 한국 기독교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민족주의와 선교사 배척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또 하나의 교회를 교란시킨 사상은 민족주의였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 민족 교회의 자각에 눈을 뜨고 이를 호소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 1922년 만국 장로회 연합 공의회 대표로 참석한바 있는 한국 대표 임 종순(林鐘純) 목사는 그의 귀국 보고에서 인제 양성을 호소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선교사들의 고답적 자세와 주인 행세는 한국 교인들을 노예시하는 요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의 풍습에 대한 이해보다도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야기 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허시모(許時模 C.A. Haysmer) 선교사 사건이다. 그는 안식교에서 경영하는 순안(順安)병원 원장으로 l925년에 내한한 사람인데, 1926년 7월에 평양 검찰청의 수사로 표면화 된 사건으로서 1925년 여름에 자기 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은 l2살 된 그 지방 어린이 김 명섭 군을 붙잡아 김 군의 뺨 좌우에 &lt;도적&gt;이라는 글자를 염산으로 크게 써서 한 시간 동안 햇빛에 말린 후 놓아주어 그 어린이의 얼굴에 평생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만든 사건이다. 이것이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민족 모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각 청년 단체에서 격문을 발송했으며, 안식교 안에서도 비판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허시모는 병원 원장직에서 면직 당하고 3개월형을 받고 1926년 l2월에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이 사건을 통하여 좌파계 민족주의자들은 선교사들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또한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와 선교사를 분리시키려고 책동했던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4. 사회주의자들의 반 기독 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3&#8228;1운동 이후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비판이었으며, 이것은 반기독교운동(反基督敎運助)으로 연결되었다. 일제가 &#985168;문화정치를 표방한 이후 각종 새로운 지식이 국내에 유입되었는데, 특히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혁명 이후, 세계 도처에서 유행된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도 소개되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가졌던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서를 비판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22년 3월 북경(北京)에서 있었던 반기독교 운동이 〈동아일보〉와 〈개벽〉등에 보도됨으로써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아래와 같은 양주삼(梁柱三)의 글은 당시 한국 기독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nbsp; &#985170;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민족의 일반적인 태도는 전일과 판이하다. 이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충격이다.&#985171;</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들이 특히 기독교를 집중 공략한 이유는 기독교가 &#985170;영토확장의 제국주의의 수족이 되고 자본주의적 국가옹호의 무기&#985171;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국내 사회주의자들의 공식적인 반기독교 운동은 1923년 3월 전조선 청년당 대회(全朝群靑年黨大會)에서 시작되었다. 종래의 청년운동을 계급투쟁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종교의 존재의의를 부인하기로 가결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다 본격적인 반기독교 운동은 1925년 1O월 25~26일 한양청년연맹(漢陽靑年聯盟)이 개최하려고 한 반기독교 대강연회(反基督敎大講演會)였다. 이것은 같은 달 22~28일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全朝鮮主日學校大會)에 대항하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이들은&#985170;기독교는 미신이다” &#985170;양이랑심(羊而狼心)의 기독교&#985171;, &#985170;현하(現下) 조선과 기독교의 해독&#985171;, &#985170;악마의 기독교&#985171; 등의 강연들을 준비하였으나, 일본경찰의 탄압과 기독교 측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그러자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일제와 한국 기독교가 유착되어 있는 증거라고 선전하였다.&#985170;엇지하야 현대의 경찰이 종교는 비상(非常)히 옹호하면서 그를 반대하려는 회합은 금(禁)케 되었는가…이제 확실히 증명 되였다. 종교는 현대의 경찰과 동일한 처지와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985171;그리고 이들은 12월 25일을&#985168;반기독데이’로 정하는가 하면, 김익두(金益斗)와 같은 부흥사들을 &#985168;고등무당&#985169;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기독교 운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런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기 한국 사회주의의 두 거두(E頭)였던 이동휘(李東算)와 여운형(呂運亨)이 평양신학교까지 다니고 전도사 직분까지 맡았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단체로 알려진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에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뒤에는 당시로서는 서구 선교사의 세력 하에 있었던 한국 교회가 채워주지 못한 측면을 반제국주의적이요 민중적이라고 이해되었던 사회주의에서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적 성향이 강하였던 평양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출교 처분을 당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주의 청년들이 이론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교역자를 폭력으로 공격하는 경우까지 있어, 대체로 한국 교회는 이들을 회유, 선도하고 교회의 결점을 보완, 개혁하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이들을 배척하는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였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1930대의 유행적 사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사이비 기독교인들 중에는 공산주의로 대거 전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교회와 공산주의의 충돌은 일본의 강압적 정책 아래서 별로 찾아볼 수 없었으나, 만주와 국경 지방에서는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 1925년 길림성(吉林省) 지역으로 파송 되었던 침례교회의 목사들이 공산당들에게 붙잡혀 일본의 밀정이라는 누명으로 순교하계 되었다. 또한 1932년에도 침례교의 김 영국(金榮國), 김 영진(金榮振) 형제 목사가 공산당들의 습격으로 순교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감리교와 장로교에도 있었고, 여러 지방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Ⅳ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 활동</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국내에서의 독립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985168;국민간의 기맥을 상통하고 복국사업(復國事業)의 완성을 기하여 내외의 활동을 일치시키고자&#985169; 국내에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내무부 소관으로 1919년 7월부터 1921년까지 시행되었다. 연통제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정부에서 발(發)하는 법령과 공문의 전달, 독립시위운동 진행의 보고, 전쟁을 개시할 때 필요한 군인 군속(軍人軍屬)의 징모(徵募) 및 군수품의 징발&#8228;수송, 4 구국금(救國金) 100원 이상을 각출할 구국 재정단원의 모집, 구국금 및 정부에 상납할 금전의 수합과 납부, 정부에서 발행할 공채(公債)의 발매(發賣), 통신, 상부로부터의 임시명령의 전달이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연통제는 황해도&#8228;평안도&#8228;함경도 등지의 서북지방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실시되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기독교 사상에 의하여 민족의식과 시민정신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부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歸人會)이다. 본래 1919년 6월 장로교 측의 한영신(韓永信), 김보원(金寶源), 김용복(金用福) 등과&nbsp; 감리교 측의 박승일(朴昇一), 이성실(李誠實), 손진실(孫眞實) 등이 1919년 11월 평양에서 대한애국부인회로 합동하여 임원으로는 총재 오신도(吳信道), 회장 안정석(安貞錫), 부회장 한영신 등이 선출되었으며, 평안도 각지에 7개의 지회를 두었다. 이 회의 주요사업은 동지규합, 군자금 모금, 배일사상 고취, 결사대 및 독립운동요원 원조 등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20년 1O월 일제에 발각되기까지 이 회는 2,400여 원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로 보냈으며, 그 조직을 통하여 연통제의 사무를 담당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이밖에도 평안남도 강서(江西)의 반석 대한애국 여자청년단(聲石大韓愛國女子靑年團), 순천(順川)의 대한민국 부인 향촌회(大韓民國歸人鄕村會), 대동(大同)의 대한독립 부인청년단(大韓獨立歸人靑年團) 등도 연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자금도 열심히 모금하였다.&nbsp; 이처럼 연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은 종종 그 사실이 적발되어 고초를 당하였다. 이들은 나체고문과 같은 혹독한 형벌을 받았고 상당수가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편 서북지역과는 달리 경기도&#8228;충청도 등지에서는 연통제가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었고, 강원도&#8228;경상도&#8228;전라도 등지에서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어 그 기능을 대행하였다. 즉 충청도&#8228;전라도 등지의 대한 독립 애국단, 경기도&#8228;경상도&#8228;충청도&#8228;전라도 등지의 대한민국 청년외교단과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그리고 대한 적십자회 등이 그러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였다. 이들은3&#8228;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역량을 결집하여 발전시켰으며 국외의 임시정부나 독립운동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들의 항일투쟁을 원조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대한 독립 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강원도&#8228;충청도&#8228;전라도 등지에 지단(支團)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시정부를 위한 지원단체였다. 단장 신현구(申鉉九)를 비롯하여 박연서, 김상덕, 조종대 등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같은 해 7월 상해에서 김태원이 파견된 이후 이 단체는 임시정부의 연통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두 차례에 임시정부축하시위를 벌였으며,&#985168;조선인 관리퇴직 동맹계획’을 세웠다. 이는 일제의 식민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을 모두 퇴직시켜 일제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20년 1월 일제에 적발되어 무산되고 이 단체도 해산당하였다. 이후 단원들은 암살단이나 대한독립군 등의 무장단체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다음으로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은 상해의 조용주, 연병호 등이 국내에 들어와 안재홍(安在鴻), 이병철(李秉澈) 등과 연합하여 1919년 5월 서울에서 조직하였는데 이들을 비롯한 단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이 단체는 국외지부의 설치, 조소앙을 위시한 외교원의 파견, 기관지〈외교시보〉의 발간 등 국내 독립운동 단체들 중 가장 활발한 외교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한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1919년 3월 조직된 혈성 부인회(血性婦人會)와 4월에 조직된 대조선 독립 애국부인회가 통합하여 발족한 것으로 회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혈성 부인회는 오현주, 오현관. 이정숙 등이 투옥 인사와 가족들을 도울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주로 정신(貞信)여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대조선 독립 애국부인회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었고, 회원들로부터 거둔 회비의 3분의 1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회비납부 이외에도 군자금모금에 헌신하였다. 이 회는 특히 3&#8228;1운동 때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정신여학교 교사 김마리아와 황에스더가 1919년 9월 각각 회장과 총무로 선출된 이후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즉 &#985168;대한민국의 국권을 확장&#985169;하기 위하여 군자금 모금은 물론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에도 힘썼다.&nbsp; 조직도 급속히 확대되어 전국에 2천여 명의 회원을 두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물론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들과도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연통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에 발각될 때까지 이 회는 2,300여 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으며, 애국지사의 가족들과 국내로 잠입한 독립운동가들을 돕기도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 회의 자매단체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일제에 탐지되면서 이 회도 적발되어 1919년 11월&nbsp; 두 단체의 간부진이 모두 검거되었다. 이들은 모진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는데,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켰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편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테러활동도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로 강우규(姜宇奎), 박치의(朴致毅), 김상옥(金相玉) 등을 들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강우규는 장로교 전도사까지 지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국권이 기울던 한말에는 함남 홍원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운동에 투신한 바 있었다. 일제에 의해 나라가 합병되자 국외로 이주, 북만주&#8228;시베리아 등지를 전전하면서 국권 회복할 정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민족교육과 국권회복운동에 힘썼다. 그러던 중 3&#8228;1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5월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결성된 「대한노인동맹단」(大韓老人同盟團)에 가입하여 조직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키지 않고 총독만 경질하여 신임총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총독은 첫째 하느님의 계명에 &#985168;네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985169;한 것에 위반되고 만국공법을 교란하며 민족자결주의를 멸시하며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는&#985171;&#985170;극흉 극악한 죄인&#985171;이므로 죽이려고 결심하고, 러시아인에게서 폭발탄을 구입하여 1919년6월에 미리 국내에 잠입해서 거사를 준비했다, 마침내 그 해 9월 2O일 남대문 역에서 새로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의 마차에 폭발탄을 던져, 수행원과 일본 경찰 등 37명의 사상자를 내어 총독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당당히 일본과 총독의 죄과를 역설하였고 이듬해(1920년) 11월 29일 교수형을 당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1920년 9월 1일 ‘박치의’의 선천(宣川)경찰서 폭파는 한국인들의 항일정신을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이후 박치의 이하 16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언도 받았고, 박치의는 사형을 구형 받았다. 그 순간 &#985170;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날에 높히 부르지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외다’ 라고 외쳤다고 한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아울러 김상옥(金相玉)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일찍이 그는 1919년 12월 총독을 비롯한 일본 관리들과 친일파들을 제거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그러던 중 이듬해인 1920년 8월 미국의원 4O명이 내한하는 기회에 그 계획을 실행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해 1O월 상해로 탈출하였다. 그곳에서 의열단(義烈團)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그는 1922년 11월 일제의 관청 파괴와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갖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다음해인 1923년 1월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던져진 사건이 일어나자, 일경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하였다. 매제 고봉근(高奉根)의 집에 숨어 있던 그는 출동한 일경들을 사살하고 남산을 거쳐 친구 이혜수(李惠秀)의 집으로 피신했다. 얼마 후 일경 400여명은 그 일대를 포위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상옥은 양손에 권총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끝내 순국하였다. 이들은 신앙과 민족을 위하여 몸바친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국외에서의 독립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국외에서는 1919년 4월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수립에 있어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그 모체가 된 독립 임시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 신한 청년단(新韓靑年團)이었다. 이 단체는 1918년 여름에 결성되었는데, 단원들 중 종교가 밝혀진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니, 장덕수(張德秀) &#8228;김구(金九) &#8228;서병호(徐丙浩) &#8228;송병조(宋秉祚) &#8228;여운형(呂運亨) .김규식(金奎植) 등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국제회의에 독립을 호소할 대표를 파견하려면 정부가 필요한데, 당장 정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우선 정당이라도 만들어 대신하려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편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는 둥 외교활동에 힘썼다. 아울러 3&#8228;1운동 이전, 단원들은 국내로 잠입하여 독립운동과 자금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985168;상해는 3&#8228;1운동의 진윈지요 그 주체는 신한 청년당이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3&#8228;1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아울러 상해 한인교회 교인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신한 청년단원들의 상당수가 이 교회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와도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신한 청년단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승만(李承院 국무총리), 안창호(安昌浩, 내무총장), 이동휘(李東輝), 조소앙(趙素昻, 秘書長) , 신익희(申翼熙, 내무차장) 등 기독교인들도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다. 그 때문에 일제는 이 교회를 &#985170;예수교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선전하는데 그 주의가 있다고 경계할 정도였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수립에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에도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의 경비는 주로 동포들의 성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이것도 특히 기독교인들의 모금이 많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보다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항일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것도 여럿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우선 북간도(北間島) 지역을 살펴보면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와 대한신민단이 주목된다. 1919년 3월 13일 북간도 용정(龍井)에서는 1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모여서 만세운동 축하식을 가진 후 가두행진을 벌였다. 그런데 중국군의 발포로 1O여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한국인들의 저항과 소요는 급속히 확대되었고, 4월초까지 북간도 전역에서는 만세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러한 상황에서 북간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대한 국민회가 성립되었다. 이 회의 전신(前身)은 조선독립기성회(朝鮮獨立期成會)인데,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것을 지지하면서 대한국민회로 개칭하였다. 회장 구춘선, 부회장 서상용(徐相庸)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이 회는 1920년 8월 당시 연길현(延吉縣) &#8228;왕청현(江淸縣) &#8228;화룡현(和龍縣) 등 3개 현에 1O개의 지방회와 133개의 지회를 둔 북간도 최대의 독립운동단체로 발전하였다. 이 회는 무력투쟁을 위하여 북간도와 함경도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였고, 노령 연해주에서 무기를 구입하였다. 또한 독립군 양성을 위하여 징병제를 실시하였으며, 1920년 7월 연길현 명월구(明月溝)에 사관학교도 설립하였다. 이 회는 다른 독립운동단체들과의 연합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洪범도(洪範圖)가 이끄는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 최진동(崔振東)이 이끄는 군무도독부(軍務都督府) 등과 합류하였다. 이들은 1920년 7월 7일 봉오동(鳳梧洞) 전투에서 일본군 사살 157명, 중상 200여명이라는 개가를 올렸다. 그리고 동년 1O월 13일 연길현에서 대한 신민단(大韓新民團), 대한 의민단(大韓義民團), 훈춘 한민회 등의 기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동년 1O월 21일 완루구(完樓構)전투, 1O월 25일 고동곡(古洞省)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9년 3월 12일 북간도 왕청현에서 조직된 대한 신민단은 단장 김규면(金圭冕)을 비롯한 단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이 회는 독립전쟁을 위한 교전단체(交戰團體)임을 표방하였으며, 민주제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중국관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 신한촌(新韓村)으로 본부를 옮기고, 북간도에는 지회(支會)와 의사부(議事部)를 두었다.&nbsp;&nbsp;&nbsp;&nbsp; 단원들은 무기구입과 훈련강화에 힘쓰면서 국내에도 의연대(義捐隊)를 파견하여 단원을 확보하고 군자금도 모금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기할만한 것은 삼둔자(三屯子)전투에서의 승리이다. 이 회는 1919년 겨울과 1920년 봄에 걸쳐 수시로 국내로 진입하여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였다. 특히 1920년 6월 4일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종성군(鍾城那) 강양동(江陽洞)으로 진입하여 일본군 헌병순찰소대를 격파하고 귀환하였는데, 뒤쫓아온 일본군 1개 중대를 박승길(朴承吉) 휘하 3O여명의 단원들이 섬멸하였던 것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다음으로 서간도(西間島) 지역에서도 국내에서의 3&#8228;1운동 이후 통화현(通化縣) &#8228;유하현(柳河縣) &#8228;즙안현(輯安縣) 등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력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1919년 4월 2일 대황구(大荒構)교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삼원보(三源堡) 부민단(扶民團)의 총기 구입 문제를 협의하고 성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청년 7O여명이 곤봉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며 항일투쟁에 대비하였다.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 단체도 조직하였다. 통화현의 최봉석(崔奉錫) 목사와 홍경현(興京縣)의 오대규(吳大奎) 목사 등은 급진파(急進派)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일제를 습격하려고 계획하였다. 또한 즙안현의 기독교인들은 천도교인들과 연합하여 의용단(義勇團), 청년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고 허선노(許善老) 장로를 총장으로 추대하였다. 이후 이들은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같은 간도에서의 항일투쟁은 1920년 1O월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이른바 &#985168;훈춘 사건&#985169;을 계기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군은 이 지역 독립운동기지를 초토화하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여 처형하였으며, 교회와 가옥을 불살랐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9673; 과 제 &#9673;</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105인 조작 사건에 대하여 약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3.1 운동과 한국교회의 활동에 대하여 쓰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국내에서 기독교인들이 펼친 독립운동에 대하여 진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4. 국외에서 기독교인들이 펼친 독립운동에 대하여 진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class=HS2><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2pt; COLOR: #000000; LINE-HEIGHT: 49px; FONT-FAMILY: 신명 순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3px; TEXT-ALIGN: center">제6장 복음 확산 활동</SPAN> </P>
<P class=HS2>&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Ⅰ 교회의 연합활동</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조선 예수교 장감 연합 협의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1905년에 만들어진 순수 선교사들만의 모임인 재한(조선)복음주의 연합 공의회(Federal Council of Protestant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1916년에 한국인 교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준비하여, 1918년 3월 26일에는 한국인과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 예수교 장감 연합 협의회(Korean Church Federal Council)가 만들어졌다.&nbsp;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조선 예수교 장감 연합협의회는 처음엔 교파를 초월한&#985168;하나된 교회를 설립하려는 취지도 없지 않았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친목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 협의체로 성격이 정착되었다. 이 단체는 장&#8228;감 두 교회 대표들로 조직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 미감리회, 조선 남감리회 등 3개 교단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재한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가 장&#8228;감 6개선교부 대표들로 구성된 것과 차이가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8년 2월 26~27일 서울 YMCA회관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장로교의 김필수(金弼秀) 목사가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전문 17조로 된 헌법이 통과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협의회는 양 교파의 교리와 정치제도의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격을 분명히 했다. 한국인이 참여하여 임원을 맡았고 장&#8228;감 두 교회 사이의 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파 교회로서 갖고 있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올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19년에 한차례 교회합동운동의 열기를 겪은 후 이원화된 협의체를 하나로 묶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 움직임은 1922년부터 본격화되어 마침내 1924년 9월 24일 새문안교회에서 &#985168;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985169;(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 Korean National ChristianCouncil)가 창설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초대 회장에 차재명(車載明) 목사가 당선되었으며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은 이 단체의 목적을,&#985170;1) 협동하야 복음을 선전함 2) 협동하야 사회도덕의 향상을 도모함 3) 협동하야 기독교 문화를 보급케 함&#985171;으로 규정하였다. 역시 설립 목적과 취지는 교회 합동이 아닌 교회간의 &#985168;협동&#985169;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권한에 대하여는 &#985170;이 회는 각 교파 신경, 정치, 의식 등에 간여치 못함&#985171;l이라고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했다. 실질적으로 오늘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모체라할 수 있는 이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는 처음에 다음의 11개 단체 대표들로 조직되었다. 이후에 1931년부터 명칭을 &#985168;조선 기독교 연합 공의회&#985169;로 바꾸었고, 기독교 기관 중에 회원으로 가입한 수가 늘어나 1937년 이 단체가 해산될 당시엔 위의 11개 회원단체 외에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YWCA), 조선 예수교 서회,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 재일본 캐나다 장로선교회,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국인이 주도하게 된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가 교회사에 남긴 업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비록 제한된 권한을 소유했지만 선교지역 분할 문제를 비롯한 각 교파&#8228;선교부 간의 선교정책에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종래 선교연합 공의회에서 관장해 왔던 재일본 한국인 선교도 예수교 연합 공의회가 관장하게 되었다. 〈기독신보&gt;, 〈주일학교잡지〉등 한글 정기간행물 발행도 맡아하였고 세브란스병원, 평양기독교연합병원, 연희전문학교, 숭실전문학교 등 장&#8228;감 연합기관의 운영에도 보다 많은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Ⅱ 교회의 문서 사업 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일제는 3&#8228;1운동 직후 통치 방식을 소위 &#985168;문화정치&#985169;로 바꾸었다. &#985168;문화정치&#985169;는 비록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위장된 것이었으나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다시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정책이 시행되기까지 1O여년 동안은 그래도 외견상 활발한 문화활동을 펴나갈 수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이러한 정책은 기독교계 문화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기독신보</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15년 창간되어 꾸준히 발간되어 오던 장&#8228;감 연합 교회 신문인 〈기독신보〉가 3&#8228;1운동 어간에는 몇 차례 압수 당하기도 하고 발매금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으나, 1920년 2월 4일자 제 217호부터는 일반 시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변화의 일면이었다. 총독부로부터 &#985170;시사신문과 등대(等對)하게&#985171; 발행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체제를 변경한 〈기독신보〉는 교회소식 뿐 아니라 일반 외교, 정치, 사회 분야 기사도 게재하기 시작했고 특히 재판중이거나 새로 발생한 기독교인 관련 독립운동사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한 보도를 하여 3&#8228;1운동과 그 이후의 기독교 민족운동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기독교 잡지 발행</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잡지 발행도 활발하게 진척되었다.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외형적으로 유화정책을 폈던 1920~29년 사이에 41종의 새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제의 완화된 정책에 기인한 바도 있겠으나&#985168;시대적 상황 변화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기독교계의 능동적 문서선교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8228;1운동 이전의 기독교 잡지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선교사들이 발행하던 영문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1905년 창간)가 있었으며 한글로 된 것으로는 감리교 협성 신학교에서 발행하던 〈신학세계〉(1916년 창간)와 안식교에서 발행하던 〈교회지남〉(1916년 창간), 장로교 평양 신학교에서 발행하던 〈신학지남〉(1918년 창간)이 교단지 성격의 잡지로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에 성결교에서 1922년 11월부터 〈활천〉이란 잡지를 간행하기 시작했고 구세군에서는 1927년 2월부터 〈사관〉을 발행하기 시작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 외에 기독교 기관들이 기관지 형태로 발행하는 잡지들도 많이 등장했다. 경성 YMCA에서 발행한 〈청년〉(1921년), 조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발행한 〈주일학교잡지〉(1925년), 기독 청년 면려회(CE) 조선 연합회에서 발행한 〈진생〉(1925년)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기에 개인 혹은 동인지 형태의 잡지들도 가세하여 다양한 기독교 잡지 문화를 창출하였으니 박희도(朴熙道)가 주관하던 〈신생활〉(1922년), 최태용(崔泰容)이 발행한〈천래지성〉(1925년), 김교신(金敎臣)이 발행한〈성서조선〉(1927년), 유형기(柳瀅基)가 발행한 〈신생〉(1928년) 등을 꼽을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처럼 다양한 잡지 발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기독교 독서층이 넓어졌다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질적으로 향상된 기독교 필진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즉 1920년 이후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학자&#8228;목회자들이 다양하고 비중 있는 글들을 발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관식 &#8228;정인과&#8228;변성옥&#8228;김창준&#8228;조병옥&#8228;김활란. 최상현&#8228;남궁혁 &#8228;박형룡&#8228;백낙준&#8228;유형기&#8228;김준옥&#8228;김인영&#8228;김형식&#8228;송창근&#8228;김재준&#8228;이대위 &#8228;정경옥&#8228;한치진 등이 미국유학을 했고, 홍병선 &#8228;전영택&#8228;김수철&#8228;김우현&#8228;채필근&#8228;전필순&#8228;함석헌&#8228;김교신&#8228;최태용 등이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 최병헌&#8228;김창제&#8228;이석락&#8228;박승봉&#8228;김원백&#8228;유경상&#8228;조상옥&#8228;이명직 등으로 짜여진 기존 국내 필진에 가세함으로 풍부한 집필 인력을 갖추었다. 이들 한국인 필자들은 다양한 서구 신학과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적 문화풍토 속에서 한국적인 기독교문화를 창출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조선 기독교 창문사</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국인들의 주체적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985168;조선 기독교 창문사&#985169;(朝鮮基督敎彰文社) 설립에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창문사(彰文社)로 널리 알려진 조선 기독교 창문사는 당시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지성인들이 모여 설립한 주체적 문서운동기관이었다. 1921년 8월 중순께부터 YMCA 관련인사들인 이상재 &#8228;윤치호&#8228;유성준&#8228;박승봉&#8228;최병헌 등과 3&#8228;1운동과 연관되어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승훈&#8228;정노식 &#8228;김세환&#8228;김창준&#8228;김백원 등이 &#985170;기독교적 문화운동으로 제반 기독교의 서적을 간행 판매하고, 그 외에 잡지 및 기타 도서 간행 및 판매, 일반 인쇄업, 교육용품 판매 또는 이상 업무의 부대사업 등을 경영&#985171;하려는 취지 하에 전문 출판사 설립 발기모임을 추진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22년 1월 14일 서울 안동교회에서 윤치호&#8228;유성준&#8228;이상재&#8228;박승봉&#8228;윤명은 등 12인이 모여 광문사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nbsp; 마침내 1923년 1월 31일 종로 명월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 동안 광문사로 준비하다가 창립과 함께 명칭을 조선 기독교 창문사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당시 일반 출판사 중에 광문사가 있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nbsp; 창문사에서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정기 간행물 〈신생명〉을 창간한 것이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창문사에서는 ‘신생명’ 외에 비중 있는 단행본들을 많이 출판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게일과 이원모가 독자적으로 번역한 일종의 사역(私譯) 성경으로 &#985168;조선어 풍&#985169;(朝解語風)을 최대한 살린 의미 있는 번역본이었으나 교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읽혀지지 않았다. 이 성경 출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창문사는 도서출판보다는 인쇄와 도서 판매업에 주력하다가 결국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930년대 출판사 기능이 소멸되었다. 비록 1O년 정도밖에 계속되지는 못했으나 창문사는 선교사와 선교부가 장악하고 있던 기독교 출판&#8228;문화 풍토 속에서 &#985170;민족 주체적인 기독교 지성운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4. 성경과 찬송가</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편 이 시기(1919~25년)에 성경과 찬송가에 대한 개역 &#8228;개편 작업이 진행된 것도 문서운동의 특징의 하나였다. 구약성서의 경우, 1911년 구약 전체의 번역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개역자회(改譯者會)가 구성되어 개역 작업에 착수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24년 레이놀즈(W. D. Reynolds)가 1926년에 피터스(A. A. Pieters)&#8228;남궁혁 &#8228;김관식 &#8228;김인준 등이 개역 위원으로 보충되면서 개역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구약의 개역 작업은 1936년에 끝났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신약의 경우는 1926년에 개역자회가 조직되어 1937년에 개역 작업을 끝냈다. 이외에 성경 연구자를 위한 관주 성경도 이 시기에 나왔다. 즉 1921년 이익채(李益采)가 편집한 《신약젼셔 관쥬》가 나왔고 1926년에 정태용&#8228;조용규가 편집한 《관주 선한문 구약전서》가 나왔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찬송가의 경우도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1908년 장&#8228;감 연합으로 《찬송가》를 발행하여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24년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가 창설되면서 그 첫 사업의 하나로 찬송가 개정작업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김인식&#8228;변성옥&#8228;아펜젤러&#8228;커(W. c. Kerr) &#8228;앤더슨(W. J. Anderson) 둥이 찬송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31년에 소위 《신정 찬송가》로 제목을 붙여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 찬송가의 출현으로 장&#8228;감 연합전선에 균열의 징후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장로교에서 별도로 《신편 찬송가》(1935년)를 발행한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Ⅲ 교회의 교육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총독부의 간섭과 탄압은 1911년에 반포되고 191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을 근거로 하여 자행되고 있었다. 관&#8228;공립 학교 이외의 모든 사립학교의 교과 과정과 내용을 규정한 이 규칙은 강제적 일본어 사용과 종교 교육을 금하는 것으로 특징을 삼고 있었다. 이 규칙에 의해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었고 &#985168;선교학교&#985169;(missionschool)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3&#8228;1운동 직후인 1919년 9월 2O일 서울에서 개최된 복음주의 선교 연합 공의회(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Missions)에서 선교사들이 총독부에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교과목으로 삼는 것과 한국어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3&#8228;1운동 후에 총독부는 시혜를 베풀듯 사립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했다.&nbsp; 그러나 이 같은 선심은 고도로 계산된 통치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3&#8228;1운동을 통해 무력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일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인의 정신적 통합을 기도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22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조선 교육령이 그같은 음모의 결정체였다. 이 교육령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학교로 구분하여 교과목을 규정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nbsp;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를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한국어 사용을 허락하면서 역사를 왜곡한 교과 내용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정책이었다. 이 신 교육령의 근본 취지는 소위&#985168;내선일체’의 기초 단계로 일본식 교육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것이다. 궁극적인 &#985168;내선일체&#985169;를 위해 우선은 한국어사용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며 교육 내용을 통해 민족 정신을 개조하려 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 교육령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함정은 사립학교들 사이의 분열 책에 있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미 1911년에 발표된 사립학교 규칙에서 나타난 조항인데 사립 중학교 중에서 총독부 시책에 순응한 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기독교계 사립 중학교들 사이에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 혼란은 종교적 신앙과 민족 문제와도 연결되는 듯했다. 비교적 현실 감각이 예민했던 감리교계 학교들은 고등보통학교 인가 절차를 받은 반면에 종교적 교육이 침해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장로교계 학교들은 고등보통학교가 되기를 거부한 채 사립 중학교로 존속했다. 총독부에서는 끝까지 버틴 장로교 학교들에겐 이른바 각종(各種) 혹은 잡종(雜鍾) 학교로 지정해 학교 명맥은 살려 주면서도 상급학교(전문학교나 대학교) 진학 자격은 부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들 학교 졸업생들은 총독부에서 실시하는 검정고시를 거친 후에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1920년대 빈번했던 기독교계 학교들의 선교사 배척운동이나 동맹 휴학의 원인 중에는 여기예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았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러한 총독부의 교활한 교육 정책으로 종교학교는 일반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연출되었고 종교학교 내에서도 종교교육을 폐지하라는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1910년대 이후 종교학교의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신 교육령이 반포된 1923년에 약간 증가한 것 외에는 1910년 이후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985168;합병&#985169;되던 1910~11년 사이에 무려 3백여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종교학교도 1910~13년 사이에 매년 100~130여 학교가 폐쇄되는 현상을 보였다. 1910년에 778개였던 종교학교가 1920년에는 279개로 줄어 10년 사이에 5백여 학교가 폐쇄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30년대 말 황민화(皇民化) 정책으로 민족혼이 말살될 위기에서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글을 사용하며 민족의식과 신앙을 지키려 애썼던 기독교 학교들의 투쟁의식도 1915년 이후 불리한 조건 속에서 &#985168;선교&#985169;학교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고수하면서 그것을 민족문제로까지 연결시키려는 교육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Ⅳ 교회의 발전</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성결교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7년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란 명칭으로 선교를 시작한 성결교회는 전국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서울에 설립된 성서학원을 통해 목회자를 배출하여 다른 군소 교파 교회보다 빠른 성장 추세를 보였다. 동양선교회는 본래 순수 복음선교기구로 출발했으나 중생 &#8228;성결 &#8228;신유&#8228;재림이라는 교리적 특징과 특수한 전도방법론으로 다른 교회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교회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감리교와 같이 감독 1인 지휘하에 전도관으로 유지되다가 3&#8228;1운동 직후에 본격적인 교회제도 정비에 착수하여 1920년 전국을 경성 &#8228;대전&#8228;경북&#8228;경남의 4개 지방회로 조직하고 지방회 마다 장로사(長老司)롤 두어 순회 목회하게 했다. 그리고 1921년 4월에 목회자들의 협의기구인 교역자 간담회와 7월에 최고 의결기구인 고문회를 각각 조직했고 9월에 복음전도관이란 명칭을 폐지하고 &#985168;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985169;란 교회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정식으로 성결교회가 창설된 것이다. 1921년 4월에 열린 1회 교역자 간담회에서는 기관지로〈활천〉을 발행키로 결의하여 이듬해 11월에 그 창간호를 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숫적으로는 한국인 목회자의 수가 월등했으나 실질적인 교회 운영권은 선교사에게 있었다. 이 같은 2중적 교회 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이 1936년의 총회 분규 사건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성공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890년에 한국 선교를 시작한 성공회는 1911년 주교로 서품된 트롤로프(M. N. Trollope)를 중심으로 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트롤로프 주교는 1914년 강화에 성미가엘 신학원을 설립,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여 1915년 김희준을 첫 한국인 사제로 세웠다. 그리고 이듬해 첫 교구의회를 개최하고 〈조선성공회 헌장과 법규〉를 제정했다. 이 헌장에 의해 교구의회는 &#985170;조선성공회의 최상권을 지니는 기구&#985171;로 권위가 확정되었다. 또한 트롤로프는 성공회의 모교회인 서울 대성당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하여 1926년 완공을 보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8년 선교를 시작한 구세군은 구령사업의 방편으로 사회 구제사업을 주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정착했다. 초대 사령관 호가드(R. Hoggard) 후임으로 1916년 프렌치(G. French)가 2대 사령관에 부임하여 1919년까지 시무 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구세군이 보여 준 대표적 사회사업은 고아원 사업이었다.1918년 12월, 일본인 신자 고바야시(小林源六)가 서울 평동에 남자 고아원인 육아원을 설립하였으며 1923년에는 아현동에 건평 288평의 별도 건물을 마련하여 7O여 명의 고아들을 수용하였다. 이 육아원은 후에 서울후생학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여자 육아원은 1916년에 시작된 여자 실업관(후의 혜천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걸인 숙박시설, 여행자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였고 구세군의 상징적 사회 구호사업인 자선남비 모금운동도 1928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다. 그러나 구세군도 영국 구세군 본부에서 파견된 선교 사관과 한국인 사관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갈등 요인이 내재해 있었고 그로 인해 1926년 구세군 제2대 대장 부드(B. Booth)의 내한을 계기로 윤수만&#8228;허 곤&#8228;김경선&#8228;전시형 &#8228;권용준 등이 주동이 된 선교사관 배척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침례교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펜윅(M. C. Fenwick)의 독자적인 선교로 시작된 대한기독교회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던 펜윅의 독선적인 교회 치리에 반기를 든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1914년 펜윅은 일선에서 은퇴, 자신은 공부(功傳)란 명칭을 사용하였고 대신 이종덕(李鍾德)을 2대 감목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초창기부터 펜윅과 함께 했던 다수 교인들이 이탈하여 별도의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펜윅의 처음 동역자였던 신명균(申明均) 목사는 조합교회로 갔고 김규면(金圭冕) 목사는 성리(聖理)교회를 따로 설립했으며, 손필환(孫弼煥) 목사는 대동(大同)교회를 세우고 나갔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처럼 독특한 교리와 체제를 갖고 있던 대한기독교회는 만주&#8228;시베리아 선교에 일찍이 착안하여 이미 1906년에 한태영 외 4인을 간도에 파송하였고 계속해서 1917년에 신명균 목사를 길림에, 박기양 목사를 즙안에, 노재천 목사를 서간도 일대에 파송하여 전도하게 했다. 1918년 박노기 &#8228;김희서 &#8228;김영태 &#8228;최응선 등이 시베리아로 파견되었으나 도중에 선박이 파선되어 순직한 일이 있었고 1921년에는 만주에서 선교하던 손상렬 목사가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어 총살당하고 1925년에도 길림에서 활약하던 김상준&#8228;안성찬&#8228;이창희 &#8228;박문기 &#8228;김이주&#8228;윤학영 등이 조선 독립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국내의 교회 조직도 일제의 간섭을 받아 1921년 교회 명칭을 동아기독교회로 바꾸어야 했다. &#985168;대한&#985169;이 붙은 교회 명칭이 일제의 눈에 거슬린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5. 장로교회</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국교회의 발전은 장로교회가 주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장로교회는 전국적인 한 조직체를 갖추고 강한 보수적 신앙을 유지하며 발전을 해 나갔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장로교회는 선교구역 구분에 따라 이북지역과 영남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성장 확산되어 나갔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여기서는 장로교의 활동은 약하고 장로교 총회의 통계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장로교 총회 통계표</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A name=#45c5ca3d></A></SPAN>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36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48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24 height=20>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연 도&nbsp;&nbsp;&nbsp;&nbsp;&nbsp; 세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합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24 height=20>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연도&nbsp;&nbsp;&nbsp;&nbsp; 세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합계</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24 height=315>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85년&nbsp;&nbsp;&nbsp;&nbsp;&nbsp;&nbsp; 4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4명 </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86년&nbsp;&nbsp;&nbsp;&nbsp;&nbsp;&nbsp; 6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0명 </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87년&nbsp;&nbsp;&nbsp;&nbsp;&nbsp; 16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6명 </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88년&nbsp;&nbsp;&nbsp;&nbsp;&nbsp; 40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66명 </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89년&nbsp;&nbsp;&nbsp;&nbsp;&nbsp; 39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05명 </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90년&nbsp;&nbsp;&nbsp;&nbsp;&nbsp;&nbsp; 0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05명 </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91년&nbsp;&nbsp;&nbsp;&nbsp;&nbsp; 19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24명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92년&nbsp;&nbsp;&nbsp;&nbsp;&nbsp;&nbsp; 8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32명</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93년&nbsp;&nbsp;&nbsp;&nbsp;&nbsp; 14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46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05년&nbsp;&nbsp; 11,061명&nbsp;&nbsp;&nbsp;&nbsp;&nbsp;&nbsp; 37,407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06년&nbsp;&nbsp; 14,353명&nbsp;&nbsp;&nbsp;&nbsp;&nbsp;&nbsp; 56,943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07년&nbsp;&nbsp; 18,061명&nbsp;&nbsp;&nbsp;&nbsp;&nbsp;&nbsp; 72,968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08년&nbsp;&nbsp; 21,230명&nbsp;&nbsp;&nbsp;&nbsp;&nbsp;&nbsp; 94,981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09년&nbsp;&nbsp; 30,337명&nbsp;&nbsp;&nbsp;&nbsp;&nbsp; 119,273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17년&nbsp;&nbsp; 68.230명&nbsp;&nbsp;&nbsp;&nbsp;&nbsp; 149.526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18년&nbsp;&nbsp; 68.506명&nbsp;&nbsp;&nbsp;&nbsp;&nbsp; 160.909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19년&nbsp;&nbsp; 69.047명&nbsp;&nbsp;&nbsp;&nbsp;&nbsp; 144.062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0년&nbsp;&nbsp; 69.025명&nbsp;&nbsp;&nbsp;&nbsp;&nbsp; 153.915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1년&nbsp;&nbsp; 72.138명&nbsp;&nbsp;&nbsp;&nbsp;&nbsp; 179.158명</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224 height=315>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2년&nbsp;&nbsp; 75.866명&nbsp;&nbsp;&nbsp;&nbsp;&nbsp; 187.271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5년&nbsp;&nbsp; 89.879명&nbsp;&nbsp;&nbsp;&nbsp;&nbsp; 193.823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6년&nbsp;&nbsp; 91.266명&nbsp;&nbsp;&nbsp;&nbsp;&nbsp; 194.408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7년&nbsp;&nbsp; 94.588명&nbsp;&nbsp;&nbsp;&nbsp;&nbsp; 159.060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8년&nbsp;&nbsp; 87.983명&nbsp;&nbsp;&nbsp;&nbsp;&nbsp; 177.416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29년&nbsp;&nbsp; 90.544명&nbsp;&nbsp;&nbsp;&nbsp;&nbsp; 186.994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0년&nbsp;&nbsp; 91.270명&nbsp;&nbsp;&nbsp;&nbsp;&nbsp; 194.678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1년&nbsp;&nbsp; 94.728명&nbsp;&nbsp;&nbsp;&nbsp;&nbsp; 208.912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2년&nbsp; 104.578명&nbsp;&nbsp;&nbsp;&nbsp;&nbsp; 258.216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3년&nbsp; 103.530명&nbsp;&nbsp;&nbsp;&nbsp;&nbsp; 281.918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4년&nbsp; 108.392명&nbsp;&nbsp;&nbsp;&nbsp;&nbsp; 298.431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5년&nbsp; 115.379명&nbsp;&nbsp;&nbsp;&nbsp;&nbsp; 323.974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6년&nbsp; 119.955명&nbsp;&nbsp;&nbsp;&nbsp;&nbsp; 341.700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7년&nbsp; 125.225명&nbsp;&nbsp;&nbsp;&nbsp;&nbsp; 356.281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38년&nbsp; 133.717명&nbsp;&nbsp;&nbsp;&nbsp;&nbsp; 362.077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839년&nbsp; 134.894명&nbsp;&nbsp;&nbsp;&nbsp;&nbsp; 360.838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40년&nbsp; 121.410명&nbsp;&nbsp;&nbsp;&nbsp;&nbsp; 328.648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41년&nbsp; 134.834명&nbsp;&nbsp;&nbsp;&nbsp;&nbsp; 355.754명</SPAN>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942년&nbsp; 110.805명&nbsp;&nbsp;&nbsp;&nbsp;&nbsp; 249.666명</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P></TD></TR></TBODY></TABLE><SPAN></SPAN></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Ⅴ 해외선교 및 해외 한인교회</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미주 지역 선교</SPAN> </P>
<P class=HS4>&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하와이</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2년 하와이 농업이민으로 시작된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처음부터 교회가 배경이 되어 추진되었다. 즉 하와이 농업이민을 정치적으로 중개한 인물이 북장로회 선교사였다가 주한 미국 공사로 신분이 바뀐 알렌(H. N. Allen)이었고, 이민모집을 주관했던 동서개발공사의 데슐러(D. Deshler)를 도와 한국인을 설득하고 나선 인물이 미감리회 선교사 존스(G.J.Jones)였다.&nbsp; 존스의 설득으로 인천 내리교회에서만 교인 남녀 50여명이 이민을 자원하고 나섰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리하여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을 출발한 1차 이민단 121명은 교인들이 중심이었으며 인솔 책임자 장경화, 통역 안정수는 모두 내리교회 직원들이었고 이들의 신앙지도를 위해 홍승하 전도사가 함께 동행하였다. 이처럼 하와이 초기 이민은 감리교 선교 확장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들은 농장에 정착함과 동시에 교회를 설립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그 결과 1903년에 오아후섬 가후쿠와 와이알루아 농장에서 평양 남산현교회 출신의 홍치범 권사와 안정수&#8228;현 순 등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설립했고, 호놀룰루에서도 안정수&#8228;우병길이 주동이 되어 현지 감리교회 감리사 피어슨(G. L.Pearson)과 교섭하여 1903년 11월 3일 교회를 설립했으며 초대 담임자로 흥승하 전도사가 부임했다. 그후 각 섬의 농장마다 교회가 계속 설립되어 1910년 당시엔 한인교회수가 35처에 달했고 한국인 권사가 27명에 이르렀다. 각 지방의 교회 교인 수를 합하면 많을 때는 1천명이 넘었으며, 적을 때는 250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1905년 이후 하와이 이민이 중단된 데다 하와이에 왔던 이민이 미국 본토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와이의 한인교회들은 하와이 선교와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멕시코</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멕시코 이민도 1904년에 시작되었는데 영국인 마이어즈와 일본인 다이쇼가 꾸민 사기에 가까운 이민 사업으로 추진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05년에 멕시코로 이민간 사람들은 1909년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었던 국민회에서는 황사용&#8228;방화중 목사 등을 파견해 멕시코 이민구제사업을 펴는 한편 교포들의 하와이 이주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이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교포들은 멕시코 유카탄, 메리다 지방에 흩어져 농업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 8월에 쿠바 사탕수수농장으로 이주한 것이 쿠바 이민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쿠바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멕시코&#8228;쿠바로 이민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 계속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이다. 이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멕시코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설립되기란 어려웠다. 또 멕시코 이민의 대부분이 비기독교인들 이었던 관계로 하와이 이민사회와는 성격이 달랐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동계약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된 교포들이 독자적으로 신앙집회를 갖기 시작하였는데 1908년 1O월 5일 김세원 &#8228;황명수&#8228;이근영 &#8228;방경일 &#8228;신광희 &#8228;조병하&#8228;정춘식 등이 메리다에서 전도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19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방화중 목사의 신앙지도를 받으며 그해 5월 12일 정식으로 멕시코 한인선교회를 조직했다. 방화중 이후 김제선 전도사가 맡아 본 이 교회는 교포들의 잦은 이동으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쿠바</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반면에 쿠바에서는 이민이 시작된 직후에 한인교회가 설립되었다. 쿠바 마탄사스에 이주한 이민들 사이엔 감리교인과 안식교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1921년 1O월 5일 한인선교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1926년에 이르러 감리교 선교부 지원을 받으면서 쿠바한인감리교회로 정식 설립되었다. 초기엔 방경일&#8228;양춘명 &#8228;호건덕 등이 교회를 이끌었으며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되기까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일본선교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일본 전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를 상대로 한 전도 및 선교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 전도의 역사는 재일 한인교회와 한인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다. 재일 한국인 교포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도 및 선교활동은 다시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으니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그 외의 교파 교회 및 개인적 전도 사업이 그것이다. 먼저 장&#8228;감 연합으로 추진된 전도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기원은 1906년 8월에 창설된 토오쿄오 한인YMCA에서부터 언급 할 수 있다. 구한말 경무관 출신의 김정식(金貞植)에 의해 창설된 토오쿄오 한인YMCA는 단순한 유학생 친교 단체가 아닌 민족운동 요람지로 발전했고 1919년 2&#8228;8독립선언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기독교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집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고, 1908년 3월 평양 예수교서원의 정익노(鄭益魯) 장로가 토오쿄오를 방문하여 백남훈&#8228;조만식 &#8228;오순형 등 유학생들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유학생들의 소속 교파를 조사한 결과 장로교가 월등하므로 교단을 장로교로 하기로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 목사 파송을 요청하였다. 이에 1909년 9월 독노회는 한석진(韓錫音) 목사를 &#985170;일삭 동안 일본 동경에 보내며 유학생에게 목사 일을 보게 하며 경비는 마삼열 &#8228;길선주 양씨에게 맛겨 지출케 할 일&#985171;을 결의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한석진은 1909년 1O월, 일본에 건너가 유학생 중심의 교회를 창립하였으니 이것이 오늘의 재일 대한기독교 토오쿄오교회가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 토오쿄오한인연합교회는 1926년부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에서 관장하기로 하였으며, 토오쿄오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전도사업도 3&#8228;1운동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칸사이(關西)지방의 경우를 보면, 1917년에 이미 코오베(神戶)에서 장로교의 정덕생(鄭德生) &#8228;임택권(林澤權) 등에 의해 한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당시 코오베신학교에 유학 중이었다. 이어서 같은 유학생인 김영구&#8228;양태승&#8228;박상동&#8228;김병우&#8228;김우현&#8228;전필순 등도 쿄오토오(京都), 오오사카(大阪), 코오베(神戶) 둥지에서 전도하여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 1924년 3월 니시노미야(西宮)에서 칸사이지방 조선예수교회 1차 신도대회가 열렸는데 이미 다섯 곳에 집회소가 설립되어 149명의 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만주 및 시베리아 선교</SPAN> </P>
<P class=HS4>&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장로교의 남만주&#8228;시베리아전도</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남만주 최초의 장로교회는 1898년 즙안현에 설립된 이양자(裡楊子)교회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00년 의화단사건으로 이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자 이듬해 선천에 있던 선교사 휘트모어(N. C. Whitternore)와 안승원(安承源)을 보내 교인을 위로하고 교회를 재건하게 한 것이 남만주 지역에 대한 한국교회전도의 효시가 되었다. 이 즈음에 남만 지역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선교부로부터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부에 만주의 한인선교를 맡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북장로회 선교부는 1901년에 유상도를, 2년 후에는 김상년을 전도인으로 파송하였다.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고 평북노회가 설립된 후에도 평북지역 교회는 남.북만주 지역에 계속 전도인을 파송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만주지역의 교회가 늘어남에 따라 1921년 4월 21일에 남만노회가 조직되었다. 남만노회가 조직되면서 남만주 지역에 대한 전도활동도 활성화되어 1922년 지산은(액목현), 장현도(화전현), 흥혜범(반석현), 박규현(관전현), 조옥현(동풍&#8228;서풍), 김 A흥연(액목현), 최봉석(길림), 임군석(흥경현) 등이, 1923년 김 봉조(동풍),정낙영(즙안현), 김덕해(반석현), 박정엽(양디소). 신기초(흥경), 박창식(화전현) 등이 남만노회 전도부 파송을 받아 만주전역에서 활동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남만지역의 교회는 눈에 띠는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우선 당시 만주지역의 반(反)기독교적 사회 분위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있고.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8228;공산주의 세력의 반종교 운동, 만주를 근거로 삼고 있는 마적단의 습격,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회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한편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선교부와 연합으로 1921년에 흥경(興京)에 선교기지(mission station)를 개설하고 한국인 선교를 지원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만주선교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장로교의 시베리아선교는 1909년 독노회에서 최관흘(崔寬吃)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정교회를 국교로 삼고 있는 러시아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란 어려웠다. 한때 최관흘 목사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감리교회 구역으로 해달라고 총회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장로교는 1912년에 블라디보스톡 선교를 &#985168;부득이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한동안 시베리아선교는 중단되었다가 1918년에 김현찬 목사를 다시 파송 함으로 재개되었다. 3&#8228;1운동 직후 시베리아 이주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교세도 성장하여 김현찬 목사는 1921년도에 교회 32처, 교인수 1,763명을 보고할 수 있었다. 1922년에는 최흥종(崔興宗) 목사가 합류했고 김익두 목사의 부홍회를 통해 교회가 크게 부홍하여 1년 사이에 교회가 26개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 그 결과 1922년 2월에 시베리아노회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3년 최흥종 목사가 1년만에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공산당의 박해를 받아 교회가 위축 받았다. 1924년에 오소리지방에서 목회하던 권승경 전도사가 공산당에 체포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일이 있으며, 1925년에는 노회 조차 폐지 했으며, 1929년 조사 박문영과 전도부인 한가자가 8개 교회 9백여 신자를 돌보고 있다는 </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보고를 총회에 낸 것을 마지막으로 시베리아의 장로교 선교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장로교회의 동만 선교</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캐나다장로회 선교부에서 안순영을 보내 전도함으로서 1906년에 양무정자교회와 광제암교회가 설립되었다. 간도지역 선교는 1908년 남감리교회에서 이화춘(李和春)&#8228;이응현(李應賢)을 전도인으로 파견하였고 그리어슨도 김문삼을 파송했다. 그 결과 1907년에 이화춘은 민족주의자 박무림(朴茂林)의 지원을 받으며 와룡동교회를 세웠고 1908년에는 이응현의 주도하에 모아산(帽兒山)교회가 세워졌다. 장로교의 경우도 1907년에 구춘선(具春先) &#8228;이보련(李輔珪)이 주동이 되어 용정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1909년 순수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명동(明東)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일찍이 간도로 망명한 민족주의자들인 김약연(金躍淵)&#8228;김 하규(金河奎) &#8228;김정규(金定奎) &#8228;문치정(文治定) &#8228;문정호(文定鎬) &#8228;최봉기(崔鳳岐) 등이 세운 것이다. 그들은 1908년에 명동학교를 세우고 그 교사로 평남출신 기독교인 정재면(鄭載冕)을 초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집단으로 개종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불과 1, 2년 사이에 동만지역에 5, 6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교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911년에는 이미 24개 교회가 설립되는 발전을 보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거의 동시에 간도선교를 착수한 남감리회와 캐나다장로회는 1909년 선교지역 협정을 맺어 남감리회가 간도지역을 포기하는 대신 강원도 지역 내의 캐나다장로회 구역을 이양 받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남감리회는 간도선교 착수 1년만에 철수하고 캐나다장로회가 간도 전 구역을 관장하게 되었다. 동만지역 교회는 &#985168;합병&#985169;을 전후하여 크게 발전하였는데 1911년 2월 성진에서 파송되어 사경회를 인도하던 이동휘(李東揮)를 중심으로 결성된 3국전도회&#985169;(三國傳道會)가 &#985170;열광적으로 3년간 활동한 결과 36처 교회가 신설되었고 교회마다 학교도 병설되어 명동학교 출신들이 교사로 봉직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14년에 이동휘가 간도로 망명하여 온 후 계속해서 민족운동가들이 합류함에 따라 간도는 민족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간도지역의 최초 민족운동 단체인 &#985168;연변교민회&#985169;(1907년)가 김약연&#8228;김영학&#8228;구춘선 &#8228;강백규&#8228;유찬희 &#8228;문치정 &#8228;김정규&#8228;마진 둥 기독교계 인사들로 조직된 것이라든지 그것이 &#985168;간민회&#985169;, &#985168;간민 교육회&#985169;란 명칭을 거쳐 1919년 3&#8228;1운동 직후 ‘국민회’로 정착하였을 때도 구춘선 회장을 비롯하여 대표적 인물들이 모두 북간도 교회 교인들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미감리회의 북만주 선교</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감리교의 만주선교는 1930년 이전에는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별도로 선교를 추진했다. 먼저 미감리회의 경우를 보면, 미감리회 조선연회는 1910년 목사 안수를 받은 손정도(孫貞道)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는 만주와 중국 천진 &#8228;북경 등을 왕래하며 중국말을 익히다가 1912년 &#985170;연회의 결의&#985171;로 하르빈에 정착했다. 그는 본국 교회에 대해 국외 선교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 손정도의 중국 행은 순수 선교 적인 것 외에 &#985168;합병&#985169;이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민족적인 동기도 강했다. 그는 만주 한인사회를 순회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신흥무관학교설립에도 관여하였다. 그 때문에 1912년 일경에 체포되어 전남 진도에 유배당함으로 그의 민족운동 의지와 함께 미감리회의 만주&#8228;중국 선교의 의지도 꺾이고 말았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8년에 다시 배형식(裵亨湜)을 만주 선교사로 파송 했다. 그는 1년간 하르빈을 중심으로 북만주 전역과 시베리아를 순회하며 선교 상황을 관찰한 후 귀국했다가 1921년 3월에 다시 파송 되어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착수했다. 그 결과 1년 사이에 장춘(長春)과 하르빈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사평가&#8228;연화가&#8228;합라소&#8228;영고탑&#8228;도뢰소&#8228;고유수&#8228;공주령&#8228;오가자&#8228;진가둔&#8228;철령 &#8228;무산&#8228;봉천 등지에 기도처 혹은 예배 소가 설립되어 북만지역 교세가 세례교인 158명, 교인 총 481명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23년 1월에는 남감리회에서 관장하던 길림지역의 신안촌&#8228;신참&#8228;화전 &#8228;액목&#8228;돈화동 등지의 교회들이 미감리회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교세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 결과 1923년에 만주 지방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감리사에 배형식 목사가 선임되었고 액목에 이광태, 장춘에 이흥주, 길림에 김응태, 봉천에 동석기, 화전에 허영백, 철령에 김성흥 등이 목회자로 파송 됨으로 목회자 진영도 갖추어졌다. 그 당시 교세를 보면 교회수가 32처, 세례교인 463명, 교인 총 1353명으로1922년에 비할 때 1년 사이에 3배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31년 남감리회 만주선교연회와 합하여 기독교 조선감리회 만주선교연회가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5><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4) 남감리회의 시베리아 동만 선교.</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24년부터는 1908년에 간도선교를 개척한 바 있는 이화춘 목사가 다시 간도지방 관리자로 부임하였으며 1925년에는 도인권(都寅權) &#8228;신광현(愼光顯) &#8228;이호빈(李浩彬) &#8228;한국보(韓國輔) 등이 합류하였다. 이들 중에 니콜스크 해림에서 목회하던 장죽섭은 105인사건 때 만주로 망명하여 봉천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인물이며, 연추구역을 관할했던 서영복은 김약연 &#8228;구춘선 등과 함께 간도지역 교회와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로 국민회 창설과 간도 3&#8228;1운동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또한 블라디보스톡 구역을 관할했던 김영학도 강원도 양양의 3&#8228;1운동을 지휘했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인물이며, 간도 용정에서 목회했던 이용정은 본래 동아기독교 출신으로 피어선 성경학원 재학 시 3&#8228;1운동에 가담하고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사업에 관여했던 독립운동가였다. 이외에 니콜스크 스맛스고에서 목회하던 유자훈도 후에 귀국하여 춘천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홍천 보리울의 남궁억과 함께 &#985168;십자가당 사건&#985169;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는 민족운동가였다. 여기에다 안중근&#8228;우연준의 이토오 암살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베리아 교민사회에서 신망 있는 민족주의자로 명성이 높던 이 강(李剛)이 엡윗청년회와 주일학교 총무로 활약하였다. 이 같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목회활동으로 이 지역 한인교회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성향을 띠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여기에 남감리회 조선 여선교회의 시베리아선교도 한 몫을 차지했다. 1923년 1O월에 남감리회 조선 여선교회의 파송을 받은 최나오미가 니콜스크에 도착하여 선교에 착수했다. 그는 니콜스크&#8228;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각지를 순회하며 지방교회 여선교회를 조직하고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그 결과 1925년에는 시베리아지역에 여선교회가 13개, 회원이 109명에 이르렀고 시베리아&#8228;만주지역 교회 출신으로 전도부인이 되어 활약하는 인원도 12명에 달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시베리아지역의 선교는 만주보다 더욱 심한 견제와 박해를 받았다. 그것은 공산혁명(1917년) 이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선포된 후에 본격화되었다. 1920년대 시베리아지역의 공산당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세력 축출을 꾸준히 시도하였다. 그 결과 교회가 받는 고난은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같이 어려운 상황은 1920년 이후에 시베리아지역 교세의 감소로 나타났으니 1922년 당시 129교회에 교인 수 6.873명이던 것이 1929년에 이르러 81교회에 교인수 3,497명으로 크게 줄었던 것이다. 결국 남감리회 선교사업은 시베리아에서 점차 퇴조하고 대신 간도지방에서 활기를 띠어 1926년에 북간도 지방회가 정식 구성되었으며, 1930년 남&#8228;북 감리교 합동과 함께 만주선교연회가 조직될 때엔 시베리아는&#985168;동만지방 시베리아 사업처&#985169;소관 지역이 되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시베리아에서 활약하던 목회자들도 대부분 간도로 옮겼으며 김영학 목사가 끝까지 남아 있다가 1930년 1월 공산당에 체포되어 북부 시베리아에 유배되어 중노동형에 처해졌고 결국 1933년 11월에 &#985170;눈을 치다가&#985168;농가름’ 에 걸려서 무참히 참사&#985171;당하였다. 이로써 남감리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시베리아선교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말았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4. 산동 선교</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산동 선교는 1912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를 조직하면서 총회 중에 서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 민족과의 해상 교역지였던 산동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총회는 김찬성 목사를 산동에 파송하여 선교 후보지를 답사하게 했고 1913년 총회는 박태로(朴泰者) &#8228;사병순(史秉淳) &#8228;김영훈(金英勳) 3인을 정식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리고 총회는&#985170;지나에 파송하는 선교사는 자유교회를 설립하지 말고 그 땅 장로회와 연합할 것&#985171;으로 결정했다. 즉 산동지방에 선교하여 교회가 설립되더라도 그 교회의 소속을 중국교회에 둘 것이지 한국교회에 두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중국교회로 옮겨지며 한국교회에는&#985168;언권위원&#985169;의 자격밖에 주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중국에서 선교할 때 현지의 중국교회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한국에 나와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소속을 본국 교회에 계속 둔 채 한국교회와는 일정한 거리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선교사들의 태도와 대비되는 점이다. 중국교회 안에서는 한국교회의 선교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중화예수교장로희 화북대회(華北大會)는 한국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동 반도의 요충지인 내양(來陽)현 등 다섯 현을 선교지로 내주었다. 박태로&#8228;사병순&#8228;김영훈 등 세 선교사는 1913년 11월에 내양에 도착하여 서문 안 중국인 가옥 한 채를 세내고 중국말을 배우는 것으로 선교에착수했다. 그러나 1915년 박태로 목사가 질병으로 귀국하였고 1916년에는 사병순&#8228;김영훈도 &#985170;전도국 허락 없이 환국&#985171;하고 말았다. 이로써 산동 선교가 시작된 지 3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미 세례교인 28명에 기도처가 여섯 곳에 설립되어 있었고 중국인을 위한 학교도 세 곳이나 설립되어 있어 중단하기엔 아쉬운 형편이었다. 결국 1917년 총회는 방효원(方孝元) &#8228;홍승한(洪承漢) &#8228;김병규(金炳奎)를 새로 파송함으로 산동 선교를 재개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18년에는 박상순(朴尙純)이, 1919년에는 의사 김윤식(金允植)이,&nbsp; 1921년에는 이대영(李大榮)이, 1923년에는 선천출신 의사인 주현측(朱賢則) 장로가 합류하여즉묵(卽墨)에 병원을 개설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처럼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사업이 체계화되면서 산동선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nbsp; 1920년 내양에 새 교회당 건물을 마련했으며 1921년부터는 내양에 성경학원을 설립하여 본토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29년에는 산동선교의 결실로 얻은 중국인 류세법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했다. 1922년부터는 산동 선교지역이 내양과 즉묵 두 구역으로 분할되었고, 1925년부터는 내양 동부와 동남부를 관장하는 북구, 즉묵 동부를 관장하는 동구, 내양 서남부 평원지역을 관장하는 서구로 3분하여 세 선교사가 관장하기 시작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산동선교는 1919~2O년에 급속한 성장을 보였고 이후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다가&nbsp; 1931년 만주의 만보산 사건과 유동의 한유사변(韓劉事變), 1932년 상해사변에 이은 중국인들의 대규모 항일전쟁, 1937년의 중일전쟁에 이르는 정치 &#8228;사회적 혼란기에 한국인 선교사와 교회는 중국인과 침략자 일본인 사이에서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점차 둔화 퇴보하게 된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특히 1937년 중일전쟁 중에는 박상순&#8228;이대영 &#8228;김순호 등이 귀국하였고, 결국 1940년 이후 이대영 &#8228;방지일 2인이 남아 내양&#8228;즉묵&#8228;청도 지방의 교회를 돌보다가 8&#8228;15해방을 맞았고 1948년에 이대영이, 1957년에 방지일이 귀국함으로 산동 선교의 막은 내려졌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Ⅵ 신앙부흥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20~30년대 부홍 운동의 특징을 꼽자면 그것은 개인의 영적 지도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1903년의&#985168;부홍운동&#985169;이나 1907년의&#985168;부홍운동, 1909년의&#985168;백만 명 구령운동’ 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진행되는&#985168;집단적&#985169;신앙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부흥운동은 특출한 개인에 의해 부홍회가 이끌어지는 유형으로 전개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익두(金益斗)목사&#8228;이용도(李龍道)목사 &#8228;길선주(吉善宙)목사 등이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길선주 목사의 내세 지향적 부흥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미 1907년 평양 부홍운동 때 그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던 길선주 목사는 3&#8228;1운동에 관련되어 옥고를 치르면서 새로운 신앙&#8228;사상적 정리 과정을 거쳤다. 그는 옥중에서&#985168;계시록만 7백독&#985169;을 하면서 말세 신앙을 정립하였다. 그의 말세신앙&#985169;은 현실 속의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었다.&nbsp; 1922년경부터 전국적인 부홍사로 활약하게 되는 길선주 목사의 설교 주제는&#985168;말세’ 와&#985168;재림&#985169;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특히 1931년&#985168;만보산 사건&#985169;이 일어나 한&#8228;중간의 민중 마찰이 생기고, 평양에서 한국인의 중국인 습격과 살해가 자행되었을 때 그의&#985168;말세&#985169;외침은 더욱 커졌다. 그는&#985168;예루살렘(평양을 지칭) 멸망&#985169;을 외치며 임박한 재림을 강조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26년부터 교회 내의 청년&#8228;진보적 계층과 사회주의 계열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1933년 그가 세우고 지켜온 장대현교회에서 배척을 받고 따로 이향리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35년 강서에서 부홍회를 인도하다가 절명함으로써 그의 부홍운동은 일단락 되었지만 그의&#985168;말세 신앙&#985169;은 한국교회 신앙 양태의 한 지류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김익두목사의 신유와 기적을 통한 부흥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20년 6월 평양에서 열렸던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 광경을〈동아일보〉는 &#985170;수천 군중은 미친 듯 취한 듯 홍분한 신경을 것잡지 못하여 어느 무명씨는 즉석에 숭덕학교를 위하여 1만원을 기부하니 뒤를 이어 일어나는 기부의 소리는 미처 수습할 길이 없이 답지하였다”고 기술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김익두 목사의 부홍운동의 특징은 기적과 신유를 동반한 것이었다. 1919년 말 현풍 집회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적현상은 1920년 4월의 영남지방 집회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 받는 집단적 기적현상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이적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로 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황해노회 안에서는 임택권(林澤權) 목사가 중심이 된 &#985168;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회&#985169;가 조직되어 김익두목사 부흥회를 통해 치유 받은 자들의 신상과 사건 기록을 정리하여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증》(1921년)이란 책을 내기까지 했다. 이를 근거로 황해노회는 1923년 장로회총회에 &#985170;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985171;라고 규정된 장로교 헌법 3장 1조를 수정하자고 헌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헌의는 1924년 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것을 계기로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는 고비를 맞았다. 총회의 &#985168;이적 불인(不認)&#985169;은 그의 부홍회의 의미를 감소시켰고 그 즈음에 교회내의 지식계층이나 일반 사회주의 계층의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1926년 간도 용정과 이리에서 &#985168;반종교가들에 의해 집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무렵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김익두 목사의&nbsp; 부홍 운동은 급격한 냉각상태로 빠져들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이용도목사의 신비주의적 부흥운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930년대 한국교회의 신비주의 신앙을 형성한 주도적 인물인 이용도 목사도 3&#8228;1운동 때 송도 고보 학생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2개월간 구금되었고, 1920년&#985168;기원절 사건&#985169;에 연루되어 다시 체포되는 등 1924년 봄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기까지 4차에 걸쳐 3년 이상 감옥에 살았던 민족주의자였다. 이 같은 그가 부홍운동가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강원도 통천교회로 부임한 지 1년 후인 1928년 12월말로부터 1929년 1월초에 이르는&#985168;중생&#985169;(重生)의 체험에 있었다. 그는 또 새벽기도 중에&#985168;교회 안에 가득 찬 악마들과의 치열한 싸움&#985169;을 체험하였으며 양양에서는 환상 중에 빨간 군대&#985169;의 습격에 대항해 싸우는 체험을 했다. 이러한 체험이 있은 후 그의 설교는 &#985168;능력 있는&#985169; 설교가 되었고 참석자들의 통회 자복이 터져 나왔다. 초기엔 통천&#8228;양양&#8228;개성 등지의 감리교회에서 부홍회를 인도하였는데, 1930년 목사 안수를 받고, 1931년 연회에서 순회 부흥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부홍운동가가 되었다. 이때부터 장로교회에서도 그를 초청하여 부홍회를 가졌는데 당시 그의 설교 주제는&#985168;회개&#985169;와&#985168;신생&#985169;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이 같은 관점에서 당시 교권적 교회가 안고 있던 부정적인 현상들이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985168;한국의 예루살렘&#985169;이라 불리던 평양도 그에게는 &#985170;마른 나무깨비 같은 꼴&#985171;로 비판받고 있었다. 1931년 재령 서부교회의 2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985170;벽돌로 담을 쌓고 울깃 불깃 장식을 해놓은 것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예요. 이 예배당을 다 불질러 버리고 잿덤이 위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아주 바쳐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교회올시다” 라고 설교한 것으로 그는 한때 &#985168;무교회 주의자&#985169;로 몰리기도 했다. 그의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제도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역 비판을 받게 되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여기에다 한준명(韓俊明) &#8228;박승걸(朴承傑) &#8228;박계주(朴啓柱) &#8228;백남주(白南柱) &#8228;유명화(柳明花) 등 스웨덴보리 및 선다싱 등의 &#985168;극단적&#985169; 신비주의신앙에 심취해 있던 신앙 인들과 교류하고, 특히 한준명 &#8228;유명화 등이 관련된 소위 &#985168;강신극&#985169;(降神劇)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용도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퍼부어졌다. 그러나 이용도가 그들이 이단 시비에 몰렸을 때에도 그 자신 &#985170;신앙태도에 다소간 다른 점이 있다는 H(한준명을 지칭)는 고사하고 도적이나 음부나 살인강도라고 하더라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죽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985171;로 자처하며 &#985168;무조건적인 무제약적인 사랑&#985169;을 실천한 것도 기성 교회가 그를 이단시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결국 1931년 황해노회가 그에게 &#985168;금족령&#985169;을 내린 것을 필두로 1932년에는 평양노회가 그의 집회를 규제하고 그에게 신앙적 감화를 받아 형성된 &#985168;평양기도단&#985169;의 해체를 명했다.&#985171; 〈기독신보〉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985168;이세벨의 무리&#985169;로 규정한 것도 치명적인 상처였다. 이처럼 제도권 교회로부터 비판과 제재조치를 받으면서 이단 시비에 휘말렸던 그는 지병인 폐병이 도져 1933년 3월 소속했던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985168;휴직&#985169;하였으며, 원산에서 요양하던 중 그 해 1O월에 3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nbsp; 아무튼 이용도는 비록 제도권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받았지만 그 자기 희생적 사랑, 그리스도의 겸비를 조건 없이 실천하려 했던 순수한 신앙으로 신비주의 신앙인 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상에서 살펴본 김익두&#8228;길선주&#8228;이용도 외에도 1920~30년대 부흥운동을 인도한 인물들은 더 있다. 성결교의 이명직과 정남수, 감리교의 김종우&#8228;유석홍&#8228;신홍식, 장로교의 김인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지방을 순회하며 사경회를 인</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도하면서 1920~30년대 암울한 민족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민중의 희망을 선포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7pt; COLOR: #000000; LINE-HEIGHT: 36px; FONT-FAMILY: 천리안체H,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Ⅶ 교회의 문화 활동</SPAN> </P>
<P class=HS3>&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1. 미술 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는 《천로역정》(1895년)삽화를 그린 김준건을 언급할 수 있다. 김준건은 게일(J. S. Gale)에게 영향을 받아 개종한 원산지방의 초기 교인이었다. 김준건은 전통 풍속화가로도 유명했다. 그는 동양화 기법으로 《천로역정》 삽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은 한국 기독교의 토착미술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 동양화기법으로 성경 메시지를 그린 &#985168;성화&#985169;(聖畵)의 효시는 김은호(金殷鎬)의 「부활 후」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3등 상을 받은 작품인데 일종의 인물화로 세 편으로 된 연작(連作) 형태였다. 서울 안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김은호는 고종과 순종의 어진(御眞)을 그린 &#985168;어용화사&#985169;(御容畵師)로 근대 한국미술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부활 후」 외에 다른 기독교적 작품을 남기지 않아 아쉽지만&#985168;후소회&#985169;(後素會)를 통한 그의 제자인 김기창(金基昶)&#8228;김학수(金學洙) 등이 그의 화풍을 계승해서 해방 후 성경주제와 기독교 역사화를 그렸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서양화가로 기독교 성화를 그린 최초의 인물은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선이라고 알려지고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2. 음악 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기독교가 한국음악사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한국 서양음악사는 곧 한국 기독교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찬송가를 통해 서양음악의 성악, 기악 양식이 소개되었고, 향상되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의 서양음악 교육은 찬송가 공부를 통해 시작되었다. 기록상으로는 스크랜톤(M. F. Scranton) 부인이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찬송가를 가르친 것이 서양음악 교육의 효시가 되고 있다. 당시 주일 오후에 정동교회에서 여성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6명으로 조직된 &#985168;합창단&#985169;이 찬송을 불렀다 하니 한국 최초의 성가대로 기록 될 만하다.&nbsp; 이화 출신의 김헬렌(최활란)이 정동교회 최초의 오르간 연주자로 1907년부터 봉사하였으니 한국인 최초의 서양음악 연주자가 된 셈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10년 이화학당에 대학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서양음악 고등교육이 이루어졌다. 1911년 음악과 주임교수로 하몬(G. Hamon)이 부임하면서 체계적인 성악 및 기악교육을 실시했고 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1925년 이화전문학교가 되면서 음악과가 설치되어 많은 음악인과 교사를 배출했는데 이곳 출신으로 1920~30년대에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활동한 대표적 인물로는 피아노를 전공한 김앨리스(정애식)&#8228;조그레이스&#8228;고봉경 &#8228;김메리&#8228;송경신&#8228;박현숙&#8228;김영의, 성악을 전공한 윤성덕&#8228;임배세&#8228;박루사&#8228;유부형&#8228;정훈모&#8228;이채리&#8228;채선엽 &#8228;한복덕, 종교음악 및 이론을 전공한 이로라 등이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초기의 한국인 남성 음악인들도 선교사를 통해 서양음악을 교육받았다. 한국 양악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김인식(金仁湜)이 대표적인 예이다. 평양 출신으로 숭실 중학교에서 여선교사 헌트 부인과 스눅(V.L.snook)에게서 성악&#8228;오르간&#8228;바이올린을 배운 그는 숭실대학교를 3년 마치고 1907년 상경하여 상동청년학원을 비롯해서 배재&#8228;경신&#8228;기호&#8228;진명학교 등지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한국 근대 음악 전문 교육기관인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에서 1911년부터 후진을 양성했다. 1905년에 한국 근대 가곡의 효시로 알려진 「학도가」를 작곡했으며 헨델의 「메시야」를 우리말로 번역했고 국악에도 관심이 깊어「영산회상」,「여민락」등을 채집하여 악보 화하기도 하였다. 이 조선정악전습소를 통해 김인식이 길러낸 음악가로는 홍난파(洪蘭波)와 이상준(李尙俊)을 꼽을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김인식을 배출한 숭실대학에는 1913년 무렵 모우리(E. M. Mowry) 부부가 주동하여 합창단을 조직하고 음악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했다. 이때 박윤근이 모우리에게서 음악을 배우고 1914년에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하고 1921년에 돌아와 모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총체적 음악교육을 실시하며 많은 음악인을 배출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김세형&#8228;박태준&#8228;현제명&#8228;김형준&#8228;박경호&#8228;차재일&#8228;위혜진 둥을 꼽을 수 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또한 말스베리에</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px; TEXT-ALIGN: justify">게서 배운 제자들이 많았는데 서원숙, 이용준, 김동진 등이 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연회전문학교의 음악교육은 1915년 예배시간에 합창과 찬송가를 지도한 베커(L. S. Baker) 부인에게서 시작된다. 그후 1918년에 피아노 연주자 김영환(金永煥)이 음악 담당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숭실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했던 현제명(玄濟明)이 1929년에 연희전문 교수로 부임하면서 연희전문학생들의 음악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연희전문학교 관현악단과 4중창단, 합창단을 조직했으며 박경호와 함께 중앙향우회 오케스트라를 조직, 활발한 연주 활동을 보였다. 또한 그에게 배운 윤기성 &#8228;이인선 &#8228;이광준 &#8228;곽정순 &#8228;이유선 &#8228;김성태 &#8228;문학준&#8228;김생려 &#8228;이인범 &#8228;이유성 &#8228;곽정선 &#8228;정희석&#8228;유한철 등이 한국 음악계의 중진들로 활약했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교회와 주일학교를 중심 한 민요와 동요창작을 통한 음악활동도 활발했다. 1924년 윤극영(尹克榮)이 「반달」이란 동요를 작곡했는데, 3&#8228;1운동 직후의 민족적 현실을 절실하게 그린 이 노래는 일제 말기에 금지 곡이 되었다. 이외에 홍난파의 《조선동요 100곡집》(1930년), 강신명(姜信明)의《아동가요곡 3백곡》(1936년), 박태준의 《동요집》 등이 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class=HS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한양그래픽,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3. 문학 활동</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문학 측면에서도 기독교가 한국 신문학에 끼친 영향은 심대하다.&nbsp; 기독교는 개화 혹은 계몽주의적 작가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끼쳐 그들의 문학작품 속에 기독교적 색채를 가미시켰다. 특히 신문학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육당 최남선이나 이광수의 작품 속에서 그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순수 신문학이 발달되면서 활동한 한국의 대표적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그같은 기독교적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남궁벽의 《말》, 변영로의 《오, 나의 영혼의 기여》, 김소월의 《묵념》, 《밭고랑 위에서》, 《신앙》, 이 상의 《날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그러나 본격적인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인들의 문학 활동을 통해 형성되었다. 한국 신문학의 최초 순수문예지로 일컬어지는 《창조》(1919년 창간)의 주요 동인인 김동인(金東仁)&#8228;전영택(田榮澤)&#8228;주요한(朱耀翰) 등이 모두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적 작품을 썼다는 데서 이들을 한국 기독교 신문학의 개척자라 부를 수 있다. 평양 숭덕학교 출신인 김동인은 단편소설 《약한 자의 슬픔》(1919년), 《마음이 얕은 자여》(1920년), 《유서》(1923년), 《이 잔을》(1923년), 《명문》(1925년),《신앙으로》(1930년) 등 기독교적 인간이해와 윤리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을 썼으며,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 전영택도 《생명의 봄》(1920년) 이후 《천치? 천재》(1920년), 《화수분》(1925년), 《흰 닭》(1925년) 등 기독교적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소설을 썼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주요한은 한국 최초의 자유시 《불놀이》(1919년)를 쓴 작가로도 유명한데 《벽모의 묘》, 《말》 등의 작품에서 히브리인들의 메시야 사상과 견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1920년대의 &#985168;브나로드운동&#985169; 및 &#985168;농촌계몽운동&#985169; 등 사회참여운동 분위기 속에서 계몽적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심 훈의 《상록수》는 YWCA가 샘골에&nbsp;&nbsp; 파송 해 실제로 활약했던 최용신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으로 유명하며, 김말봉(金末峰)의 《밀림》, 《찔레꽃》, 《푸른 날개》 등도 기독교적 희생과 인내를 그린 작품이고, 이용도의 예수교회와 연결되는 박계주(朴哲周)의 《순애보》, 《진리의 밤》, 《구원의 정화》 등에서도 강한 기독교적 인본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함홍 영생중학교 출신으로 1925년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돌아온 김동명(金東嗚)도 시집 《나의 거문고》(1930년), 《파초》(1938년) 등을 내면서 일제시대의 민족 현실을 서정적 감성으로 표현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이외에 1930년대 문단에 등단한 기독교인 작가들로는 노천명(盧天命) &#8228;김동리(金東里) &#8228;황순원(黃順元) &#8228;박영준(朴榮濬) &#8228;임옥인(林玉仁) &#8228;김현승(金顯承) &#8228;박두진(朴斗鎭) &#8228;윤동주(尹東柱) &#8228;모윤숙(毛允淑) &#8228;정지용(鄭芝容) 등이 있으나 이들 중 일제말기 옥중에서 순절한 윤동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기독교 문학뿐 아니라 일반 문학사에서도 그 위치가 분명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가 한국 문화운동사에 끼친 영향과 공헌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9673; 과 제 &#9673;</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1. 교회의 연합 활동을 약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2, 교회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진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3. 해외 선교와 해외 한인 교회에 대하여 약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4. 1920-30년대 3인의 신앙 부흥운동에 대하여 설명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5. 기독교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하여 진술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BR></SPAN>출처 ; <A href="http://cafe.daum.net/church9191/1xME/57?docid=1239476464&amp;q=%C1%A64%C6%ED+%BA%D0%BF%AD%BB%E7+%28+1950%B3%E2+-+1995%B3%E2+%29">http://cafe.daum.net/church9191/1xME/57?docid=1239476464&amp;q=%C1%A64%C6%ED+%BA%D0%BF%AD%BB%E7+%28+1950%B3%E2+-+1995%B3%E2+%29</A></P>
<!-- -->
카페 게시글
한국교회사
한국교회사-제2편 성장사 ( 1907년 - 1925년 )
이지명
추천 0
조회 248
13.04.26 10:1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