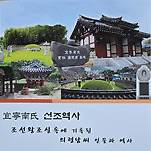<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span data-ke-size="size23">◆ 남변(南&#24557;) - 충경공 충간공 부정공파 9세</span></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 남변의 묘갈명 (墓碣銘)</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160; &#983790; </span><span data-ke-size="size18">저자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김안국</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160; &#983790;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명</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 </span><span data-ke-size="size18">자 </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숙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叔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9</span><span data-ke-size="size18">세 삭령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朔寧公 諱 &#24557;</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묘갈명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墓碣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행 통정대부 삭녕군수 남공 묘갈명</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공의 휘는 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24557;</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고 자는 숙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叔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며 성은 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南</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씨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씨는 본디 의령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宜寧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대족</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大族</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고려 때의 문하 시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門下侍中</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인 휘 을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乙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있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의 아들 휘 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在</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초명 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본조에 들어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태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太祖</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도와 개국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좌명공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開國佐命功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책록</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冊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됨과 아울러 의정부 영의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議政府領議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역임하고 의령부원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宣寧府院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책봉되었으며 시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諡號</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는 충경</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忠景</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의 아들 병조의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兵曹議郞</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증 좌의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贈 左議 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휘 경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景文</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공의 증조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증 좌의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左議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충간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忠南公</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휘 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智</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는 공의 조이 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섬시부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內贍寺副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중호조참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贈 戶曹參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휘 칭</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20545;</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은 바로 공의 부</span><span data-ke-size="size18">0|</span><span data-ke-size="size18">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모는 송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宋</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씨로 중추원부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中樞院副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휘 희경</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希瓊</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경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景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갑술년</span><span data-ke-size="size18">(1454) 10</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20</span><span data-ke-size="size18">일에 공을 낳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b3fcd031ebf7714a848e670ce52fc0971964cb0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b3fcd031ebf7714a848e670ce52fc0971964cb08" data-origin-width="1347" data-origin-height="499"></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삭령공 남변의 묘소</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였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음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蔭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연은전 참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延恩殿 參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임명된 뒤 예빈시봉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禮賓寺奉事</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전직되었는데 직무를 관장하면서도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아 성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成化</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경자년</span><span data-ke-size="size18">(1480)</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진사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進士試</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급제하고 이어서 선공감직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繕工監直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승진한 뒤 한성부참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漢城府參軍</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종부시주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宗簿寺主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사헌부감찰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司憲府監察</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등을 역임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홍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弘治</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기유년</span><span data-ke-size="size18">(1489)</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장예원사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掌&#38584;院司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임명도 었는데 명쾌한 판단을 이끌어 법정에 쌓인 송사가 없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다시 내섬시판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內&#36193;寺判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 로 승진하고 이어서 외직으로 나가 개성부도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開城府都事</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임명되었는데 능숙하게 잘 다 스린다는 평가를 받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당시 의지를 고추 세워 남을 잘 인정하지 않던 유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留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홍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洪 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공이 청렴하고 법을 잘 지키는 공을 보고 매우 중하게 여겼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다시 장례원사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掌&#38584;院 司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체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遞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한 뒤 공조정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工曹正郞</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거쳐 형조로 옮겨왔는데 옥사를 세심하 심사 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는 예가 많아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모를 모시려는 이유로 외직을 구해 식녕군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朔寧郡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나갔는데 그 치적이 다시 뚜렷하여 백성이 편안한 삶을 누렸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리고 이곳에 내려온 지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년 되는 해인 기미년</span><span data-ke-size="size18">(1499) 10</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30</span><span data-ke-size="size18">일에 관청에서 세상을 떠나니 아전이며 군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0|</span><span data-ke-size="size18">음해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7</span><span data-ke-size="size18">일에 광주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廣州</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쪽 음촌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陰村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건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乾坐</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손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巽向</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언덕에 장지를 마련하였으니 향년은 </span><span data-ke-size="size18">46 </span><span data-ke-size="size18">세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 말 이후 변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명문대가들이 거의가 자신을 보존하지 못했는데 남씨 가문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내 온전히 보존되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대대로 빛나는 공로를 세 워 높은 반열에 명성을 드날렸으니 쌓은 덕이 두텁고 그 연원이 깊지 않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공은 또 단정하고 바른 자질로 학문에 힘쓰고 세상에 우뚝 서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계승된 가업을 지킴은 물론 그 흐름을 더욱 넓혀 후손에까지 경사가 이어져 바이 흐로 그 영광이 끝없으니 하늘의 베&#54542;이 어굿나지 않음을 새삼 알겠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가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嘉靖</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자년</span><span data-ke-size="size18">(152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자식이 귀하게 된 일로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贈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추증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부인은 정부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貞夫人</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氏</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한산세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韓山世家</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문정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文靖公</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穡</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후예 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증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曾祖</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휘는 숙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叔野</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통정대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通政大夫</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광주목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光州牧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역임하였 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조의 휘는 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가선대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嘉善大夫</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황해도관찰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黃海道觀察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역임하였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의 휘는 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순성조자리공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純福佐王理功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숭정대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崇政大夫</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정부좌참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議政府左參贊</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한성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韓城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모는 비인현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庇仁縣主</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우리 태종대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太宗大王</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아들인 효녕대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孝寧大君</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부인은 어질고 법도가 있었으며 자식을 의리와 방정함으로 이끌고 노비들을 관대함으로 다스려 집안이 정연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평생 무당 등에 의탁하여 복을 비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근면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자세를 늙음에 이르기까지 줄곧 견지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손에서 여인이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아 자식들 이 그만 하실 것을 권유하면</span><span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실을 짜는 일은 부인이 할 일이니 너희들의 책과 같은 것을 어찌 놓을 수 있겠느나</span><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라고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인은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 건강하였 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집안이 부유하고 이름을 떨쳐 높은 관직에 오른 자식들이 많아 두루 잘 모시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귀와 영화를 갖추는 큰복을 누렸으니 당시 가문들에서 이보다 앞선 예가 없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가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가정</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유년 </span><span data-ke-size="size18">(1537) 10</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1</span><span data-ke-size="size18">일 정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正</span><span data-ke-size="size18">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편안히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span><span data-ke-size="size18">84</span><span data-ke-size="size18">세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듬해 </span><span data-ke-size="size18">(1538) 2</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6</span><span data-ke-size="size18">일에 공의 무덤에 합장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슬하에 </span><span data-ke-size="size18">7</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이 있으니 장자는 세웅</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급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及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한 뒤 호조 참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戶曹祭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역임 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차남은 세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18072;</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선공감 첨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繕工監僉正</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역임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3</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 세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안성 군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安城郡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역임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4</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 세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準</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급제한 뒤 이조 참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吏曹祭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역임하 고</span><span data-ke-size="size18">, 5</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 세칙</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則</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병절교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秉節校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역임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6</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 세 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健</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급제한 뒤 사헌부 대사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司憲府大司憲</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역임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7</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은 세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世彦</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장 예원사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掌&#38584;院司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역임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장남 호조참판은 인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문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文簡</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을 맞아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녀를 낳았으니 장녀는 감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監察</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몽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高夢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차녀는 유학</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幼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윤지 성</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尹之誠</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차남 첨정은 목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牧使</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윤구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尹龜山</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을 맞아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남 </span><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녀 를 낳았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장자는 응각</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應角</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차자는 응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應奎</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8">, 1 </span><span data-ke-size="size18">녀는 유학 이효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孝曾</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3</span><span data-ke-size="size18">남 안성군수는 좌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佐郞</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소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紹元</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을 맞아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을 낳았으니 장자는 연경</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延慶</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진사시에 급제하고 차자는 홍경</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弘慶</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4</span><span data-ke-size="size18">남 이조참판은 판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判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안침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安琛</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을 맞아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남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녀를 낳았으니 장자는 응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應老</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차자는 응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應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고 장녀 는 종실인 극포수령</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極浦守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희남</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希男</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고 차녀는 유학 구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具彦</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5</span><span data-ke-size="size18">남 병절교위는 첨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僉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한사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韓士介</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을 맞았고 후사가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18">, 6</span><span data-ke-size="size18">남 대사헌은 군자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軍資正</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윤식</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允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따님을 맞아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남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녀를 낳았으니 장자는 용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應 雲</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승정원주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承政院注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역임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차자는 응룡</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應龍</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공조좌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工曹佐郞</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을 역임하였는데 동시에 을미년 과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乙未科擧</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에 급제하였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장녀는 참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參奉</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鄭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고 차녀는 유학 이홍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李弘縉</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 그 남편이고 </span><span data-ke-size="size18">3</span><span data-ke-size="size18">녀는 유학 정순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鄭純&#22031;</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가 그남편이다 </span><span data-ke-size="size18">. 7</span><span data-ke-size="size18">남 장예원사의는 군수 권교의 따님을 맞았는데 자녀가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외의 중손은 남녀 </span><span data-ke-size="size18">20</span><span data-ke-size="size18">여 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혁혁한 남씨 가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고려부터 흥성하였으니 덕을 쌓고 충성을 이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저 하늘도 감동시켰도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위기를 부축하여 다시 일으켜 세움은 실로 신명의 도움이 있어 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며 경</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卿</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자리들 세대가 흐를수록 더욱 많았으니 훌륭하신 삭녕 군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朔寧郡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께선 이를 잇고 이를 닮으셨도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편은 심고 부인은 가꾸어 높은 덕을 쌓았으나 그 몸에 다 누리지 않고 후손에 경사를 물려주어 황금 띠에 인끈을 늘어뜨린 이들 집안에 영광으로 빛나니 찬란한 가문은 동방의 모범이 되었도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공적을 적어 후손에 권장하며 먼 미래에 분명히 알리노라</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160; 자헌대부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資憲大夫</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의정부 좌참찬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議政府左參贊</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겸 지춘추관사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兼知春秋館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예문관 관제학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禮文館提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동지성균관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同知成均館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오위도총부도총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五衛都摠府都摠管</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김안국</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安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짓고 숭의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崇議郞</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조좌랑</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吏曺佐郞</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겸 춘추관기사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春秋館記事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승무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承文院</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검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檢校</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김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金魯</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묘소는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산20 선산에 모셔져 계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160;</p><hr data-ke-style="style7"><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 남변의 묘소</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20">&#160; &#160; <span data-ke-size="size18">선영 :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경기도 광주시 직동 산20&#160;</span> </span></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160; &#160; &#160;재실 : </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경기도 광주시 직동 산20&#160;</span>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06468ff3166e657e6657f29d4d6e46ef1de61ec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06468ff3166e657e6657f29d4d6e46ef1de61ec2" data-origin-width="1201" data-origin-height="818"></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8639f12d3ef07256552aa82874954aa3964afec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8639f12d3ef07256552aa82874954aa3964afeca" data-origin-width="1464" data-origin-height="838"></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충경공 충간공 부정공파 선영 묘소</span></p><p>&#160;</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35648963fec04c1f12ac1ca97e5ce6f4ecde8a8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6lk/35648963fec04c1f12ac1ca97e5ce6f4ecde8a86" data-origin-width="1141" data-origin-height="827"></div><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160;</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4">&lt;출처&gt;</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4">의령남씨부정공파종중 홈페이지</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
<!-- -->
카페 게시글
충경공 충간공 부정공파
남변(南忭) - 충경공 충간공 부정공파 9세 묘갈명 (墓碣銘)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