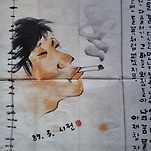<p>&#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000000;">풍자문학론</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span style="color: #000000;">諷刺文學論</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문단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文壇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의 타개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打開策</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으로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최재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崔載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침체에 침체를 거듭하여 오다가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조선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朝鮮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해부하고 아우러 그 대책을 각 방면으로부터 논구하는 것이 오늘의 문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중심적 흥미가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해부하고 설명함에 있어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거지반 유감이 없으리 만큼 상세하고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대책에 있어서는 너무도 공소하고 빈약함은 어쩐 까닭인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물론 이 같은 논단은 일종의 예언인지라 현명한 비평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처음부터 손대기를 꺼려할 종류의 물건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예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豫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긍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스라엘의 예언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豫言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들이 절규하든 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왕국</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王國</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아직도 지상에 실현되지 않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경우에 예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豫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란&#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저급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미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未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점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占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아니라&#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필연적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재의 갈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渴望</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내지&#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정직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인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人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고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告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러한 의미의 예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豫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라면 누구나 다 한 마디씩은 준비가 있을 것이고 또 발언을 삼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예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豫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영세함은 무슨 까닭인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출발점에 무리가 있었던 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문단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방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方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 자체가 제한되고 고정되었기 때문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결론도 자연 속박되지 않는가 나는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실례를 들어 말하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요새 우리가 흔히 보는 문단위기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危機論</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대체로 공통된 점은 현문단정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文壇情勢</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분류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分類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조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朝鮮</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과거에 국민주의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國民主義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가졌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그것은 얼마 아니하여 사회주의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社會主義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압박을 받아 잠식하고 말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런데 이 신흥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新興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도 최근에 발발한 여러 가지 사회정세로 말미암아 활동불능에 빠지고 말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리하여 조선문학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이 논지의 골격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만하면 독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讀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제씨도 대강 예상할 수 있겠지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곳에선 현재의 문단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타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打開</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할 아무런 방책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왜 그러냐하면 국민주의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國民主義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사회주의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社會主義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현재의 조선문학을 분할하는 이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二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분야로서 중간적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두 개의 대립적 문학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둘 밖에 없는 데서 둘을 다 제거한다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은 자연의 수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문단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타개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打開策</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논구하려면 우리는 종래의 것과는 좀 다른 분류법으로써 문학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우리는 과거의 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서 정치사상의 지위를 너무도 과대시한 허물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물론 정치가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 기초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정치가 우리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더욱이 문학에 있어 정치의 가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價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절대시하는 기풍은 흔히 그 사회의 문학을 진퇴양난의 함정으로 몰아 드리는 수가 많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그 사회의 정치가 실질적으로 정지하거나 혹은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설 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때까지 그에게 추종하여 오든 문학은 별안간 방향전환할 기지도 이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도 발견하지 못하는 법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문학세계는 일반적 세계의 갈등이 풀려나오기를 기다리면 수수방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袖手傍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할 수 밖에 없이 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누가 보든지 문학의 명예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회가 핍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逼迫</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더래도 아니 핍박하면 할수록 문학은 문학 독자의 사명과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그 같은 실례를 우리는 많이 본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상 말한 것은 문학비평</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批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도 그대로 들어 맞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정치학적 체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政治學的體系</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만 절대적 배타적으로 의거하여 모든 문학비평</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批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정치의 혼란을 따라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정치적으로 의거할 아무런 체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의 실상이라면 그에 따라 문학비평도 문학창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創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더불어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을 도리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리도 아니고 또 현재의 실정도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문학비평이 활동할 가장 적절한 시기의 하나라고 생각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비평</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임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任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아울러 창작지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創作地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방어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주장한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면 현재에 문학비평이 조선문학의 장래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무엇일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풍자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라고 나는 대답하고 싶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결코 일 개인의 취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趣味</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단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壇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관찰하고 해부함에서 생겨나는 자연적 귀결이라는 것을 위선 말하고 싶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면 나는 현재 조선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朝鮮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어떻게 관찰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부터 말하려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결국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회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社會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문학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혼동하는 이론을 우리는 흔히 본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회적 위기가 문학적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사회적 위기가 그대로 문학적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회적 위기가 문학적 위기로 되려면 모든 신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信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상실이 의식화되어야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사람의 감정생활이 의거할만한 모든 지주가 붕괴하여 무신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無信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사람들의 생활태도로 화할 때에 비로소 문학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도래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문학이 창조적 문학만을 의미한다면 문학은 감정생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感情生活</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안정되지 못한 곳에 발생할 수 없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감정생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感情生活</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신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信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없는 곳에 안정할 수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감정이란 풀의 넝쿨 모양으로 늘 남에게 의지하여 생장하는 물건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사회를 통일할만한 전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傳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도 신념도 없는 곳에선 감정은 돛대를 잃은 배 모양으로 표량할 수밖에 없이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또 표랑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창조적 문학의 발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독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讀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문제는 언제나 곤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困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 문제이나 현재에 있어선 더욱이 까다로운 문제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과거의 문학사를 통관하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다음 같이 말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작가는 독자를 예상하지 않고 창작할 수도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작가는 신념이 없이는 창작할 수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설혼 전세계가 그의 예술을 조소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작가가 그 자신의 예술에 대한 신념만 있다면 그는 창작할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이 최후의 신념은 흔히 보편적 진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普遍的眞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라는 형식을 취하여 존재하여 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작가자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自身</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아무런 신념도 갖지 못 할 때엔 작가는 산란한 인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印象</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파편 속에 고민할 따름이고 그것들을 수집하고 통일하여 예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藝術</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로 집대성할 방법도 용기도 갖지 못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그의 열렬한 창작의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創作意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창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創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전에 좌절되고 만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유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여하튼 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충분한 창작의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創作意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가지면서도 성실하게 창작할 수 없는 모순상태&#8212;이것이 즉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위기에 비한다면 일반적 사회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한 변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變種</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지나지 못하는 문단적 위기&#8212;독자가 줄고 책이 팔리지 않고 작가가 빈궁하고 등등&#8212;는 오히려 용이한 무제라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면 이상과 같은 문학적 위기가 조선에도 도래하였느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렇다고 나는 대답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인생 삼십을 지나고서도 오히려 문학 밖에는 없다는 순진하고 강렬한 신념을 가지고 문학에 종사함을 가능케 할 신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信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지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支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조선에 있는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는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만한 대의명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大義名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가지고 있는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의 순간순간의 부분적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뿐만 아니라 자아 전체를 통일할 만한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그의 사색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전체를 규율할 만한 주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主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나 원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原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가지고 있는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아무것도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이것을 나는 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허물로 돌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같은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파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破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결국 사회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社會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여튼 조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朝鮮</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문학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창작불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創作不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내지 좌절</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挫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상태를 가져오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나는 본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이 현재 조선문학이 출발할 지반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같은 지반 위에서 문학은 어떤 방향을 취할 수 있으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취함이 합리적이냐 함을 생각하여 봄이 나의 목적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앞서 나는 조선문학의 장래의 방향으로서 풍자문학을 지적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지적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조선 현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朝鮮現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문학적 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的危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해부하여 보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나는 이제 그 준비의 제이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第二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으로서 문학을 분류해 보려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분류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分類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여하에 의하여 그 결과가 대단히 달라지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나는 현재와 같은 정세하에서 장래의 문학을 암시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분류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分類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처음부터 기피하려고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이론적 자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論的自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나는 문학분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分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 내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內容</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사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思想</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작가의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기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技術</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중점을 두는 방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方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취하려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어떤 문학이 국민주의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國民主義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냐 사회주의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社會主義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냐 혹은 기타의 주의를 가진 것이냐 등등의 질문을 나는 제이차적 지위로 돌려 보낸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 대신 그 작품</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외부정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는 질문을 제일의적 지위에 올린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람은 외부세계에 대하여 더욱이 현재와 같은 혼돈세계에 처하여 무릇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수용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受容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거부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拒否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및 비평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외부세계를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승인하고 접대하는 태도를 나는 수용적 태도라고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문학창작엔 가장 적절한 태도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작가는 위선 사회인으로서 이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없지 않을가 하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둘째로 외부세계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려는 태도를 나는 거부적 태도라고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태도는 현재세계에 관심하기 보다는 혹종의 신세계를 건설함에 분명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신사회의 콘트라스트로서 혹은 안티태제로서 그를 거부하는 외엔 현재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기능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機能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으로 볼 때에 이 태도는 건설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建設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라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내가 후에 말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예술적 양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藝術的良心</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충실한 현대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로서 이 역시 용이하게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억지로라도 건설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建設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취하려면 실제성의 일부분을 왜곡 내지 묵살하여 인위적으로 태도를 작성할 수밖에 없이 될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렇게 되면 그것은 벌써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술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藝術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리하여 우리는 최후의 희망을 비평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걸게 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는 말할 것도 없이 과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過渡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전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傳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거부 할 수도 없는 곤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困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 시대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때에 인간 예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人間叡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전통의 비평이 아닐가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비평적 태도는 다만 모든 사회현상의 진위 선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眞僞善惡</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변별하여 이론적 판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論的判斷</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도울 뿐만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더욱 중대한 직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職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으로서는 정서의 냉각에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람은 자기네 전통이 그릇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애착심을 품고 있는 법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본능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우리가 비평적 태도를 가질 때엔 이지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모아라든지 혹은 풍자가 부수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같은 심리상태는 우인담&#8228;루이스가 말한 바와 같이 정서의 왁진주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住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반독소주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反毒素住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되어 맹목적으로 침전하려는 열광심을 소독 즉 냉각함에 신통한 작용을 발휘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더욱이 쎈치멘탈리즘의 대응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對應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로선 천하무쌍의 묘약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우리는 낭만적 도취로부터 냉각되어 스스로 실재성을 보게 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진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眞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이론적으로 주입하는 것 보다 흐리지 않는 눈으로 인생을 직시함이 실재성을 파악함에 몇 배의 위력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요구하고 있는 실재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實在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동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洞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이와 같은 냉소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冷</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笑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심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心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상은 수용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受容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의 관계 밑에서 비평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지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地位</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직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職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고찰한 것이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다음으로 나는 거부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拒否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의 관계 밑에서 그것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문학에 있어 거부적 태도는 현재의 외부 세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그 존재를 허용치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현재 세계에 관계하기보다는 혹종의 신세계를 건설함에 분주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이 같은 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혹종의 이상과 주의를 선전함에는 유효하나 진정한 문학으로서 사람이 예술적 상상에 호소함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약점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왜 그러냐하면 문학의 성립은 언어와 씸볼</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象徵</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로써 가능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언어는 어떤 필요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 (</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실제에 있어선 이것도 그리 용이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정의와 개념규정의 과학적 수단을 통하여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씸볼에 있어선 그것을 별안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문학의 매개로서의 씸볼은 항상 장국한 시일과 민족적 경험에 의하여 사회의 전통적 생활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사람들의 정서적 상상적 생활과 얼키어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정서적 씸볼은 그 전통 자체가 소멸한 뒤에도 착실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낡은 전통을 일거에 거부하는 신문학이 왕왕 우리에게 생소한 감을 주어 친해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거부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拒否的太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문학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난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難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가지는 외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생활태도로서 본대로 일반민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一般民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통일할만한 태도가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일반민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一般民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 화급한 관심사는 늘 사회개혁보다는 그들의 출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들의 이상적 사회의 출현을 고대하지 않음이 아니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 보다도 그 자신과 그의 가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家族</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어는 일정한 사회적 수준에 올라서기에 부심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들은 아마도 신사회에 발을 드려 놓는 날까지 구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舊制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 있어서나 애착심을 가질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이 오히려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이 진리라면 인생과 사회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일부 사회 개혁가가 생각하듯이 용이하게 일반민중의 인생태도로는 되지 못할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여기에도 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서의 파괴적 태도의 약점은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와 같은 과도기에 있어 예술적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태도는 비평적 태도가 아닐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태도는 인생과 사회를 도매금으로 거부한다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는 위선 입장을 현대에 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목전에 살아 있는 사람과 제도를 끌어다가 비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도마에 올린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는 사회의 표면을 아는 동시에 이면을 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는 장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將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할 사회를 그리기 보다는</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결함과 악을 확대하고 혹은 적출하고 혹은 야유하고 혹은 매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罵倒</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비평적 태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態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수용적 태도와 파괴적 태도와의 중간에 개재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결국 중간적인 존재임을 면하지 못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현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같은 과도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過渡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선 오히려 합리적인 태도일가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그 직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職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 그것은 수용적 태도처럼 소극적이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한편 건설적 태도처럼 같이 적극적도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수용적 태도에 비하면 파괴적이고 건설적 태도에 비하면 소극적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소극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消極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파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破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 이것이 비평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태도의 직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職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비평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태도는 초월적이고 도피적이라는 비난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비난이 있다고 해서 이 태도의 사회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社會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효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效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조금도 멸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滅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태도는 직접으로 새로운 인생과 사회를 건설하지 못할망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구시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舊時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죄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罪惡</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부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腐敗</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소재하고 소독하는 준비공작은 될 터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상 비평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태도에 관하여 내가 말한 바에 과히 틀림이 없다면 주로 그 태도를 표현하는 풍자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시대에 적합할 것은 자연히 추측될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적극적으로 시대를 통일할 수 없는 이상 소극적으로나마 인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人心</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기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幾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포착하려면 그는 이 태도 말고 취할 아무런 태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진정한 비평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사람을 욕하면서도 독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讀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게 그다지 불유쾌한 감정을 주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일종의 유리와 같은 것이어서 독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讀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거기서 그 자신을 빼어 놓고는 모든 사람을 본다」고 쓰위프트는 말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고래로 많은 풍자작가는 이 성질을 이용하여 그 시대의 죄악을 정면으로부터 공격하지 않고 측면 혹은 이면으로부터 공격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사람을 놀라게 할만한 통괘미는 없을망정 사람을 찌르고 질식시킬만한 신랄미와 삼각미가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영국</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英國</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쓰위프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불란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佛蘭西</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볼테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독일</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獨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하이네 등의 작품이 이것을 잘 실증하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리하여 풍자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현대 작가에게 비교적 용이하고도 효과적인 전수를 약속하는 듯싶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풍자문학은 현대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게만 유망성을 약속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 독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讀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게 대하여는 더욱 매력있는 약속을 하여 주는 것 같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인의 심리를 짙으게 물들이고 있는 공통적 특색은 인생에 대한 실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허무감과 무가치감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들의 대부분은 겨우 생존하여 나가는 외엔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희망이 아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뜻하지 않은 생존을 계속하려고 속는 줄 알고 속아 지내는 자기자신에 더욱 더욱 추악감을 일으키게 하는 실망에 대한 의식적 대조에 지나지 않는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현대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무릇 두 가지 길을 취할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나는 우울의 길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하나는 풍자의 길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절망에서 우울로 통하는 길 같이 용이하고 감미로운 것은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만일에 그가 현대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지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知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가졌다면 그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굴욕의 길인가를 알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스스로 지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知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권리를 포기하여 자기 스스로 최면술에 걸리는 우매인 까닭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리하여 그는 이를 악물고 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소극적이나마 일종의 복수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그 실망을 해부하여 그 허무를 폭로하고 아울러 그 무가치를 냉소할 지성을 가졌다면 그는 아직도 그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인은 이 지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풍자문학이 현대인의 비위에 맞는 이유의 태반은 여기에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한가지 이유는 인생에 대한 풍자가 현대인에게 움직일 수 없는 실재감을 주는 점이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낭만시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浪</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漫時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있어 사람들은 인생찬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人生讚美</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운데에 실재성을 발견하였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인류의 진보를 신앙하였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인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人間</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본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本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착하고 또 개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個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방해가 되는 외부의 모든 제도만 개혁한다면 인간은 드디어 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지위에 도달하리라</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이 전세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前世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람들의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실재성은 불완전으로부터 완전으로 진보하여 가는 향상 가운데에 있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럼으로 개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個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美</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위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偉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표현한 것이면 그들에겐 무엇이나 진실한 예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藝術</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 자신은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한 인물 가운데에 인간의 명일의 장래를 보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들은 시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詩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천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天才</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영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英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숭배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이 시인과 천재와 영웅들은 인류에게 무엇을 끼쳐 주었는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신의 태를 품었다고 보이든 인간 개성은 결국 지상에 무엇을 나아 놓았는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질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그들은 볼테엘의 경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警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운데서 그 해답을 구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세상이 지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地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아니라면 나는 지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地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상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想像</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할 수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현대인은 전세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前世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람과 반대로 개성매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個性罵倒</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운데에 실재성을 발견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가 비록 현재에 비교적 완전하다 할지라도 명일의 그는 더욱 불완전하여질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래서 불완전한 개성의 출현은 명일의 세계를 암시하여 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인생찬미는 구십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九十度</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회전하여 인생찬미로 변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여기서 풍자문학의 무대가 마련되었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라는 문학형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形式</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현대에 생겨난 것은 아닌지라 그 내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內容</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도 인류문화사와 거의 병행하는 변천이 있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개인공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個人攻擊</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저급한 풍자로부터 시대의 정치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政治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권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權力</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비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는 소위 정치적 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政治的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거쳐 인류전체를 조소하는 고급한 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단이 있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가 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자신을 해부하고 비평하고 조소하고 질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叱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고 욕설하는 자기풍자는 일찍 보지 못하던 예술형식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나는 이 같은 새로운 문학을 루이스와 엘리웃과 학슬리 가운데서 발견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자기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무엇보다는 현대의 산물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전대엔 생겨날 수 없었던 현대의 독특한 예술형식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왜그러냐 하면 자기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자의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意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작용이고 자의식</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意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자기분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裂</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서 생겨나는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자기분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裂</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현대에 와서 비로서 결정적으로 형태화</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形態化</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였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밥을 먹고 장가를 들고 애를 낳고 친구와 교제하는 자아와 가끔 이 자아를 떠나서 먼 곳에서 혹은 높은 곳에서 회고하고 관찰하는 또 하나의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두 자아가 대부분의 현대인 속에 동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同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면서도 소위 「동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洞窟</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내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內亂</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일으키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우인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루이스는 그것을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와 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라고 일컫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비자아는 늘 자아의 적이며</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또 자아와 비자아의 양극 사이에 작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역</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逆</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작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用</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교류할 때에 마침내 전기 모양으로 웃음의 스파크를 일으킨다고 말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여기서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우리는 대부분 외부의 힘을 빌어 존재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이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될 수 있는대로 외부의 영향에 적응하려고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또 생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生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즉 행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行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 행동이 순전하면 순전할수록 생존은 완전하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순전한 행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行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반성의 결무를 수반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래서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맹목적인 행동의 뭉치라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잔의 술로 말미암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마디 오해가 원인이 되어 우리는 얼마나 비루한 혹은 우스꽝스러운 혹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자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맹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치 못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서 그것을 본다면 그는 노예이고 인생의 피에로이고 우열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愚</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漢</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일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여기에 풍자가 발생할 계기가 생겨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현대인에 있어 이 같은 관찰자는 다른 사람에 구할 필요가 없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는 그 자신 가운데에 이 같은 관찰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즉 비자아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다시 말하면 비판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判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자아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인은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다음 순간 비자아로 하여금 이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조소케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인생의 최대 비극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그것은 현대인의 피치 못할 운명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인이 자기자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自身</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대한 성실성과 날카로운 지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知性</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두 모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矛盾</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포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包容</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고 있는 동안</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분렬의 비극은 성실하게 표현하는 외에 달리 처치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리하여 자기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은 현대적 사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使命</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아울러 매력을 가지고 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앞서 나는 풍자문학이 일종의 복수 문학이라고 말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말은 자기풍자 문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거에 있어 풍자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는 어떤 개인에 대하여 혹은 사회에 대하여 혹은 어떤 정치권력에 대하여 혹은 인류 전체에 대하여 이지적으로 복수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러나 그것은 인류나 사회가 아직도 비평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가하거나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만일에 인생이나 사회에 대하여 완전히 허무와 무가치를 느끼던가 혹은 개선에 고나하여 아주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풍자의 대상으로서 인류나 사회를 들지 않을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 대신 풍자의 메스를 자기 자신으로 돌린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밀튼의&#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lt;</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실락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樂</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園</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gt;</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보면 신에 반역하여 실패한 사단은 신에 대한 가장 효과 있는 복수방법으로서 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神</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새로 창조한 인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人間</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즉 아담과 이브를 추락시킬 음모를 안출하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자기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심리는 이 사단의 심리와 공통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끝으로 자기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관한 또 한 가지 중대한 동기를 들겠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즉 인생의 재출발이라는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무엇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의주의</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懷疑主義</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일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우주와 인생에 대한 종래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에 대신할 새로운 이론체계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음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再吟味</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로 돌아간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회의의 대양</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大洋</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위에 표류하는 모든 문명</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文明</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파편 중에서 지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것은 데칼트의 철학을 보아도 알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現代</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 또 다시 한번 데칼트가 출현하겠느냐 함은 별문제로 치고</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현재의 문학이 자아에 대하여 가장 진지하고도 모험적인 탐구를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이 자아탐구가 위선 자기풍자의 형식을 취하여 나타나는 것도 자연한 도리라 할 것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나는 넓지는 못하나마 외국</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外國</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작가</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家</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의 작품</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作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과 비평</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批評</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읽을 때에 자기풍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自己諷刺</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를 늘 느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그것은 결국 현대사회에서 필연적</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必然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풍자문학</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諷刺文學</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우리 사회에 대망함은 과연 일장의 환상에 지나지 못할까</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朝鮮日報</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 1935.7.21)</span></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
<!-- -->
카페 게시글
문학일반론
풍자문학론(諷刺文學論) - 문단위기(文壇危機)의 타개책(打開策)으로서 / 최재서(崔載瑞)
시인의마을
추천 0
조회 36
24.05.08 20:3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