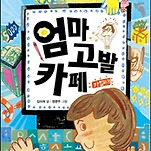<p style="text-align: justify;"><b><span data-ke-size="size23">열린아동문학 2023 겨울호</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b><span data-ke-size="size23">다슬기/고이</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오늘은 </span><span data-ke-size="size18">2</span><span data-ke-size="size18">학년 첫날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안녕</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지아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옆자리에 앉은 여자아이가 인사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안녕</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지누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까까머리 홍이가 홱 뒤돌아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어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둘이 이름이 비슷하잖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랑 지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뭐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뭐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둘이 사귀는 거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홍이가 깔깔대며 놀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1</span><span data-ke-size="size18">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홍이랑 또다시 같은 반이 되다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난 정말 운이 나빠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홍이는 소문난 말썽꾸러기란 말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책상에 탁탁</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소리가 나게 책을 올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기분 나쁜 티를 내려고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때 옆에 있던 지아가 중얼거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러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말 잘 어울리는걸</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깜짝 놀라 지아를 쳐다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나를 보며 생긋 웃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때였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 콧잔등에 애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라졌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처음엔 몰랐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 웃는 모습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건 바로 코 때문이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는 코를 잔뜩 찡그리며 웃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마치 코로 하는 윙크처럼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콧잔등을 찌푸릴 때마다 쪼글쪼글 주름이 생겨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마치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지아가 웃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넋을 잃고 보던 걸 들켰을까 봐 </span><span data-ke-size="size18">창피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일부턴 절대 지아를 보지 않을 거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이상한 일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집에 와서도 자꾸만 생각나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웃는 모습 말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는 모든 아이에게 그렇게 웃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코찔찔이 민구에게도 썰렁맨 은재에게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심지어는 맙소사</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싫어하는 홍이에게도 찡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코 윙크를 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알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저 미소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렇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쉬는 시간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너 누구 좋아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예나가 물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좋았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예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새침데기 예나가 오늘만큼 예뻐 보인 적이 없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웠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 대답이</span> <span data-ke-size="size18">들리지 않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조금만 크게 말해 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코끼리만큼 크게 귀를 키웠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span><span data-ke-size="size18">러다 나도 모르게 지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세상에</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나를 보며 쌩긋 웃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 한 마리가 또다시 나타났다 사라졌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예나가 찡얼찡얼 보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얼른 말해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궁금하단 말이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도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서 나를 보고 웃었던 걸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 콧잔등에 사는 애벌레가 꼬물꼬물 기어 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 심장을 톡톡 건드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심장이 팔딱팔딱 개구리로 변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매일 뛰는 심장이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심장이 오늘 처음 태어난 것 같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오늘 나는 지아에게 고백할 거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교실 앞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멀기만 하던 길이 이렇게 짧아지다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마법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래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만의 마법사</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에게 그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하지만 교실 문을 여는 순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만의 마법사는 요술 빗자루를 타고 휘잉 날아가 버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홍이와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홍이를 보며 까르르 웃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찡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찡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찡긋</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 세 마리가 한꺼번에 지나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꽁꽁 얼어버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말이지 바보 같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수업 시간 내내 화가 나 있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앞에 앉은 홍이 뒤통수를 노려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동그란 머리통이 수박 같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앗</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걸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홍이를 째려보느라 까맣게 몰랐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어디 아프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잔뜩 인상을 쓰고 있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칠판이 안 보여서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칠판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이 나를 보고 칠판을 보더니 다시 나를 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이 놀라는 게 당연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으니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게 수박 때문에</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수박</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 앞에 앉은 수박 머리통도 뒤돌아 앉아 킥킥 웃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이 다시 수업을 시작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여러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짝꿍을 보면 떠오르는 동물을 말해볼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홍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카멜레온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예나는 빨주노초파남보 매일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와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와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멋져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홍이가 짝을 잘 관찰했네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홍이가 어깨를 우쭐우쭐 흔들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저게 뭐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볼수록 밉상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다음은 예나 차례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홍이는 얼룩말 같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마구 뛰어다니거든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홍이가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이히잉</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소리를 내며 따그닥 따그닥 말 달리는 흉내를 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이 말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다음은 지누가 말해볼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엉거주춤 일어섰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를 보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가 생각나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뭐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우하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래</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이들이 탕탕 책상을 두드리며 마구 웃어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갑작스러운 소란에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때였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 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왜냐하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왜냐하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작은 소리로 우물거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span><span data-ke-size="size18">듣지 않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망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수업이 그대로 끝나버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선생님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영영 대답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이들은 지아를 애벌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송충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굼벵이라 놀려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때마다 지아는 두 팔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너무 슬펐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와 나 사이에 우주만큼 커다란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는 옆에 있지만 지구와 달만큼 멀리 떨어진 느낌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깜깜한 우주 속을 혼자 떠다니고 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창밖은 따스한 봄이지만 나의 우주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160;<br><span data-ke-size="size18">토요일이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엄마 아빠와 냇가에 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다슬기가 안 보여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내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바위 뒤를 잘 살펴보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다슬기는 꼭꼭 숨어있단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말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커다란 돌을 들어보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정말로 다슬기가 따닥따닥 붙어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다슬기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햇살을 받은 다슬기가 반짝반짝 까맣게 빛나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문득 지아 생각이 났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꼭꼭 숨은 지아 마음을 보고 싶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마음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바위 뒤에 꼭 붙은 다슬기처럼</span><br><span data-ke-size="size18">들추면 보이는 다슬기처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그날 저녁 식탁에서 엄마 아빠는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슨 생각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지아를 생각하며 말한 거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걸 알 리 없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어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징그럽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엄마가 몸서리를 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멋진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싱긋 웃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가 얼마나 예쁜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얼마나 사랑스러운데</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자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문을 열고 얼굴을 빼꼼 내밀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일부러 자는 척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얼마나 지났을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살며시 눈을 떴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으악</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나를 내려다보며 씨익 웃고 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벌떡 일어나 베개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아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난 지아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거기까지 말하고 지아 얼굴을 떠올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아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가 정말 좋은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엄만 그걸 이해 못 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뭔가 곰곰 생각하더니 배시시 웃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는 뭘 좋아할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몰라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는 언제나 내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어떤 날엔 재미있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오늘은 아니에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봐야 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도 알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서 답답한 거예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 마음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만 지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이마에 쪽 입을 맞추곤 방을 나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책상에 놓아둔 유리병을 바라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돌멩이 뒤에 숨어있던 다슬기가 슬금슬금 기어 나와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작은 더듬이를 까딱까딱 움직여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 여기 있다고 손짓하는 것만 같아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 말이 벌떼처럼 귓가를 웽웽 울렸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아침이 밝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무슨 일이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 집은 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얼른 말해줘</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궁금하단 말이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예나가 시끄럽게 굴긴 했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결국 지아 집을 알아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다행히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까워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아빠에게 살짝 귓속말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저 애벌레 보러 가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빠가 찡긋 윙크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집 초인종을 누르자 지아 아빠가 나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누구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어</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저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때 아저씨 등 뒤로 아직 잠이 덜 깬 지아가 나타났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스스한 머리를 한 지아는 정말 예뻤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등 뒤에 숨겨둔 스케치북을 꺼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VnAw/0ae4280de3714ae5122214b8fe15b9134df6ab0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VnAw/0ae4280de3714ae5122214b8fe15b9134df6ab09" data-origin-width="188" data-origin-height="136"></div><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노랑나비 한 마리를 지아가 봐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까만 크레파스로 꼭꼭 눌러 쓴 내 마음을 지아가 읽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봐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 마음이 꽉 닫힌 걸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 된 걸까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망설였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때였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나는 얼른 스케치북을 주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커다란 나비를 품에 안았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고마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누</span><span data-ke-size="size18">.”</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순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애벌레 한 마리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br><span data-ke-size="size18">봄이 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지아와 나의 우주에 연둣빛 봄이 찾아 왔어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VnAw/8207ba3282f080ab903771e3fbe69aaa686f2a2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VnAw/8207ba3282f080ab903771e3fbe69aaa686f2a21"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676"></div><p style="text-align: left;">&#160;</p>
<!-- -->
카페 게시글
산문,동화 읽는 방
[열린아동문학] 다슬기/고이
팥쥐신랑
추천 1
조회 71
23.12.22 09:5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