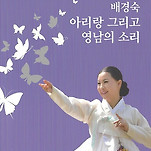<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YUs/8c20f88378a5ab498b3740276d2aef7c37986bc8?download" data-file-name="20081007.pdf" data-file-size="364464"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CYUs%26fldid%3DTtPw%26dataid%3D146%26fileid%3D1%26regdt%3D20230802222820&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CYUs%2F8c20f88378a5ab498b3740276d2aef7c37986bc8')"><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0081007</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355.92KB</div></div></a></div><p>&#160;</p><p><b><span data-ke-size="size18">6. &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수수께기</span></b></p><p>&#160;</p><p><span data-ke-size="size18">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소</span></p><p><span data-ke-size="size18">동지섯달 꽃본듯이 날좀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소</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재욱의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영남전래민요집</span><span data-ke-size="size18">&gt; </span><span data-ke-size="size18">청송지역 조사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날좀 보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경북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이라고 표기했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에서는 어떤 아리랑도 조사되지 않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오늘의 자료에서는 이 사설이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불려진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러므로 </span><span data-ke-size="size18">1930</span><span data-ke-size="size18">년 조사 당시 영남에서는 오늘의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유행되지 않았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또한 이 사설은 이미 영남지역에서 다른 아리랑 사설로 불려지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이는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려온 아리랑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의외의 사실일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리고 </span><span data-ke-size="size18">1920</span><span data-ke-size="size18">년대 중반 밀양지역의 한 권번 운영자인 박남포</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작곡가 박시춘의 부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가 서울에서 아리랑이 유행하자 밀양 지명을 쓴 아리랑을 구성하여 음반으로 발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불려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려온 노래로 알려지게 되었을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2007</span><span data-ke-size="size18">년 </span><span data-ke-size="size18">5</span><span data-ke-size="size18">월</span><span data-ke-size="size18">, &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제</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참관한 후</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대나무에 둘러싸여 도도함을 뽐내는 영남루에서 남천강물을 바라보며 정리한 것인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바로 다음과 같은 원귀설화</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寃鬼說話</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곧 </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아랑처녀의 정절</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로 요약되는 이런 줄거리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조선조 명종 때 밀양 윤부사의 무남독녀 외동딸 아랑을 관노인 통인이 뜻밖에도 흠모하여 유모를 돈으로 매수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달이 밝은 날 영남루 대숲에서 통인과 만나게 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 때 통인이 고백을 했으나 완강히 거절하자 통인은 숨겼던 칼을 빼들어 아랑의 가슴을 찌르고 말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결국 아랑은 죽음으로서 정절을 지켜낸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대숲에 아랑의 죽음을 모르게 처리하였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사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이임하고 말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후 계속해서 신임 부사가 부임하면 첫날밤을 넘기지 못하자 나라에서는 급기야 누구든 부사로 발령을 내겠다고 방을 붙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러자 담대한 이상사가 평생소원인 부사나 한번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자원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서 첫 날밤 곳곳에 불을 밝히고 있노라니 머리를 산발한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말하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부사는 즉시 통인과 유모를 벌하였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묘를 쓰고 아랑의 한을 달랬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이후 밀양지역 사람들이 정절을 지킨 아랑을 추모하여 매년 음력 </span><span data-ke-size="size18">4</span><span data-ke-size="size18">월 </span><span data-ke-size="size18">16</span><span data-ke-size="size18">일 제</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祭</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지내주었고</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때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span><span data-ke-size="size18">&lt;</span><span data-ke-size="size18">밀양아리랑</span><span data-ke-size="size18">&gt;</span><span data-ke-size="size18">이라는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렇게 원귀설화가 배경이 되어 언제부터인가 그 역사를 조선 중기로까지 끌어 올려놓았던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
<!-- -->
카페 게시글
신문방송/공지
6. <밀양아리랑>의 수수께기
배경숙
추천 0
조회 12
23.08.02 22:2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