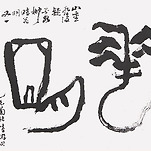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20">다시 꺼내보는 명품시조 </span><span data-ke-size="size20">117,</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고목</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외 </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신웅순(시인&#8228;평론가&#8228;중부대명예교수)</p><p>&#160;</p><p>&#160;</p><p>천년을</p><p>압축시킨</p><p>생의 마디 닦아내며</p><p>&#160;</p><p>생불의</p><p>등뼈 속에</p><p>새겨넣은 여래 말씀</p><p>&#160;</p><p>어스름</p><p>생의 뒤쪽에</p><p>적막 하나 놓고 간다</p><p>-조경순의「고목」</p><p>&#160;</p><p><span data-ke-size="size18">고목은 굵고 주름져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남을 것만 남겨 놓고 마디를 닦아내는 고목</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등뼈 속에 여래 말씀을 새겨놓고 생의 뒤쪽에 적막하나 놓고 간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언무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無言無說</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언무답</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無問無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불이선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고목은 버릴 것 다 벗어버린 어스름 생의 뒤쪽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간결체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란 고목과 같은 것이 아닐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인생은 고목과 같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는 고목 같은 맨 나중의 인생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야 우리들은 시처럼 적막 하나 놓고 갈 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쥐죽은 듯</p><p>촛불도 고요한데</p><p>&#160;</p><p>주장자</p><p>쾅-쾅 치는</p><p>큰 스님 호통 소리</p><p>&#160;</p><p>동백꽃 엿듣다 그만</p><p>쳐든 고개 떨쿤다</p><p>-김기수의 「선운사 동백꽃」</p><p>&#160;</p><p><span data-ke-size="size18">촛불도 고요한데 큰 스님 호통소리에 동백꽃이 고개 들다 그만 툭 떨쿤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슨 법문</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슨 화두가 이런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슨 소리인지 통 알 수가 없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상황만 있고 나머지는 여백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홍운탁월</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달 주변 구름만 그렸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호통소리와 동백꽃만 그렸지 달을 그리지는 않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는 굳이 의미를 묻지 않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면 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슬픈 말을 한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슬픈 말을 하지 말아야 슬픈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가 산문이 아닌 이유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오미 중 시조는 톡 쏘는 어떤 맛일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호통치며 스님이 묻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160;</p><p>-2024.1.31.(수)주간한국문학신문</p><p>&#160;</p>
<!-- -->
카페 게시글
시와 시조
다시 꺼내보는 명품시조 117,「고목」외
신웅순
추천 0
조회 180
24.02.01 16:4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