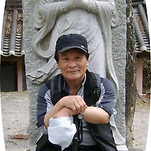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林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산</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峴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앙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키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송림동은 구한말에 인천부 다소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多所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역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나무 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뜻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78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간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구총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戶口總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터 등장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당시 전국의 인구와 가구 숫자를 조사해 기록한 이 책에는 인천부 다소면 산하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 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 도마교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刀馬橋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충훈부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忠勳府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천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川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과 함께 송림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林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동네를 일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日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국적 인 행정구역 통폐합 때 새로 만든 부천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富川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포함시켰다가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다시 인천부로 편입시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때 주변의 새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승거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샛골 등의 마을을 합쳐 송림리라 이름 붙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5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 인천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地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확장 때 일본식으로 송림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林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뒤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그대로 송림동이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시대의 이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처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 동네의 뒷산인 만수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萬壽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이가 해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6m</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불과해 산이라기보다 언덕에 가까운 이 만수산은 소나무가 많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솔고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고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솔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도 불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일대는 원래 상당 부분이 바닷가였다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3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부터 시작된 매립사업에 따라 육지가 된 곳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매립이 시작되기 전까지 만수산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소나무숲 언덕이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로 이 산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수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보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道局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이 알려지고 불려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trong>수도국산</strong></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수도국산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대한제국 시절을 거쳐 일제 식 민지 시절에 상수도를 관리하던 정부 기구의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인천은 바다와 맞닿아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물이 적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질도 대부분 좋지 않았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그 옛날 비류 백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沸流 百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전설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탓에 구한말 개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開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후 인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박 통행도 늘어나자 사람들이 마시고 쓸 물을 구하는 것이 당장 큰 문제가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5</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부터 수도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시작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주도한 것은 일본인들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이 빠르게 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이 운영하는 공장과 상가 등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처음에는 문학산 계곡에 빗물을 담아 두는 방식을 생각했으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어 서울의 노량진을 수원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源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삼아 한강물을 인천으로 끌어오는 계획을 세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은 조선 정부를 압박해 오늘날 재무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財務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격인 탁지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度支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수도국을 신설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계 은행에서 건설비용을 빌리게 한 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90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상수도 공사를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물론 일제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5</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사늑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巳勒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조선의 국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國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실질적으로 모두 뻬앗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수도 공사도 일본인들이 맡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이곳 송림산 꼭대기에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配水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들어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배수지는 수도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이 있는 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뜻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아예 산 이름처럼 돼버린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배수지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에 공사를 시작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8</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준공됐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9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에는 노량진의 수원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源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수시설이 준공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 함께 노량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537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 사이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2.62km</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수도관을 깔아 같은 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부터 인천으로 급수를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처럼 수도시설이 있다고 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곳은 인천 이외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이나 충청남도 천안시 등지에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 수도국산은 오랫동안 인천의 대표적 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서도 널 리 알려졌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0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무렵부터 주민들이 모여살기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러일전쟁으로 지금의 중구 전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錢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변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그곳에 살던 조선인들을 내쫓아 강제로 이곳에 옮겨 살게 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 이후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또 자리를 잡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더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 결과 이곳에 있던 소나무들은 자취를 감추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대신 산비탈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00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 가구의 켜다란 판자촌이 생겼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해서 수도국산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 달동네의 대명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됐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판잣집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재개발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지금은 판자촌 대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됐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동네에 생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가면 그 옛날의 모습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한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은 흔히 높은 산자락에 있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이면 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잘 보이는 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뜻으로 쓰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6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빈민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貧民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들이 도심에서 쫓겨나 한 데 모여 살던 곳을 가리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단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8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V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일연속극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방영 되어 큰 인기를 끌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연속극은 어려운 생활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달동네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내용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낡고 좁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난한 산동네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지만 국어학자들은 달동네의 어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語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하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은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뜻하는 우리 옛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찾기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는 남동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월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재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 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를 따른다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이 보이는 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뜻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은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있는 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땅값과 집값이 싼 곳을 찾다보니 다니기 힘든 높은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은 곳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렀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이 생 겼다는 해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trong>송현동</strong></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송림동 옆에 붙어있는 송현동도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지역 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191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송현리라는 이름으로 인천부에 편입 됐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이름 그대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나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에서 수도국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수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밝혔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일본인들에 의해 지금의 동네 이름으로 정해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3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인천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府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확장 때 일본식으로 송현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峴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했다가 광복 뒤 이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송현동이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따라서 송현동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마찬가지로 만수산의 소나무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앞서 말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구총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戶口總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인천부 다소면 산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 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운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 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松林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나오는 반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나오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 이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87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나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친부읍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府邑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림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나올 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동은 송림동과는 달리 일본인들이 새로 만들어 붙인 이름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송현동은 원래 만석동 괭이부리를 통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넓은 저지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갯벌과 논이 있던 땅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 갯골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구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口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문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門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렸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갯골물은 지금의 배다리 앞까지 드나들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문통은 이제 복개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일제 강점기에 신문기자로 활동했던 고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高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생의 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석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昔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보면 러일전쟁 무렵 일본군이 중구 전동 일대에 살던 우리 주민들을 이곳으로 내쫓았을 때의 상황이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송림산 자락에 자리를 잡을 당시 그 아래 땅은 모두 논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이주민들이 버린 양잿물 섞인 빨랫물이 계속 이 논으로 흘러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걸핏하면 바닷물까지 넘쳐 들어와 이곳의 논은 모두 망가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결국은 황량한 갈대밭으로 변해 버렸다는 내용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수문통 갯골과 갈대밭은 그 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3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말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초까지 매립돼 택지와 공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상가지역으로 바뀌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 지역이 매립된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 세계대전 이후 한동안 인천에도 전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戰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황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호황에 힘 입어 기존의 인천시내에는 각종 상점이나 서비스업종이 번창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학교나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아 빈 땅이 거의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결국 인천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땅을 마련하기 위해 해안가인 지금의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동 일대를 매립하기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다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3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일본의 기업들은 땅값과 인건비가 싼 인천으로의 진출을 서둘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석동과 송현동의 매립지는 점차 공업 지대로 바뀌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앙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키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trong></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지금 동인천역의 뒤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송현동에 있는 중앙시장은 이렇게 해서 생긴 매립지의 야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夜市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시작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매립사업으로 새로운 땅이 생기자 밤이 되면 이곳에서 야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夜市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열려 크게 번창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처음에는 배가 드나드는데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파는 곳들이 생긴 것이 매립사업과 더불어 점차 시장으로 커나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전하는 이야기로는 인천에서 유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柔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범을 한 유창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柳昌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씨가 광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절에 이곳 송현동 공설시장 개천가에서 야시장을 연 것이 그 시초가 됐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러나 이 야시장 자리에 있던 상점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 때 폭격으로 모두 없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대신 그 자리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어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전에 번성 했던 야시장의 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이은 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 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6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초 이곳이 정비되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다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앙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5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에는 북한과의 냉전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冷戰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결 구도에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 자유시장뿐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공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래 이름은 만국공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극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8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까지만 해도 인천사람들은 이곳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키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이 불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불러야 잘 통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한국전쟁이 끝난 뒤로도 오랫동안 미군부대에서 몰래 빼낸 군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軍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건이나 원조 물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암달러 등이 이곶에서 많이 거래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제는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나이가 든 인천시민들 중에는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br></p>
<!-- -->
카페 게시글
미추홀
[동구편] 송림동
천심
추천 0
조회 50
20.08.10 19:0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