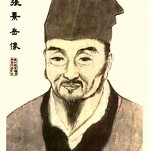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8">14.&#160;병기(病氣)</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수요강유편(&lt;壽夭剛柔篇&gt;)에 이르기를 &quot;풍한(風寒)은 형(形)을 상(傷)하고 우공(憂恐) 분노(忿怒)는&#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를 상(傷)한다.&#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는 장(藏)을 상(傷)하니 장(藏)이 병(病)하고 한(寒)은 형(形)을 상(傷)하니 형(形)이 응(應)한다. 풍(風)은 근맥(筋脈)을 상(傷)하면 근맥(筋脈)이 이에 응(應)한다. 이는&#160;<span style="color: #ff0000;">형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形氣</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외내(外內)의 상응(相應)이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맥요정미론(&lt;脈要精微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양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유여(有餘)하면 신열(身熱) 무한(無汗)하고&#160;<span style="color: #ff0000;">음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陰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유여(有餘)하면 다한(多汗) 신한(身寒)하며 음양(陰陽)이 유여(有餘)하면 무한(無汗) 한(寒)한다. 언(言)이 미(微)하고 종일 언(言)을 부언(復言)하면 이는&#160;<span style="color: #ff0000;">탈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奪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자지론(&lt;刺志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실(實)하면서 형(形)이 실(實)한 경우,&#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서 형(形)이 허(虛)한 경우 이것들은 그 상(常)이고, 이에 반(反)하면 병(病)한다. 곡(穀)이 성(盛)하면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성(盛)한 경우, 곡(穀)이 허(虛)하면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한 경우 이것들은 그 상(常)이고, 이에 반(反)하면 병(病)한다. 맥(脈)이 실(實)하면서 혈(血)이 실(實)한 경우, 맥(脈)이 허(虛)하면서 혈(血)이 허(虛)한 경우 이것들은 그 상(常)이고, 이에 반(反)하면 병(病)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한데 신열(身熱)하는 경우 이를 반(反)이라 한다. 곡(穀)의 입(入)은 다(多)한데&#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소(少)한 경우 이를 반(反)이라고 한다. 곡(穀)이 입(入)하지 않는데&#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다(多)한 경우 이를 반(反)이라 한다. 맥(脈)이 성(盛)한데 혈(血)이 소(少)한 경우 이를 반(反)이라 한다. 맥(脈)이 소(少)한데 혈(血)이 다(多)한 경우 이를 반(反)이라 한다.&#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성(盛)한데 신(身)이 한(寒)한 경우 이는 상한(傷寒)으로 득(得)한 것이다.&#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한데 신(身)이 열(熱)한 경우 이는 상서(傷暑)로 득(得)한 것이다. 곡(穀)의 입(入)이 다(多)한데&#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소(少)한 경우 탈혈(脫血)하였거나 습(濕)이 하(下)에 거(居)하므로 득(得)한 것이다. 곡(穀)의 입(入)이 소(少)한데&#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다(多)한 경우 사기(邪)가 위(胃) 및 폐(肺)에 있는 것이다. 맥(脈)이 소(小)한데 혈(血)이 다(多)한 경우 음(飮: 음주)하여 중(中)이 열(熱)한 것이다. 맥(脈)이 대(大)한데 혈(血)이 소(少)한 경우 맥(脈)에&#160;<span style="color: #ff0000;">풍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風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있어 수장(水漿)이 불입(不入)한 것이다. 이것들을 말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실(實)은&#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입(入)한 것이고 허(虛)는&#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출(出)한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실(實)하면 열(熱)하고&#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 한(寒)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선명오기편(&lt;宣明五氣篇&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오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五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병(病)이니, 심(心)은 희(噫)가 되고, 폐(肺)는 해(咳)가 되며, 간(肝)은 어(語)가 되고, 비(脾)은 탄(呑)이 되며, 신(腎)은 흠(欠) 체(&#22164;)가 된다. 위(胃)는&#160;<span style="color: #ff0000;">기역</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逆</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얼(&#22118;) 공(恐)이 되고, 대장(大腸) 소장(小腸)은 설(泄)이 되며, 하초(下焦)는 일(溢)하여 수(水)가 되고, 방광(膀胱)은 불리(不利)하여 융(&#30275;)이 되며, 불약(不約)하여 유뇨(遺溺)가 되고, 담(膽)은 노(怒)가 된다. 이는 오병(五病)이라 말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오정(五精)의 병(&#20006;)이니,&#160;<span style="color: #ff0000;">정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精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심(心)에 병(&#20006;)하면 희(喜)가 되고, 폐(肺)에 병(&#20006;)하면 비(悲)가 되며, 간(肝)에 병(&#20006;)하면 우(憂)가 되고, 비(脾)에 병(&#20006;)하면 외(畏)가 되며, 신(腎)에 병(&#20006;)하면 공(恐)이 된다. 이는 오병(五&#20006;)이라 말하니, 이는 허(虛)하여 상병(相幷)하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오노(五勞)의 상(傷)이니, 구시(久視)하면 혈(血)을 상(傷)하고, 구와(久臥)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를 상(傷)하며, 구좌(久坐)하면 육(肉)을 상(傷)하고, 구립(久立)하면 골(骨)을 상(傷)하며, 구행(久行)하면 근(筋)을 상(傷)한다. 이를 오노(五勞)의 상(傷)이라 말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거통론(&lt;擧痛論&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내가 알기로 백병(百病)은&#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서 생(生)하니, 노(怒)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상(上)하고, 희(喜)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완(緩)하며, 비(悲)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소(消)하고, 공(恐)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하(下)하며, 한(寒)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수(收)하고, 경(炅: 熱)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설(泄)하며, 경(驚)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난(亂)하고, 노(勞)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모(耗)하며, 사(思)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결(結)한다.&#160;<span style="color: #ff0000;">구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九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부동(不同)한데, 어떻게 병(病)을 생(生)하게 하는가?&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노(怒)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역(逆)하고, 심(甚)하면 구혈(嘔血) 및 손설(&#39153;泄)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상(上)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희(喜)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화(和)하고 지(志)가 달(達)하며 영위(營衛)가 통리(通利)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완(緩)하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비(悲)하면 심계(心系)가 급(急)하고 폐(肺)의 포엽(布葉)이 거(擧)하여 상초(上焦)가 불통(不通)하고 영위(營衛)가 불산(不散)하며&#160;<span style="color: #ff0000;">열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중(中)에 있으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소(消)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공(恐)하면 정(精)이 각(却)하고 각(却)하면 상초(上焦)가 폐(閉)하며 폐(閉)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환(還)하고 환(還)하면 하초(下焦)가 창(脹)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불행(不行)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한(寒)하면 주리(&#33120;理)가 폐(閉)하고&#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불행(不行)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수(收)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경(炅)하면 주리(&#33120;理)가 개(開)하고 영위(營衛)가 통(通)하며 한(汗)이 대설(大泄)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설(泄)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경(驚)하면 심(心)이 의(倚)하지 못하고 신(神)이 귀(歸)하지 못하며 려(慮)가 정(定)하지 못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난(亂)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노(勞)하면 천식(喘息) 한출(汗出)하여 외내(外內)가 모두 월(越)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모(耗)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사(思)하면 심(心)이 존(存)하고 신(神)이 귀(歸)하여&#160;<span style="color: #ff0000;">정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正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유(留)하고 불행(不行)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결(結)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거통론(&lt;擧痛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한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寒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맥(脈)의 외(外)에 객(客)하면 맥(脈)이 한(寒)하게 되고, 맥(脈)이 한(寒)하면 축권(縮&#36385;)하며, 축권(縮&#36385;)하면 맥(脈)이 출급(&#32064;急)하고, (맥이) 출급(&#32064;急)하면 외(外)로 소락(小絡)을 인(引)하므로 졸연(卒然)하게 통(痛)한다. 이에 경(炅)을 득(得)하면 통(痛)이 즉시 지(止)하고, 한(寒)에 거듭 중(中)하면 통(痛)이 구(久)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모든 한기(寒氣) 등의 의(義)는 심복통({心腹痛})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본신편(&lt;本神篇&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간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肝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 공(恐)하고 실(實)하면 노(怒)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비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脾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 사지(四肢)를 불용(不用)하고 오장(五藏)이 불안(不安)하며 실(實)하면 복창(腹脹)&#160;경수(涇&#28338;)가 불리(不利)하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심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心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 비(悲)하고 실(實)하면 소(笑)가 불휴(不休)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폐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肺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 비색(鼻塞)하여 불리(不利)하고&#160;<span style="color: #ff0000;">소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少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하며 실(實)하면 천갈(喘喝)&#160;흉영(胸盈)&#160;앙식(仰息)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신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腎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허(虛)하면 궐(厥)하고 실(實)하면 창(脹)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반드시 오장(五藏)의 병(病)의 형(形)을 살펴서 그&#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허실(虛實)을 알아야 삼가 조(調)할 수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수우(愁憂)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폐색(閉塞)하여 불행(不行)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구문편(&lt;口問篇&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상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上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부족(不足)하면 뇌(腦)가 불만(不滿)한다.&quot; 하였다. (허손({虛損})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생기통천론(&lt;生氣通天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로 인하면 종(腫)이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사유(四維:&#160;풍한서습)가 서로 대(代)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양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곧 갈(竭)하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수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兪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화(化)하여 박(薄)하면 전(傳)하여 곧잘 외(畏)하고 및 경해(驚駭)가 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궐론(&lt;厥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양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하(下)에서 쇠(衰)하면 한궐(寒厥)이 되고,&#160;<span style="color: #ff0000;">음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陰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하(下)에서 쇠(衰)하면 열궐(熱厥)이 된다.&quot; 하였다. (궐역({厥逆})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역조론(&lt;逆調論&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인신(人身)의 상(常-&gt;裳)이 온(溫)한 것도 아니고 열(熱)한 것도 아닌데 열(熱)하면서 번만(煩滿)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quot; 하였다. (한열({寒熱})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비론(&lt;痺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풍한습</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風寒濕</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의 삼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三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뒤섞여(:雜) 들어와 합(合)하면 비(痺)가 된다.&quot; 하였다. (풍비({風痺})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위론(&lt;&#30207;論&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오장(五藏)이 사람으로 하여금 위(&#30207;)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폐(肺)가 열(熱)하면 엽(葉)이 초(焦)하고 (초하면) 피모(皮毛)가 허약(虛弱) 급박(急薄)하게 되고 착(著)하면 위벽(&#30207;&#36484;)을 생(生)하게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심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心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열(熱)하면 하맥(下脈)이 궐(厥)하여 상(上)하니, 상(上)하면 하맥(下脈)이 허(虛)하게 되고, 허(虛)하면 맥위(脈&#30207;)를 생(生)하여 추(樞: 사지관절)를 절(折)하고, 설(&#25352;)하(지 못하)며, 경(脛)이 종(縱)하여 지(地)를 임(任)하지 못한다.&quot; 하였다. (위증({&#30207;證})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백병시생편(&lt;百病始生篇&gt;)에서 황제(黃帝)가 이르기를 &quot;적(積)의 시생(始生)과 이성(已成)은 어떠한가?&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기백(岐伯)이 이르기를 &quot;적(積)의 시생(始生)은 한(寒)을 얻으면 생(生)하고 궐(厥)하면 적(積)이 성(成)한다.&quot; 하였다. (적취({積聚})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평열병론(&lt;評熱病論&gt;)에 이르기를 &quot;모든&#160;<span style="color: #ff0000;">수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水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있는 것은 미종(微腫)이 먼저 목하(目下)에 나타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월사(月事)가 불래(不來)하면 포맥(胞脈)이 폐(閉)한 것이니, 포맥(胞脈)은 심(心)에 속(屬)하고 흉중(胸中)에 락(絡)하므로,&#160;<span style="color: #ff0000;">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폐(肺)를 상박(上迫)하여&#160;<span style="color: #ff0000;">심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心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가 하(下)로 통(通)하지 못하므로 월사(月事)가 불래(不來)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지진요대론(&lt;至眞要大論&gt;)에 이르기를 &quot;<span style="color: #ff0000;">제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諸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160;분울(&#33209;鬱)은 모두 폐(肺)에 속(屬)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병능론(&lt;病能論&gt;)에 이르기를 &quot;병(病)에 노(怒) 광(狂)하면 양(陽)에서 생(生)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양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氣</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는 폭절(暴折)로 인하여 결(決)하기 어려우므로 잘 노(怒)한다.&quot; 하였다. (전광({癲狂})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음양별론(&lt;陰陽別論&gt;)에 이르기를 &quot;일양(一陽)이 발병(發病)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소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少氣</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선해(善咳) 선설(善泄)하고 그것이 전(傳)하여 심체(心&#25507;)가 되고 그것이 전(傳)하여 격(隔)이 된다.&quot;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