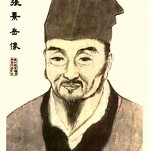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6">14. </span><span data-ke-size="size26">經脈應天地 呼吸分補寫</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素問</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離合眞邪論</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黃帝問曰 余聞九針九篇 夫子乃因而九之 九九八十一篇 余盡通其意矣</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針經之數 共八十一篇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經言氣之盛衰 左右傾移 以上調下 以左調右 有餘不足 補寫於榮輸 余知之矣 此皆榮衛之傾移 虛實之所生 非邪氣從外入於經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榮衛傾移 謂陰陽偏勝 則虛實內生而爲病 非邪氣在經之謂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余願聞邪氣之在經也 其病人何如 取之奈何 </span></p><p><span data-ke-size="size18">岐伯對曰 夫聖人之起度數 必應於天地 故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宿 謂二十八宿 度 謂三百六十五度 經水 謂淸渭海湖汝&#28576;淮&#28463;江河濟&#28467; 以合人之三陰三陽 十二經脈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天地溫和 則經水安靜 天寒地凍 則經水凝泣 天暑地熱 則經水沸溢 卒風暴起 則經水波涌而&#38580;起</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人氣與天地相通 故溫和寒冷暑熱卒風暴至 而經脈之應 必隨時爲變 邪之中人亦然也 詳如下文 泣 澁同 &#38580; 隆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夫邪之入於脈也 寒則血凝泣 暑則氣&#28118;澤 虛邪因而入客 亦如經水之得風也 經之動脈 其至也亦時&#38580;起 其行於脈中循循然</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之自外而入者 或爲 凝泣 或爲&#28118;澤 皆由於寒熱之變 其入客於經 亦如經水之得風 卽血脈之得氣也 故致經脈亦時&#38580;起 蓋邪在脈中 無非隨正氣往來以爲之動靜耳 循循 隨順貌</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至其寸口中手也 時大時小 大則邪至 小則平 其行無常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隨脈 必至寸口 有邪則&#38580;起而大 無邪則平和而小 隨其所在而爲形見 故行無常處</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在陰與陽 不可爲度</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隨陽經則入陽分 隨陰經則入陰分</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從而察之 三部九候 卒然逢之 早&#36943;其路</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見邪所在 則當&#36943;之 &#36943;者制也 早絶其路 庶無深大之害 三部九候 詳脈色類五</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吸則內針 無令氣&#2454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此下言呼吸補寫之法也 吸則內針 寫其實也 蓋吸則氣至而盛 迎而奪之 其氣可泄 所謂刺實者 刺其來也 去其逆氣 故令無&#2454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靜以久留 無令邪布</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前氣未除 後氣將至 故當靜留其針 俟而寫之 無令邪氣復布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吸則轉針 以得氣爲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未泄 候病者再吸 乃轉其針 轉 &#25619;轉也 謂之催氣 得氣爲故 以針下得氣之故爲度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候呼引針 呼盡乃去 大氣皆出 故命曰 寫</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入氣曰 吸 出氣曰 呼 引 引退也 去 出針也 候呼引至其門 則氣去不能復聚 呼盡乃離其穴 則大邪之氣隨泄而散 經氣以平 故謂之寫 調經論曰 寫實者氣盛乃內針 針與氣俱內以開其門 如利其戶 針與氣俱出 精氣不傷 邪氣乃下 外門不閉 以出其疾 搖大其道 如利其路 是謂大寫 必切而出 大氣乃屈</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黃帝</span><span data-ke-size="size18">가 질문하며 이르기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span><span data-ke-size="size18">九針</span><span data-ke-size="size18">의 </span><span data-ke-size="size18">九篇</span><span data-ke-size="size18">을 들었고 </span><span data-ke-size="size18">夫子</span><span data-ke-size="size18">는 이를 인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九</span><span data-ke-size="size18">를 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8">九九</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八十一篇</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하였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내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8">意</span><span data-ke-size="size18">를 모두 </span><span data-ke-size="size18">通</span><span data-ke-size="size18">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針經</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數</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共</span><span data-ke-size="size16">히 </span><span data-ke-size="size16">八十一篇</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經</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8">&#39;</span><span data-ke-size="size18">氣</span><span data-ke-size="size18">의 </span><span data-ke-size="size18">盛衰</span><span data-ke-size="size18">와 </span><span data-ke-size="size18">左右</span><span data-ke-size="size18">의 </span><span data-ke-size="size18">傾移</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上</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8">下</span><span data-ke-size="size18">를 </span><span data-ke-size="size18">調</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8">左</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右</span><span data-ke-size="size18">를 </span><span data-ke-size="size18">調</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有餘 不足</span><span data-ke-size="size18">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8">榮輸</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補寫</span><span data-ke-size="size18">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는 모두 </span><span data-ke-size="size18">虛實</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生</span><span data-ke-size="size18">한 </span><span data-ke-size="size18">榮衛</span><span data-ke-size="size18">의 </span><span data-ke-size="size18">傾移</span><span data-ke-size="size18">이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外</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8">經</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8">入</span><span data-ke-size="size18">한 것이 아니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榮衛</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傾移</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陰陽</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偏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말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虛實</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生</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된 것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經</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있다는 말이 아니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내가 원하건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邪氣</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經</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에 있을 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span><span data-ke-size="size18">病人</span><span data-ke-size="size18">은 어떠하고 그 </span><span data-ke-size="size18">取</span><span data-ke-size="size18">는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岐伯</span><span data-ke-size="size18">이 </span><span data-ke-size="size18">對</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며 이르기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聖人</span><span data-ke-size="size18">이 </span><span data-ke-size="size18">度數</span><span data-ke-size="size18">를 </span><span data-ke-size="size18">起</span><span data-ke-size="size18">할 때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8">天地</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應</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故</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天</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宿度</span><span data-ke-size="size18">가 있고 </span><span data-ke-size="size18">地</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8">가 있으며 </span><span data-ke-size="size18">人</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經脈</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宿</span><span data-ke-size="size16">이란 </span><span data-ke-size="size16">二十八宿</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말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度</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三百六十五度</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말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淸 渭 海 湖 汝 &#28576; 淮 &#28463; 江 河 濟 &#28467;</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말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三陰三陽 十二經脈</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天地</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溫和</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安靜</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天寒 地凍</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凝泣</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8">天暑 地熱</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沸溢</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卒風</span><span data-ke-size="size18">이 </span><span data-ke-size="size18">暴起</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波涌</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8">&#38580;起</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人氣</span><span data-ke-size="size16">와 </span><span data-ke-size="size16">天地</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相通</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溫和 寒冷 暑熱 卒風暴至</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經脈</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應</span><span data-ke-size="size16">은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時</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變</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邪</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中</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도 그러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詳</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下文</span><span data-ke-size="size16">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泣</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澁</span><span data-ke-size="size16">과 </span><span data-ke-size="size16">同</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38580;</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隆</span><span data-ke-size="size16">과 </span><span data-ke-size="size16">同</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邪</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脈</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入</span><span data-ke-size="size18">할 때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寒</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血</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凝泣</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暑</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氣</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28118;澤</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로 </span><span data-ke-size="size18">因</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虛邪</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入客</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또한 </span><span data-ke-size="size18">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風</span><span data-ke-size="size18">을 </span><span data-ke-size="size18">得</span><span data-ke-size="size18">한 것과 같아서</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經</span><span data-ke-size="size18">의 </span><span data-ke-size="size18">動脈</span><span data-ke-size="size18">의 </span><span data-ke-size="size18">至</span><span data-ke-size="size18">가 또한 </span><span data-ke-size="size18">時</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38580;起</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脈中</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行</span><span data-ke-size="size18">함이 </span><span data-ke-size="size18">循循然</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外</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或 凝泣</span><span data-ke-size="size16">하거나 </span><span data-ke-size="size16">或 &#28118;澤</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모두 </span><span data-ke-size="size16">寒熱</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變</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말미암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經</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入客</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經水</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風</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得</span><span data-ke-size="size16">한 것과 같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血脈</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得</span><span data-ke-size="size16">한 것이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經脈</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또한 </span><span data-ke-size="size16">時</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38580;起</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邪</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脈中</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있으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正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往來</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動靜</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음이 없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循循</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順</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따르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貌</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寸口</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이르면 </span><span data-ke-size="size18">手</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中</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8">時大 時小</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大</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邪</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至</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小</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平</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span><span data-ke-size="size18">行</span><span data-ke-size="size18">에 </span><span data-ke-size="size18">常處</span><span data-ke-size="size18">가 없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脈</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따라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寸口</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邪</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으면 </span><span data-ke-size="size16">&#38580;起</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大</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邪</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없으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平和</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小</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所在</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形</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見</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常處</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없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陰</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있는지 </span><span data-ke-size="size18">陽</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있는지를 </span><span data-ke-size="size18">度</span><span data-ke-size="size18">할 수 없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陽經</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따르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陽分</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陰經</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따르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陰分</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8">三部九候</span><span data-ke-size="size18">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8">察</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갑자기 </span><span data-ke-size="size18">逢</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8">路</span><span data-ke-size="size18">를 일찍이 </span><span data-ke-size="size18">&#36943;</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所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見</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당연히 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6">&#36943;</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36943;</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制</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早</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路</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絶</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無深大</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害</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없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三部九候</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脈色類 五</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吸</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內針</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8">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24548;</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 않게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下</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呼吸 補寫</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말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內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迎</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奪</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泄</span><span data-ke-size="size16">할 수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39;</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來</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39;</span><span data-ke-size="size16">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逆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24548;</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없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靜</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8">久留</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邪</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布</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 않게 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前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아직 </span><span data-ke-size="size16">除</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後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고 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당연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靜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俟</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다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다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布</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게 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吸</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轉針</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得氣</span><span data-ke-size="size18">를 </span><span data-ke-size="size18">故</span><span data-ke-size="size18">로 삼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泄</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았으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病者</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다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다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轉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轉</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催氣</span><span data-ke-size="size16">라고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得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삼는다는 것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針下</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得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度</span><span data-ke-size="size16">로 한다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呼</span><span data-ke-size="size18">를 </span><span data-ke-size="size18">候</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引針</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8">呼</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盡</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去</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大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모두 </span><span data-ke-size="size18">出</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8">故</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命</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span> <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寫</span><span data-ke-size="size18">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入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라 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出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引</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引</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退</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去</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門</span><span data-ke-size="size16">까지 </span><span data-ke-size="size16">引</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去</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다시 </span><span data-ke-size="size16">聚</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盡</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離</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大邪</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泄</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散</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에 </span><span data-ke-size="size16">經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平</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調經論</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은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盛</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와 같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開</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니 마치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戶</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利</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와 같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精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傷</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下</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外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閉</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으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疾</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고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道</span><span data-ke-size="size16">를 크게 </span><span data-ke-size="size16">搖</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마치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路</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利</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大寫</span><span data-ke-size="size16">라 하니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切</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야 </span><span data-ke-size="size16">大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帝曰 不足者補之 奈何 </span></p><p><span data-ke-size="size18">岐伯曰 必先&#25451;而循之</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先以手&#25451;摸其處 欲令血氣溫舒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切而散之</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次以指切捺其穴 欲其氣之行散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推而按之</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再以指&#25545;按其肌膚 欲針道之流利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彈而怒之</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以指彈其穴 欲其意有所注則氣必隨之 故脈絡&#17436;滿如怒起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25235;而下之</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用法如前 然後以左手爪甲&#25488;其正穴 而右手方下針也 &#25235; 爪同 又平去二聲</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通而取之</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下針之後 必候氣通以取其疾 如下文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外引其門 以閉其神</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門 穴門也 此得氣出針之法 詳下文</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呼盡內針 靜以久留 以氣至爲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此詳言用補之法也 呼盡則氣出 氣出內針 追而濟之也 故虛者可實 所謂刺虛者 刺其去也 氣至義見後 爲故義如前</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如待所貴 不知日暮</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靜以久留 以候氣至 如待貴人 毋厭 毋忽也</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其氣以至 適而自護</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以 已同 適 調適也 護 愛護也 寶命全形論曰 經氣已至 愼守勿失 卽此謂也 義如下文</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候吸引針 氣不得出 各在其處 推闔其門 令神氣存 大氣留止 故命曰 補</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候吸引針則氣充於內 推闔其門則氣固於外 神存氣留故謂之補 調經論曰 補虛者持針勿置以定其意 候呼內針 氣出針入 針空四塞 精無從去 方實而疾出針 氣入針出 熱不得還 閉塞其門 邪氣布散 精氣乃得存 動氣候時 近氣不失 遠氣乃來 是謂追之 </span></p><p><span data-ke-size="size16">愚按近代用針撮要 凡足以發明本經 開導後人等法 有不可不知者 如用針之道 以氣爲主 知虛知實方可無誤 虛則脈虛而爲&#30306;爲麻 實則脈實而爲腫爲痛 虛則補之 氣至則實 實則寫之 氣去則虛 故用補用寫 必於呼吸之際 隨氣下針 則其要也 下針之法 先以左手&#25451;摸其處 隨用大指爪重按切&#25488;其穴 右手置針於穴上 凡用補者 令病人咳嗽一聲 隨嗽下針 氣出針入 初刺入皮 天之分也 少停進針 次至肉中 人之分也 又停進針至於筋骨之間 地之分也 然深淺隨宜 各有所用針入之後 將針搖動&#25619;彈 謂之催氣 覺針下沈緊 倒針朝病 向內&#25619;轉 用法補之 或針下氣熱 是氣至足矣 令病者吸氣一口 退針至人之分 候吸出針 急以指按其穴 此補法也 凡用寫者 令其吸氣 隨吸入針 針與氣俱內 初至天分 少停進針 直至於地 亦深淺隨宜而用 却細細搖動 進退&#25619;捻其針如手顫之狀 以催其氣 約行五六次 覺針下氣緊 卽倒針迎氣 向外&#25619;轉以用寫法 停之良久 退至人分 隨嗽出針 不閉其穴 此爲寫法 故曰 欲補先呼後吸 欲寫先吸後呼 卽此法也 所謂轉針者&#25619;轉其針 如&#25619;線之狀 慢慢轉之 勿令太緊 寫左則左轉 寫右則右轉 故曰 撚針向外寫之方 撚針向內補之訣也 所謂候氣者 必使患者精神已潮 而後可入針 針旣入矣 又必使患者精神寧定而後可行氣 若氣不潮針 則輕滑不知疼痛 如揷豆腐 未可刺也 必候神氣旣至 針下緊澁 便可依法施用 入針後輕浮虛滑遲慢 如閑居靜室 寂然無聞者 乃氣之未到 入針後沈重澁滯緊實 如魚呑釣 或沈或浮而動者 乃氣之已來 虛則推內進&#25619;以補其氣 實則循&#25451;彈怒以引其氣 氣未至則以手循攝 以爪切&#25647; 以針搖動 進撚&#25619;彈 其氣必至 氣旣至 必審寒熱而施治 刺熱須其寒者 必留針候其陰氣隆至也 刺寒須其熱者 必留針候其陽氣隆至也 然後可以出針 然氣至速者效亦速而病易&#30154; 氣至遲者效亦遲而病難愈 生者澁而死者虛 候氣不至 必死無疑 此因氣可知吉凶也 所謂出針者 病勢旣退 針氣必&#39686; 病未退者 針氣固澁 推之不動 轉之不移 此爲邪氣吸拔其針 眞氣未至 不可出而出之 其病卽復 必須再施補寫以待其氣 直候微&#39686; 方可出針豆許 搖而少停 補者候吸 徐出針而急按其穴 寫者候呼 疾出針而不閉其穴 故曰 下針貴遲 太急傷血 出針貴緩 太急傷氣也 所謂迎隨者 如手之三陰 從藏走手 手之三陽 從手走頭 足之三陽 從頭走足 足之三陰 從足走腹 逆其氣爲迎爲寫 順其氣爲隨爲補也 所謂血氣多少者 如陽明多血多氣 刺之者出血氣 太陽厥陰多血少氣 刺之者出血惡氣 少陽少陰太陰多氣少血 刺之者出氣惡血也 所謂子母補寫者 濟母益其不足 奪子平其有餘 如心病虛者補其肝木 心病實者寫其脾土 故曰 虛則補其母 實則寫其子 然本經亦有補寫 心虛者取少海之水所以伐其勝也 心實者取少府之火 所以泄其實也 又如貴賤之體有不同者 賤者硬而貴者脆也 男女之取法有異者 男子之氣早在上而晩在下 女子之氣早在下而晩在上 午前爲早屬陽 午後爲晩屬陰 男女上下 其分在腰 足不過膝 手不過&#32920; 補寫之宜 各有其時也 又如陰陽經穴 取各有法者 凡陽部陽經多在筋骨之側 必取之骨傍陷下者爲眞 如合谷三里陽陵泉之類是也 凡陰部陰經 必取於&#17411;隙之間 動脈應手者爲眞 如箕門五里太衝之類是也 至於針製有九 所以應陽九之數也 針義有五 所以合五行之用也 古人以&#30765;石 後人代以九針 其體則金也 長短小大各隨所宜 其勁直象木也 川原壅塞 可決於江河 血氣凝滯 可疏於經絡 其流通象水也 將欲行針 先摸其穴含針於口 然後刺之 藉我之陽氣 資彼之虛寒 其氣溫象火也 入針以按 出針以&#25451; 按者鎭其氣道 &#25451;者閉其氣門 其塡補象土也 諸如此類 皆針家之要 所不可不知者</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帝</span><span data-ke-size="size18">가 이르기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不足</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할 때 어떻게 </span><span style="color: #0000ff;" data-ke-size="size18">補</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는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岐伯</span><span data-ke-size="size18">이 이르기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8">先</span><span data-ke-size="size18">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8">&#25451;</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循</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先</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處</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25451;摸</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血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溫舒</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切</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散</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次</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指</span><span data-ke-size="size16">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切捺</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行散</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推</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按</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다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指</span><span data-ke-size="size16">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肌膚</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25545;按</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針道</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流利</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彈</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怒</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指</span><span data-ke-size="size16">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意</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곳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脈絡</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怒</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起</span><span data-ke-size="size16">하듯이 </span><span data-ke-size="size16">&#17436;滿</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25235;</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下</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用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前</span><span data-ke-size="size16">과 같이 한 </span><span data-ke-size="size16">然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左手</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爪甲</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正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25488;</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右手</span><span data-ke-size="size16">로 비로소 </span><span data-ke-size="size16">下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25235;</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爪</span><span data-ke-size="size16">와 </span><span data-ke-size="size16">同</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通</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8">取</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下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通</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下文</span><span data-ke-size="size16">과 같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疾</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取</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外</span><span data-ke-size="size18">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8">門</span><span data-ke-size="size18">을 </span><span data-ke-size="size18">引</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8">神</span><span data-ke-size="size18">을 </span><span data-ke-size="size18">閉</span><span data-ke-size="size18">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穴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得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下文</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呼</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盡</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內針</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靜</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8">久留</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至</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는 것을 </span><span data-ke-size="size18">故</span><span data-ke-size="size18">로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이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詳</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말한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追</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6">濟</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한 자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할 수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39;</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去</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39;</span><span data-ke-size="size16">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義</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볼지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삼는다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義</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前</span><span data-ke-size="size16">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8">貴</span><span data-ke-size="size18">한 자를 </span><span data-ke-size="size18">待</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다 </span><span data-ke-size="size18">日</span><span data-ke-size="size18">이 </span><span data-ke-size="size18">暮</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久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6">貴</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待</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다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厭</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忽</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그 </span><span data-ke-size="size18">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至</span><span data-ke-size="size18">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8">適</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스스로 </span><span data-ke-size="size18">護</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以</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已</span><span data-ke-size="size16">와 </span><span data-ke-size="size16">同</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適</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適</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調</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護</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愛護</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寶命全形論</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經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이르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愼</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守</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失</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말라</span><span data-ke-size="size16">.&quot;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으니 곧 이를 말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義</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下文</span><span data-ke-size="size16">과 같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8">吸</span><span data-ke-size="size18">을 </span><span data-ke-size="size18">候</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針</span><span data-ke-size="size18">을 </span><span data-ke-size="size18">引</span><span data-ke-size="size18">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8">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出</span><span data-ke-size="size18">하지 않도록 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各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span><span data-ke-size="size18">處</span><span data-ke-size="size18">에 있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span><span data-ke-size="size18">門</span><span data-ke-size="size18">을 </span><span data-ke-size="size18">推闔</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8">神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存</span><span data-ke-size="size18">하게 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8">大氣</span><span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data-ke-size="size18">留止</span><span data-ke-size="size18">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8">故</span><span data-ke-size="size18">로 </span><span data-ke-size="size18">命</span><span data-ke-size="size18">하여 </span><span style="color: #ff0000;" data-ke-size="size18">補</span><span data-ke-size="size18">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6">(</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引</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充</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推闔</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外</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神</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存</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留</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라고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調經論</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持</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置</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말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意</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定</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空</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四塞</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精</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去</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게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方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疾</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熱</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還</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고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閉塞</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布散</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精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存</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動氣</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時</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近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不失</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遠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이에 </span><span data-ke-size="size16">來</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追</span><span data-ke-size="size16">한다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quot;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내가 생각하건대 </span><span data-ke-size="size16">近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撮要</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히 </span><span data-ke-size="size16">本經</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發明</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後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開導</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等</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를 모르면 안 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道</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爲主</span><span data-ke-size="size16">로 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를 알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을 알면 비로소 </span><span data-ke-size="size16">誤</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없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脈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3030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脈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腫</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用補 用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呼吸</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際</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下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要</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下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p><p><span data-ke-size="size16">先</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左手</span><span data-ke-size="size16">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處</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25451;摸</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이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大指</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爪</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重按</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切&#25488;</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span><span data-ke-size="size16">右手</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穴上</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置</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病人</span><span data-ke-size="size16">에게 </span><span data-ke-size="size16">咳嗽</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一聲</span><span data-ke-size="size16">케 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嗽</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下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初刺</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皮</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天</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分</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少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進</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次</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肉中</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게 하며 </span><span data-ke-size="size16">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分</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또 </span><span data-ke-size="size16">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進</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筋骨</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間</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地</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分</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런데 </span><span data-ke-size="size16">深淺</span><span data-ke-size="size16">은 마땅함을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各 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바가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搖動 &#25619;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이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催氣</span><span data-ke-size="size16">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下</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沈緊</span><span data-ke-size="size16">한 것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倒</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朝</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向</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或 針下</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熱</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이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病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吸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一口</span><span data-ke-size="size16">케 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分</span><span data-ke-size="size16">까지 </span><span data-ke-size="size16">退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急</span><span data-ke-size="size16">히 </span><span data-ke-size="size16">指</span><span data-ke-size="size16">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것이 </span><span data-ke-size="size16">補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吸氣</span><span data-ke-size="size16">케 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와 같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初</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天分</span><span data-ke-size="size16">까지 이르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少停</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進</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直</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地</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게 하니 또한 </span><span data-ke-size="size16">深淺</span><span data-ke-size="size16">은 마땅함을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細細</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搖動</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進退</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捻</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狀</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催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대략 </span><span data-ke-size="size16">五六次 行</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針下</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緊</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곧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倒</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迎</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外</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向</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寫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良久</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退</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人分</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이르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嗽</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閉</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것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寫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先</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先</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quot;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으니 곧 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轉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되 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6">線</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듯한 </span><span data-ke-size="size16">狀</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慢慢</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太緊</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안 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左</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左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右</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右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이르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撚</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外</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向</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方</span><span data-ke-size="size16">이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撚</span><span data-ke-size="size16">할 때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向</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訣</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6">.&quot;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候氣</span><span data-ke-size="size16">란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患者</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精神</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潮</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또한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患者</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精神</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寧定</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行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만약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潮</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으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輕滑</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不知疼痛</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6">豆腐</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揷</span><span data-ke-size="size16">하듯 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안 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神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針下</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緊澁</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곧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의해 </span><span data-ke-size="size16">施用</span><span data-ke-size="size16">할 수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輕浮 虛滑 遲慢</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6">靜室</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閑居</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寂然</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無聞</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듯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到</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은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沈重 澁滯 緊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마치 </span><span data-ke-size="size16">魚</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釣</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呑</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或沈 或浮</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動</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듯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來</span><span data-ke-size="size16">한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推</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內</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進</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循&#25451;</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彈怒</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引</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未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循攝</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爪</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切&#25647;</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搖動</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進撚</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 </span><span data-ke-size="size16">&#25619;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寒熱</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審</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施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熱</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寒</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留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陰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隆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寒</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熱</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留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陽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隆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然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할 수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런데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速</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效</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또한 </span><span data-ke-size="size16">速</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쉽게 </span><span data-ke-size="size16">&#30154;</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至</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遲</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效</span><span data-ke-size="size16">가 또한 </span><span data-ke-size="size16">遲</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어렵게 </span><span data-ke-size="size16">愈</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生</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경우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澁</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경우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候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도 </span><span data-ke-size="size16">不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疑</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못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처럼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로 인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吉凶</span><span data-ke-size="size16">을 알 수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이란 </span><span data-ke-size="size16">病勢</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退</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針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3968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未退</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針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固澁</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推</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도 </span><span data-ke-size="size16">不動</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轉</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도 </span><span data-ke-size="size16">不移</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는 </span><span data-ke-size="size16">邪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吸拔</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眞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未至</span><span data-ke-size="size16">한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不可</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病</span><span data-ke-size="size16">을 바로 다시 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補寫</span><span data-ke-size="size16">를 다시 </span><span data-ke-size="size16">施</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待</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야 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直</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微&#39686;</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야 비로소 </span><span data-ke-size="size16">豆許</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할 수 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搖</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少停</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다가</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吸</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徐</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急</span><span data-ke-size="size16">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呼</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候</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疾</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그 혈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閉</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下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遲</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貴</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여기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太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傷血</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出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緩</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貴</span><span data-ke-size="size16">하게 여기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太急</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傷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quot;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迎隨</span><span data-ke-size="size16">란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三陰</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藏</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走</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三陽</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頭</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走</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三陽</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頭</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走</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三陰</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腹</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走</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逆</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迎</span><span data-ke-size="size16">이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順</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隨</span><span data-ke-size="size16">이고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血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多少</span><span data-ke-size="size16">란 </span><span data-ke-size="size16">陽明</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多血多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血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太陽 厥陰</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多血少氣</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少陽 少陰 太陰</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多氣少血</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소위 </span><span data-ke-size="size16">子母</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補寫</span><span data-ke-size="size16">란 </span><span data-ke-size="size16">母</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濟</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不足</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益</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子</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奪</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有餘</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平</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心病</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肝木</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心病</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脾土</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故</span><span data-ke-size="size16">로 </span><span data-ke-size="size16">&quot;</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母</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子</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寫</span><span data-ke-size="size16">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6">.&quot; </span><span data-ke-size="size16">하였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그런데 </span><span data-ke-size="size16">本經</span><span data-ke-size="size16">에도 </span><span data-ke-size="size16">補寫</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心</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虛</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少海</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水</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取</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伐</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 때문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心</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少府</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火</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取</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實</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泄</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 때문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또 </span><span data-ke-size="size16">貴賤</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體</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不同</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賤</span><span data-ke-size="size16">한 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硬</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貴</span><span data-ke-size="size16">한 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脆</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男女</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取法</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異</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男子</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上</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早</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下</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晩</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女子</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下</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早</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上</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晩</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午前</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早</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 </span><span data-ke-size="size16">陽</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屬</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午後</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晩</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 </span><span data-ke-size="size16">陰</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屬</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男女</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上下</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分</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腰</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있으니 </span><span data-ke-size="size16">足</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過</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고 </span><span data-ke-size="size16">手</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32920;</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過</span><span data-ke-size="size16">하지 않으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補寫</span><span data-ke-size="size16">의 마땅함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各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時</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또 </span><span data-ke-size="size16">陰陽</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經穴</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各 取</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span><span data-ke-size="size16">法</span><span data-ke-size="size16">이 있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陽部 陽經</span><span data-ke-size="size16">은 대부분 </span><span data-ke-size="size16">筋骨</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側</span><span data-ke-size="size16">에 있으니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骨 傍</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陷下</span><span data-ke-size="size16">한 곳이 </span><span data-ke-size="size16">眞</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合谷 三里 陽陵泉</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類</span><span data-ke-size="size16">가 그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陰部 陰經</span><span data-ke-size="size16">은 반드시 </span><span data-ke-size="size16">&#17411;隙</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間</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取</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span><span data-ke-size="size16">動脈</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應手</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는 곳이 </span><span data-ke-size="size16">眞</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箕門 五里 太衝</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類</span><span data-ke-size="size16">라 그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製</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九</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陽九</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數</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應</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 때문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p><p><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義</span><span data-ke-size="size16">에는 </span><span data-ke-size="size16">五</span><span data-ke-size="size16">가 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五行</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用</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合</span><span data-ke-size="size16">하기 때문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古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30765;石</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後人</span><span data-ke-size="size16">은 </span><span data-ke-size="size16">九針</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span><span data-ke-size="size16">代</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體</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金</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長短 小大</span><span data-ke-size="size16">는 </span><span data-ke-size="size16">各 </span><span data-ke-size="size16">마땅한 바를 따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勁直</span><span data-ke-size="size16">함은 </span><span data-ke-size="size16">木</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川原</span><span data-ke-size="size16">이 </span><span data-ke-size="size16">壅塞</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江河</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決</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血氣</span><span data-ke-size="size16">가 </span><span data-ke-size="size16">凝滯</span><span data-ke-size="size16">하면 </span><span data-ke-size="size16">經絡</span><span data-ke-size="size16">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6">疏</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流通</span><span data-ke-size="size16">함은 </span><span data-ke-size="size16">水</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行</span><span data-ke-size="size16">하려면 </span><span data-ke-size="size16">先</span><span data-ke-size="size16">으로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穴</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摸</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口</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含</span><span data-ke-size="size16">한 </span><span data-ke-size="size16">然後</span><span data-ke-size="size16">에 </span><span data-ke-size="size16">刺</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나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陽氣</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藉</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다른 사람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虛寒</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資</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溫</span><span data-ke-size="size16">함은 </span><span data-ke-size="size16">火</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入</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按</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針</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出</span><span data-ke-size="size16">하여 </span><span data-ke-size="size16">&#25451;</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按</span><span data-ke-size="size16">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道</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鎭</span><span data-ke-size="size16">하고 </span><span data-ke-size="size16">&#25451;</span><span data-ke-size="size16">은 그 </span><span data-ke-size="size16">氣</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門</span><span data-ke-size="size16">을 </span><span data-ke-size="size16">閉</span><span data-ke-size="size16">하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그 </span><span data-ke-size="size16">塡補</span><span data-ke-size="size16">함은 </span><span data-ke-size="size16">土</span><span data-ke-size="size16">를 </span><span data-ke-size="size16">象</span><span data-ke-size="size16">하느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이러한 모든 </span><span data-ke-size="size16">類</span><span data-ke-size="size16">는 모두 </span><span data-ke-size="size16">針家</span><span data-ke-size="size16">의 </span><span data-ke-size="size16">要</span><span data-ke-size="size16">이니</span><span data-ke-size="size16">, </span><span data-ke-size="size16">모르면 안 되는 것이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6">.)</span></p>
<!-- -->
카페 게시글
10. 침자류
14. 經脈應天地 呼吸分補寫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18
24.01.03 13:5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