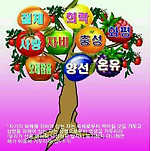<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의 재래종교와 기독교에 관한 연구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 례</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서 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문제제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연구방법 및 방향성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무속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무속신앙의 기본구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世界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宇宙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人間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儀式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歌舞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과 강신무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ecstacy) 2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상징으로서의 무속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마을 공동체의 주재자로서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2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무속신앙이 한국재래종교에 끼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불교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유교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도교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한국인의 심성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타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依他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수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保守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명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사의식의 결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5</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락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娛&#63836;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7</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성서 속에 나타난 무속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0</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신약의 관점에서 본 무속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0</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구약 속에 나타난 무속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무속신앙과 기독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신앙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앙 생활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복적 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윤리적 현실 생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降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주의 신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각적 체험 생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한 교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에 대한 신당 개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0</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화된 부흥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량주의적 가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배 의식에 미친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5</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열된 예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5</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방관자로서의 예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복적인 예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적 신앙이 일어나는 이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계적인 신비주의적 종교현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0</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사회의 불안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순절주의의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극적 사고 방식의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 성장 신학의 영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초대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수용 형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7</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과 기독교의 차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5</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도와 축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설교와 공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찬송과 가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현상에 대한 목회적 대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5</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무속에 대한 평가와 기독교의 토착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에 대한 평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에 대한 역사적 평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9</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에 대한 기독교의 평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과 기독교의 만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0</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기독교 문화와 토착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교회와 복음의 토착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착화의 성경적 근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착화의 과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독교와 한국 무속신앙의 수용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요약 및 결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 고 문 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서 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문제 제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독교의 역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음의 문화적 전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轉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역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음이 어느 문화권에 선포되든지 복음이 그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수용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복음과 문화의 만남에서 현상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과 문화의 만남으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형성되어 그 문화가 생기를 되찾고 복음도 그 문화 토양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화권에서 태동했던 복음의 씨앗이 헬라 문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틴 문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앵글로색슨 문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문화에서 그러했음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는 어떠한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땅에서 천주교의 역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이 넘고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이 넘은지 오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시점에서 볼 때에 선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의 연륜을 헤아리는 한국 교회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괄목할 만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별히 교회 성장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한편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 자체에서 자성과 참회의 소리가 드높고 외부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물량 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복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의 대형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기적 개인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교회 중심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헌금 양태와 그 용도 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학교 난립 문제와 그에 따른 목회자의 자질 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파 분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 난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직된 보수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율법 및 교회 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비적 열광 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앙과 생활의 불일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원론적 신앙생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속화 등을 들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한국 교회의 병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잘못 정립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토속신앙에 침식되고 동화되므로 복음적 신앙을 잃지 않았는지 반문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환언하면 기독교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크게 변혁시키거나 대치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침식되고 습합된 점이 많음을 보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독교 신앙이 한국인 신앙의 형태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잘못 정립된 다섯가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①</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복적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②</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혼합적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③</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인주의적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④</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타계적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⑤</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거 지향적 신앙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적된 비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구조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선 자리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로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땅 위에 기독교 문화가 과연 어느 정도 정착해 왔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 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의 정착 없이는 복음의 정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한민족의 복음화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이 질문은 한국 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는 기독교의 위치를 찾아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질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도입의 연한이 다른 재래 종교와 비교해서 짧으니 만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떻게 기독교가 한국 문화 주류에 자리잡고 정착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문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한국 문화와는 전혀 이색적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수용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떻게 적응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떠한 변모를 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서양 옷을 입고 온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옷을 입을 수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적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안은 한국의 개화기로서 서구 문화와 문명을 수용하는 시기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경시한 것이 사실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기독교 복음의 본질상 한국 재래의 구습과 미신을 타파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한국의 토속적 신앙이나 전통 문화는 무시되고 기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한국 기독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토양인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전래 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인의 종교심성과 의식구조를 깊이 성찰하고 거기에 맞는 선교 전략이 기독교회가 복음이나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 문화와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소한 전통 문화의 내용은 거부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담은 형식은 벗어날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한국인의 전통적으로 공유하는 문제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유 방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서에 뿌리 박힌 표현 등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신학을 정립할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한국적 신학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연구 방법 및 방향성</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독교가 한국 땅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첫째는 개종자가 자기의 전통적 문화나 종교적 유산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새로 도입된 기독교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형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떻게 보면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중에는 전통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무시하거나 기독교적 문화로 대치하려는 경향성이 강했다고 할 수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로 개종한 사람들도 서양식으로 사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다른 극단은 기독교를 한국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의 하나로 취급하여 전통 문화 속에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라의 주권과 개화에 이용한 듯한 초대 급진적 기독교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초기의 전형적인 기독교의 수용 태세는 전자에 가깝다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의 과거와 전통에 대해 전적으로 이를 거부하려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형성되고 몸담아 온 자기 문화에 대해 건설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른 한편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입장은 서구의 기독교를 흉내낼 뿐 진정한 주체적 기독교 이해는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태도 때문에 전통적 문화나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행태를 택하건 종합이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록 전통 문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 무속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거절하는 입장에 서 있었을지라도 한국 전통 문화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중에서도 무속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은 중요한 민간 신앙으로서 한국인의 편재된 종교 현상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온 살아 있는 신앙 체계로서의 무속은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유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온 것이 사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종교 현상의 특이점으로 모든 종교의 무속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말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대한 평가를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과 복음의 대치 현상은 한국 문화의 서구화 경향과 발맞추어 복음의 일방적인 이김으로 평가되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통용되었던 판단을 내용적인 수용과 창조적인 상호 변형의 종교학적인 살핌을 통하여 재고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골의 촌락에서는 무속의 만신과 무당들의 기능을 기독교의 사제나 목사들이 단순하게 대체하는 경향이 짙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랫동안 당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堂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통하여 익숙해 있던 공동체적인 말을 지도자로서의 큰무당의 기능을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이어받은 일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역기능성도 많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제로 종교현상 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 백 년의 선교 역사를 통하여 선사 시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한국의 종교 현상 위에 껍데기를 두르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질그릇의 겉에 외피로 도금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용적인 침식 과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안목에서 무속과 복음의 만남은 기층 문화적인 합류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조적인 과정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기독교의 자리 매김을 위한 생명선과 같은 숭고한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비바람과 폭풍이 닥쳐오면 넘어지거나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본고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판단을 위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수용할 한국 전통 문화의 실체와 그 기본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이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와 한국인의 심성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음이 한국에 전래되면서 어떻게 토착화되어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인의 무속적인 심성과 전통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며 극복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무속 신앙</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 종교를 크게 분류하면 불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 및 기독교와 같은 기성 종교와 동학을 효시로 하여 발행한 증산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종교와 같은 신흥종교와 항간에서 전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점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占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풍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風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민간신앙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한국의 기층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기성 종교나 신흥종교가 아니라 민간신앙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민간신앙은 고대로부터 민간에 전승되어 온 주술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呪術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종교적 복합체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민간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무속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H. B. Hulber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제국사 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대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인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앙은 원시적인 영혼 숭배 사상이며 그 밖의 모든 문화는 그러한 신앙 위에 기초를 둔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말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서 원시적인 영혼 숭배라 함은 정령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精靈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마니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배물교적 미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拜物敎的 迷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및 자연 숭배 사상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동식 교수도 그의 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종교와 기독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인의 심성을 결정한 것은 무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한 예로서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를 들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군신화는 샤머니즘의 창작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말 고려의 충렬왕 시대에 보각국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一然</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편찬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三國遺事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속에 기록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話</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이것은 한갓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佛僧</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은 한국에 부족국가가 형성되던 고대 조선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의 기록이라고 보아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말해서 불교 이전의 샤머니즘 시대에 형성된 이야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政一致時代</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부족사회 형성 신화라는 점에서 이것은 당시의 신앙이었던 샤머니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대체로 일치된 것은 최남선의 해석에 따라 단군이 무당이라는 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군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무당의 칭호의 하나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사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寫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蒙古語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Tengri</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공통되는 말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텐그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崇天者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곧 무당의 뜻을 가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단군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政一致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대의 정치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軍長</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동시에 종교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서의 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ham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백산이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589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589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을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곧 샤머니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主神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나님을 제사하는 산이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檀樹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곧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낭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木</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城邑</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꾸미었다는 이야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고 보면 단군신화는 전혀 샤머니즘이 낳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開國神話</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것이 분명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고대로부터 한국에 전해 오는 신화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로 샤머니즘은 한국 문화 형성의 바탕을 흐르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 속을 흘러 온 하나의 뿌리 깊은 한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通俗信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동식은 이어 한국에 전래된 모든 외래종교는 무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종교적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마디로 한국인의 사상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빔밥 철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주장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한국 사상의 맨 밑바닥에는 토속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土俗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무교가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위에 일천 년 역사를 가진 불교 신앙이 얹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위에 기독교 신앙과 서구 사상이 곁들여 있다고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무교에 대한 이해 없이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는 이 무속 신앙은 대단히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종교와 사상을 변질시켜 버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의 무속 신앙은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후에는 외래의 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내면으로 숨어버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고 내면에 살아 있어 결국은 외래종교를 무속화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무속 신앙의 기본 구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무속 신앙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심성에 그토록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속의 의미와 세계관을 살펴보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정의</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은 신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ham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적 종교현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이 무속 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haman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애니미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Animism)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비타이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Vital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기초로 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애니미즘은 모든 물체에 애니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anima)</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자연숭배 또는 정령숭배의 원시종교로서 일종의 다령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olydemnnism,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多靈神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을 한국 고유의 종교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아니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실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시베리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몽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 등 우리 주변의 여러 민족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현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의 범세계적인 보편적 원시종교 현상임이 드러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류학자 캠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J. Campbell)</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의하면 샤머니즘은 대략 구석기시대 말에 발생한 종교현상으로 생각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이 한반도에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먼이란 용어는 흥분하는 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발하는 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동하는 자 등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마니즘 연구가 에라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Eliade)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수는 샤머니즘을 정의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엑스타시의 고대적 기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곧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황홀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하여 무교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와 춤으로서 신령을 섬기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융합됨으로써 신령의 힘을 빌어 재앙을 없애고 복을 초래하자는 한 원시종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에서는 샤머니즘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敎</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부르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교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한자의 구성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의 위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하늘 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뜻하는 것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땅 또는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한 가운데 내려그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73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人間</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면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둘이 들어서 있는 것은 바로 춤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敎</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무당을 통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人合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케하는 종교현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의 샤먼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873;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萬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丹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女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의 이름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男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표시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卜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석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卜脚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의 이름으로 각각 불려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밖에도 명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鳴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侶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은 칭호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헌상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師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國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차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次次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仙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의 칭호가 나타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世界觀</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종교사상은 고등종교의 그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무속신앙에서 교리적 이론 체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교의 교리 체계는 체험의 내용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논리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여건이 하락되지 않는 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사회에는 그와 같은 여건이 주어지지 못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직도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무속 신앙에도 그 나름의 사상적 표현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사상 현상은 샤먼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經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표현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에 있어서도 사상적 표현의 내용은 우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의 세 실재의 관계가 그 초점이 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宇宙觀</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먼의 모든 사상적 표현의 밑바닥에는 원시적인 애니미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anim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애니미즘은 사람은 물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정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anima)</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힘입어 존재한다고 믿는 정령신앙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애니미즘에 의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적이며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정령은 인간과 자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은 나무나 큰 바위에는 강대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애니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보다도 강하거나 날랜 동물에게도 신비한 애니마가 있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나 빛나는 태양에도 신비롭고 위대한 애니마가 있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목 숭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옥 숭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체 숭배 등의 여러 가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숭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주술적 의식의 밑바닥에는 이같은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애니미즘의 세계는 생명의 사회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갈등과 힘의 세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애니미즘적 세계는 모든 인간과 만물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呪術的 因果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서로 얽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이같은 정령의 세계에는 우연한 일이란 하나도 있을 수 없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물은 살아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애니미즘의 세계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기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생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은 것이란 존재할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종교 사상은 이러한 원초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에 의하면 우주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上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地上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地下界</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삼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상계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光明界</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地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그 부하인 제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諸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이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상계는 중간세계로서 이에는 인류를 비롯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禽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蟲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草木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군생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하계는 암흑계로서 악신과 악령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같은 삼층 구조의 우주관은 시베리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몽고 등지의 샤머니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우주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트란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trance)</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형의 샤머니즘에서는 샤먼의 우주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특기를 지니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먼의 이같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交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그들이 믿는 우주적 구조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트란스형의 샤먼이 우세한 지역의 샤머니즘에서는 우주관이 비교적 복잡하게 발달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빙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憑依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possessio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형의 샤먼이 우세한 우리 나라의 샤머니즘에 있어서는 우주관이 비교적으로 약한 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트란스적 엑스터시 체험에 있어서 샤먼의 영혼은 신체를 떠나서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령의 세계로 비상 또는 하강하는 우주여행을 하게 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빙의적 엑스터시 체험에 있어서는 밖에서 신령이 샤먼에게 찾아와서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주관에 대한 관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觀</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haman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정령들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게 편재해 있으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계되는 여건들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일반인은 그 영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없고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여기며 그 영역이나 존재가 두려운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이 신적 영역과 그 안에 신들을 접촉할 수 있는 자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 자가 샤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은 영들과 직접 교통하는 자로서 영계를 탐지하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제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 등으로 재앙을 물리치며 복을 가져다주는 사제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에서 신앙 대상이 되고 있는 신령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에 의하면 이 천지간에는 무수한 신령과 악령들이 가득차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무속 신앙은 다령숭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oly-demonism)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다신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oly-the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인 원시종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무속의 신령관은 아주 복잡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태곤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7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①</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거리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神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③</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당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上祭神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④</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家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무수한 신령들을 그 계보에 따라 분류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地神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人神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雜鬼系</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각각 나누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무속의 신앙 대상의 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日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月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星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地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山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水神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자연계의 신령들로 나타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연신계가 우세한 것은 한민족의 오랜 전통적인 농경적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문화 속의 신은 특히 인간 주위의 어둡고 한적한 곳에 있으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공동묘지와 같은 곳은 묘지에 묻힌 시신들의 영이 귀신이 되어 그 주위에 항상 머문다고 여겨 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산은 영들이 살고 있으며 죽은 자들의 영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죽은 혼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죽은 자의 장지를 산으로 택하는 것으로 살아서 아직 세상에서 활동하는 일상의 영역에서 분리된다는 개념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세계에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高低</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순위가 없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至上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하느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하고 그 밑에 지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신 등이 각각 특정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상계에는 하느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신 등이 있어 다스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상계에는 지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풍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신 등이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하계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十王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비롯하여 여러 신령들과 악령 악귀들이 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각기 그 직분을 담당할 뿐 다른 신령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령들 사이의 횡적관계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신령들의 경향은 전통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이들 신령은 초인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전지전능한 존재는 결코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령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人間觀</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에는 인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92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肉</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産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점지하고 잘 자라게 도와준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면 밥과 미역국을 이 신령에게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에 의하면 인간의 생사 회복 흥망성쇠는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신령들의 작용으로 좌우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테면 북두칠성은 인간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壽福</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다스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帝釋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어린이들을 수호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大監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재복을 가져다 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4004;地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주부를 수호한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마는 호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胡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질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盲人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신병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精鬼</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탈로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체 질병은 악령의 탈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祖靈</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벌로 오는 것으로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인간의 모든 길흉은 오로지 외부의 신령들의 작용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나 그 영혼만은 없어지지 않고 저승으로 간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혼백이 셋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후에 그 하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下界</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른 하나는 묘지 속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지막 하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家廟內</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위패 속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에 영혼 불멸의 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의 혼백은 죽은 후에 바로 저승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척과 천지들에게 불안과 괴로움을 준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儀式</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실제적인 행위를 통하여 표현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일컫는 제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은 무속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 현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반적으로 무속의 제례를 총칭하여 굿이라고 부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엄격히 말하면 굿은 가무가 따르는 큰 규모의 제례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치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致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으로 부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중간 규모의 제례로는 푸닥거리와 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告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푸닥거리는 병자나 흉조가 발생하였을 때에 재화를 소멸하고 길복을 기원하기 위한 제의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사는 길복을 더욱 증진하고 재화를 소멸하기 위한 제의행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儀</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초인간적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呪力</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지닌 행사로 확신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무속은 굿거리로써 공사간의 인생만사를 소원대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점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儀</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예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worship)</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기보다는 차라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呪術</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더 가까운 행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儀</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의식화된 주술 또는 주술적 의식이 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은 종교 이전의 단계에 속하는 초자연적인 힘의 조종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먼은 굿거리를 일종의 원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archetype)</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 의식행위로서 반복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먼은 굿거리의 특수기능을 지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전문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의의 기계적 반복행위를 통하여 샤먼은 사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치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락 등의 그 직능을 행사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은 샤먼에게 있어서 가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조적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교 행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샤먼은 아기의 출산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産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병들었을 때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病</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혼사에 혼인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초상엔 자리거지를 지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밖에도 복을 비는 재수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득남을 기원하는 칠성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풍어를 비는 풍어제와 용왕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망자의 넋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樂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천도시키기 위한 진오기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자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왕굿 그리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入巫祭</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내림굿 등 무수한 굿거리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 굿거리는 그 동기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祈福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治病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死靈祭</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크게 나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굿거리의 최대 관심사는 기복과 양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禳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있다고 보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歌舞</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적 샤머니즘의 특징이라 한다면 한국 샤머니즘에 있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歌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것이 문화적 단계에까지 발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역사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三國志</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魏志 東夷傳</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한국 고대사회의 축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기에 보면 직접 샤머니즘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축제에서 신을 제사지내는 데에 가무가 거의 함께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책은 중국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眞髓</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지은 것이지만 당시의 한국인의 의례 생활에 관한 귀중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서 신과 가무의 관계가 밀접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무는 한국인 의례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이라는 것은 한국 민속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 민속문화 안에서 춤의 강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조시대는 유교가 가무를 극히 제한하던 시대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극히 제한을 받던 여성사회에서 샤머니즘을 통해서 춤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과 샤머니즘을 결부시키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결합관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춤에도 구조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음악적 요소의 분석이나 악보상의 문제로 접근된 것이 아니고 기호학적 시각에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굿에서 전체의례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전체의례를 구성하는 가장 독립적 단위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진행과정을 살펴 보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거리의 시작은 우선 음악과 춤으로만 진행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무녀는 아무런 가사를 노래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나 관중에게 낯을 익히는 과정이고 그 의례의 서주부에 해당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느린 행동이나 춤을 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단에 절을 하는 것도 이때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에 이어서 무녀는 노래와 춤을 두 가지로 구분되어 행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를 노래하고 이때 장단은 반주로 변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을 하는 연유나 정성드리는 목적을 구술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는 거의 정지상태에서 한 다음에 비교적 느린 춤을 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이 한 단계 더 빨라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단계에서는 노래의 가사는 거의 알아들기 어려워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다음 단계에서는 노래와 춤이 함께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템포도 한 단계 더 빨라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악은 더 크고 템포도 빠른 상태에서 무가가 구송되기 때문에 무가의 내용 전달은 오랫동안 굿을 보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지 짐작도 하기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일 이때 새로 나타나 굿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리뿐이고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손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짓이며 굉음적 음악뿐이라고 느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이 발광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의 무가는 정해진 스토리가 아니고 무녀의 즉흥적인 축원의 짤막한 반복적인 것이 대부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주시고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명장수 주시고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의 반복이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대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잘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소리가 나오거나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녀의 춤은 머리 위에서 앞뒤로 젓는 단순한 반복동작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 충혈된 상태로 되어 무가를 창하지 않고 무악과 춤만이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는 신이 내렸거나 왕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에게 신복이나 벌을 주는 의례를 행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의 노한 표정과 위엄을 보이는 행위도 이때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과 무언극 등으로 이 장면이 연극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끝나면 신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무녀의 무가가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끝나면 마을이나 개별적으로 축원하여 주는 시간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인기도와 같은 성격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녀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거두거나 축원하는 장면이지만 개별적으로 특별히 축원하여 주는 것이 상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축원의 양식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헌금이나 축복기도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기도가 끝나면 거리의 마지막이며 끝맺음이라 할 수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부치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간단한 의례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녀가 술잔을 들고 잡귀잡신들을 간단히 향응시켜 보내는 의미의 형식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이것이 끝나면 담당무녀는 무복을 벗고 완전히 거리를 끝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복을 입는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사람이라는 뜻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벗은 상태는 일상적 상태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에 예를 든 굿의 거리의 형식을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모든 거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그러한 동일한 구조 안에서 삽입과 생략 등에 의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구조적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거리가 보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 합쳐져 전체의 의례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성립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거리의 구조를 단순화 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①</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는 없고 춤만 있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②</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와 춤이 교차적으로 행해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③</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의 것이 템포의 단계적 변화가 있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④</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순한 가사의 반복과 괴성 그리고 춤의 형태의 파괴적 작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⑤</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스러운 신의 축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와 축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의 회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⑥</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을 보냄의 순서로 단순화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구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노래가 일상적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code</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서 행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는 춤의 아름다움과 구송 및 노래가사의 분명한 전달력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 단계에서는 춤은 격렬하거나 연극적 요소를 짙게 띤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래나 구송의 전달력은 약해지고 행동이 주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언극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첫단계의 언어적 행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verbal performance)</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두번째 단계의 비언어적 행연으로의 변화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구조는 일상적 차원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한국문화와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의식구조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극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어라 할말을 잃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표현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말을 버리고 울어버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주 기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을 잃고 웃음의 구조에서 우는 현상이 벌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contex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code</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변화를 가져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한국문화나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과 강신무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ecstacy)</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신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탄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째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무과정에서 나타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상적인 인간이 변하여 신의 사제적 기능인으로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할 것도 없이 무병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신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떤 학습이나 수도의 결과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병적 현상으로 인하여 자기 의식을 잃는 신비스러운 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일상성에서 질서의 혼란을 상징하는 병적 현상을 통해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째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에서 나타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의 과정의 첫단계에서는 일상적인 구송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때로는 서사적인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춤이 점점 템포를 빨리하고 드디어는 격렬한 음과 도무의 상태에 이르러 노래도 가사도 없는 극단적인 도취상태에 이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녀는 이러한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을 잃고 신의 자격을 획득하여 신의 말을 전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두 단계를 의도적으로 구분한다면 서사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정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토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편적 축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음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의식 등의 대조를 보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째 단계를 종합적으로 말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의 무의식적 도취상태에서 신의 자격으로 서정적이고 단편적인 무가만이 행해지면서 격한 춤을 추는 소음적 장면을 상기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신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둘째의 장면이 보다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굿의 형식이 아무리 간소화되었다고 하여도 그 과정은 생략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간단한 의례에서는 노래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춤과 도무의 뚜렷한 대조가 돋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상징으로서의 무속신앙</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 신앙은 개인의 원한뿐만 아니라 사회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 민중의 원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살아서 원한이 많은 사람은 죽어서 그 원한이 종교적 신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형식으로 인간에게 작용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죽어서 원혼이 되어 복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민중의 입장에서 더욱 상징화하고 있음이 주목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나라 무속에서 신앙되고 있는 인물 중에는 최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崔&#6391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군과 장보고를 들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부이북 무속에서는 최영 장군을 신화하여 모시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성의 덕물산에는 최영사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원혼의 탈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전남 완도에서는 장섬에 장보고를 부락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을에서는 이 신을 위한 부락제를 지내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자는 고려 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후자는 신라 말에 있었던 사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아직도 시대를 초월하여 민중의 신앙으로 경배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보고는 자신이 충성을 다한 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영은 뜻을 같이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되어 죽음을 당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여기서 민중의 원한이 투영되고 있다는 살아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동일시를 느낄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억울하게 죽은 것을 위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살아 있는 민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들은 생활에서 항상 모순을 느끼면서 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을 추상화한다면 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말로 표현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의 두 인물신의 경우를 들어 분석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영은 위기에 있는 국란을 평정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그 개인의 차원을 넘은 것은 물론 가족의 차원을 훨씬 넘은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흔히 큰일이기도 해도 사회를 위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에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가적이라는 것이 판단될 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한 것만으로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간적인 공적일 뿐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적인 공적은 인간적인 역사책에는 기록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이 신앙화되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것이 조건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가 하자는 일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한은 크고 넓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인간의 원한도 있을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그것은 상호간의 폭이 너무 좁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떤 여인이 시집살이가 심해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계제도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에게 가지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의 부계제에 대한 한으로 추상화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여성의 죽음은 남성의 죽음보다 원한이 많은 것이 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많은 이 세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불려지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같이 한이 깊이와 폭을 가질 때 신앙의 대상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셋째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혈연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은 억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삼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三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멸하는 법에 따라 후손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혈족이 있다고 해도 조상으로 받들기 어려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어도 이러한 사람이 시조신으로 받들어진 사례는 보지 못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일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면 사회적 신으로 되기보다는 가족신에 머물러버리고 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그들은 집에서 임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臨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객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타살 등에 의한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의 가족환경이나 죽을 당시의 세세한 상황은 모두 원사라는 개념 안에 매몰되어 버려 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를 요약하고 좀더 추상화하면 가족을 떠나서 큰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무속에서 모신다는 것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이것이 보다 깊은 구조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가정을 벗어나서 큰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이 한의 상징이고 한을 푸는 메커니즘이라 보는 것이 현상적인 설명이라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억울하게 죽는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무속신앙의 근본구조인 동시에 우리 문화의 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큰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대한 일을 소신대로 밀고 나가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민중의 마음속에 살 수 있다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종교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화적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무속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심성이라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구병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救病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푸닥거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사령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死靈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맺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病</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恨</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풀어 주는 치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푸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pudak)</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원래 장애물을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 속에서 민중의 삶을 차단하고 있는 것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죽은 영혼까지를 붙들고 있는 말못할 억울한 사실들을 풀어 헤치는 것이 무속의 본래적인 기능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하여 무속은 민중의 한을 해체하려는 희망의식에서 출발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민중은 굿을 통하여 삶에서 충족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하여 인간은 신령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원초적인 신화 속에서 무제한의 창조와 생산능력을 가지게 되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의 제전을 통하여 현실적인 모든 제약을 넘어서서 고향상태인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굿은 현실과 이상을 매개하고 민중의 희망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산력과 실천의 힘을 가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 사령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死靈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의 굿은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한 그 영혼을 불러 억울한 사정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넋두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넋두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바로 맺힌 한이 일시에 풀어지게 하는 해한작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解恨作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말못할 사정을 발설하는 고발행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넋두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한맺힌 죽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하여 이 죽음은 이제 삶의 끝과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창조로 이어지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푸닥거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살풀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 따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보면 죽은 이의 한을 풀거나 잡귀를 몰아내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구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적든 많든 한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죽게 된 한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한을 가지고 죽으면 그것이 신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붙거나 그것이 신이 될 힘이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 자신들의 생활을 보더라도 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은 거의 전부가 어릴 때부터 불행하고 고통에 찬 생활을 해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의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가정 자체도 파탄되고 사회적으로 천한 위치에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릴 때부터 자신의 안전감은 상실되어 있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자의 경우는 남존여비 사상에 젖은 부모들로부터 천대받기 일쑤였고 이런 경향은 커서도 마찬가지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서 혹은 부모의 인식이 모자라서 그들은 배움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간혹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있으나 부모의 성격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리적으로 불행했던 그들은 불안과 갈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여건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혹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부터 히스테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신분열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은 심인성 신체장애를 앓고 있었던 경우가 태반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의 생활사에 있어서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감정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핍박자로 무의식계에 존재하기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개심은 문제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들의 강신몽이나 종교체험에서 동성의 부모를 상징하는 존재로부터 핍박을 받는 내용이 많은 것도 어린 시절부터 적개심이 문제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특징을 지닌 무당들의 생활사는 한마디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의 고통스런 정신과적 질환은 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표현에 불과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무당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조직인 무속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무속의 가치관에 투사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의미를 찾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될 때 그들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곧 신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광일은 무당들이 바로 이러한 신병이란 해리를 통해서 자기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고 주장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무병의 의미 중에는 열등의식을 보상하는데 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로부터의 천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으로서의 무력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낮은 사회계급 이런 여건들은 유아기부터 열등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결과 여러 형태의 정신질환까지 생기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의 결혼이란 상징적 과정을 통하여 신과 동격이 되면서 스스로가 자기열등을 보상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의 입신과정은 신과의 상징적 결혼을 말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그들 자신이 신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의 사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은 인간과 신의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굿할 때만은 무당의 지시를 받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질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난을 구해주는 구세자의 입장에서 서게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통 무속의례의 주술성이나 신앙을 식재초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息災招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하여 현세이익만을 추구하는 미신으로 생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론 의례 자체만을 보면 그러한 인상을 면하기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무속이 침전되기를 되풀이하여 가면서 남긴 무속신앙의 사상으로서는 어떤 경험철학적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무병을 극복하는 상징처럼 위기나 큰일로 인해 비록 억울하게 희생되곤 하여도 그 억울함이 신력으로 극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환되어 비로소 민중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점에서 무속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마을 공동체의 주재자로서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이 땅 위의 수많은 신령에게 벽사초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壁邪招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기원을 담았던 계절마다의 풍요 제의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의 공동체의 간절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그 제사에는 그것을 받아 잡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여러 초월적 존재자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처럼 술과 고기를 즐기며 춤과 노래에 흥겨워하고 신화적 사건을 되풀이하는 의례를 즐거워하리라는 확신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하여 신에게 바쳐졌던 춤과 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육식들은 신을 즐겁게 한다는 제의 공동체의 믿음과 확신 아래 마을 공동체의 잔치가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신성한 즐거움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거룩한 축제는 무속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거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놀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잔치라거나 향연이며 동제나 별신굿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놀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마을 공동체가 원초적인 면에서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삶 속에 일치시켰던 기층적인 이해를 틀로 삼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순히 놀이가 소비적이며 낭비적인 것으로 푸대접받는 것이 아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놀이가 무질서나 장난으로 천대받는 것이 아닌 놀이와 일이 합류하는 생산성의 재현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굿놀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표현되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은 주술적이며 제의적인 의미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흥적이며 오락적인 기능을 함께 엮어 갔다는 면에서 기층 문화 속에 살아 있는 전통으로 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에서 우주적 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Cosmic Mountai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세계 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World Tree)</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이러한 종교적 상징의 공동체성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징표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종교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모두는 우주의 중심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의 존재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상징주의는 무당의 기능과 맞물려서 신성의 우주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宇宙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신비한 세계관을 유지해 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을 공동체와 무당은 종교적 전승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골 제도가 발생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골 제도란 한장의 당골이 한 마을 또 수개의 마을과 일정한 종교적 독점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인 당골은 마을 안의 가정이나 부락 차원의 모든 의레를 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을은 당골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의미에서 무당은 마을의 여러 가지 통과 의례나 생사 화복에 관한 의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건강에 대한 종교적 책임을 맡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넓은 의미에서 마을 공동체의 주재자인 것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기능은 여러 면에서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의 수용과 표출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 무속신앙이 한국재래종교에 끼친 영향</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불교에 미친 영향</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에서 불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가 전래된 연대는 문헌상으로는 기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 이후의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전통종교로서 이들 외래종교와 접촉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 종교 중 가장 먼저 전래되어 강성한 것은 불교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7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제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8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전래되어 왕가와 귀족층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佛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복을 얻기 위하여 신봉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라에도 불교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경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나 오랫동안 배척당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2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이차돈이 순교한 뒤의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신라에 전래된 불교가 처음에 토착신앙과 크게 충돌하였으나 차츰 무속신앙과 습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習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함으로써 그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는 원래 마음을 닦음으로써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윤리적인 종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도 심오한 이론으로 발전된 철학적인 세계종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시불교가 후대에 대승불교로 전개되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創敎者</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석가가 초인격으로 승화하여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행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의 해탈운동으로 발전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승불교는 각자의 각성으로 해탈을 얻는 자력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自力神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불타나 보살의 은덕에 의존하는 타력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같은 대승불교가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민중 사이에 퍼져들어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리하여 불교는 점차 그 본래의 철학적인 연구보다는 현실적인 행복과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는 신앙운동으로 전개되어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불교의 기복적 신앙운동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비롯하여 여러 신령들에게 질병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과 평안을 비는 재래의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쉽게 손잡을 수 있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라에서는 법흥왕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7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國祭</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서 팔관회를 불교사찰에서 거행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戰死者</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게 제사를 지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팔관회는 불교의 의례와 무속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山川神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신령을 제사하던 제의를 합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통일신라를 거쳐 고려가 망할 때까지 지켜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불교와 무속의 습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를 대중 속에 심어 그 토착화에 크게 공헌한 신라의 승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惠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大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元曉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은 토착화의 방편으로서 전래의 무속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明郞法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부터 유래된 주술적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密敎</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병을 고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을 비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법으로서 민간에 유포되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주술적인 무속의 기복사상과 더욱더 밀착할 수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편 아미타신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阿彌陀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크게 성행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으로 대중에게 침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기복적인 신앙 경향은 원래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불교를 기복적 의례 중심적인 종교로 변용케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불교와 무속의 혼합주의는 그후 신라 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道詵國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려의 태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王建</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조선조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西山大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 같은 불교와 무속의 습합과정은 그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 불교사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山神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龍王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將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非神信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衆信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은 오랜 습합과정을 통하여 불교에 스며들어간 무속적 요소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의식면에서만이 아니라 교단 자체마저도 무속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무속화되어 있는 실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불교는 오늘날 근대화를 위하여 왜곡된 체질개선에 몸부림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원 안에 스며든 샤머니즘의 해소작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解消作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결의한 바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불교사원 안에서 아직도 무속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展閣</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신불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지내는 절이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간을 찾아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불교와 무속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신도 중에는 무속도 함께 신봉하는 이른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二重信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많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불교는 수용과정에서 특성도 나타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과의 습합과정을 통하여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로 인하여 불교는 그 본래적인 신앙본질에 변질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윤리적인 종교가 무속신앙을 수용기반으로하여 수용됨으로써 무속적인 기복신앙으로 변용하여 드디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불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토착화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불교를 기복화함으로써 불교의 윤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유교에 미친 영향</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는 일찍이 이 땅에 수용되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랜 역사과정을 통하여 토착화하면서 조선조시대에 이르러서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國敎</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되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문화의 창조와 특히 한국인의 윤리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는 한문자와 문화의 수입과 함께 들어왔을 것이므로 그 경전의 전래는 불교보다도 앞섰을 것으로 생각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그것은 소수 지식층의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앙으로서 일반 민중에게 보급 신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소수림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7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오늘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세워 인재를 등용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고구려 방방곡곡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局堂</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세워 청년들에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五經</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三史</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공부하게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제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經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관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博士制度</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유교의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라에서는 화랑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孝悌思想</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국가를 치리하는 대요라고 가르쳤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려시대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國字監</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립대학이 있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사립교육기기관으로서는 문종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8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유학자들이 각자 사숙을 설립하여 젊은이들을 가르쳤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려의 유교는 그 기풍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文章學的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학으로 기울어져 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여말에 이르러 충렬왕 때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安珦</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元</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부터 주자학을 도입하여 합리적 정신과 윤리도덕을 고취함으로써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조는 유교를 국가이념으로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排佛崇儒政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유교문화를 창조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조의 건국이념은 주자학적 유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건국 후 곧 정도전은 주자학에 의하여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고 유교의 본질을 천명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후일 성리학은 철학화되어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후대에 성리학이 너무 사변적으로 기울어지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淸朝</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實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들어와서 새 학풍이 일어나 서구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개화사상의 선구가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선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년간 유교는 한국인의 정신과 생활을 인도하는 지배종교가 되어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유교는 권력층에 의하여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졌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식층은 유교의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일반 대중은 오히려 유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祀制度</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중이 받아들인 것은 유교의 치국이념이나 철학사상이 아니라 제사적인 종교로서의 유교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제사행사는 천지에 대한 제사와 조상에 대한 제사와 성현에 대한 제사로 나눌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유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敬天信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조상숭배의 제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上古</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부터 전하여온 조상제사와 쉽게 습합하여 무속신앙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中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家廟</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려로 인하여 사대부들은 누구나 조상의 사당을 짓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후 사당 짓는 일이 일반화되어 드디어 일반 대중까지도 짓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빈곤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士人</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서민은 집안 한 모퉁이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主</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위한 사당을 부설할 정도로 유교는 제사종교로서 보편화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곳곳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交廟</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사원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는 윤리도덕이나 경세의 이론으로보다는 제사종교로서 대중에게 수용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조상제사는 원래 효도의 표현이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중의 제사동기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祖靈</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가호나 축복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조상제사는 기복신앙에 있어서 무속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家神信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일체화되어 대중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周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보더라도 원래 주역은 천하만물과 인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人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의 여러 현상을 음양팔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陰陽八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요 동양철학의 극으로서 경전의 수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首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되는 것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양의 서요 경륜의 서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명의 서인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占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서로 화하다시피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에서 내려온 오행설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천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822;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에 들어와서는 오행설이 계통적인 교리보다도 관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수 등으로 신봉된 점이 많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제로 유교와 무속은 그 신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혼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의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것이므로 유교의 대중화는 무속을 통해서 쉽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을 천시하고 억압하였으나 언제나 양자가 공존하였던 것은 양자간에 사회적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相補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는 상류층의 종교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은 하류층의 종교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는 남성들의 종교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은 여성들의 종교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유교가 지식층의 종교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이 배우지 못한 서민층의 종교로서 공존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윤리적 합리주의는 무속의 주술적 비합리주의를 배척 억압하여 왔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조상제사적 의례주의는 무속의 가신신앙과 습합되어 대중 속에 기복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하여 양자는 형식적으로는 늘 충돌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보하며 공존하여 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과 공존한 대중의 유교는 윤리적 합리주의로서의 본래적 유교가 아니고 의례 중심의 기복적 유교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도교에 미친 영향</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와 유교의 뒤를 이어 이 땅에 들어온 종교는 도교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는 중국에서 발생한 주술적인 민간신앙으로서 불로장생을 목적으로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服食</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秘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仙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방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方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양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양기를 희구하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종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고구려 영류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2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唐高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天尊像</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道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보내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道德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9;</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독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唐高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도사를 파견하게 된 것은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백성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五斗米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道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다투어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로 미루어 도교는 그 이전부터 이미 민간에 들어와서 유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의 가르침이 고구려의 토속적인 신선사상이나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비슷한 점이 많았으므로 도교는 쉽게 퍼져 한 때 매우 성행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보장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4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淵蓋蘇文</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당시 중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 종교들 중 유교와 불교의 두 종교는 들어왔으나 도교만이 없다하여 당태종에게 사신을 보내어 진숙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陳叔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도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을 초청하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사원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道館</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삼고 도사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儒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위에 앉히는 등의 일을 하여 국가의 종교에서 유교나 불교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여러 가지 도교행사와 함께 국가를 진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鎭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제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齊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행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도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이 종교가 국가를 진호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종교정책 때문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당시 도교는 불교와 충돌을 일으켜 고구려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를 받아들인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으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교단적 발전을 보지 못한 채 침식되고 말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가 백제와 신라에 전래된 기록은 없으나 도교사상 또는 도가사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 유학생들은 그곳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祭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짓기도 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修鍊的 道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수입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754;可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59),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崔承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90)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은 유화등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羽化登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仙藥</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丹</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폐단을 지양하고 본격적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丹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발전시켜 신라의 도맥을 형성하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奇人</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의 단학설화를 산출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國祭</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팔관회가 도교적인 초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醮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변모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西京</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설치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八聖堂</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半佛半道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혼합현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도교의례가 국가적 행사로서 성행하였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지 않은 초제의 축원문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靑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전하여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도교의 의례가 국가적 행사로서 거행되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가 고려에서 교단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 예종 때의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휘종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0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도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을 보내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福源宮</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도관을 세우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도교를 수련케 하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복원궁은 고려 도교의 본산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츰 도교는 조정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까지도 널리 유포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원궁 이외로 대청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大淸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격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格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사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淨事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정청계배시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政淸溪拜是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및 구요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九曜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도관이 건립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사들로 하여금 도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科儀</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행하게 하며 수도케 하였으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姜邯贊</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비롯하여 이영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969;&#63923;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권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權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도사들을 배출하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는 기복양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祈福禳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희구하는 현세주의적인 종교로서 도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道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풍수사상과도 밀착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조에서는 조상의 사당을 세워 그 제사만은 지내야 한다고 가르친 주자학을 국교로 삼는 한편 불교를 몹시 탄압하였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의 신령을 모신 조격전만은 그대로 두어 복을 빌고 왕이 병들면 왕자를 그곳에 보내어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격전은 후에 조격서로 개편되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초제의 대상은 칠성제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七星諸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옥황상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玉皇上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산노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山&#63796;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화천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普化天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염라대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閻羅大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해용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四海龍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부제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水府諸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신령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에서는 노자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山&#63796;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太上道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玉淸元始天導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으로 존칭하여 최고신으로 숭배하므로 유교의 성리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양재를 위한 제의 중심의 국가적인 행사로서의 도교는 임진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9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지나고서야 겨우 종식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임란 중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關帝信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도입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교적인 행사가 궁중과 민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하여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편 수련적 도교는 두드러진 도맥을 형성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과 습합하게 되어 각종 민간신앙과 신흥종교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 도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盲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讀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家&#64004;行事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은 무속신앙에 완전히 흡수되어 오늘날에도 전해 오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리하여 조선조에서는 조상의 제사가 유교식으로 지내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옥황상제를 비롯한 도교적 신령의 제사가 도교식으로 지내져 왔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제로 이러한 신령을 맡아서 섬긴 사람은 무속의 사제인 무당들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궁에서조차도 왕족들이 병들면 무당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우제와 성황제도 무당으로 지내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佛寺</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칠성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부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왕신앙 등은 무속신앙을 통하여 불교에 수용된 도교의 흔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래 기복신앙에서 출발한 도교는 그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796;莊</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철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의 의례와 조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敎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교의 윤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종교적 체제를 갖추어 크게 융성하였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에 들어와서는 무속신앙과 쉽게 습합하여 이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림으로써 이제는 도교적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무속이 한국인의 심성에 미친 영향</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무속신앙은 대종교들이 전래될 때에는 언제나 그 수용기반이 되어 이들 외래종교를 이 땅에 토착화시켜 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결과 외래종교들은 무속적으로 변용하여 기복종교로서 대중에게 신봉되어 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외래종교들의 성행으로 무속신앙은 차츰 밀려나게 되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종교도 무속신앙을 완전히 제압했던 일이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오늘날까지도 끈질기게 존속하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회 하층민의 생활과 정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무속적 정신풍토를 형성하면서 서민층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무속신앙은 한국의 고대문화의 전승과 기층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이 한국인의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작용하는 무속적 심성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타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依他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인간의 생활화복을 좌우하는 무수한 신령을 신앙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시적 신앙체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령의 도움으로 길복의 소원을 성취하고 악령의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생활의 안전을 얻는 데 온갖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에 의하면 인간만사는 신령과 악귀의 소행으로 그 길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귀신신앙은 인간의 한계성을 의식하게 하는 작용도 없지 않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신봉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주체성을 상실케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에서 부딪히는 자기의 문제를 귀신의 탓으로 투사하고 굿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으로 믿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안일한 생각에서는 정신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격적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아무 신령이든 가지 않고 받아들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일신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monothe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처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조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외의 모든 신들을 우상시하여 그 실제성을 부정하는 일이 무속신앙에는 전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萬神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외국의 신령들도 수없이 수용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무속의 귀신신앙은 귀신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이성의 힘을 마비시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신론적인 귀신신앙의 극복은 무당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귀신을 섬기는 무당의 영역과 그 권위에 대한 맹신 맹종은 사람들에게 의타심을 조장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령이나 무당에 대한 의타심은 자기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등한시함으로써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자아의 상실을 초래하여 모든 인간문제를 밖에 투사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만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수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保守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통적 보수성이 주술신앙의 통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通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려니와 의타성이 강하였던 한국인에게는 진취성이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에 태한 책임과 윤리적인 결단이 없는 한국인에게는 자기변혁과 환경의 개혁에 무관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것이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明</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게 근거되어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는 문화발전의 요인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천 년을 변화 발전 없이 전승되어 내려오는 무교 자체가 이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샤머니즘의 종교 영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迎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있어서 화랑도의 경우와도 같이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한국에서의 통례적인 외래 종교와의 혼합개념을 볼 것 같으면 한국 무교의 보수성은 그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타종교를 받아들여서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혁신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만 타종교의 제요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諸要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에서 자기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口味</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맞는 것만을 융합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公分母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것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의 샤머니즘이 불교나 도교와 융합한 것은 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祈禱祭祀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仙 &#63923;交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있어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교적인 특성과 일치되는 한에 있어서만 쉽게 융합하는 것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결코 타종교의 본질적인 것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同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되어 자신을 변혁 발전시키는 일은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샤머니즘은 그 강한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종교 절충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折衷主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yncretism)</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형성하지 못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크리티즘이란 종교혼합 속에 자신의 특이성을 잃고 변질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보수성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969;朝 以來</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강한 정치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화적 쇄국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鎖國主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이 땅에 형성하였던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 한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固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형식주의와 폐쇄적인 제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諸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生理</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바로 이러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保守性</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發露</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해야 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명신앙</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의 삶은 변화무상한 것이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생활에는 불안이 있게 마련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생활에 대한 불안은 생활 자체를 위축시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안의 해소는 인간의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의 표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신령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믿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도와 제의로 그 소원을 성취코자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이같은 무속행사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신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자기의 목적 달성을 체념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神意</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속의 운명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運命信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인생을 숙명적인 인과관계로 믿는 무속의 불안 해소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변화의 원인을 운명에 돌리는 무속적 인생관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운명관에서 출발하여 운명적 변화의 근거가 무엇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하는 방법으로서 각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占卜術</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卜</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발달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운명신앙은 인생만사를 팔자소관으로 맹신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세타령이나 일삼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인간이 되게 만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같은 결정론적인 운명사상에서는 혁신적인 기상이나 개탁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開&#64002;精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이같은 운명론적인 신앙자세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냉철한 비판정신과 용기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의 운명신앙은 역사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회적 현실의 도피를 합리화하는 퇴행적인 사고양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사의식의 결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주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에는 창조신관이나 역사를 섭리하는 이른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歷史</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기능을 지닌 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 역사성에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에는 이같은 인간의 역사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현상이 이를 산출케 한 시대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회적 배경을 다소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속신앙에서 뚜렷한 역사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에 있는 것은 다만 동일한 일을 천편일률적으로 되풀이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순환적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機械的 反&#6384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이 있을 따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사의 방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823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미에 대한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순환적으로 과거를 반복하는 것은 역사라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自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사는 자연으로부터 의식의 세계로 떨어져 나올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되풀이하는 자연 곧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역사적인 역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을 따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듯 역사의식이 없는 곳에서 역사의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사회에서는 역사의 문제에 대하여 아랑곳없이 인간은 그저 재앙만 면하고 복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現金主義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福</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비는 것은 물론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래를 점치는 것이 다 현재를 어떻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가에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삶의 뿌리를 캐려 들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적인 행복만이 무속의 궁극적인 관심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것이 모든 역사적인 환난을 어물어물 넘겨 버리는 성격이 될 수 도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거기에는 심오한 철학도 종교도 발전할 수는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락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娛&#63836;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명론에 등을 대고 있는 현실주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娛&#6383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낳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巫覡</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職能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속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外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는 달리 가무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이것을 표시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의 가무예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歌舞藝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발전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花郞道</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형성은 바로 이러한 한국인의 오락성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근에는 가무가 풍기문란의 상징처럼 만연되고 있어서 정부당국에 의해 단속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결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속도로를 달리는 많은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와 춤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리는 캬바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인 현상은 교통안전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은 춤바람이라하여 가정문제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춤의 세력은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바로 이러한 오락성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신앙</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속신앙은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magic)</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더 가까운 원시적 종교현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샤머니즘을 주술의 하나로 다루는 학자도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현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은 비과학적인 인과율을 전제로 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술은 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63952;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법칙에 의한 모방주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homeopathic magic)</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접촉의 법칙에 의한 감염주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contagious magic)</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크게 나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방주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동종요법적 주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실행하는 행위와 기대되는 결과 사이의 유사성의 원리인데 예를 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의 아이누족의 경우에 한 쪽 편 사람들은 채로 물을 뿌리고 다른 편 사람들은 배처럼 사방에 돛과 노를 달고서 마을과 밭 주변을 돌아 다니는 방법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를 오게 하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처럼 보이거나 비를 연상시키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감염주술은 한 번 접촉한 일이 있는 사물은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사물에 행해진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다른 하나에 꼭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대인들은 자식에게 덧니가 나는 것은 부모가 아이의 배냇니를 뽑아 돼지우리에 던지거나 잘못 취급한 데서 온 결과라고 믿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빨이 튼튼해지기를 바라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배냇니를 뽑아 쥐가 들끓는 장소에 두고 그 아이의 이빨이 튼튼한 쥐의 이빨에 감염되면 새롭고 튼튼한 이빨이 새로 돋아난다고 믿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시골 풍습에도 이빨을 뽑아 지붕에 던지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 샛니를 다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헌니를 주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주문을 외는 속신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초가지붕에는 쥐들이 살고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짐승 가운데 쥐의 이빨이 가장 튼튼하다니까 사람과 쥐 두 사물이 결합하여 빠진 이빨이 쥐의 튼튼한 이빨에 감염됨으로 튼튼해진다는 주술적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span><br></p>
<!-- -->
카페 게시글
신학논단 및 신앙논문
한국의 재래종교와 기독교에 관한 연구
천성교회
추천 0
조회 213
16.07.31 08:4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