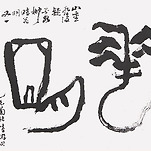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20">다시 꺼내보는 명품시조 </span><span data-ke-size="size20">137</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선유</span><span data-ke-size="size20">」</span><span data-ke-size="size20">외 </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신웅순(시인&#8228;평론가&#8228;중부대명예교수)</p><p>&#160;</p><p>꿈속은</p><p>쪽빛 바다</p><p>파도가 출렁이고</p><p>&#160;</p><p>때로는</p><p>비바람치고</p><p>삼킬 듯한 태풍 분다.</p><p>&#160;</p><p>이 속에</p><p>노를 저으면</p><p>처용이 가고 있다</p><p>- 최정란의 「선유」</p><p>&#160;</p><p><span data-ke-size="size18">태풍 속을 노를 저으며 가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처용이 가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span data-ke-size="size18">왜 여기서 처용이 나오는가</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선유하다 들어와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서 어쩌란 말이냐</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느닷없는 처용의 등장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종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뜬금없어야하고 엉뚱한 것이어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래야 놀라고 당황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무슨 말이 장황한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말을 질질 끌고 다니지 말라</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간만 끌 뿐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뒤집기 한판</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업어치기 한판이면 그만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것이 시조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span></p><p>&#160;</p><p>그렇거나 말거나</p><p>어둠이 짙어와서</p><p>&#160;</p><p>그리움 한소쿠리</p><p>무릎 아래 부려지고</p><p>&#160;</p><p>빈 가슴</p><p>슬몃 드는 초승달</p><p>눈물 마른 쪽잠 하나</p><p>- 김대식의 「실루엣, 봄 저녁」</p><p>&#160;</p><p><span data-ke-size="size18">그러거나 말거나 겉으로 무심한 체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런데 가슴에 슬몃 초승달이 들어와 시인은 쪽잠이 들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눈물이 말랐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초승달과 쪽잠 그리고 어둠과 그리움</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인은 언어를 부릴 줄 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조를 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런 여유만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조의 매력은 이런 것이 아닐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span data-ke-size="size18">말 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그 차이는 무엇일까</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시인은 말했는데 분명 말하지 않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말하지 않았는데 분명 말을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불이</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不二</span><span data-ke-size="size18">)</span><span data-ke-size="size18">의 세계 같은 참으로 묘한 엠비규어티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span data-ke-size="size18">이것이 시조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8">. </span></p><p>-주간한국문학신문</p>
<!-- -->
카페 게시글
시와 시조
다시 꺼내보는 명품시조 137「선유」외
신웅순
추천 0
조회 155
24.06.24 17:4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