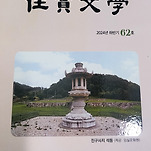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6"><b><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u>외동읍 신발시리즈&#160;‘고모신’에 얽힌 사연들</u></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에는 옛적에 ‘고모신’이라는 신발이 있었다. ‘고모신’은 표준어(標準語)로 ‘고무신’을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말하는데,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주로 쓰던 말이다.그리고 ‘고모신’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당시에는 사투리라기보다는 한 때 전국적(全國的)으로 사용하던 표준어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일제 당시 신문에 게재된 ‘고모신&#39; 관련 광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c5f2b009d89ec8634411345203f0a2f4c55b9701" class="txc-image" width="542" height="68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c5f2b009d89ec8634411345203f0a2f4c55b9701" data-origin-width="334" data-origin-height="50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b>고무신 대신 짚신을 신자는 캠페인성 기사(1931년 3월 9일자 조선일보)</b></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당시 ‘고모신’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웃음거리로 전해지는 얘기도 있었다. 짚신이 ‘고무신’으로 바뀔 때의 이야기다. 당시의 ‘고무신’은 모든 사람의 꿈이고 갈망(渴望)하던 귀한 물건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느 시골집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벼르고 별러서 여자 고무신 한 켤레를 사가지고 집에 왔다. 땔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46909;거리(장작)’를 모아 두었다가 오일장(五日場)에 내다팔아 어렵사리 사온 어머니의 고무신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들’이 시장(市場)에 갔다 오면서 무엇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니까 가족들 모두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게다가 ‘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신발을 같이 사오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의식적(意識的)으로 어머니의 고무신을 숨겨 들어왔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그 시절 어머니의 ‘고모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ff8315184e96d3c5d5ce53761790397e907f2d6" class="txc-image" width="541" height="37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ff8315184e96d3c5d5ce53761790397e907f2d6" data-origin-width="300" data-origin-height="166"></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야야, 니 야불떼기에 숭가가 가 오능 기 머고(얘야, 너 옆에 숨겨서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예, ‘고모신’입니더(예, 고무신입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시집갔던 고모가 친정(親庭)에 놀러와 있었다. 그 고모(姑母)는 친정집 조카가 그 것이 ‘고모신’이라고 하자 축담에서 마당으로 부리나케 뛰어내려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이고, 조카야 내가 여기 와 있능거로 우예 알고 내 신꺼정 사왔노. 참말로 고맙데, 고맙데”하면서 고모(姑母)는 그 신발을 빼앗듯이 받아 신고, 좋아서 춤을 추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이라고 발음(發音)해야 할 말을 ‘고모신’이라고 발음한데서 일어난 사건(事件)이었다. 물론 당시의 말이 ‘고모신’이었기 때문에 발음(發音)을 잘못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그 ‘고모신’이라는 용어(用語)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모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5ee9f0838916fb68e95d36e49809d05bf58db9b1" class="txc-image" width="500" height="43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5ee9f0838916fb68e95d36e49809d05bf58db9b1" data-origin-width="580" data-origin-height="435"></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모님의 말은 “아이구, 조카야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내 신까지 사 왔느냐. 정말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선천적(先天的)으로 내성적이고, 숫기(부끄러워하거나 수줍음을 타지 않는, 쾌활하고 활발한 기운)이 없는 ‘순꼴배기’ 경상도(慶尙道) 총각인지라 조카는 차마 “고모님 그건 ‘고모 신’이 아니고, 어머니 ‘고무신’인데요.”라는 말을 못해 일어난 희극(戱劇)이었다. 이하에서는 현대어(現代語)인 ‘고무신’으로 통일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제대로 이해(理解)하려면, 우선 ‘고무신’의 역사(歷史)와 유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신발’인 고무신의 역사는 1916년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76ea0d1ab107a6088a44292cac9277bf1128ac7b" class="txc-image" width="515" height="63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76ea0d1ab107a6088a44292cac9277bf1128ac7b" data-origin-width="337" data-origin-height="35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에 한 미국인(美國人)이 브라질에 갔다가 그곳의 인디오들이 고무나무 유액(乳液)에 발을 담가 발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이 고무로 비신(雨靴)을 만들어 판 것이 고무신의 시발(始發)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후 비가 많은 일본(日本)에서 이를 도입하여 호모화(護謨靴)란 이름으로 일상화한 것은 1916년, 이 일제 고무구두를 한국적(韓國的) 조건에 맞게 개량하여 우리나라에 수출(輸出)하기 시작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한때 우리나라 신발시장의 85%를 차지했던 ‘고무신’은 짚신을 신던 서민(庶民)들에게 질기고 물이 안 샌다는 점에서 경이적(驚異的)인 물건이었고, 최대의 히트상품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1442d9eaa141627ec4c0b5c9c30fca4dba91435" class="txc-image" width="507" height="4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1442d9eaa141627ec4c0b5c9c30fca4dba91435" data-origin-width="900"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916년은 ‘고무신’ 생산·수입액(輸入額)이 당시 화폐(貨幣) 단위로 1만2,149원이어서 짚신 생산액(565만8,957원)의 500분의 1밖에 안 됐으나, 1930년이 되자 고무신 생산액(生産額)이 1,685만6,447원으로 늘어나 짚신 생산액(260만7,505원)의 일곱 배나 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때의 ‘고무신’ 수입(輸入)은 주로 일본 본토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南北韓)을 합해서 약 1,600만 명 정도였으니 평균 50전(錢 ; 현재의 가치로 약 1만원)짜리 고무신을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2켤레씩 신었던 셈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에는 “고무신이 강철보다 견고하다”는 과장(誇張) 섞인 광고가 신문에 등장하기도 했고(조선일보 1924년11월4일자), 고무신 신기가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확산되자 농한기에 짚신을 만들어 팔던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더니 결국 고무신 불매운동(不買運動)이 벌어지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신문 광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7d6d57815abf1a2153e7feeb1dd06153748f667" class="txc-image" width="531" height="5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7d6d57815abf1a2153e7feeb1dd06153748f667" data-origin-width="413" data-origin-height="276"></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당시의 고무신은 지금과 같이 포장도로(鋪裝道路)나 인도(人道)가 없어 ‘아카시아’나 ‘탱자나무’ 가시가 고무신 바닥을 뚫고 들어와 엄청난 통증(痛症)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진흙 길을 갈 때는 고무신이 진흙에 달라붙어 벗어 쥐고 맨발로 다니는 등 불편(不便)도 많았으며, 어쩌다 중심을 잃어 비틀거리면 맥없이 찢어져 낭패를 당하기도 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당시 고무신 불매운동의 정황(情況)을 조금 더 살펴본다. 고무신의 보급(補給) 확산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짚신의 사용이 격감(激減)해지자 “고무신 대신 짚신을 신자”는 캠페인성 기사가 신문(조선일보 1931년3월9일자)에 보도되고, 고무신 사용금지 분위기가 전국적(全國的)으로 확산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2ad0b6fd617e8b8fbad43ab66a90b60454ae1e3" class="txc-image" width="531" height="89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2ad0b6fd617e8b8fbad43ab66a90b60454ae1e3" data-origin-width="467" data-origin-height="70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함경남도(咸鏡南道) 신흥군 원평면의 전동(典洞) 농민청년회는 1929년 9월 7일 농촌생활 개신(改新)을 위한 대회에서 ‘고무화(고무신) 침입 방지’를 결의(決議)하는 등 고무신 불매운동을 전개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또한 전국의 모든 보통학교(普通學校) 생도와 그 부형들이 “조선 사람 손으로 맨드러진 신(草鞋·초혜)을 벗고, 이 ‘고모신’을 신는 것은 민족의 경제적 파멸과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무신 배척(排斥)에 나섰다(조선일보 1931년 3월 9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었던 ‘고무신’은 거의가 일본(日本)에서 생산(生産)하여 수입된 일제(日製) 고무신이었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찢어진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dc5c7b4833e21b6fd86f641c343a9e0e1ba0b4a" class="txc-image" width="547" height="50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dc5c7b4833e21b6fd86f641c343a9e0e1ba0b4a" data-origin-width="723" data-origin-height="503"></div><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경기도(京畿道) 양주군 농민 150여명(조선일보 1932년 6월 16일자)과 강원도 양구군 내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생도들도 고무신 신지 않기를 결의했다(1932년 12월 13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고무신은 없어질 것”(조선일보 1921년 8월 28일자)이라던 희망 섞인 예상(豫想)은 빗나가고 말았다. 1933년도에는 전국(全國)의 고무신 공장 수가 70곳을 넘어섰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고무신은 섬세한 여성인력(女性人力)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고무신 공장 여성노동자(女性勞動者)가 급증해 ‘고무공장 큰 애기’라는 유행가까지 만들어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검정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4da1f3c90fb4fd52743f24fe05612dcdad00a7e5" class="txc-image" width="539" height="57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4da1f3c90fb4fd52743f24fe05612dcdad00a7e5" data-origin-width="424" data-origin-height="298"></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업체들의 광고전(廣告戰)도 1920년대부터 치열해졌다. “강철은 부서질지언정 ‘별표고무’는 찢어지지 아니한다”는 과장(誇張) 섞인 카피의 광고가 나오자, 또 다른 업체는 “지구표 고무신은 강철보다 견고함”이라고 맞받았다(조선일보 1924년 11월 4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고무신 업체(業體)들은 ‘짚신 시장’을 뺏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拒否感)을 의식했는지 “국산 고무신을 구입해 주면 그것도 자작자급(自作自給)”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923년 9월 14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의 고무신 광고는 “한 가지 두 가지씩이라도 우리 손으로 맨든 것을 장녀하야 줍시다”라며 국산(國産) 고무신을 신어 달라고 호소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강철보다 강하다는 고무신 광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1e47987558f0388c5f31da67d516b160b2b37169" class="txc-image" width="538" height="80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1e47987558f0388c5f31da67d516b160b2b37169" data-origin-width="255" data-origin-height="356"></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이 강철보다 견고하다는 과장섞인 광고</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조선일보 1924년11월4일자)</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심지어 “이강(李堈) 전하가 손수 고르셔 신고 계시는” 신발이라며, 반일 의식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진 순종(純宗)의 동생 의친왕(義親王) 이강까지 고무신 광고(廣告)에 끌어들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조선 고무신의 원조인 대륙(大陸)고무가 1922년 9월 21일자의 신문에 낸 광고에서도 “대륙고무도 고무신을 출매(出賣)함에 있어 이왕(純宗)께서 이용하심에 황감함을 비롯하여 여관(女官) 각위의 애용을 수하야”라고 기록하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또한 당시의 고무신은 미국공사(美國公使)로 재임 시 갓 쓰고 도포차림으로 양춤을 잘 추어 워싱턴 사교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하영(李夏榮) 대신이 애용하여 유명해 지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6.25와 누더기와 전쟁고아와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6f32046264c3ec601b52f18e2f1a2047148ee380" class="txc-image" width="48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6f32046264c3ec601b52f18e2f1a2047148ee380"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729"></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렇듯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무신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버이,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100여년을 걸어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앞쪽 어느 파일에서 소개한 대로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 전쟁 물자난(物資難)으로 고무가 귀해지자 일제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고무신 제조를 금지시키기도 했었다(조선일보 1938년 9월 2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 이러한 총독부(總督府)의 조치로 흰 버선과 함께 “조선 여성의 특유한 발 맵시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던 흰 고무신이 품절(品切)되자 개성(開城)의 여인들은 “금족령(禁足令)이나 당한 듯 문 밖 출입을 자유로이 못하는 형편”이 되기도 했었다(조선일보 1939년 6월 6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렇듯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무신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버이,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100여년을 걸어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앞쪽 어느 파일에서 소개한 대로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 전쟁 물자난(物資難)으로 고무가 귀해지자 일제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고무신 제조를 금지시키기도 했었다(조선일보 1938년 9월 2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 이러한 총독부(總督府)의 조치로 흰 버선과 함께 “조선 여성의 특유한 발 맵시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던 흰 고무신이 품절(品切)되자 개성(開城)의 여인들은 “금족령(禁足令)이나 당한 듯 문 밖 출입을 자유로이 못하는 형편”이 되기도 했었다(조선일보 1939년 6월 6일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 고통의 세월을 함께 걸어 온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d750b184abe3fd7294925817f4449a5b43e9f3c" class="txc-image" width="517" height="60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d750b184abe3fd7294925817f4449a5b43e9f3c" data-origin-width="529"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은&#160;1938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통제를 받아 신기 힘들었으나, 1945년 이후 6.25전쟁 때까지는 그 전성기(全盛期)를 이루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최초의 ‘고무신’은 폐고무를 원료(原料)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160;검정고무신이었는데, 나중에 표백제(漂白劑)를 첨가한 고급의 흰 고무신을 만들게 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일제 강점기(日帝時代)를 거쳐 1960~70년대에 유행했던 ‘고무신’은 왕자표(국제고무), 기차표(동양고무), 다이아표(보생고무), 말표(태화고무)같은 우리나라 메이커들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말표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683b51ccd199f518d18d6c68bbd4001a1b93f2f" class="txc-image" width="545" height="48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683b51ccd199f518d18d6c68bbd4001a1b93f2f" data-origin-width="771" data-origin-height="607"></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렸을 적 기억이다. 외출(外出)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고무신을 씻어 말리는 일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름이면&#160;외출이 아니라 잠시 사립문 밖에만 나갔다 오셔도 고무신을 씻어서 볕이 좋은 곳에다 가지런히 엎어 세워 두셨다.그래서인지 하얀 고무신의 뾰족 나온 앞 코에 두른&#160;검은 선이 제일 먼저 닳아 없어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기에서 고무신을 씻어 엎어놓는다는 것은 고무신의 경우 물로 씻으면, 고무신 안에 소량(小量)의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여 빨리 건조(乾燥)시키려면 반드시 씻은 고무신을 엎어 놔야 하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씻어 말리는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f4a9343ba42263cdcb983cbe79dda85234b29b3" class="txc-image" width="509" height="62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f4a9343ba42263cdcb983cbe79dda85234b29b3" data-origin-width="567" data-origin-height="424"></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에 고무신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單位)는 지금처럼 ‘미리(mm)’가 아니라 ‘문(文)’으로 표시하였다. 1문(文)은 약 2.4cm에 해당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발이 조금 크신 필자의 어머니는 ‘10문3’은 조금 끼고, ‘10문5’는&#160;헐렁거려서 언제나 고충(苦衷)을 겪기도 하셨다. 신발이 낡을 대로 낡아 더 이상 못 신을 때가 되면, 불국장(佛國場) 고무신 가게에 가셔서 새 고무신을 사서 갈아 신으셨는데, 그때마다 ‘10문3’과 ‘10문5’짜리 고무신 두 켤레를 들고 고민(苦悶)을 하시곤 하셨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우리 고향 시인 박목월(朴木月)의 ‘가정’이라는 시(詩)에는 ‘문(文)’이 신발의 크기로서 직접 씌어져 아버지의 책임감(責任感)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박목월의 ‘가정’을 소개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가 정</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박목월</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지상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깐*에는</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알전등이 켜질 무렵을</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문수(文數)**&#160;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 신발은 십구 문 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들 옆에 벗으면</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육 문 삼의 코가 납작한</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동아.</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여기는 지상.</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연민한 삶의 길이여.</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 신발은 십구 문 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강아지 같은 것들아.</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니 십구 문 반의 신발이 왔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니 지상에는</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 경상도 방언으로 부엌 가까이에 설치되어 주로 주방용품을 보관하는 ‘곳간’</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고무신의 크기 단위(1문은 약 2.4cm)</span><br><br><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고무공업을 시작한 때는 1919년으로 이하영(李夏榮)이 대륙고무주식회사를&#160; 창설한 때부터 였고, 이후 1921년에 김성수가 ‘중앙상공주식회사’를 창설했고, 김동원은 ‘정창고무공장’을 평양(平壤)에 설립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우리 민족은 이런&#160;선각자(先覺者)들 덕분에 당시의 짚신, 미투리, 갖신, 나막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160;당시의 서민용(庶民用) 고무신 가격은 40전(지금의 8천원)이었는데, 고무제품으로서는 신발류가 유일한 생산품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후 1930년대에는 ‘만월표’ 고무신 공장이 전주(全州)에 세워졌다. 당시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160;큰아기는 신여성(新女性)으로 무척 선망 받던 존재였다.&#160;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고무공장 큰 애기’라는 신민요(新民謠)까지 지어져 유행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만월표 고무신 가게</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5d03f8f310295f4f9b68c316f9a4dd2ee3c3a05d" class="txc-image" width="530" height="11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5d03f8f310295f4f9b68c316f9a4dd2ee3c3a05d" data-origin-width="764" data-origin-height="1138"></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옛적의 검정고무신은 너무나 소중(所重)하고 아끼고 싶은 귀중품(貴重品)이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고무신’은 너무나 값진 선물(膳物)이었다. 비가 오면 버릴까 봐 신고 나가지 않았고, 잠을 자면서도 가슴에 품고 잘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다른 아이들의 헌 신발과 바뀌지 않도록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表示)를 해서 신고 다녔고, 신다가 찢어지면 몇 번이고 실로 꿰매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신을 정도였으니 무슨 부연설명(敷衍說明)이 더 필요하겠는가.</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필자의 경우 한여름 아침밥이 늦어 지각(遲刻)이라도 할라치면, 책보를 등허리에 질끈 매고, 불볕으로 달아오른 영지저수지(影池貯水池) 둑길을 고무신을 벗어든 채 내달리곤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꿰맨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13ca72033b76f6bd2cff52524b5aded85cba7843" class="txc-image" width="525" height="39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13ca72033b76f6bd2cff52524b5aded85cba7843"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91"></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벽 밭일을 다녀오시는 어머님께서 아침밥을 늦게 시작하시거나, 꽁보리밥의 경우 조리시간(調理時間)이 너무 길어 아침밥이 늦을 때는 사립문에서부터 맨발 달리기가 시작되기도 했다. 소중한 고무신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신고 뛰면 고무신에 땀이 배어 미끈거려 빨리 달릴 수가 없고, 무리(無理)하면 아까운 고무신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차하면 고무신을 벗어 들고 뛰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특히 ‘참외서리’나 ‘밀서리’를 하다가 들키거나, 남의 집 추녀 밑에 매달아 놓은 꼬깜(곳감)을 빼 먹다가 들킬 때에는 예외 없이 고무신을 벗어 양손에 한 짝씩 움켜쥐고 ‘걸음아 나 살려라’며 도망치곤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벗어들고 다니기</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0111c1f3d41ca6438b97dbb72d8a3dd81443e03" class="txc-image" width="509" height="58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0111c1f3d41ca6438b97dbb72d8a3dd81443e03" data-origin-width="360" data-origin-height="355"></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새로 샀을 때는 고무신이 닳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벗어들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 질퍽이는 길을 가다가 고무신에 진흙과 물이 들어와도 벗어서 손에 쥐고 학교를 오가곤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하교(下校) 길에도 시키지도 않은 뜀박질을 다반사로 했었다. 시오리(十五里) 학교 길을 돌아오면서 여차하면 뜀박질을 하던 시절이 어렴풋이 떠오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집에 빨리 가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언제나 학교 정문(正門)을 나서면 그렇게 뛰어 다녔다.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영지저수지(影池貯水池)에 뛰어들기 위해서이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진흙투성이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3bea137dfe415dbc244a6a57b0d6a4cbb8ae2c72" class="txc-image" width="550" height="6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3bea137dfe415dbc244a6a57b0d6a4cbb8ae2c72"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402"></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양은(洋銀) 도시락이 든 덜그럭거리는 책보를 왼쪽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에 대각선(對角線)으로 걸쳐 질끈 매고, 두 손에 고무신을 한 짝씩 움켜쥐고 학교 문에서 집까지 줄곧 뛰어서 오기도 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에는 어른들도 비싸고 귀한 고무신을 아끼느라 ‘자린고비’ 같은 삶을 살았다. 그 중에서도 심한 ‘자린고비’는 외출(外出)할 때면 으레 고무신을 벗어들고 가다가 앞에서 사람이 오면 신발을 신고 제자리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들고 길을 가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이 닳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겠지만, 실제(實際)로 1940∼50년대에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새 고무신을 사면 아까워서 선반에 올려놓기도 하고, 여름철이면 맨발로 다니던 때가 있었다. 물론 가난한 서민가정(庶民家庭)의 경우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당시의 고무신은 동무와 싸우다가 밀리면 꼬나들고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학교에서 분단끼리 또는 이웃 동네 간에 패싸움이 벌어질 때도 주먹이나 발길질 대신 고무신을 벗어들고 상대방을 가격(加擊)하곤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무엇보다 그때의 검정고무신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신발 그 이상의 소품(小品)이 되기도 했었다. 학교(學校)에서 집에 오다가 냇가에서 도랑을 둘러막고 ‘가재’나 ‘송사리’를 잡을 때는 물을 퍼내는 ‘바가지’로 이용하기도 했고, ‘물방개’나 ‘송사리’가 잡히면 어항으로 사용(使用)하기도 했다. 깊은 물에서 ‘사고디(다슬기)’를 잡을 때는 바구니가 되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어항</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cecb4091e5fb4090454ee4d1901068d0c1db1aa7" class="txc-image" width="529" height="50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cecb4091e5fb4090454ee4d1901068d0c1db1aa7" data-origin-width="401" data-origin-height="297"></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모래장난을 할 때는 고무신에 모래를 퍼 담아 나르기도 했고, 들판에서 ‘꼴’을 베다가 너무 더워 개울가 백양(白楊)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잠이 들 때는 두 짝을 모두 벗어 ‘베개’로 활용하면 말랑말랑해서 여간 편하지가 않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때로는 고무신짝을 힘껏 던져 살구를 따먹거나, 늦가을에 감나무 홍시(紅&#26623;)를 따 먹는 용도(用度)로도 사용하기도 했었다. 자기 집이나 남의 집 살구나무에 탐스런 살구가 익어 가면, 신고 있던 고무신 한 짝을 살구가 달린 가지를 향해 힘껏 집어던진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베개</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6cfc31525d0ed6015c5f02d06c6a4db5b883d94a" class="txc-image" width="521" height="52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6cfc31525d0ed6015c5f02d06c6a4db5b883d94a" data-origin-width="588" data-origin-height="39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짝을 던지는 것은 우선 뭔가를 던질 것이 없을 때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피차의 안전(安全)을 위해서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기에서 피차의 안전(安全)을 위한다는 것은 가정집 울타리나 담장 옆에 있는 살구나무의 경우 대체적(大體的)으로 그 나무 밑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어 돌멩이나 막대기를 사용할 경우 장독대의 독을 깨트릴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맞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可及的)이면 고무신짝을 사용하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짝은 그 신축성(伸縮性) 때문에 장독에 떨어지거나, 사람이 맞아도 깨지거나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문제도 있었다. 고무신짝이 익은 살구나무가지에 정통(精通)으로 맞으면 살구가 후드득 떨어지기도 하지만, 운이 없으면 고무신이 살구나무 가지에 걸려 버리거나 주인집 울타리 안으로 떨어져 여간 낭패스럽지가 않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살구를 따먹으려 했다는 자백(自白)은 물론 인정사정없이 쥐어박는 ‘꿀밤’을 수도 없이 받아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나무에 달린 ‘홍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살구나무 밑 장독대</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f5017f4f597e689a65d50d24ce349a979e1008d5" class="txc-image" width="519" height="63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f5017f4f597e689a65d50d24ce349a979e1008d5"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639"></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 고무신은 헌신발이 되어도 쓸모가 많았다. 다 떨어진 고무신은 적당한 크기로 오려서 ‘게시고무(けしゴム ; 지우개)’로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몽당연필을 ‘시너릿대’ 대롱(가느다랗고 속이 빈 통대의 토막)에 끼워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一般的)이었던 그때는 고무신 지우개를 사용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울 때 공책(空冊 ; 노트)이 찢어지거나 시커멓게 된다는 게 흠이었을 뿐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기에서 말하는 ‘시너릿대’는 우리 고향 사투리로 ‘시늘대’ ‘시널대’라고도 한다. 표준어(標準語)로 ‘신우대’ 또는 해장죽(海藏竹)이라고도 하며, 보통 대나무와는 달리 마디가 굵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 또한 특별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몽당 연필</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낚싯대나 담뱃대, 국수를 말리는 대나무나 통발 등 그 밖의 여러 죽물(竹物)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댓잎 또한 보통 대나무 보다 넓고 크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얘기로 돌아간다. 고무신은 바닥이 닳아 못쓰게 되거나, 찢어져 신을 수 없게 되어도 가시게(가위)로 잘라서 ‘새총’을 만들고, ‘게시고무’를 만들어 쓴 누더기 고무신도 정말 요긴(要緊)하게 쓰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그때의 헌고무신은 그 자체가 현금(現金)이기도 했었다. 엿장수에게 주면 꿀맛 같은 엿을 바꾸어 주기 때문이다. 멀리서 엿장수 가위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온 집안을 뒤져 헌 고무신을 찾아내느라 부산을 떨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 백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또한 그때의 ‘고무신’은 어린이들에게는 훌륭한 장남감이 되기도 했었다. 장난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 없었던 시절(時節)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요즘처럼 밀기만 하면 저절로 굴러가며 스스로 소리까지 내는 장난감 자동차(自動車)는 아니었지만, 고무신 한 켤레는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장난감 자동차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한 짝 위에 다른 한 짝을 약간 구부려 끼우면 자동차(自動車)가 되었고, 한 짝을 둥글게 말아 다른 한 짝 앞코에 끼우면 훌륭한 짐차가 되었다. 또 두 짝을 앞 코끼리 연결하면 기차(汽車)가 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자동차</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9f8ab21a9ffc878fe3f1dc28de69c6e41d88a60b" class="txc-image" width="507" height="48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9f8ab21a9ffc878fe3f1dc28de69c6e41d88a60b"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48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개울가나 모래톱에서 고무신 한 켤레로 여러 가지 자동차(自動車)의 모형을 두루 만들어 거기에 따른 자동차 소리를 음성으로 묘사(描寫)해 가며 신나게 놀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은 또 홍수(洪水)가 지면 동서남북(東西南北)이 홍수로 뒤덮이는 개울이나 저수지(貯水池)에서의 뱃놀이 소품이 되곤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벗어 배처럼 띄워 누구의 고무신이 목표지점(目標地點)에 먼저 다다르느냐를 겨루는 놀이인데, 스릴을 만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무신이 뒤집혀서 물속에 갈아 앉으면 찾을 길이 없어진다는 문제점(問題點)이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홍수에 떠내려 온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44be69c080afa1cc2ad282ff412076b41f4ac294" class="txc-image" width="533" height="64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44be69c080afa1cc2ad282ff412076b41f4ac294" data-origin-width="250" data-origin-height="373"></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떠내려 오면서 날카로운 돌멩이들에 짓이겨져 헌신발이 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시뻘건 흙탕물 속에 검정색 고무신이 갈아 앉아 거친 물결에 휘말리면, 그 것으로 그 고무신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의 혹독한 부지깽이 매질을 감수(甘受)해야 하는 비극이 뒤따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린 시절 새 신을 사서 신는 날의 기분은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가볍고 신나는 일이었다. 오일장(五日場)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 고무신을 사다 주시면, 하늘을 날듯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라는 동요(童謠)의 가사(歌詞) 그 자체였다. 그러나 부잣집 자녀가 아니면 새 고무신을 얻어 신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검정 고무신을 말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낡은 고무신이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다 떨어져야 그제야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다음 장날에 새 신을 사 주시기 때문이다. 부잣집 자녀가 아닌 한 뚫어진 신바닥 구멍에서 굵은 모래알이 들어와 발바닥을 갉아먹을 정도가 아니면 결코 새 고무신을 신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떨어진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5c7aaab898d54b6f3bf15aa3864ac2fd8daaacf2" class="txc-image" width="526" height="34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5c7aaab898d54b6f3bf15aa3864ac2fd8daaacf2" data-origin-width="723" data-origin-height="50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만큼 가난들 했고, 고무신 값이 비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만큼 알뜰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들께서 신발을 사주겠다는 약속(約束)을 하면 어린이들은 손꼽아 다음 장날을 기다리게 된다. 장날이 공일날이라도 되어 어머님을 따라 나서고 싶은 생각이 간절(懇切)하던 시절이기도 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어린이들은 웬만해서는 장(場)에 따라 갈 수가 없었다. 학교(學校)에 가 있거나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발은 어린이들이 직접 신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에 가실 때 ‘손 뼘’이나 지푸라기로 발을 재어서 눈대중으로 사 오신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보통은 아이가 발이 클 것을 예상(豫想)하고 더 큰 것을 사는 것이 예사(例事)였다. 새 신을 기다리는 장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 뒷산 언저리까지 나가 장에 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마중하러 들락날락하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160;수리점</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37da3edd166dbc24f0ce64dc68e07a28abe6ff1" class="txc-image" width="532" height="58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37da3edd166dbc24f0ce64dc68e07a28abe6ff1" 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584"></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한 시간이라도 빨리 윤기(潤氣) 흐르는 고무신을 신어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웃의 ‘불알친구’들에게 한바탕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애들은 ‘보단지(여자아이들의 ‘○지’를 점잖은 표현으로 이르던 말)’ 친구들에게 그랬을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의 검정고무신은 그 이름도 10여 가지나 되었다. 검정고무신, 껌정고무신, 깜장고무신, 검둥고무신, 껌둥고무신, 깜둥고무신, 까만고무신, 까망고무신, 꺼멍고무신 등 사람 따라 고장 따라 숱한 이름으로 불리어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기에서 윤석중(尹石重 1911∼2003) 선생이 쓴 동요(童謠) ‘새 신’의 가사를 잠깐 되새겨 보고 넘어간다. 손 모아 오일장(五日場)을 기다렸다가 새신을 얻어 신은 아이들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 그려 놓은 가사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160;&#160;&#160;&#160;&#160;&#160;&#160;&#160; &#160;신</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윤석중</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에는 또 고무신이 얼마나 귀했던지 고무신을 처음 사면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고무신은 모양(模樣)이 같고 단지 크기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이나 모임에 가면 언제나 바뀔 우려가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래서 고무신을 처음 사는 날은 ‘쇠죽솥’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알불’에 철사(鐵絲)를 달구어 고무신 안쪽에 ‘*’나 ‘+’ 등의 표를 자기 신발에 새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일종의 비표(秘標)를 만드는 것이다. 할머니, 어머니, 아내, 누나, 누이동생 등의 것은 아들이나 남편, 오라버니나 남동생이 대신 새겨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비표(秘標)</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2fcf6065401df5bdfd874d7d17199ffa239ac41" class="txc-image" width="50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2fcf6065401df5bdfd874d7d17199ffa239ac41"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375"></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이렇게 새겨 준 비표(秘標)는 ‘고무신’ 주인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암기(暗記)해 두어야 한다. 자기 고무신의 비표(秘標)를 자기가 모르면, 자기 고무신을 자기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학교(學校)에서나 남의 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신발과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마음씨 나쁜 사람들이 일부러 바꿔 신고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최근(最近)까지 잔치 집에서 할머니들이 비닐봉지에 자기 신발을 꼭 싸서 챙기는 이유도 신발의 외형(外形)이 똑같아 쉬 바뀔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게 그것 같은 당시의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fccd3d2e66ead416c646f77f830f9807ffb2d037" class="txc-image" width="542" height="52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fccd3d2e66ead416c646f77f830f9807ffb2d037" data-origin-width="318" data-origin-height="239"></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고무신’이 일철에는 모두 그게 그것 같은 검정 고무신이었고, ‘가람신’ 또한 모두 모양이나 크기가 비슷한 흰 고무신이었기 때문에 검정고무신이든 흰 고무신이든 자신의 신발에 자기가 아는 어떤 표시(表示)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만큼 바뀌기가 쉬웠고, 의도적으로 훔쳐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위에서 말한 ‘가람신’이란 경주지방(慶州地方) 방언으로 외출용 신발을 말한다. 평소에는 짚신이나 검정고무신을 신다가 명절이나 친척(親戚) 집에 갈 때, 또는 잔치집이나 초상(初喪) 집에 나들이를 갈 때 시렁위에 얹어서 보관하고 있던 흰고무신(주로 ‘백고무신’이라고 했다)을 신고 나가는데, 이 흰 고무신을 ‘가람신’이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쨌든 이런 사정과 풍토(風土) 때문에 당시의 필자들이 초등학교(初等學校)에 다니면서 새 고무신을 신고 등교(登校)하는 날은 신발을 잃어버리는 날이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홍수에 떠내려간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9fa6452b3f97052987705cde7bcf71a0e0e81452" class="txc-image" width="517" height="52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9fa6452b3f97052987705cde7bcf71a0e0e81452" data-origin-width="764" data-origin-height="52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순박(淳朴)하던 시절에도 새 고무신이 탐이 나서 훔쳐 신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도 그렇게 당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렵사리 새 고무신을 신고 등교하던 날, 종례(終禮)를 마치고 우르르 나와 신발장을 보니 필자의 새 신발이 없어졌다. 그러나 혹시 필자가 잘못 놓았을까 싶어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 다시 확인(確認)해 봐도 짝짝이 다른 헌 신발 한 켤레만 남아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울상이 되어 있는 필자를 발견하신 담임선생(擔任先生)님께서 고함을 질러 귀가(歸家)하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신발검사를 하신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 학생들의 &#160;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d17438b50eb26d86d1adc8e912afbe1920155fa3" class="txc-image" width="542" height="86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d17438b50eb26d86d1adc8e912afbe1920155fa3" data-origin-width="567" data-origin-height="86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양말이나 버선이 없는 학생들은 ‘짚북디기(지푸라기)’를 깔아 신고 다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고만고만한 아이들의 발 크기도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다양(多樣)한 디자인도 아닌 똑 같은 ‘타이어표’ 통고무신에 새 고무신도 많아 찾을 길이 없었다. 때투성이가 된 남의 헌 고무신을 질질 끌고 귀가(歸家)하면서 눈물만 펑펑 쏟았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 신발을 신고가면 잃어버린다”고 당분간 집에서만 신고, 대신 헌 신발을 신고 다니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못들은 체 새 신발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신고 간 것인데, 할 수 없이 짝짝이 신발을 끌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제든 새 신발을 신고 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런 날은 어깨에 멘 책보의 무게가 천근같이 무거웠고, 훤하게 뚫린 신작로(新作路)도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마을 어귀 봇도랑에 걸터앉아 하릴없이 풀포기만 쥐어뜯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집으로 향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헌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꾸중을 듣고 매를 맞을까봐 토담 밖에서 서성거리기를 한참, 구정물을 버리러 나오신 어머니가 보이자 그만 엉엉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애절(哀切)한 추억의 한 토막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기에서 잠시 그 시절 새 고무신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애달파하던 우리들의 애타던 심정(心情)을 속속들이 그려놓은 양병우의 ‘검정고무신’을 음미하고 넘어간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검정 고무신</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양병우</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잃어버린 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학교 끝나곤 쉬이 집에 못 가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맨발로 걸어 논둑길을 헤매었었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삐쭉히 나온 돌을 차는 아픔보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두운 마음이 더 무지근했었지.</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젯밤 부지깽이 달궈서</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앞 코에 점 세 개 삼각형으로 찍어놓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한번 신어보고 머리맡에 두고 잠잤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연한 황토색에 흰 테 두른 새 고무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조심조심 교실 밖 신발장</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 키보다 높은 곳 깊숙이 감춰 두었는데</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뒤꿈치 째지고 닳아빠진 타이어 표</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날 놀리듯</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기다리고 있었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린 맘에 꾸지람들을 걱정에 뚝 길에 앉아</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속없이 살찐 삐비 뽑아 먹으며</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먼 산 바라기 하게 했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 고무신</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은 또 우리나라 전통주(傳統酒)인 ‘막걸리’와 함께 우리나라 선거역사(選擧歷史)상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선거용품(選擧用品)’이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든, 지방선거든 1950~60년대에는 고무신이 단골 ‘선거용품’이었다. 당시 말께나 하는 가정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고무신 한두 켤레씩을 얻어 신었다. 그런데 이 ‘선거고무신’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양태(樣態)를 나타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선거 고무신과 표값</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910b7eafe66b7f61a1db627dcac575acac1218f6" class="txc-image" width="507" height="63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910b7eafe66b7f61a1db627dcac575acac1218f6"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800"></div><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온 가족이 구두나 운동화(運動靴)를 신어 고무신이 필요 없는 부잣집 사람들은 ‘선거고무신’을 얻어 신었고, 고무신이라고는 평생 동안 신어보지 못한 서민(庶民)들은 아예 배당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후보자(候補者)들이 여론 주도층(主導層)인 부잣집에만 고무신을 돌리고, 전혀 영향력(影響力)이 없는 서민(庶民)들에게는 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재수 좋게 배당대상(配當對象)이 되더라도 부잣집에는 흰고무신을 주고, 서민들에게는 검정고무신을 배당했었다. 그래서 우리들 어버이들께서는 논을 팔고 소를 팔아 자식공부에 생(生)을 바친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선거 막걸리</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828cc9859bf0a4f8bd337d88e602086a4cf9d23" class="txc-image" width="523" height="76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828cc9859bf0a4f8bd337d88e602086a4cf9d23" data-origin-width="448" data-origin-height="56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모두가 문맹자(文盲者)였던 필자의 조부모(祖父母)님과 부모님들도 전혀 영향력(影響力)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 한번도 ‘선거고무신’을 얻어 신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대신 위대한(?) 중학교(中學校) 졸업장을 딴 필자는 ‘선거고무신’을 한번 얻어 본 일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四一九革命)’이 일어나고, 그해 7월 29일 실시한 총선거(總選擧) 때 투표에 참가하면서부터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만 해도 선거사무(選擧事務)가 엉성해서 만 17세에 불과한 필자에게 투표권(投票權)이 교부되었다. 이때의 선거에서는 동리의 이장(里長)도 주민에 의한 직선(直選)을 했는데, 당시 필자의 동리 이장선거(里長選擧)에서 유력한 이장 후보 한사람이 필자에게 ‘선거고무신’을 배당했고, 선친(先親)께서 그 고무신을 받아 오셨다는 예기를 들은바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 시절 투표모습</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6e613e6aadcac114816c231b634a690c5edad8f" class="txc-image" width="502" height="37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6e613e6aadcac114816c231b634a690c5edad8f"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378"></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물론 선친(先親)께서 선친의 발에 맞는 문수(文數 ; 고무신의 크고 작은 치수를 말함)골라 오셔서 선친께서 요긴(要緊)하게 신으셨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런데 해방(解放)이후부터 이토록 애용되어 왔던 고무신이 검은 운동화(運動靴)세대를 거쳐 오늘날의 유명(有名) 메이커의 구두와 바이오 운동화시대로 바뀌면서 어느 샌가 우리 생활주변(生活周邊)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새신 하나를 신기 위해 긴 기다림과 기대(期待)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새신을 신었던 그 때의 어린 시절 고무신은 이제 동화(童話) 속의 유물(遺物)이 되어버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짚신만을 신어 온 시골 사람들이 거의 한 세기(世紀) 동안 신어왔던 고무신이 이제 그 고무신에 얽힌 일화(逸話)들과 함께 역사(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우리들 선조들의 ‘삶’ ‘껌둥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7acb6b4a994b966246afe12ebadbbcdfdbc2b23d" class="txc-image" width="538" height="51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7acb6b4a994b966246afe12ebadbbcdfdbc2b23d"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99"></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풍자(諷刺)되어 온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는 말도 다른 말로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자가 군대(軍隊)에 간 사이 변심(變心)한 여성(女性)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예가 예전보다 드물어서가 아니라 고무신을 신는 여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제 고무신은 절간이나 상가(喪家), 그리고 한복(韓服) 입는 명절날에나 몇 사람 정도 신은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나마 한복(韓服)에 받쳐 신는 여자 고무신은 고무신인지 ‘고무구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형(變形)되어 버렸다. 어쨌든 이제는 그냥 고무신이든 ‘선거고무신’이든 우리 주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린 지 오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하이힐 같은 여성 백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9846399467832b2fdc38333a61c47910bb757d1" class="txc-image" width="539" height="4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9846399467832b2fdc38333a61c47910bb757d1"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332"></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얘기가 나온 김에 “고무신 바꿔 신는다”는 말의 어원(語源)을 잠시 찾아보기로 한다. 이 말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을 보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예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성을 ‘고무신(줄여서 곰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의 유래는 여러 가정(假定)이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눈 오는 겨울 밤, 도둑이 물건을 훔쳐 도망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눈 위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을 찍어 도망갈 시간을 벌었다는 설(說)이 그 하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거꾸로 난 고무신 자국</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fe1b5cb7024e02e7b4347a3f40ed5e2ce3067437" class="txc-image" width="533" height="48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fe1b5cb7024e02e7b4347a3f40ed5e2ce3067437"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48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한 가정의 부인(婦人)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다가 들켜서 눈 오는 겨울밤에 내연남(內緣男)을 따라 도망 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을 갔다는 유래(由來)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눈이 내린 마당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나가면, 발자국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찍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내의 발자국이 집 안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남편(男便)은 마음 놓고 아내가 집 안에 있을 것으로 믿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도망가는 남녀</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a5b261a26414a92d1efae8a9335d0a88ba41a3d" class="txc-image" width="521" height="60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a5b261a26414a92d1efae8a9335d0a88ba41a3d" data-origin-width="441" data-origin-height="34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그러는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자신의 외간남자를 따라 멀리 도망(逃亡)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응용표현(應用表現)으로 “군화(軍靴)를 거꾸로 신는다”라는 표현도 있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린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는 남자를 주로 일컫는 표현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때문에 과거(過去)에는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성’에게만 비난(非難)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요즘은 끝까지 잘 기다린 ‘곰신’을 ‘배신(背信)’해 버린 ‘군화 거꾸로 신은 남성’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거꾸로 신은 아가씨</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0732d217084d5f48e31263533ca664bee43d846" class="txc-image" width="488" height="6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a0732d217084d5f48e31263533ca664bee43d846" data-origin-width="250" data-origin-height="188"></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군대(軍隊)에 간 남자친구를 끝까지 기다려 성혼(成婚)을 이룩한 의지(意志)의 ‘곰신’을 “꽃신을 신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군대(軍隊)에 보낸 외로운 시기를 참지 못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여성과 달리, 제대(除隊)한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를 꾸민 의지(意志)의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하지만 정말 인연(因緣)이라면 군대에 가든, 외국에 나가든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우리 외동향우회(外東鄕友會) 청년회원님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군화 거꾸로 신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표현의 하나로 흘려듣고, 모두 예쁜 ‘꽃신’을 신으시기 바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바꾸려는 ‘곰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69bc067775514d744d173a1a7aebb90aaae679ff" class="txc-image" width="520" height="60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69bc067775514d744d173a1a7aebb90aaae679ff" data-origin-width="580" data-origin-height="608"></div><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여성(女性)에 따라서는 신고 있던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보다는 두 가지의 고무신을 함께 신기도 한다. 군대에 간 애인(愛人)과 애인 대신 주위에서 사귄 남자친구 둘 다 사귀는 ‘양다리 걸치기’ 여성을 말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발이 두 개니까 짝짝이 고무신을 신을 수는 있겠지만, 상황(狀況)이 뒤 틀어지거나 꼬이게 되면, 고무신 두 짝이 모두 찢어지는 불행(不幸)을 당하기도 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거꾸로 신는 얘기를 조금 더 보탠다. 지난 2010년 국군방송(國軍放送)에서 병사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 의하면, 실연(失戀)한 병사 즉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병사는 10명 중에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짝짝이 고무신을 신은 &#39;양다리 걸기&#39; 아가씨</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87e2f17a62a28b977c1d068751f3944cb68d0ea1" class="txc-image" width="507" height="87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87e2f17a62a28b977c1d068751f3944cb68d0ea1" data-origin-width="709" data-origin-height="1031"></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군인을 애인(愛人)으로 둔 여성이 가장 많이 변심하는 시기는 남자애인이 군(軍)에 입대한 직후인 이병(二兵) 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국방홍보원(國防弘報院)이 운영하는 국군방송 라디오의 ‘행복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최근 병사 400여 명과 군에 간 자식을 둔 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에 입대한 뒤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헤어졌다)’고 답한 병사는 응답자의 16%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헤어질 당시의 계급(階級)은 이병(二兵)이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병(33%) 상병(13%) 훈련병(12%) 병장(4%) 순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바꿔 신기</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7d0dcb41857fbb037885941762c6f5a651ace6db" class="txc-image" width="528" height="52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7d0dcb41857fbb037885941762c6f5a651ace6db" data-origin-width="463" data-origin-height="257"></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추억(追憶)의 검정고무신, 실타래 하나를 다 풀어도 끝이 없을 만큼 즐겁고 애달프고 아기자기한 추억(追憶)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필자들의 시절을 얘기하면 무슨 고려시대(高麗時代) 이야긴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쨌든 필자들이 어릴 때는 신발이래야 고무신밖에 없던 시절이라 너나없이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고무신은 겨울에 발이 시리다는 단점(短點)만 빼면 참으로 장점(長點)이 많은 신발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도랑을 건널 때 벗을 필요(必要)가 없이 그냥 신은 채로 첨벙대며 건너면 되었고, 더러워지면 물로 간단하게 씻으면 깨끗하게 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선정적인 맨발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beaf5bc92d51d7c047b0ebaf165c875b1423e01" class="txc-image" width="517" height="87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beaf5bc92d51d7c047b0ebaf165c875b1423e01" data-origin-width="364" data-origin-height="648"></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심부름이 싫어 투정을 부리느라 높게 차올린 고무신짝이 하늘높이 치솟다가 벼가 무성한 논바닥에 떨어지면, 그 신발을 찾느라 한참 동안이나 헤매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장마철 황톳물이 흐르는 도랑을 건너다 벗겨진 고무신짝이 둥둥 떠내려가면 발만 동동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사계절 전천후(全天候) 신발인 고무신은 바닥이 종잇장처럼 얇아지면 발바닥이 신발 노릇을 했고, 찢어져서 발가락이 삐죽이 튀어나와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구멍을 다시 때워서 신고 다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 빵꾸전문, 기술본위, 신용보증’에서 때운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장날이면 장터 한쪽 구석에 고무신 때우는 아저씨가 있었다. 그 아저씨의 몰골은 필자들이 봐도 정말 꾀죄죄했었다. 그러나 등 뒤에는 그 알량한 글씨로 ‘고무신 빵꾸전문, 기술본위, 신용보증’이라는 문구(文句)가 언제나 써 붙여져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의 고무신은 주로 ‘만월표’에 이어 ‘타이어표’, ‘왕자표’, ‘말표’ 등이 있었는데, 필자들의 경우 검정 고무신은 ‘타이어표’를 제일 많이 신었다. 당시에는 이를 ‘다이야표’라고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좀 산다는 집안의 애들은 ‘왕자표’ 백고무신을 신기도 했고, 운동화(運動靴)를 신기도 했는데, 필자의 마을에서 운동화를 신고 다닌 건 6.25때 서울에서 피난 온 혜영이 누나가 처음이었고, 근화여중과 근화여고를 다니던 건너 마을 ‘옥조’가 그 다음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백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c7610f34c9393448beea81c435f3c4f96ebdd8d" class="txc-image" width="516" height="56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c7610f34c9393448beea81c435f3c4f96ebdd8d" data-origin-width="723" data-origin-height="736"></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신</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사내아이로는 역시 피난민(避難民) 가정의 혜영이 누나 오빠가 처음이었다. 그때 혜영이 누나 오빠가 신고 다니던 눈부시게 하얀 운동화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래서 자나 깨나 신던 검정고무신이 너무 싫어 빨리 닳아 떨어지게 하려고, 그 질긴 고무신을 큰 돌에 문질러 구멍이 나게 했더니 어머님께서 장에 가실 때 자전거 수리점(修理店)에서 자전거 헌 주부(튜브)를 오려 붙여 때워 오시기도 하셨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차라리 그냥 신었으면 덜 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후회(後悔)가 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었다. 겨울엔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고무신을 신으면 너무 조여서 발가락이 아팠고, 어쩌다 돌부리를 차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프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꿰맨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97aed430b0a9ed83f7b4cafb40e07f359d3ffec" class="txc-image" width="499" height="54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97aed430b0a9ed83f7b4cafb40e07f359d3ffec" data-origin-width="555" data-origin-height="364"></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b>(떨어진 고무신을 헝겊으로 덧씌워 꿰맸다)</b></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이 다 닳아지면 엿장수한테 엿을 바꿔 먹었는데, 그나마 ‘백고무신’은 잘 바꿔줘도, ‘검정고무신’은 마지못해 바꿔주는 처지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에는 ‘얼룩고무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둘 다섯’이라는 보컬그룹이 있다고 노래로까지 부르고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둘 다섯’의 ‘얼룩고무신’ 가사를 소개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얼룩 고무신</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둘 다섯</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구비 구비 고갯길을 다 지나서</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돌다리를 쉬지 않고 다 지나서</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행여나 잠들었을 돌이 생각에</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눈에 뵈는 산들이 멀기만 한데</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꾸불꾸불 비탈길을 다 지나서</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소나기를 맞으면서 다 지나서</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개구리 울음소리 돌이 생각에</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꿈속에 고무신을 다시 보았네</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허 우리 돌이 우리 돌이 얼룩고무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허 우리 돌이 우리 돌이 얼룩고무신</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무공장이 세워질 무렵에는 ‘고무공장 큰 애기’라는 대중가요(大衆歌謠)가 만들어져 불리어 지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 노래는 일제(日帝) 당시 부산과 평양(平壤) 등지에서 일본인(日本人) 또는 조선인 고무공장 기업주의 노동착취(勞動搾取)와 부당고용을 비판하는 여공(女工)들이 지어 부른 노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감독(監督)이라는 자들에게 성상납(性上納)이라도 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겨지기도 한다. 그 시절 유행하던 ‘고무공장 큰 애기’ 가사(歌詞)를 게재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공장 큰 애기</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른 새벽 통근차 고동 소리에</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공장 큰아기 벤또 밥을 싼다.</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하루 종일 쭈그리고 신발 붙일 제</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얼굴 예쁜 색시라야 예쁘게 붙인다나.</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감독 앞에 해죽해죽 아양이 밑천</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공장 큰아기 세루치마는</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감독 나리 사다준 선물이라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공장 큰 애기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bba452fbfd6e8b46fbd14c7e84593cdeab693e0a" class="txc-image" width="527" height="42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bba452fbfd6e8b46fbd14c7e84593cdeab693e0a" data-origin-width="400" data-origin-height="237"></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940~50년대에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새 고무신을 사면 아까워서 선반에 올려놓기도 하고, 앞서 기술(記述)한 대로 여름철이면 고무신을 벗어놓고 맨발로 다니던 때가 있었다. 물론 가난한 서민가정(庶民家庭)의 경우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당시의 초등학교(初等學校) 저학년생의 검정고무신은 남녀공용(男女共用)이었다. 조그마한 여자용 고무신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쩌다 여자용 꽃고무신을 신는 부유층(富裕層) 가정 어린이도 있기는 했지만, 대개가 서민층(庶民層)인 시골 어린이들의 경우 남녀학생의 신발의 모양이 모두 같았다. 5~6학년 여학생들의 경우는 여자용 검정고무신 또는 흰 고무신을 신기도 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남녀 공용 고무신</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081876186aef1445c4d88b1de5397fa1166f50c" class="txc-image" width="543" height="8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0081876186aef1445c4d88b1de5397fa1166f50c" data-origin-width="414"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우리들이 어린 시절은 온 가족이 ‘고무신’을 신었다. 요즘은 한 사람이 신발을 여러 켤레를 가지고 이것저것 갈아 신지만, 그 때는 한 사람이 신발을 두 켤레나 가지고 갈아 신는다는 것은 상상(想像)하기도 어려운 호사(好事)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950년대 후기의 어린이들 고무신과 운동화</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dd87f4e8ec12a7179fa4230b3fa7af696c8e2c80" class="txc-image" width="528" height="42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dd87f4e8ec12a7179fa4230b3fa7af696c8e2c80" data-origin-width="580" data-origin-height="425"></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가을 운동회 때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뛰었고,&#160;검정</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신은 아이들은 출발선에 고무신을 벗어놓고 맨발로 뛰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중학교(中學校)에 들어가면 교복에 맞추어 와신또(운동화)를 신어야 했기 때문에 신발이 두 켤레가 되었지만, 그래도 운동화(運動靴)는 학교에 갈 때만 신는 신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그 시절(時節)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들에 갈 때만 아니라, 소 먹이러 갈 때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도 ‘고무신’을 신고 지게를 지고 골골을 누벼야 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래서 그 때 ‘고무신’은 잘 닳기도 했지만, 산에서는 낫으로 벤 날카로운 그루터기에 찔려 찢어지기도 잘 했다. 때문에 그 시절 아이들은 한 달에 한 켤레의 ‘고무신’을 갈아 신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그 시절 우리들의 ‘고무신’은 너무나 좋은 장난감이 되어 주었고, 쓰임새도 너무나 다양했었다. 야산(野山)이나 냇가에서, 그리고 무논에서 송사리와 사고디(다슬기), 고디(우렁)와 물방개, 소금쟁이와 달팽이, 장수풍뎅이를 잡아 담아 놀기도 하고, 산딸기와 산 새알을 따고 주워 담아오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바가지’로도 사용(使用)했고, 소먹이기를 가서 쇠잔등에 달라붙은 ‘쇠파리’도 ‘고무신’을 벗어 때려잡았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쇠파리</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b09f148a54ae1798e127c0521c74d6f03d50cd74" class="txc-image" width="530" height="77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b09f148a54ae1798e127c0521c74d6f03d50cd74" data-origin-width="940" data-origin-height="1253"></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또한 그 시절 ‘고무신’은 아이들만의 장난감만이 아니고, ‘바둑이’의 놀잇감이기도 했었다. 식구들의 ‘고무신’을 마루 밑 개집에 물어다 놓고 장난을 하기도 하고, 마당에서 이리저리 물고 끌고 다니면서 뒹굴고 물어뜯다가 호되게 매질을 당하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점점 자라 ‘중개(중간 쯤 자란 개)’ 정도가 되면, 고무신을 뒷들에 있는 보리밭에 물고 가서 갈가리 물어뜯어 놓기도 했었다. 고무신의 쫄깃쫄깃한 감촉(感觸)과 고무신 안쪽에 밴 고린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飮食物)로 착각되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보리밭으로 물고 가서 물어뜯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먹거리’보다는 ‘개껌’으로 씹은 것이기도 하다. 때로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고무신을 갈가리 물어뜯어 천금 같은 농자금(農資金)을 털어 변상을 하기도 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갖고 노는 바둑이</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4f0e5de5a07036d94e060bcf7904c8bdfa449a1" class="txc-image" width="513" height="9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24f0e5de5a07036d94e060bcf7904c8bdfa449a1" data-origin-width="393"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하는 짓이 금년 &#39;중복&#39;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귀염을 받던 ‘복실이’가 이런 사고를 몇 번 되풀이 하면, 그 해 복(伏)날을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귀여운 ‘바둑이’라도 값비싼 ‘고무신’ 손실(損失)을 더 이상 방치(放置)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더구나 이웃 집 어른들과 아낙들의 ‘고무신’까지 보리밭으로 물고 가서 갈가리 찢고 물어 뜯어버려 더 이상 벌충을 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지금은 모르지만 옛적에는 군대(軍隊)나 수형시설(受刑施設)에도 이른바 실내화라는 이름으로 검정 ‘고무신’을 착용(着用)했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지금은 군대 내무반(內務班)에 비치한 실내화(室內靴)가 모두 고급 슬리퍼로 바뀌었지만, 필자가 군대생활을 할 때는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검정고무신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질이 나쁜 고무로 만들어서였는지는 몰라도 ‘고무신’이 너무 딱딱하여 겨울에는 맨발로 신을 경우 거친 ‘고무신’ 테두리 때문에 발에 ‘생채기’가 날 정도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당시의 경우 정부(政府)든 군대(軍隊)든 모조리 도둑놈 투성이어서 실내화(室內靴) 예산을 이리저리 뜯어 먹고 가장 질이 낮은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무반 실내화</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29d033a8e12fdc815f3a76b0f51c4ddc93a4327" class="txc-image" width="517" height="40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e29d033a8e12fdc815f3a76b0f51c4ddc93a4327" data-origin-width="590" data-origin-height="405"></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마루 밑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얘기가 너무 길어져 여기에서 무조건(無條件) 파일을 덮기로 한다. 실타래 같은 ‘고무신’ 얘기를 며칠을 두고 한다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읽으시는 회원님들도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배경음악은 그 시절 ‘고무신’에 대한 우리들의 ‘바램’과 그 ‘고무신’을 사다 주시던 우리들 어머니들의 애틋했던 마음을 서리서리 그려놓은 대중가요(大衆歌謠) ‘검정 고무신’을 음미해 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뙤약볕이 쏟아지는 오일장에서 보리쌀을 팔고 있던 그 시절 우리들의 어머니</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d717b5152df458af0a5c04e9d95c77ea95c578c2" class="txc-image" width="547" height="63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d717b5152df458af0a5c04e9d95c77ea95c578c2" data-origin-width="940" data-origin-height="776"></div><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무신을 사주겠다는 엄마를 따라간 꼬마도 엄마와 함께 호객을 하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충재와 김병걸이 작사(作詞)&#8228;작곡(作曲)하고 가수 한동엽이 부른 노래인데, 오늘은 여자 가수 ‘금잔디’의 음성으로 들어본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아까운 ‘고무신’을 잃어버리고 보채던 우리들에게 힘들여 ‘고무신’을 다시 사다 주시고, 밤낮으로 애태우시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안쓰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헤아려보시기 바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검정 고무신</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한동엽 노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충재, 김병걸 작사</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이충재 작곡</span><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면</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내 마음도 따라 난단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잃어버릴라 닳아 질세라</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꿈에서 깨어 보니 아무도 없구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세월만 휭휭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보리쌀 한 말 이고 장에 가면</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사오려나 검정고무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밤이면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고이 포개서 잠이 들었네.</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잃어버릴라 닳아 질세라</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세월만 휭휭 검정고무신 우리 어머니</span><br><br><br><br><br><br><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b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160;</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anum Gothic';" data-ke-size="size18">어항</span></p>
<!-- -->
카페 게시글
◆옛선인들의작품감상◆
외동읍 신발시리즈 ‘고모신’에 얽힌 사연들
백암 문진남
추천 0
조회 75
24.08.31 18:3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