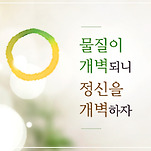<p>&#160;</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olwDno6S800&amp;list=PLTff1vXjfstHhZ2N8CbMYxzWl0SvpXJ3P&amp;index=3"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480" data-video-height="36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irm74/hyYvq5YWgK/Ua2wvwGOac5tu4KZmGBADk/img.jpg?width=480&amp;height=360&amp;face=0_0_480_360,https://scrap.kakaocdn.net/dn/cifNSH/hyYrSQxbtL/7LPRkiNt8Y7FQ2kJIu6XZK/img.jpg?width=480&amp;height=360&amp;face=0_0_480_36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480" data-video-origin-height="36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lwDno6S800" width="480" height="36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원불교&#160;변산성지 <br><br>변산성지는&#160;전라북도&#160;부안군&#160;변산면&#160;중계리&#160;내변산에&#160;위치한&#160;제법성지이다 <br>소태산&#160;대종사는&#160;원기&#160;4년&#160;10월에&#160;변산으로&#160;입산해&#160;변산&#160;봉래정사에서&#160;5년여를&#160;머무르며&#160;교법제정과&#160;새&#160;회상&#160;공개를&#160;준비했다 <br><br>소태산&#160;대종사는&#160;봉래정사에&#160;머무르며&#160;원기&#160;5년&#160;새&#160;회상의&#160;교강인&#160;사은사요와&#160;삼학팔조를&#160;발표했으며,&#160;원불교&#160;초기교서인&#160;조선불교혁신론과&#160;수양연구요론을&#160;초안했다 <br><br>소태산&#160;대종사는&#160;변산성지에서&#160;익산총부&#160;건설당시&#160;중요한&#160;역할을&#160;담당했던&#160;서중안,&#160;서동풍&#160;형제를&#160;비롯한&#160;초기교단&#160;창립인연들&#160;다수를&#160;만났다 <br><br>소태산&#160;대종사가&#160;익산충부&#160;건설로&#160;봉래정사를&#160;떠난&#160;후&#160;원기&#160;33년에&#160;오창건의&#160;발의로&#160;성지&#160;수호를&#160;위해&#160;석두암을&#160;중수했으나&#160;원기&#160;35년&#160;소실되었다 <br><br>원기&#160;65년&#160;봉래정사&#160;석두암&#160;터에&#160;교강&#160;선포&#160;60주년을&#160;기념하여&#160;일원대도비를&#160;건립했다 <br><br>&quot;변산대성지는&#160;천하의&#160;대도요&#160;만고의&#160;대법인&#160;일원의&#160;원만한&#160;진리에&#160;근원하여&#160;세계평화의&#160;원리로&#160;사은의&#160;신앙과&#160;보은의&#160;법을&#160;밝혀&#160;주셨고,&#160;만&#160;생령&#160;부활의&#160;원리요&#160;대도인&#160;삼학의&#160;원만한&#160;수행법을&#160;밝혀주신&#160;대성지이다&quot;&#160;[대산종사] <br><br>봉래정사 <br>봉래정사는&#160;소태산&#160;대종사께서&#160;원불교의&#160;교법을&#160;제정한&#160;곳이다&#160;전북&#160;부안군&#160;봉래산&#160;실상사지&#160;옆에&#160;자리하고&#160;있다&#160;현재&#160;일원대도비가&#160;위치한&#160;석두암&#160;터와&#160;석두암&#160;아래의&#160;실상초당을&#160;함께&#160;봉래정사라&#160;한다 <br><br>실상초당&#160;터 <br>원기&#160;4년&#160;소태산&#160;대종사가&#160;부안&#160;변산으로&#160;거처한&#160;이듬해&#160;마련하여&#160;제자들과&#160;함께&#160;사용한&#160;집이다&#160;이&#160;집을&#160;실상초당&#160;또는&#160;실상초옥이라&#160;부른다&#160;소태산&#160;대종사는&#160;원기&#160;5년&#160;이곳에서&#160;교리의&#160;강령인&#160;사은사요와&#160;삼학팔조를&#160;제정&#160;발표했으며,&#160;조선불교혁신론과&#160;수양연구요론을&#160;차례로&#160;초안했다&#160;특히&#160;실상사에&#160;찾아가는&#160;노부부에게&#160;실지불공의&#160;법문을&#160;한&#160;곳이기도&#160;하다 <br><br>석두암&#160;터 <br>원기&#160;6년&#160;소태산&#160;대종사는&#160;찾아오는&#160;제자들을&#160;실상초당에서&#160;다&#160;수용하지&#160;못했고&#160;이때&#160;백학명과&#160;한만허의&#160;후원으로&#160;실상초당&#160;바로&#160;위쪽에&#160;제자들과&#160;함께&#160;초가삼간을&#160;지어&#160;석두암이라&#160;이름했다&#160;소태산&#160;대종사는&#160;이곳에서&#160;창립인연들을&#160;만나&#160;새&#160;회상&#160;공개를&#160;준비했다 <br><br>변산&#160;월명암 <br>원기&#160;4년&#160;영산에서&#160;법인성사&#160;후&#160;정산종사가&#160;소태산&#160;대종사의&#160;명을&#160;받고&#160;월명암&#160;주지였던&#160;백학명&#160;스님의&#160;상좌로&#160;약&#160;2년여&#160;간&#160;머문&#160;암자이다 <br><br>월명암이라는&#160;절&#160;이름은&#160;부설거사의&#160;딸&#160;이름에서&#160;유래된다&#160;부설거사가&#160;창건한&#160;월명암은&#160;신라&#160;때&#160;의상대사가,&#160;조선조에는&#160;진묵대사가&#160;중창했고,&#160;1915년에는&#160;학면선사가&#160;4창했다&#160; <br>한국전쟁으로&#160;소실된&#160;후&#160;용성,&#160;고암,&#160;서옹,&#160;해안&#160;등의&#160;고승대덕이&#160;머물렀다 <br><br>변산원광선원 <br>원기&#160;63년&#160;변산성지를&#160;수호하고,&#160;순례인의&#160;편의&#160;제공과&#160;교도들의&#160;훈련을&#160;담당하기&#160;위해&#160;건립했다&#160;정산종사의&#160;성해를&#160;모셨던&#160;구&#160;성탑의&#160;석재를&#160;옮겨&#160;건립하고&#160;정산종사&#160;추모탑이라&#160;이름했다 <br><br>인장바위 <br>변산&#160;실상동&#160;계곡&#160;건너&#160;산&#160;중턱에&#160;위치한&#160;바위로&#160;도장을&#160;세워놓은&#160;것처럼&#160;생겼다하여&#160;도장바위&#160;또는&#160;장군바위라고&#160;불린다 <br>참선을&#160;하지&#160;않는&#160;제자를&#160;크게&#160;나무라는&#160;노승들의&#160;하소연을&#160;듣고&#160;소태산&#160;대종사는&#160;인장바위를&#160;가리키며&#160;&quot;저&#160;인장바위에&#160;금이&#160;들어있으니&#160;내&#160;말을&#160;듣고&#160;금을&#160;채굴하겠는가?&quot;라&#160;묻고,&#160;&#39;먼저&#160;실행하여&#160;모범을&#160;보이라&#39;는&#160;참된&#160;제도의&#160;방편을&#160;전해주었다 <br><br>용두샘 <br>소태산&#160;대종사를&#160;시봉하던&#160;16세의&#160;주산&#160;송도성&#160;종사가&#160;샘에서&#160;차&#160;탕기&#160;꼭지를&#160;깨고&#160;실심하여&#160;한나절을&#160;앉아있었다는&#160;이야기가&#160;전해지는&#160;용두샘은&#160;당대에&#160;봉래정사에서&#160;사용하던&#160;우물이다 <br>소태산&#160;대종사는&#160;제자들에게&#160;무슨&#160;일을&#160;당부할&#160;때면&#160;매사에&#160;정성스럽고&#160;진지했던&#160;주산종사의&#160;이야기를&#160;비유하여&#160;&quot;도성이&#160;깨진&#160;그릇&#160;붙이듯&#160;하라&quot;고&#160;당부하기도&#160;했다 <br><br>일원대도비 <br>변산&#160;성지사업회의&#160;제법성지&#160;장엄공사&#160;1차&#160;사업으로&#160;교강(敎綱)반포&#160;60주년을&#160;기념&#160;하여&#160;원기&#160;65년(1980)&#160;7월&#160;17일&#160;교강&#160;반포의&#160;땅(석두암&#160;터)에&#160;세운&#160;기념비다. <br>전면에는&#160;제법성지를&#160;기념하는&#160;대산종사&#160;휘호[일원대도&#160;(一圓大道)]를&#160;음각으로&#160;새겼으며&#160;뒷면에는&#160;제법성지&#160;비문을&#160;적었다.</p><p>&#160;</p>
<!-- -->
카페 게시글
원불교 동영상
원불교 변산성지 영상
노인광
추천 0
조회 12
25.03.20 19:4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