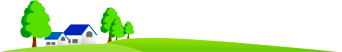|
한바탕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더니 주춤해진 더위를 사이에 두고 밤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밀려드는 요즘이다...
딱히 입맛도 없고... 그렇다고 묘한 요리도 마땅치 않다...
이것저것 뒤적뒤적 메뉴를 들춰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음식이 없다...
지리한 더위에 입맛조차 변해 버린 모양이다...
무엇을 먹을까? 뭐 좀 입맛을 돋울 것이 없을까?
지리하게 무덥던 여름의 뒷끝이 길기만 하다.
가끔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다...
삼각동에 있던 하동관 곰탕이며 종로 초입에 있는 이문 설렁탕... 을지로 인쇄소 골목에 있는 이남장 설렁탕과 관철동의 옛날 자장면...
무교동의 용금옥 추어탕... 또 같은 무교동 골목에 있는 남포면옥의 어복쟁반...
그 옆 골목에 있던 치술령의 한우 소금구이 등 등... 생각만 해도 어느새 혀 밑에 침이 고인다.
무교동 음식 중 빠트릴 수 없는 싸고 맛있는 별미 중의 별미는 토요일 점심에 자주 찾던 조개칼국수가 있었다.
대개 금요일 저녁이면 일주일 내내 과음한 속을 푸는데 그만이었던 그 인천 조개 칼국수집의 시원하고 담백한 국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워낙에 칼국수를 좋아 해서 그 집 조개 칼국수 말고도 논현동에 있는 한성 칼국수와 압구정동의 안동 칼국시 그리고 성북동 혜화동로타리 초입에 있는 할머니 칼국수집도 자주 드나들었었다.
칼국수 집마다 특색 있는 안주거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안주삼아 빈대떡 한 접시를 곁들여 먹으면 어진간한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다.
우연히 먹었던 칼국수 중 지금도 잊을 수없는 칼국수는 총각시절 시골 낚시터에서 맛 본 시골집 칼국수다.
내가 자리한 낚시 좌대 옆에 동네 아이 하나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낚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얼추 저녁시간이 되는 석양 무렵이 되었다.
배도 출출하던 차에 난 그 아이네 집에 저녁을 시켜 먹었으면 해서 슬슬 말을 건넸다.
이런 저런 얘기 끝에 저녁밥을 시켜 먹을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은 집에서 칼국수를 해먹기 때문에 밥은 없다고 했다.
'아! 하느님은 오늘도 내게 이런 훌륭한 일용할 양식을 만찬으로 준비해 주시는 구나'
잘됐다 싶어서 빨리 엄마한테 가서 어떤 낚시 아저씨가 오늘 집에서 먹는 그 칼국수 한 그릇만 부탁한다고 말씀드려 보라고 했다.
알았다며 한달음에 달려간 아이는 한 참 후 정말 칼국수 한 그릇을 내왔다.
배고픈 낚시꾼의 시장 끼에 더해서 그 날의 칼국수 맛은 "새삼 일러 무삼하리오" 급의 지상 최고의 만찬이었다.
해맑은 멸치 국물에 애호박을 고명삼아 끓여 낸 그 시골 칼국수 맛은 그 유명하다던 이 집 저 집의 비법 육수 맛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지난 번 성묘 길에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읍내로 향하는 도중에 한적한 길 가에 못 보던 칼국수 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많이 늦었지만 점심을 거른 터라 칼국수로 요기를 할 생각이 들었다.
늘 다니던 알려진 음식점 말고, 모르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건 상당한 모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간단한 요기를 위한 선택으로는 그다지 부담이 없다.
칼국수를 시키고 성묘 끝 음복도 하지 않은 터라 모처럼 그 지방에서 나오는 막걸리 한 병을 시켰다.
이 집은 주방에서 미리 다 끓인 국수를 그릇에 담아 내오는 것이 아니라 육수와 재료를 넣은 국수 냄비를 손님이 직접 끓여 먹게 했다.
손님이 간을 맞춰가며 음식 끓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음식먹는 재미의 하나다.
국수가 끓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 막걸리를 따라 마시기 딱 좋은 그 전주가 쌓인 피곤을 달래 주고 있었다.
프라스틱 병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굳이 옛날에 쓰던 양은 주전자에 부어 주었고 술잔도 옛날 양은 잔을 내왔다.
노란 양은 빛이 잃어버린 어릴 적 추억의 빛으로 되살아났고 양은 주전자와 양은 술잔의 감촉에 온기가 흘렀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보자 젊은 날 그 때 그 시절, 친구들과 젓가락 장단을 맞춰가며 막걸리를 마시던 생각이 떠 올랐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용케도 중중머리 잦은머리에서 무르팍장단까지를 쳐가며 '문패도 번짓 수도 없는 주막에 ...' 어쩌고 해가며 유성기 판을 돌리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노래를 불렀었다.
양은주전자의 공명통에서 나는 젓가락 부딛치는 특유한 금속성 소리와 통나무 목판 술상을 치는 둔탁한 손바닥 소리는 그야 말로 음양이 어울리는 자연의 소리였다.
쇠와 나무는 상극이라 했지만 아니었다. 그 상극의 두 쇠와 나무에서 울리는 장단소리는 상극을 뛰어 넘어 상생의 하모니로, 절묘한 우리의 소리로 다시 태어 나는 것이었다.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한다. 매콤한 해물 칼국수 국물을 한 수저 떠서 맛을 다신다.
'어! 시원쿠나!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행복의 문...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행복의 문을 보지 못한다...
|
출처: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처럼... 원문보기 글쓴이: 봉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