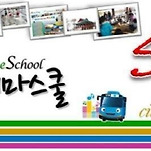<h2>부산경찰서를 폭파하고 조국 독립 위해 27세 젊음 불살라</h2><p>나이스중구 제461호</p><p><span class="strapline">주경업의 중구이야기〈13〉- 부산경찰서와 의사 박재혁</span> </p><div class="content"><div class="photo1" style="width: 350px;"><img width="350"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sjunggu.go.kr%2Ffileupload%2FNewsPDS%2FhmBhfvwwVFRRrifWcWbHFi9yOoluEF.jpg"> <span>&lt;사진설명&gt;</span></div><p style="font-size: 15px;"> 전국&nbsp;각&nbsp;곳에서&nbsp;기미독립운동이&nbsp;일어난&nbsp;다음해(1920년)&nbsp;9월&nbsp;2일&nbsp;한낮,&nbsp;용두산&nbsp;남쪽&nbsp;기슭의&nbsp;부산부청&nbsp;곁에&nbsp;자리한&nbsp;부산경찰서에&nbsp;느닷없이&nbsp;폭탄이&nbsp;터지면서&nbsp;경찰서장이&nbsp;피투성이가&nbsp;되고&nbsp;아래&nbsp;위층에&nbsp;있던&nbsp;경찰관들이&nbsp;혼비백산하는&nbsp;사건이&nbsp;벌어졌다.<br> 부산경찰서에&nbsp;폭탄을&nbsp;터트린&nbsp;사람은&nbsp;27세&nbsp;젊은피가&nbsp;끓는&nbsp;부산청년&nbsp;박재혁이었다.&nbsp;박재혁(朴載赫,&nbsp;1894∼1921)은&nbsp;범일동에서&nbsp;가난한&nbsp;선비의&nbsp;3대&nbsp;독자로&nbsp;태어나&nbsp;사립육영학교(지금의&nbsp;부산진초등학교)를&nbsp;졸업하고&nbsp;부산상고(제4회)를&nbsp;졸업한다.&nbsp;15세&nbsp;때&nbsp;부친을&nbsp;여읜&nbsp;박재혁에게는&nbsp;처지가&nbsp;비슷한&nbsp;세&nbsp;친구가&nbsp;있었다.&nbsp;최천택(崔天澤),&nbsp;오택(吳澤)이었다.&nbsp;셋은&nbsp;결의형제를&nbsp;맺고&nbsp;부모상을&nbsp;당할&nbsp;때는&nbsp;상주노릇을&nbsp;하는&nbsp;등&nbsp;모든&nbsp;일에&nbsp;뜻을&nbsp;함께&nbsp;하기로&nbsp;약속하였다.<br> 부산상고를&nbsp;졸업한&nbsp;박재혁은&nbsp;부산에&nbsp;본사를&nbsp;둔&nbsp;조선와사전기(주)에&nbsp;취직하는&nbsp;등&nbsp;직업전선에&nbsp;뛰어드나,&nbsp;1918년&nbsp;최천택이&nbsp;조직한&nbsp;구국단(救國團)에&nbsp;가입하고&nbsp;1920년에는&nbsp;의열단(義烈團)에&nbsp;몸담는&nbsp;등&nbsp;독립운동에&nbsp;적극적으로&nbsp;나선다.&nbsp;그해&nbsp;7월&nbsp;상해에서&nbsp;의열단장&nbsp;김원봉(金元鳳)을&nbsp;만나므로&nbsp;일본요인의&nbsp;암살지령을&nbsp;받고,&nbsp;중국&nbsp;서적상으로&nbsp;변신하여&nbsp;책보따리&nbsp;깊숙히&nbsp;폭탄을&nbsp;감추고&nbsp;일본을&nbsp;거쳐&nbsp;귀국한다.&nbsp;서울로의&nbsp;상경은&nbsp;실패하지만&nbsp;부산경찰서가&nbsp;애국지사를&nbsp;많이&nbsp;체포한다는&nbsp;정보를&nbsp;듣고&nbsp;경찰서를&nbsp;폭파하여&nbsp;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nbsp;경각심을&nbsp;불러일으키고자&nbsp;결심한다.<br> 거사&nbsp;당일&nbsp;중국인&nbsp;고서적상으로&nbsp;변장한&nbsp;박재혁이&nbsp;경찰서장&nbsp;하시모토(橋本秀平)를&nbsp;면담한다.&nbsp;하시모토가&nbsp;고서적을&nbsp;구경하는&nbsp;틈을&nbsp;타서&nbsp;폭탄을&nbsp;꺼내&nbsp;마룻바닥에&nbsp;던졌다.&nbsp;그리고&nbsp;유창한&nbsp;일본말로&nbsp;우리나라&nbsp;독립투사를&nbsp;붙잡아&nbsp;괴롭힌&nbsp;죄상을&nbsp;추상같이&nbsp;꾸짖었다.&nbsp;천지를&nbsp;뒤흔드는&nbsp;굉음과&nbsp;함께&nbsp;하시모토는&nbsp;피투성이가&nbsp;되어&nbsp;쓰러지고,&nbsp;박재혁도&nbsp;무릎&nbsp;부상으로&nbsp;현장에서&nbsp;잡히고&nbsp;만다.&nbsp;박재혁과&nbsp;가까운&nbsp;최천택을&nbsp;비롯한&nbsp;요시찰&nbsp;인물들이&nbsp;잡혀&nbsp;들어왔으나&nbsp;끝내&nbsp;단독범행임을&nbsp;주장하였다.&nbsp;<br> 부산지방법원에서는&nbsp;무기징역형을&nbsp;선고&nbsp;받으나&nbsp;대구복심원(지금의&nbsp;대구고등법원)에서&nbsp;사형선고를&nbsp;받는다.&nbsp;박&nbsp;의사는&nbsp;일본인&nbsp;손에&nbsp;교수형을&nbsp;당하느니&nbsp;스스로&nbsp;목숨을&nbsp;끊기로&nbsp;결심하고&nbsp;단식으로&nbsp;절명한다.&nbsp;사형집행&nbsp;예정일을&nbsp;사흘&nbsp;앞둔&nbsp;1921년&nbsp;5월이었다.&nbsp;옥사한&nbsp;박&nbsp;의사의&nbsp;유해가&nbsp;부산진역에&nbsp;닿자&nbsp;박&nbsp;의사의&nbsp;순국을&nbsp;애도하여&nbsp;모인&nbsp;군중이&nbsp;인산인해를&nbsp;이루었다.&nbsp;놀란&nbsp;일본경찰은&nbsp;군중을&nbsp;강제&nbsp;해산시키고&nbsp;장례에는&nbsp;유족으로&nbsp;남자&nbsp;2명,&nbsp;여자&nbsp;3명만&nbsp;입회시켰으며,&nbsp;입관&nbsp;때는&nbsp;인부&nbsp;2명을&nbsp;제외하고&nbsp;삼엄한&nbsp;경계를&nbsp;폈다.&nbsp;박&nbsp;의사&nbsp;유해는&nbsp;좌천동&nbsp;공동묘지에&nbsp;묻혔다가&nbsp;1969년&nbsp;서울&nbsp;동작동&nbsp;국립묘지에&nbsp;안장되었다.<br> 부산의&nbsp;일본경찰서는&nbsp;개항&nbsp;후&nbsp;1880년&nbsp;4월&nbsp;`영사관경찰서'로&nbsp;창설되어&nbsp;1890년&nbsp;이사청(지금의&nbsp;동광동&nbsp;2가,&nbsp;일제가&nbsp;부산에&nbsp;설치한&nbsp;통감부의&nbsp;지방자치&nbsp;기관)&nbsp;입구&nbsp;계단&nbsp;동쪽에&nbsp;청사를&nbsp;지어&nbsp;사무를&nbsp;보았다.&nbsp;후에&nbsp;불타고&nbsp;다시&nbsp;지은&nbsp;2층&nbsp;목조에&nbsp;기와지붕을&nbsp;얹은&nbsp;전형적인&nbsp;일본관공서&nbsp;건물이었다.&nbsp;1910년&nbsp;이사청이&nbsp;폐지되자&nbsp;경찰권은&nbsp;완전히&nbsp;독립되었고,&nbsp;1928년대&nbsp;후반&nbsp;지금의&nbsp;대창동&nbsp;1가의&nbsp;중부경찰서&nbsp;자리로&nbsp;옮겨간다.&nbsp;동광동의&nbsp;건물은&nbsp;부산부의&nbsp;내무과&nbsp;사무실로&nbsp;사용되었다.&nbsp;해방이&nbsp;되자&nbsp;이&nbsp;건물에&nbsp;남궁산부인과가&nbsp;자리한다.<br>문의:010-8224-5424&nbsp;부산민학회장</p></div>
<!-- -->
카페 게시글
^)^주경업의 중구이야기
주경업의 중구이야기〈13〉- 부산경찰서와 의사 박재혁
여로
추천 0
조회 76
15.04.27 13:0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