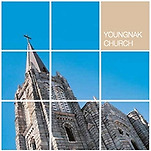<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lt;iframe type=&quot;text/html&quot; src=&quot;https://www.youtube.com/embed/ujc0agfL-4w?mute=0&amp;autoplay=1&amp;loop=1&amp;playlist=ujc0agfL-4w&amp;start=0001&amp;end=0211width=&quot;0&quot; height=&quot;0&quot; frameborder=&quot;0&quot; allow=&quot;autoplay&quot;&gt;&lt;/iframe&gt;"><div data-ke-class="article"><iframe type="text/html" src="https://www.youtube.com/embed/ujc0agfL-4w?mute=0&autoplay=1&loop=1&playlist=ujc0agfL-4w&start=0001&end=0211width="0" height="0" frameborder="0" allow="autoplay"></iframe></div></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91.7079%;"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23"><b>&#160; &#160; &#160; &#160; &#160;&#160; ‘수선화에게’</b></span><br><b>&#160; </b><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20"><b> &#160;&#160; &#160; &#160; &#160; &#160; &#160;&#160; <span data-ke-size="size18">울지마라</span></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외로우니까 사람이다</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갈대 숲에서 가슴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br></b></span><br><span style="color: #1b711d;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8"><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lt;정호승(鄭浩承·1950~ &gt;, 시/ “수선화에게“ 전문입니다.</b></span><br><b><b>&#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b></b><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NL9x/b0e5e2d7cb3863c37cde340a1102f5860f347130" class="txc-image" width="418" height="27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NL9x/b0e5e2d7cb3863c37cde340a1102f5860f347130" data-origin-width="900" data-origin-height="600"></div><br><b><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5f6d2b;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6"> ◇ 생각보다 감성이 여린 탓인지 나이를 먹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역시 실존적인 외로움과 싸움입니다</span></span><span style="color: #5f6d2b;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6">. 평생 책과 함께 바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쉽사리 곁을 떠나지 않는 끈질긴 고독과 외로움의 실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나 마귀 그 자체란 생각을 할 때가 많았네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삶인데 왜 외로우냐는 질타의 소리도 숱하게 들었지만, 여전히 다 떨치진 못하고 오늘도 삽니다. </span></b><span style="color: #5f6d2b;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6"><b>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롭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예 잘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혹자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지요. 그런데도 온전히 떨치지 못하고 사는 오늘의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싶어 절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요. </b></span><span style="color: #5f6d2b;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16"><b>나의 고독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때, 이 시를 만났습니다. 무릎을 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시를 보내주셨단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함께 삽니다. 특별히 털어버리거나 떨치려고 몸부림을 하지도 않지요. 받아들이니 감사가 나오고 고독도 과해서 못 가진 사람에 비하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싶기도 하지요. 의인 오십 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그 숫자를 줄여가며 찾으실 때 하나님만큼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lt;‘삶을 나르는 시(강남국, 등대지기, 2019)’에서 옮겨 적음.&gt;</b></span></td></tr></tbody></table></div><p>&#160;</p>
<!-- -->
카페 게시글
좋은 시
‘수선화에게’ /정호승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361
23.12.01 08:1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