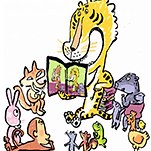<P> <A name="[문서의 처음]"></A></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엄마의 마흔번째 생일</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지은이 최나미&nbsp; 1965년생. 서울여대 아동학과 졸업. 한겨레작가학교 졸업.</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04년&lt;바람이 울다 잠든 숲&gt;, 2005년&lt;진휘 바이러스&gt;,&lt;엄마의 마흔번째 생일&g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06년&lt;걱정쟁이 열세 살&gt;, 2010년&lt;움직이는 섬&gt;</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lt;엄마의 마흔번째 생일&gt;은 할머니, 직장인 아빠, 전업주부 엄마, 중학생 언니 가희 그리고 가영, 이렇게 3대가 사는 집에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갈등을 겪는 이야기이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 아이 가영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와 대비시키며, 하고 싶은 일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엄마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물음을 주고 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1.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살림과 육아, 시부모의 봉양이 첫 번째 의무가 된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집안일 다음이며, 직업을 갖더라도 명절이나 제사를 비롯한 집안일을 완벽히 할 것을 요구 받는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이 책의 ‘엄마’는 마흔번째 생일에 그림그리기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아빠는 물론이고 딸들, 외할머니 모두 반대하지만, 엄마는 고모들을 불러 할머니 간병 당번을 정해준 후 아빠에게 주말을 할당한다. 고모들은 엄마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고, 아빠는 책임감 있는 협조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부모님 간병 같은 일은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맞지만, 며느리인 엄마에게 떠미는 것이 현실이다. 집안일과 육아, 부모봉양은 가족일이라 생각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2.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이 책에서의 남편은, 남편은 가족부양을 하고 아내는 집안에서의 가사와 가족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집안일과 그림그리기를 함께 하려는 아내와의 생각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만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남편과 아내의 성역할이 강하게 고정되면 유연할 때보다 더 불행할 수 있다. 이런 남자가 만일 부양 의무를 못하게 되면 크게 실의에 빠질 것이다. 아내는 집안일이라는 1차 의무에 얽매어 하고 싶은 일을 맘껏 못하고, 둘 다 하더라도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가지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실제로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라도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3배 한다는 통계가 있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남녀 모두 자신의 적성을 살려 직업을 선택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며, 남자든 여자든 주부가 되었을 때는 편견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3. ‘당분간 아빠와 엄마가 떨어져 지낸다’는 결말이 어린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지혜롭게 해결되어 모두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 문제에 대입할 ‘지혜’를 보여주지도, 확실한 해방감을 주지도 않는다. 초등 고학년이 읽기에 적합한가?</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최나미 작가가 이 책을 쓴 것이 2005년이었다. 이 책에서 문제 제기가 된 성차별, 가부장제 사회에서 엄마에게 강요된 역할, 이혼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nbsp;&nbsp;&nbsp;&nbsp; 10대부터 황혼의 부부까지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이 호주제도 폐지되었으며, 외가와 가까이 지내는 비율이 늘었고,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편견은 거의 없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그럼에도 시댁에 가족이 모였을 때 음식장만은 며느리의 몫이며, 시부모 간병의 의무도 며느리가 최우선이다. 결혼한 여자는 시댁에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남성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전업주부 또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우리 사회에서 엄마에게 강요된 역할, 며느리에게 부여된 역할이 정당한가?</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가족내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가 동등한 입장에서 가족일(음식장만, 제사, 부모님 생신, 간병 등)을 분배할 수는 없나?</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nbsp;전업주부는 다른 직업이 없으므로 시댁 식구들이 모였을 때 가족일을 도맡아야 하는가?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nbsp;(전업주부라도 친정일에 의무감은 적다)</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한컴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0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x; COLOR: #000000; FONT-SIZE: 10pt"><BR></SPAN></P>
<!-- -->
카페 게시글
교육부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김도연
추천 0
조회 69
11.04.12 17:4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