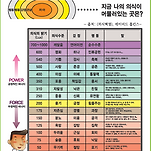<p><span style="font-size: 11pt;">beyond reason</span><br></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육바라밀(六波羅密)&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육바라밀(六波羅密)에서 '바라밀'이란<br>산스크리트의 <b><span style="color: rgb(255, 0, 0);">'paramita</span></b>'를 발음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의미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처음에는 도피안(到彼岸)의 뜻으로<br>'<b><span style="color: rgb(9, 0, 255);">피안에 이른다</span></b>'와 도(度)의 뜻으로 '구제한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번역되었지만,</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최근에는 '성취' '최상' '완성'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바라밀행(波羅蜜行), 그리고 무아(無我)를 실천하는 길</span></b>은<br><b><span style="color: rgb(9, 0, 255);">나를 넘어서는 어떠한 보편적인 진리를 위해</span><br><span style="color: rgb(9, 0, 255);">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 존재인 보살의 삶의 방식</span></b>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즉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팔정도의 개인적 수행법의 차원에서<br>사회적 책임까지도 강조하는 의미를 포함한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법이 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무아를 실천하는 길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바라밀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의 6가지로&nbs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2pt;">보살의 수행 실천덕목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1)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dana-paramita)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69, 98, 195); font-size: 13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span></b>을 뜻한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아함의 교설에서도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종교적 행위로 설해지고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나 대승불교에서의 보시는 공덕을 바라고 남에게 시여하는 것이 아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금강경에 "보살은 마땅히 법에 주(住)함이 없이 보시할지니,<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소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주함이 없이 베풀어주어야 한다."고&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설해져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베풀어주어도 준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므로 보살의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하나니,<br>주는 자(施者)와 받는 자(受者)와 주는 물건(施物)의 셋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lt;대품반야 권 7&g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2)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sala-paramita)은</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3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계율을 잘 지니는 것</span></b>을 뜻한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국가에는 법률이 있고 사회에는 도덕이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불교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로서<br>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가 있고,<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출가한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각각 250계, 348계라는 구족계(具足戒</span></b>)가 있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지계바라밀은 이러한 법과 계율들을 잘 지키는 것인데,<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이때도 계율을 지킨다는 부담감이나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된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죄(罪)와 부죄(不罪)를 얻을 수가 없는 불가득의 공관에서<br>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준법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lt;대품반야 권 1&g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3)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ksanti-paramita)은</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3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span></b>安受苦忍 안수고인)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우리는 조금만 욕된 일을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곧 좌절되기 쉽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나 보살은 그런 경우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이니,<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제법(諸法)이 본래 불생(不生)임을 보기 때문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금강경에서 석가모니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생담을 설하고 계신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옛날 가리(Kaling-a)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만일 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마땅히 진한(瞋恨)이 일어났을 것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나 내겐 그러한 상이 없었느니라."</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4)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virya-paramita)은</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3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부지런히 노력하여 방일하지 않는 것</span></b>을 뜻한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선법을 증장시키는 데에 있어 정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아함교설의 여러 가지 행법(三十七助道品 삼십칠조도품)에는<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정진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석가모니께서 열반에 임하였을 때</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는 법이니 방일하지 말라</span></b>.</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불방일로써 나는 정각에 이르렀으며 무량한 선을 낳은 것도 불방일이니라."고<br>유촉하고 계신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공관(空觀)의 실천을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5)선정바라밀(禪靜波羅密dhyana-paramita)에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3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선(禪)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span></b>(靜盧정려)을 뜻한다.&nbs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신(god)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는 달리 불교처럼 존재의 실상을 밝혀<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인간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무지를 타파하려는 종교에서<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선은 특히 중요한 행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기에 원시불교에서도 사선(四禪)의 행법이 설해져 있으며<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대승불교에서도 육바라밀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나 이것 또한 머무름이 없는 법(不住法) 속에서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nbsp;</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6)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prajna-paramita)에</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3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육바라밀에서의 반야바라밀은<b><span style="color: rgb(255, 94, 0);">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span><br></b></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255, 94, 0);">다섯 바라밀의 주도자이며 그들의 성립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span></b>으로 충분하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다섯 바라밀은 모두가 반야공관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마치 대지에 씨앗을 뿌리면 인연 화합하여 생장이 있게 되는데,<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이때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이와 같이 다섯 바라밀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반야바라밀 속에 머물러 증장함을 얻는다.&nbs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lt;소품반야 권2&g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간심(인색함)·범계심(犯戒心)·진심(瞋心)·해태심(懈怠心)·산란심(散亂心)·무지심(無智心)이 있을 때</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큰 자비(maitri-karuna)는 일어날 수가 없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그러나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법의 공에 상응하는 까닭에<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능히 대자대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nbs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lt;대품반야 권 1&gt;</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반야바라밀다는 이렇게 모든 분별 방념을 초월하여 말할 수 없이 청정한 것이며,<br>모든 선법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며,&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놀람이 없고 거꾸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고 반야심경은 설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br>삼세의 모든 부처가 무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도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lt;반야심경&gt; 소승불교의 출세간적인 종교적 행위는</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dotum, Tahoma, 굴림; font-size: 12px;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1.6pt; word-break: break-all; background-color: rgb(251, 250, 241); line-height: 21.6px;"><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대승불교의 반야바라밀다에 이르러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지극히 적극적인<br></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11pt;">종교적 행위로 지양된 것을 볼 수가 있다.</span></p>
<!-- -->
카페 게시글
깨달음 이야기
6바라밀 행 - 6가지 피안으로 가기 위한 길
문형철
추천 0
조회 448
20.08.17 22:4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