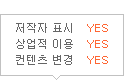<p>&nbsp;</p><!--StartFragment-->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9</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회 하곡학교실 강의자료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5</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6</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經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居處</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條</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1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冬溫而夏&#2093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昏定而晨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체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의 예절은 겨울에는 부모님께서 따듯하신지 여름에는 시원하신지 살펴보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침과 저녁에는 안부를 살피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레들과 다투면서 쉽게 홧김에 자신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또레들과 다투지 않도록 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曲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凡&#28858;人子之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冬溫而夏&#2093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昏定而晨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在丑夷不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1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事父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437;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230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14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冠&#32204;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左右佩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左佩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410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刀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小&#3532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金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右佩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3532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58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들로서 부모님을 모실 때는 새벽에 첫닭이 울 때 모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머리카락을 빗어 검은 비단으로 싸매서 꼭지에 비녀를 꽂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갓을 쓰고 갓끈을 턱밑에 묶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리띠 왼쪽에는 수건을 오른쪽에는 도구들을 찬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리띠 왼쪽에는 수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은 칼과 숫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은 뿔송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햇볕을 모아 불을 피우는 둥근 구리거울을 차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른쪽에는 화살통과 필통 상아로 만든 송곳을 차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리를 묶은 각반을 단단히 묶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小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明倫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內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事父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8622;初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咸&#3043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230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157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拂&#3965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冠&#32204;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端</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888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搢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左右佩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58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365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著&#3216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天欲明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昧爽乃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아들과 딸은 달이 지고 별빛이 흐려지면서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일어나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먼동이 틀 때에는 부모님께 찾아가 인사 올리고 아침밥을 잡수셨는지를 여쭙고 잡수셨으면 물러나고 잡수시지 않았으면 곁에서 잡수시는 것을 모신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內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男女未冠&#31492;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8622;初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咸&#30437;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櫛&#3230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拂&#39654;總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衿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皆佩容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昧爽而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問何食&#39154;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由命士以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子皆異宮</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昧爽而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慈以旨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日出而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各從其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日入而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慈以旨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適父母之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下氣怡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問衣&#35158;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疾痛苛&#30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而敬抑搔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出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則或先或後而敬扶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問所欲而敬進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色而溫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벽에 의관을 갖춘 뒤에 부모님 처소에 가서 목소리를 낮추고 곱게 하여 옷이 따듯한지 추운지를 여쭙고 아프거나 가렵다고 하시면 조심스럽게 마사지하거나 긁어드린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께서 밖에 나가시거나 들어오실 때는 앞에서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께 잡수시고 싶은 것을 여쭈어서 조심스럽게 바치고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온화하게 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內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以適父母舅姑之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及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下氣怡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問衣&#29152;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疾痛苛&#30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而敬抑搔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出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則或先或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而敬扶持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問所欲而敬進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柔色以溫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具而共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尊長擧&#3159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婦乃各退就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식사할 때는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님께서 잡수시고 싶은 음식을 여쭙고 어린아이들은 먹고싶은 대로 먹을 수 없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린아이에게는 다만 어른께서 잡수신 뒤 물리신 음식을 먹인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과 어른께서 젓가락을 들으신 뒤에 아들과 며느리는 각기 물러나서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밥을 먹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小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明倫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溫公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母舅姑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供藥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婦具晨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尊長&#33289;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婦乃各退就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注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藥物乃關身之切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人子當親自檢校調煮供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可但委奴&#2016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脫若有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卽其禍不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晨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俗謂點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易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在中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惟酒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是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凡烹調飮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婦人之職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近年婦女驕倨皆不肯入&#24214;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今縱不親執刀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亦當檢校監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務令淸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司馬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居家雜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將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婦請所欲於家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卑幼各不得恣所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退具而供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尊長&#33289;&#3159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婦乃各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就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丈夫婦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各設食於他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依長幼而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其&#39154;食必均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幼子又食於他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亦依長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席地而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男坐於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女坐於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丈夫婦人各設食於&#20311;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依長幼而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幼子又食於&#20311;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亦依長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男坐於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女坐於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들 부부는 부모님과 다른 곳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순서대로 앉아서 먹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지만 형제들은 다른 곳에 밥상을 차리고 순서대로 앉아 먹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앉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命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唯而無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手執業則投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食在口則吐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走而不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얼른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대답하고 뜸드려 허락하듯이 하지 않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손에 집고 있는 일을 버리듯이 내려놓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에 들은 밥을 뱉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려가며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玉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命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唯而不諾</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手執業則投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食在口則吐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走而不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在父母舅姑之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有命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應唯敬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進退周旋愼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升降出入揖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敢&#22118;噫&#22164;咳欠伸跛倚&#30535;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敢唾&#2793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寒不敢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306;不敢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有敬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敢袒&#3506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涉不&#2722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褻衣衾不見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아들이나 며느리를 부르면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하고 공경스럽게 대답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나가거나 들어오는 행동을 모두 신중하게 하며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몸을 숙이고 걷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함부로 휘파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트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체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리 펴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쪽 다리로 서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기대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곁눈질을 하지 않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함부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춥다고 함부로 옷을 껴입지 않고 가렵다고 함부로 긁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심해야할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면 옷을 걷어올리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이불이나 속옷은 속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內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在父母舅姑之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有命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應唯敬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進退周旋&#24910;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升降出入揖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敢&#22118;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2159;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欠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跛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535;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敢唾&#2793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寒不敢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306;不敢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有敬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敢袒&#3506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涉不&#2573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褻衣衾不見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嚴威儼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非所以事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엄격하게 위엄을 나타내거나 엄숙하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태도가 아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祭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嚴威儼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非所以事親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孔穎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謂儼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謂恭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坐如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立如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訊不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言必齊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未得爲人子之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 앞에서 앉을 때 마치 시동</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尸童</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처럼 단정하게 앉거나</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있을 때 마치 제사지내는 것처럼 엄숙하게 서있거나</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묻지 않으셨는데 함부로 말하거나</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할 때 안색을 몹시 엄숙하게 하는 것은 모두 아들의 도리가 아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大戴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曾子事父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孝子無私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母所憂憂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母所樂樂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孝子唯巧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故父母安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若夫坐如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立如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弗訊不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言必齊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此成人之善者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未得爲人子之道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閨門之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戱而不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떠들고 놀되 탄식하지 않도록 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禮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坊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閨門之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138;而不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138;謂孺子言笑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又謔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2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居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親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叱咤之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未嘗至於犬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증자가 집안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계시면 야단치는 큰소리가 개와 말에게 야단치는 소리처럼 크지 않았습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小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稽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公明宣學於曾子三年不讀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曾子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而居參之門三年不學何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公明宣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安敢不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見夫子居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親在叱&#21522;之聲未嘗至於犬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說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學而未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見夫子之應賓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恭儉而不懈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說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學而未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見夫子之居朝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嚴臨下而不&#27584;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說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學而未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說此三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學而未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宣安敢不學而居夫子之門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若飮食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雖不嗜必嘗而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加衣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雖不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服而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加之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人代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雖不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姑使之而後復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시면 비록 입에 맞지 않더라도 맛을 본 뒤에 어른께서 버리라고 하신 뒤에야 버린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옷을 내려주시면 비록 입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입어본 뒤에야 벗어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을 시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시면 비록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더라도 잠시 그 사람에게 맡긴 뒤에 나중에 다시 일을 맡는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小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明倫十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內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30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子婦孝者敬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舅姑之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勿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勿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若飮食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雖不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必嘗而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加之衣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雖不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必服而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加之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人代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己雖不欲姑與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529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而姑使之而後複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nbsp; </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