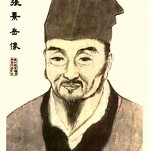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2.&#160;증(證)을 논(論)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황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黃疸</span><span style="color: #ff0000;">)&#160;</span>일증(一證)은 고인(古人)들이 대부분 습열(濕熱)이라 말하였고&#160;<span style="color: #ff0000;">오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五疸</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로 구분(分)하였으나 모두 족히 다하지는 못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황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대요(大要)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곧&#160;<span style="color: #ff0000;">양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160;<span style="color: #ff0000;">음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陰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160;<span style="color: #ff0000;">표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表邪</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의 발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發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160;<span style="color: #ff0000;">담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膽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임을 모르기 때문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 네 가지를 알면 황달(黃疸)의 증(證)에서 나머지 정의(義)는 없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단계(丹溪)는 이르기를 &#39;황달(疸)을 다섯 가지 종류(種)로 구분(分)할 필요가 없다. 모두 같은 습열(濕熱)이니, 마치 누룩(:&#40623;)을 덮는(:&#30438;) 것과 비슷하다.&#39;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어찌 모두 누룩(:&#40623;)을 덮는(:&#30438;) 것과 같으며 모두 습열(濕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족히 믿을 바가 아니니, 내가 아래와 같이 열거(列)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양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陽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증(證)</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습(濕)이 많으므로 인하여 열(熱)이 되고 열(熱)하면 황달(黃)이 생기니라. 이것은 소위&#160;<span style="color: #f200f2;">습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그 증(證)은 반드시&#160;<span style="color: #0000ff;">신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身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있고 번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煩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있으며 혹 조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躁擾</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불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寧</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소곡</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消穀</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선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善飢</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열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熱痛</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적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赤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비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秘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그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반드시 홍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洪滑</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유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有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 증(證)은 표리(表裏)를 불구하니,&#160;<span style="color: #f200f2;">풍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風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외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外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거나&#160;<span style="color: #f200f2;">주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酒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내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의해 모두 이를 수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단지 살펴서 그 원기(元氣)가 여전히 강(强)하고 비위(脾胃)가 손(損)이 없으면서 습열(濕熱)이 성(盛)하면 마땅히 직접&#160;<span style="color: #00cc00;">화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火邪</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청</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고&#160;<span style="color: #00cc00;">소변</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小便</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利</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 습열(濕熱)이 거(去)하면 황달(黃)은 저절로 퇴(退)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를 치료(治)하는 것은 본래 어렵지 않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음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陰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증(證)</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전적(:全)으로 습열(濕熱)이 아니니, 모두&#160;<span style="color: #f200f2;">혈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敗</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말미암느니라. 기(氣)가 혈(血)을 생(生)하지 못하므로 혈(血)이 패(敗)하고 혈(血)이 색(色)을 화(華)하지 못하므로 색(色)이 패(敗)한다. 병(病)으로 황달(黃疸)하면서 전혀 양증(陽證) 양맥(陽脈)이 없으면 곧&#160;<span style="color: #ff0000;">음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陰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음황(陰黃)의 병(病)은 어떻게 이르는 것인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반드시&#160;<span style="color: #f200f2;">칠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七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으로 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거나&#160;<span style="color: #f200f2;">노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으로 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形</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므로 인하여&#160;<span style="color: #f200f2;">중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中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크게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니 비(脾)가 혈(血)을 화(化)하지 못하므로 비토(脾土)의 색(色)이 저절로 밖(: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그것이 병(病)이 되면 반드시&#160;<span style="color: #0000ff;">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것을 좋아하고 동</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는 것을 싫어하며 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것을 좋아하고 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明</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것을 두려워하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畏</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신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神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곤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困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언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言語</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경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輕微</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혹 정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24596;&#24545;</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현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眩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외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畏寒</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소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少食</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사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四肢</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무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無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혹 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부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膏</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와 같으며 맥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息</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무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無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는 등의 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 되니, 전부&#160;<span style="color: #f200f2;">양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증후(候)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것과 습열(濕熱)의 발황(發黃)은 마치 얼음과 숯불(:氷炭)과 같이 서로 반대(反)가 되니, 속히&#160;<span style="color: #00cc00;">원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元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고&#160;<span style="color: #00cc00;">비신</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脾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대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지 않으면 결코 복원(復元: 원래대로 회복되다)될 리(理)가 없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또한 이 증(證)이 가장 많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 색(色)이 황(黃)한 것만 보고 맥증(脈證)을 살피지 않으면서 결국 &#39;황달(黃疸)은 모두 습열(濕熱)이다.&#39;고 하면서, 그 치료(治)를&#160;<span style="color: #834d00;">인진</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span style="color: #834d00;">茵蔯</span><span style="color: #834d00;">)&#160;</span><span style="color: #834d00;">치자</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span style="color: #834d00;">梔子</span><span style="color: #834d00;">)</span>의 사화(瀉火) 이수(利水)하는 방제(劑)로 하게 되면 약(藥)을 쓰는 대로 폐(斃)하지 않는 수 없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표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表邪</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의 발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發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즉&#160;<span style="color: #f200f2;">상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상한(傷寒)으로 한(汗)이 투(透)하지 못하면서&#160;<span style="color: #f200f2;">풍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風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있으면 황증(黃證)이 있게 된다. 혹은 표사(表邪)가 풀리지 않고 표(表)에서 리(裏)로 전(傳)하여&#160;<span style="color: #f200f2;">습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도 황증(黃證)이 있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표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表邪</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가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발열(發熱) 신통(身痛) 맥부(脈浮) 소한(少汗)하니, 마땅히 발한(汗)으로 산(散)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습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내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반드시 번열(煩熱)하고 맥(脈)이 완활(緩滑)하며 다한(多汗)하니 마땅히 청리(淸利)하여 분소(分消)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양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실</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고 사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邪</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내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비결(&#30174;結) 창만(脹滿)하면 마땅히 먼저 하(下)하여야 하고, 그 연후에 나머지 열(熱)을 청(淸)하여주면 저절로 낫지 않음이 없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담황</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膽黃</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증(證)</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대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大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거나 대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大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거나 투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鬪毆</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싸우고 때리다</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경우에 모두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일찍이 호랑(虎狼: 호랑이나 이리)에 놀라(:驚)&#160;<span style="color: #f200f2;">갑자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突然</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喪</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고 병(病)으로 황달(黃)을 하는 경우를 보았으니, 이 병(病)은 빠르게(:驟) 오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또 혹독(:酷)한 벼슬아치(:吏)를 만나거나 화해(禍害: 재난)의 염려(:慮)로&#160;<span style="color: #f200f2;">공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恐怖</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그치지 않아서</span>(:不已) 병(病)으로 황달(黃)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 병(病)은 천천히(:徐) 오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남북조(南北朝) 제(齊)나라 때의 영명(永明) 11년(: 494년)에 태학생(太學生)이었던 위준(魏準)이 두려움(:惶懼)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 몸(:體)을 들어보니 모두 청(靑)하였다. 시인(時人)들이 이를&#160;<span style="color: #f200f2;">담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膽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라고 하였는데, 곧 이러한 종류(類)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또 일찍이 육박전(:鬪毆)을 한 후에 날마다 점차 병(病)으로 황달(黃)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160;<span style="color: #f200f2;">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므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었니라. 그 증(證)은 화(火)도 없고 습(濕)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혼침(昏沈) 곤권(困倦)하고 그 색(色)이 마치 염색(:染)한 듯 정황(正黃)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러한 여러 증(證)들은 모두&#160;<span style="color: #f200f2;">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므로 인한 것이니, 담(膽)이 상(傷)하면&#160;<span style="color: #f200f2;">담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膽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敗</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담액(膽液)이 설(泄)하므로 이 증(證)이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경(經)에 이르기를 &#39;담액(膽液)이 설(泄)하면 구고(口苦)하고 위기(胃氣)가 역(逆)하면 구고(嘔苦)한다. 따라서 이를&#160;<span style="color: #ff0000;">구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嘔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한다.&#39; 하였으니, 그 의미(:義)가 이와 같으니라.</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또 담(膽)은 간(肝)에 부착(附)되어 소양(少陽)의 춘생지기(春生之氣)를 주(主)하니 이에 생(生)이 있으면 생(生)하고 생(生)이 없으면 사(死)한다. 따라서 경(經)에 이르기를 &#39;십일장(十一藏)은 모두 담(膽)에서 결단(決)을 취한다.&#39; 하였으니, 정히 담(膽) 중의 생기(生氣)가 만화(萬化)의 원(元)이 되기 때문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와 같은 제증(諸證)은 모두&#160;<span style="color: #f200f2;">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것이니, 담(膽)이 상(傷)하면 생기(生氣)가 패(敗)하고, 생기(生氣)가 패(敗)하면 생(生)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를 앓는 자는 대부분 불구(不救)에 이르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그러나 당연히 그 상(傷)의 미심(微甚)을 살펴서 속히 그 근본(本)을 구(救)하면 만회(挽回)할 수도 있다. 연석보천(鍊石補天: 돌을 다듬어 하늘을 보수하다)하는 권세(權)은 곧 조(操)하는 의사(醫)의 명철(明)함에 달렸느니라.</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황달(黃疸)의 대법(大法)에서 고(古)에 오달(五疸)의 변(辨)이 있었으니, 곧&#160;<span style="color: #0000ff;">황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黃汗</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황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黃疸</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곡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穀疸</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주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酒疸</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여로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女勞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이를 총괄(:總)하자면 한(汗)이 출(出)하여 옷을 염(染)하고 그 색(色)이 마치 황백(黃栢)의 즙(汁)과 같으면&#160;<span style="color: #ff0000;">황한</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黃汗</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하였고, 신면(身面) 안목(眼目)이 마치 금색(金色)과 같이 황(黃)하고 소변(小便)도 황(黃)하면서 무한(無汗)하면&#160;<span style="color: #ff0000;">황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黃疸</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하였으며, 음식(飮食)으로 인하여 비(脾)를 상(傷)하여 얻으면&#160;<span style="color: #ff0000;">곡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穀疸</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하였고, 음주(飮酒) 후에 습(濕)에 상(傷)하여 얻으면&#160;<span style="color: #ff0000;">주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酒疸</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하였으며, 색욕(色慾)으로 인하여 음(陰)을 상(傷)하여 얻으면&#160;<span style="color: #ff0000;">여로달</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女勞疸</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하였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비록 그 명목(名目)은 이와 같지만 결국&#160;<span style="color: #f200f2;">음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두 증(證)에서 벗어나지 않다. 크게 보면&#160;<span style="color: #0000ff;">양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陽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대부분&#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실</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고,&#160;<span style="color: #0000ff;">음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陰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대부분&#160;</span><span style="color: #f200f2;">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다. 이러한 허실(虛實)을 잃지(:失) 않으면 그 요점(要)을 얻은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 황달(黃疸)에서 치료(治)하기 어려운 증(證)</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촌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寸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무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無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鼻</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냉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冷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나오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膨</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形</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연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煙</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로 훈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것 같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요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搖頭</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직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直視</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환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環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여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黎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유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油汗</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발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發黃</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오래되어 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으로 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變</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경우</span>는 모두 난치(難治)이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