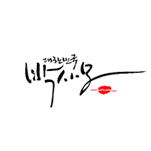<P></FONT></P>
<DIV class=bbs_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P><STRONG><FONT face=한컴돋움 size=4>
<IMG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65/8_cafe_2008_03_28_00_26_47ebbcaf669ae" border=0></FONT></STRONG></P>
<P>김홍도의 춘화도(당시에도 파격적인 여성상위를 ㅋㅋ)</P>
<P>&nbsp;</P>
<P><STRONG><FONT face=한컴돋움 size=4>쌍화점(雙花店)&gt;</FONT></STRONG> <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right">- 작자미상</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right">&nbsp;</P>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58282;&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만&nbsp; </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回回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회회(몽고인) 아비 내 손목을 쥐었어요</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말&#59787;미 이 店밧긔 나명들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삿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새끼 광대 네 말이라 하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잔 &#58280;&#57767;티 덤ㅅ거츠니 업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三藏寺애 브를 혀라 가고신&#58282;&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더니만</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뎔 社主ㅣ 내 손모글 주여이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절 지주 내 손목을 쥐었어요</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말&#59773;미 이 뎔밧긔 나명들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소문이 이 절 밖에 나며 들며 하면</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삿기 上座ㅣ 네 마리라 호리라&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새끼 상좌 네 말이라 하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잔 &#58280;&#57767;티 덤ㅅ거츠니 업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드레 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58282;&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두레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더니만</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우믓 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우물 용이 내 손목을 쥐었어요</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말&#59773;미 이 우믈밧&#59973; 나명들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소문이 우물 밖에 나며 들며 하면</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두레박아 네 말이라 하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잔 &#58280;&#57767;티 덤ㅅ거츠니 업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술&#62610; 지? 수를 사라 가고신&#58282;&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더니만</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짓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집 아비 내 손목을 쥐었어요</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말&#59773;미 이 집밧&#59973; 나명들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이 소문이 이 집 밖에 나며 들며 하면</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구비가 네 마리라 호리라&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시궁 박아지야 네말이라 하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긔 잔 &#58280;&#57767;티 덤ㅅ거츠니 업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ff;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그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5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ff;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embed style="LEFT: 223px; WIDTH: 300px; TOP: 95px; HEIGHT: 69px" src="http://kwija.new21.net/technote/./board/audio/upfile/sanghwajum.mp3" width="300" height="69" type="audio/mpeg" autostart="true" showstatusbar="true" volume="0"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nbsp;<BR><SPAN>쌍화점(雙花店) <BR></P></SPAN>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3.7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8pt; COLOR: #000000; LINE-HEIGHT: 16.44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1. 핵심정리</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연대 : 고려 충렬왕 때(1274~1308)</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갈래 : 고려 속요</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형식 : 전 4연의 분절체</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성격 : 향락적, 퇴폐적</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의의 : 정사(情事) 감정을 극화(劇化)한 연극적 가요</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제재 : 탕녀의 밀애</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 주제 : 남녀 간의 향락 추구</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8pt; COLOR: #000000; LINE-HEIGHT: 16.44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2. 해설</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고려 충렬왕 때 지어진 노래로, 당시의 퇴폐적인 성윤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작품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이 노래는 4연의 분절체로 되어 있는데, 매연의 앞 4구는 한 여인의 성적 불륜의 행각을 그렸고,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뒤 2구는 그러한 여인처럼 자기도 한번 놀아보고 싶다는 탕자(蕩子),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혹은 탕녀(蕩女)의 독백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노래의 내용은 회회아비, 삼장사의 중, 우물의 용, 술집아비에 대한 것으로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사건의 성질은 모두 성적 불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조에서는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이 노래를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의 대표적인 노래로 지목하여 배척하였다.</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이러한 노래가 당시 고려의 궁중 연회에서, 방탕한 기질이 농후한 충렬왕의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불려졌다 하니,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그 때의 군신들이 얼마나 향락적이며 퇴폐적이었나를 능히 짐작하게 해 준다.</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몽고의 병화(兵火) 이후 원나라의 간섭과 왕권의 동요로 인해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사회가 혼란하여 퇴폐적인 생활로 흐르고 있을 때이다. 이 노래에서도 그 일면이 드러난 것처럼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위로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외국인(회회아비)과 종교 지도자에게서도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타락한 성윤리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일반적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때일수록 섹스 문화가 성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고려속요가 후기로 갈수록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이 짙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8pt; COLOR: #000000; LINE-HEIGHT: 16.44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3. 감상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쌍화점 : 고려&nbsp; 가요의 하나. 충렬왕 때의 작품으로 작자와 연대 미상으로 알아 왔으나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lt;고려사&gt; 악지(樂志)에 한역(漢譯)된 &lt;삼장(三藏)&gt;이라는 노래의 내용과 꼭 같아 그 제작 연대가 밝혀졌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 연악(宴樂)을 좋아하여 오잠(吳潛)&#8228;김원상(金元祥)&#8228;석천보(石天輔) 등을 시켜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자주 노래를 짓게 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 &lt;삼장&gt;, 즉 &lt;쌍화점&gt;도 그들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따라서 이 노래를 고려 시대의 속요(俗謠)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전 4절로 된 이 노래는 퇴폐한 당시의 성(性) 윤리를 잘 나타냈으며 나아가 그것을 풍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표현면에 있어서도 유창한 운율과 아울러 봉건시대의 금기(禁忌)이던 왕궁을 우물로,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제왕을 용(龍)으로 은유(隱喩)한 것은 뛰어난 표현이다. 이조 성종 때 음사(淫辭)라 하여 가사를 약간 고쳐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lt;악장가사(樂章歌詞)&gt;에 전하고 있고, 어떤 문헌에는 &lt;상화점(霜花店)&gt;이라 한 곳도 있는데 쌍화점(혹은 상화)는 만두라는 뜻이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7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nbsp;</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nbsp;쌍화점 노래는 고려 충렬왕 때 궁중악의 하나로 상연되었던 가극의 대본이었다.</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nbsp;지은 사람은 충렬왕 5년에 승지였던 오잠(吳潛)&nbsp; 이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7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nbsp;이 노래를 불러야 했던 사람은 궁중에 적을 둔 남장별대(男粧別隊)였다.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남장별대는 노래기생, 춤기생, 얼굴기생으로 편성된 여자배우단 무대 이름은 향각(香閣)이었다....</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중략)...무대가 뒤로 물러났으며, 장막을 지니고 있는 것</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7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nbsp;고려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어지럽게 된 것은 충렬왕조부터였으며, </SPAN></P>
<P style="FONT-SIZE: 10.5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7%;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9.46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1pt; FONT-FAMILY: 양재 다운명조M,한컴돋움; LETTER-SPACING: -0.526pt; TEXT-ALIGN: justify">충렬왕조에 두드러진 것은 몽고풍이 들어온 것이다. 쌍화점 가극도 몽고풍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PAN> </P>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XSCRIPT type="text/xxxxxxxxxxxxxxjavascript"></XSCRIPT><XSCRIPT type="text/xxxxxxxxxxxxxxjavascript"></XSCRIPT><!--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 스크랩 출처 --><XSCRIPT language=xxxxxxxxxxxxxxjavascript type="text/xxxxxxxxxxxxxxjavascript"></DIV>
<!-- -->
카페 게시글
박사모 대전동구지부
쌍화점(雙花店)> - 작자미상
현인[賢人]
추천 0
조회 304
08.11.28 13:3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