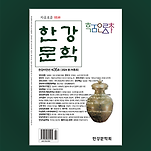<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한&#160;여름&#160;밤,&#160;詩의&#160;향연</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Light';" data-ke-size="size20">&#9744;&#160;시작&#160;메모</span> <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한강문학》誌가&#160;일취월장해서&#160;나는&#160;이&#160;특집시&#160;5편을&#160;작심하고&#160;써본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아직도 시詩를 옛날 서울 모던뽀이 기생 후리기 수기手旗처럼 휘날리고, 인생무</span><span data-ke-size="size18">상이나 주절대고 다니는 주루패[酒類派]가 있으므로 “현학적이라”느니, “난해하다”느</span><span data-ke-size="size18">니,&#160;이&#160;소리&#160;저&#160;소리&#160;귓전으로&#160;튕기듯&#160;적어본&#160;졸품拙品에&#160;다름&#160;아니다.</span></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17세기 영국의 형이상학파시形而上學派詩(Metaphys Poetry Poetry) 리더인 존.단</span><span data-ke-size="size18">(J.Donn)의 이른바 구어체口語體, 또는 회화체會話體 시詩를 개척해 그 3백년 뒤 </span><span data-ke-size="size18">T.S.엘리어트가 그것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현대 세계시의 현대화를 창출한 일</span><span data-ke-size="size18">은&#160;아는&#160;이는&#160;다&#160;아는&#160;일이다.</span></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저 구어체니 회화체니 하는 현대시의 기법은, 시의 표현(Rander)을 말[言語]로 이</span><span data-ke-size="size18">야기 하듯이(지껄이듯이) 적어놓는 문장 표기로써 완결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존.</span><span data-ke-size="size18">단의 경우, </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160;벼룩을&#160;좀&#160;보시라!&#160;이걸&#160;보면&#160;알거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당신이&#160;날마다&#160;하는&#160;것은&#160;정말&#160;아무것도&#160;아니야.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놈이&#160;우선&#160;날&#160;빨더니,&#160;당신을&#160;빠는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놈의&#160;핏&#160;속에서&#160;우리&#160;두&#160;사람의&#160;피가&#160;섞였구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것이&#160;죄도&#160;수치도&#160;처녀성處女性의&#160;상실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아니라는&#160;것을&#160;당신은&#160;잘&#160;알거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런데&#160;이놈은&#160;구혼求婚도&#160;하지&#160;않고&#160;달려들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두&#160;사람의&#160;피로&#160;배를&#160;채우고&#160;있구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아니&#160;이것은&#160;우리가&#160;하려는&#160;것&#160;몇&#160;배&#160;아닌가.</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라는 시 〈벼룩〉(The Flea) 부분만 보아도 그의 구어체, 회화체 시의 표현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생동하는 이미저리로 가득 차있는지 불여일견일 터이다. 그렇다고 </span><span data-ke-size="size18">벼룩이 하는 행동의 상징성, 그 행위의 정당한 윤리성을 인간의 그것에 비유한 비판</span><span data-ke-size="size18">적 주제의식이 어디 한군데 훼손되고 있는가. 오히려 그 긴요점의 전달은 여기의 구</span><span data-ke-size="size18">어체,&#160;회화체&#160;기법으로&#160;더욱&#160;알기&#160;쉽게&#160;독자들에게&#160;회자될&#160;수&#160;있다&#160;하겠다.</span></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나의 졸품들로 되돌아와 본다.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span><span data-ke-size="size18">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내 자식들이니 비판만은 슬쩍 접어서 말하기도 싫다. </span><span data-ke-size="size18">그런대로&#160;독자&#160;몫이다. </span></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다 알아 들으시리라. 저 돈.단처럼 구어체, 회화체 기법의 유사체로 써봤으니까 </span><span data-ke-size="size18">말씀이다.</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80fab14606ef652eaa3ceb05bcf150fa021de91b" class="txc-image" width="285" height="60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80fab14606ef652eaa3ceb05bcf150fa021de91b" data-origin-width="342" data-origin-height="722"></div><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생중사生中死 </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생중사生中死,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나는&#160;지금&#160;밥&#160;먹고&#160;분糞&#160;싸지르고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술&#160;퍼마시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생중사生中死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무섭다거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도피를&#160;꿈꾸게&#160;되는&#160;게&#160;싫어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미당시未堂詩를&#160;열심히&#160;찾아서&#160;읽는다</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지금&#160;그&#160;분&#160;있는&#160;데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사중생시死中生詩&#160;아니냐…&#160;생시生時(?!)</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160;옛날&#160;아내와&#160;같이(생시&#160;때였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사당동舍堂洞에&#160;주례&#160;사은차&#160;찾아뵐&#160;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어,&#160;미륵보살님,&#160;어서들&#160;오시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수화秀和,&#160;자네는&#160;미륵보살님과&#160;해로일&#160;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나도&#160;그&#160;때꺼정&#160;끄떡없어,&#160;우리&#160;방方보살님도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미륵보살이거든(!)&#160;흐흐흐흣(!)</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그런데야&#160;어찌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span data-ke-size="size18">생중사生中死(죽음을&#160;향해&#160;살고</span>&#160;있는)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따위로&#160;우환憂患을&#160;삼으랴.</span></p><p>&#160;</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시詩가&#160;써질&#160;때면…</span></p><p>&#160;</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나는&#160;시詩가&#160;찾어오실라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시詩가&#160;쓰여질라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기쁘고&#160;기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기쁘디&#160;기뻐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자꾸&#160;내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귀貴해지는&#160;건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왜이냐(?!)</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야,&#160;인제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일흔&#160;다섯,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상판上板&#160;대기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일곱구멍&#160;어디&#160;하나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눈,&#160;귀,&#160;코구멍,&#160;입)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신통한&#160;거&#160;없나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돼지머린양&#160;하늘&#160;선녀仙女들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아차차,&#160;감히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귀천歸天을…)</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간식꺼리가&#160;된다손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하늘님께&#160;삐치진&#160;않을란다.</span></p><p><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염라대왕&#160;졸아치들이겠지. </span><br><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저&#160;하늘&#160;선녀仙女들이란,)</span></p><p>&#160;</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data-ke-size="size20">위무제시爲無題詩</span> <br></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성완종成完終, <br>이&#160;세상&#160;온갖&#160;것 <br>완결完結이&#160;어딨나</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br>죽는다&#160;슬퍼말라, <br>돈&#160;벌었다&#160;기뻐&#160;말라, <br>절창 한 마디 읊어 상 탔다 제 혼자 벌쭉거릴 거 없다고,</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br>세상에&#160;아무&#160;것도&#160;완종完終은&#160;없다고, <br>지구도&#160;언젠가는 <br>돌고&#160;돌다&#160;멈출&#160;것이니, <br>(염세주의&#160;논리&#160;아닌, <br>지구&#160;물리학적&#160;믿는&#160;바도&#160;아니건만…)</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br>그&#160;한&#160;차례씩의 <br>정지停止를&#160;위하여 <br>우리는&#160;숨쉬는고야….</span></p><p>&#160;</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data-ke-size="size20">구어체시口語體詩&#160;복습</span> <br></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자크&#160;데리다가 <br>작크&#160;내리다로&#160;보이고, <br>《문학과&#160;성性》&#160;계간지가 <br>〈이념理念과&#160;사랑〉을 <br>특집으로&#160;꾸미는데, <br>거기&#160;나의&#160;앙케이트 <br>회답이&#160;걸작으로&#160;꼽혔은즉,</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br>-나(85세,&#160;老詩人) <br>“눈이&#160;침침해서가&#160;아니라 <br>세상&#160;꼴뵈기&#160;싫어&#160;야동&#160;본다. <br>왜? <br>꼴뵈기&#160;싫냐!?</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br>내,&#160;중늙은이&#160;된 <br>며느리가,&#160;나 <br>老시인이람서 <br>야동&#160;보는&#160;늙다리영감이래서 <br>꼴뵈기&#160;싫은&#160;거&#160;그거요(!!)”</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br>-였다.&#160;은유법은</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래서&#160;골통&#160;두들기다가도 <br>아스피린&#160;먹은&#160;듯, <br>아니&#160;어째서&#160;돌연히 <br>미당의&#160;석유石油&#160;자신&#160;듯 <br>꽃&#160;뱀&#160;아니,&#160;화사花蛇가 <br>보고픈가&#160;몰러라.</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 <br><span data-ke-size="size14">*&#160;구어체口語體&#160;시詩를&#160;맛깔스럽게&#160;풀어내는&#160;석란사&#160;이수화&#160;시인은&#160;서구문학과&#160;관련된&#160;평론에 </span><br><span data-ke-size="size14">서&#160;타의&#160;추종을&#160;불허한다.&#160;대화체가&#160;섞인&#160;이수화&#160;시인의&#160;시를&#160;읽다보면∽&#160;저절로&#160;흥얼거리게 </span><br><span data-ke-size="size14">된다.&#160;“이&#160;시詩는!&#160;‘5분&#160;단막극’으로&#160;만들면~&#160;재밌겠다!”&#160;저절로&#160;감탄이&#160;새어나온다.&#160;아울러&#160;탄 </span><br><span data-ke-size="size14">탄한&#160;문학이론은&#160;‘이수화&#160;평론’의&#160;정점이다.&#160;탁월한&#160;식견으로&#160;풀어내는&#160;평론과&#160;맛있는&#160;구어체 </span><br><span data-ke-size="size14">시는&#160;프랑스&#160;일품요리에&#160;견줄&#160;만큼&#160;절창!&#160;이다. </span><br><span data-ke-size="size14">**&#160;본고는&#160;《한강문학》&#160;3호에&#160;게재했던&#160;내용을&#160;재구성했음을&#160;밝힙니다.</span> <br></span></p><p>&#160;</p><p>&#160;</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6adbbdcb1a3887c83cbcb5c5f46eb8e64f6e3bbc" class="txc-image" width="20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09B/6adbbdcb1a3887c83cbcb5c5f46eb8e64f6e3bbc" data-origin-width="5429" data-origin-height="6390"><div class="figcaption">이수화</div></div><p><span data-ke-size="size18">호 석란사石蘭史, 고려대 시분과 회장을 역임하고 동 대학 문화예술교우회 고문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동창회 고문이며 미국 I.A.E.U 명예문학박사 임. 한국현대시인협회 고문, 한국문인협회 원임부이사장, 국제펜 한국본부 원임부이사장, 공초 숭모회 부회장(공초문학상 운영위원)과 서울시낭송클럽 대표, 미당시맥회 4대회장(시맥상 창설), 한국문학비평가협회 회장 및《한강문학》편집고문</span></p>
<!-- -->
카페 게시글
일반 문학의 향기/ 소리글시
이수화 / 한 여름 밤, 詩의 향연 / ≪한강문학≫ 34호 소리글 詩
이혜경
추천 0
조회 63
24.01.01 01:4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