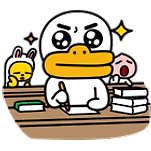<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p><p><!-- end article_writer -->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p><div class="bbs_contents" id="bbs_contents"><div class="bbs_contents_inbox"><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table class="protectTable" id="protectTable"><tbody><tr><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格物致知, 誠義,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span><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의 7조목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로 이루어져 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의 7조목에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가장 중요하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格物致知)만 이루어지게 되면,</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나머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의 7조목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格物致知)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7조목이라는 견해와 8조목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格物)을 이루게 되면,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치지(致知)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에서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8조목이 되는 것이고</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格物)만 이루어서는,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치지(致知)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과 치지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7조목이 되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것은 미묘한 문제이지만,</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格物)을 이루었다하여, 치지(致知)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는 보여 지지 않으므로,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저자는 7조목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치지(致知)”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지식을 끝까지 추궁하여 새롭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서양에서는 이를 make, brake, make라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잘못된 기반위에 형성된 지식과 관념, 습관등을 모두 깨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형성하라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지덕은 신(新)이라하여,&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지덕을 이루는 것은&nbsp;새로움에 있다라고&nbsp;한 것&nbsp;또한&nbsp;&nbsp;이를 말하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를 해석함에 있어서,</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치지(致知)”에 대한 해석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므로,</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格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되겠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주자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해석함에 있어,</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格)자를 “꿰뚫다”로, 물(物)자를 “사물의 이치”로 보았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따라서, 주자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서, 지식을 새롭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왕양명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러한 주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格)자를 “물리치다”로, 물(物)자를 “물욕”으로 봄으로써,</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모든 물욕을 물리쳐, 지식을 새롭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것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물(物)”자에 대한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해석이 달라 지게된 것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 “물(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다시, 천부의 이치를 살펴보아야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천부경에서 말하는 일(一)은, 넓은 의미에서는, “음양의 결합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하지만,</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 일(一)이라는 음양의 결합물은,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大學)에서는,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의 결합물을 “명(明)”이라 하여,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의 이치” 측면을 말하고 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중용에서, “중(中)”이라 할 때에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전체의 이치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요소로써, 음양의 결합물을 말하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불교에서 말하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에서도,</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색(色)”자, 역시, 음양의 결합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는, “음양의 결합”이라는 “운동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우리가 새로 시집을 온 여인을 “새색시”라 하는데,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 말의 뜻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새롭게 음양의 결합을 시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지금까지 음양의 결합물에 대하여, 각각의 명칭을 살펴본 이유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의,</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물(物)”자, 역시, 음양의 결합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물(物)”자는, 음양의 결합물 중에서도,</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인간이 만들어낸 음양의 결합물.”을 의미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모든 음양의 결합물 중에서,</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인간이 만들어 낸” 음양의 결합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인간이 만들어낸 음양의 결합물.”이라는 의미 속에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것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황극(皇極)을 이룬 상태에서,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무극(無極)을 이루기 위해서는,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의 경계를 지워야 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우리 마음에서의 음양의 경계는,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의 경계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우리가 사람이나 물건등과 서로 부딪힐 때 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매번 새롭게 형성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중용에서 "인심유위"라 하여, 사람의 마음은 위태로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사람의&nbsp;마음은 음양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그러므로, </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의 경계”를 지우기 위해서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의 경계를 발생시키는, “부딪침” 자체를 차단하자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格物)”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nbsp;음양의 물결을 물리치라는 뜻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어느 이름없는 선비가 말하길,</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나는 세상의 모든&nbsp;번잡함을 물리치고, 조용히 앉아, 정을 기를 뿐이다."라고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아마도, 이분은 성(性)을 이루셨을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분의 말씀에는, 삼일신고에서 말하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지감(止感), 조식(調息), 금촉(禁觸)이 그대로 녹아&nbsp;들어가 있기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대학에서, 대학지도는 음양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라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格物致知)를 행한 후의 상태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일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황극(皇極)을 이루게 되면,</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음양이 균형을 이루어, 나를 위한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러한 상태에서,</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格物致知)를 행하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나와, 나이외의 다른 것을 나누는, 경계를 지우게 되면,</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나를 위하여 할 것도, 나이외의 다른 것을 위하여 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하늘이 불인(不仁)하고, 군자가 불인(不仁)할 수 있는 것은, 무위자연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자연은 있는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자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아무것도 위하여 할 것이 없는, 자연과 같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러한 상태를, 도덕경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천부의 이치는, 상하의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무위자연(無爲自然)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상위단계에서의 순환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하위단계에서의 순환은, 천부의 이치를 직접 자신의 몸에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수신(修身)이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이치를 직접 몸에 실행 시키는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수신(修身)을 이루게 되면,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자연스럽게 제가가 이루어지게 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제가(齊家)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몸 안의 모든 장기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치국(治國)이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자신의 머리, 즉,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평천하(平天下)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온 몸을 평정하여 성(性)을 이루어 냈음을 말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천부의 이치를 직접 자신의 몸에 실행시키는,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구체적인 수신(修身)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nbsp;</span></span></p><p class="바탕글">&nbsp;-----</p><p class="바탕글"><br></p><p><span class="b"><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격물치지 (格物致知)</span></span><span class="bar2"><font color="#e9e9e9"><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span></font></span><a class="txt_sub" href="http://cafe.daum.net/_c21_/bbs_list?grpid=YWVw&amp;mgrpid=&amp;fldid=Fmxw"><font color="#62624b"><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예언서 연구</span></span></font></a><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 </span><!-- end article_subject --><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 </span></p><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showSideView(this, '7PZcRWIuZN90', 'uC544uD760'); return false;"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YWVw&amp;fldid=Fmxw&amp;contentval=001Ixzzzzzzzzzzzzzzzzzzzzzzzzz&amp;isRedirected=true#"><font color="#0066cc"><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아흠</span></span></font></a><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span><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nuclearpig/Fmxw/5019"><font color="#0066cc" face="Tahoma" size="2"><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http://cafe.daum.net/nuclearpig/Fmxw/5019</span></span></font></a><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HYmodern2; font-size: 10pt;">&nbsp;</span></span></div></td></tr></tbody></table></div></div></div><p><br></p>
<!-- -->
카페 게시글
고대 동양사상
격물치지(格物致知)
혜공[蕙孔]
추천 0
조회 130
15.10.30 18:0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