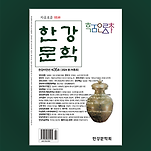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font face="함초롬바탕"><br></fon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일</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正玄</span><span style="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 편</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집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0990624"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195.6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441.14pt;width:138.20pt;height:242.4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0c"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0c.pn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D9E3A5D2EC7E60A" class="txc-image" width="184"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84" exif="{}" data-filename="noname01.jpg" id="A_997D9E3A5D2EC7E60A99BC"/></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正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4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남 순천 생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57</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구례 화엄사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田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89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7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전개화상으로 구족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具足戒</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받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이래 십오안거를 성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盛滿</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7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남 실상사 주지를 역임하는 한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8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도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A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렌지 카운티 주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리건 포틀랜드 보광사 주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콜로라도 덴버 용화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캘리포니아 금강선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대로 활동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판화제작에도 혼을 쏟아 많은 작품을 남겼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8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A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문화원과 하와이연방정부 청사에서의 판화전시는 한국불교의 고승의 예술행위가 현지인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9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동을 준비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9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구본사 용주사 주지로 취임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9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공주 마곡사 태화산 자락 토굴에서 수행하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그려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0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의 그림 그려주기를 성취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쇄 등으로 전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장의 그림을 무료로 배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 우담바라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과 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畵</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畵</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선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화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畵派</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선정삼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定三昧</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나아가는 그림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부처의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통해 불교의 실천 수행인 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체계화된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은 팔만사천 번뇌를 다 잡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요한 마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다스리는 수행이고 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선 상태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三昧</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집중한다는 의미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결같은 고요한 마음을 통해 진리에 눈을 뜨고 법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法悅</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얻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매의 경지에서 근원적인 물음으로 사물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선화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요한 마음의 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원용되기도 하고 사물의 실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본래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本來心</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각자의 불성을 깨달아 지금 여기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참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붓다의 지혜와 진리의 삶을 살려는 마음이 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고 정현스님이 말하는 평정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마음은 일체의 경계에 좌우되거나 걸림이 없으며 일체의 번뇌나 망념이 없는 근원적인 마음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도와 달마도로 대표되는 정현스님의 선화는 지혜의 스승인 문수동자와 선사상의 지존인 달마도를 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선화들은 모두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선화는 평화롭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평범한 듯 친숙하고 단순하면서도 정겹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뜻하면서도 불교의 상징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그림은 생각을 던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畵</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연꽃과 문수보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와 물고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머리가 두 개인 공명조 등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상징 속에는 그림으로 불법을 포교하려는 스님의 뜻도 담겨져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름 하여 그림 포교인 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어떻게 스님은 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畵</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그리게 되었는지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indent: -1pt;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097172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197.32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77.14pt;width:193.80pt;height:279.0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0e"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0e.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text-indent: -1pt;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1C1345D2EC81302" class="txc-image" width="258" style="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58" exif="{}" data-filename="noname02.jpg" id="A_9991C1345D2EC8130203B1"/></p><p class="0" style="text-indent: -1pt;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nbs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용주사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절도 아닌 벽제 성련암에 있다가 보광사로 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절에서 나는 그때 당시에 뭘 했냐하면 판화를 수집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에서는 판화를 변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變相圖</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그림으로 형상화 한 거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의 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종교화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상이 화엄경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화엄경에 대한 그 배경을 그림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化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키는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그림을 이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엄경변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하고 지장경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장경변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벽마다 변상도가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금강경 변상도 그것이 유명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팔만대장경의 해인사에 그것을 전부 탁본을 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상도가 유명한데 그것을 성암 고서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내가 속된말로 얼굴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하자면 내가 나를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뭔가 시도 쓰고 철학도 하고 그랬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뭐 하나 뚜렷하게 해 놓은 게 없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중간한 사람이 됐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상도 그것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변상도를 많이 찍어놨으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국사람 상대로 문화원에서 변상도를 한 번 보여주고 전시하려고 미국에 갔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보기에 그것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판으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에는 석판이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방에는 목판 만다라라는 우수한 예술품이 있다는 것을 안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때 너무 몰랐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우물 안 개구리가 돼가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히려 그것을 내가 깨우친 거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용주사에 있을 때 한 미국 선교사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은중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새겨진 목판을 탁본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도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것인데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때부터 스님은 전국을 돌면서 경판을 찍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탁본하기도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이 미국에 가서 포교를 하게 된 계기도 우리의 목판을 미국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LA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문화원과 하와이연방정부청사에서 판화전시를 열기도 했지만 스님의 기대만큼 미국인들은 한국판화에 관심이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저런 연유로 스님을 선화로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불교적 사유와 화두 가운데 그리게 된 군더더기 없는 그림은 스님만의 독자적인 그림으로 발전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스님의 선화에 대해 불교신문의 서현욱 기자는 지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초대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보성 갤러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시회를 보고 스님의 화풍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어 기사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3301152"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163.0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282.94pt;width:195.00pt;height:289.8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0f"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0f.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8CD385D2EC8431E" class="txc-image" width="260"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60" exif="{}" data-filename="noname03.jpg" id="A_9998CD385D2EC8431EE15B"/></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 스님이 추구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별과 분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넘어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심플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군더더기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모습이 화려하지만 심플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엄한 장식을 걷어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 스님의 작품은 양식상 선화로 구분해야 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창적인 자기어법을 가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화풍은 순수함과 신선함을 부각시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합하지 않은 조형언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造形言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표현주의 성향의 예술을 추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抽想</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 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술을 전공하지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큰 스승으로부터 사사 받은 적 없는 스님의 화풍은 매우 독창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독창성은 여느 화가들의 작품과 다른 개성주의와 차별성으로 확장돼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험적인 영험과 삶을 통한 체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행과 포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지가 화풍으로 이어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술에 관한 한 무학의 스님이 성취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매우 창조적인 예술행위임에 틀림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의 것을 베끼거나 빌려오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 스님만의 순수한 오리지널리티가 결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연작의 중심핵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분명 그림그리기를 사사받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스님의 작품에서는 스스로의 오리지널리티와 함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친교한 미술대가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붓으로 바위에 구멍을 내서 물기를 얻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환쟁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故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욱진의 심플함이 그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7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장욱진의 명륜동 시절 그와 교분을 맺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걸레승 중광과도 인연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욱진이 그리고 성우스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TV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회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글을 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가락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품을 정현스님이 판화로 만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성욱 박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국대 전 총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강경 공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임도 같이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욱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7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명륜동 시절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작품에 선적 언어가 충만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걸레승 중광과의 인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인의 예술 모습에 감명 받아 그린 대표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진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眞眞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팔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이 시절의 작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장욱진의 추상세계는 간결한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표현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작품에 나타나는 심플한 추상세계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플한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미학으로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깨달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좇던 장욱진의 화풍에 맞닿아 있어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플한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미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흉내 낸 것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욱진이 직접 드러내지 못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적 정서와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추상을 정현스님은 직접 드러내 추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선화의 주제와 사상이 장욱진의 그것보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직설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보현과 문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명조를 전면에 등장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토리텔링 하듯 그려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승려들의 선화와 달리 먹선으로만 추상의 세계를 표현하지도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친숙한 오방색을 통해 동화적 시각화를 만들어 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넓은 의미에서 우주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생을 위한 날마다 좋은날을 염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얼굴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의 얼굴이자 보살의 얼굴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중생의 얼굴이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얼굴은 날마다 좋은날로 가는 통로이자 관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얼굴은 정현스님이 추구하는 불교적 사유와 신념이자 지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얼굴은 오감을 받아들이는 관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설명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신의 사상과 철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심이 묻어나는 얼굴을 통해 오관이 숨 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오감을 들여다보는 문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나의 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눈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깨달음의 창이자 달관의 눈으로 본 세상은 먹색일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주제의 등장인물로 차용한 것은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하는 추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의 상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문수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행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상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보현을 그림의 중심에 배치한 것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불문의 최고 가치를 전면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110864"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484.4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115.24pt;width:182.40pt;height:269.4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0"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0.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13C335D2EC87408" class="txc-image" width="243" style="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43" exif="{}" data-filename="noname04.jpg" id="A_99213C335D2EC874088702"/></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플한 컬러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線</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표현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색채미학 역시 한국적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정현스님의 선화는 색채미학의 단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간결한 색채미학이 자연스레 사찰의 단청이 주는 안정적 시각화와 오버랩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등장배우들은 한결같이 단순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함축적 의미는 불교철학과 화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畵僧</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불교적 사유가 베이스를 이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등에 올라 탄 피리 부는 문수동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 엉덩이 끝에 타고 있는 두 머리를 가진 새 공명조와 연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우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연상시키는 소재 하나하나에 불교의 설화와 가르침을 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풍자와 해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학의 이미지와 암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暗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메타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모든 작품에 함축돼 정현스님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이 설정한 주제와 불교적 사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미지의 평면추상 등 표현의 방법론은 교육받지 않은 그림으로 보기에는 원숙하고 여백과 공간의 이상적 활용이 인상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자신의 작품노트에 이렇게 적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동자나 달마선사를 그리는 일은 세상을 맑게 하는 일이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동자는 지혜를 상징하지 않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도를 나누는 일은 지혜를 나눠 갖는 일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마도를 갖는 일은 깊은 사려와 깨달음을 나눠 갖는 일 아닌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자신의 그림에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저 흰 화선지에 간결하고 두터운 오방색 선으로 시종을 유지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려운 문구나 멋도 부리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장되지 않고 허세도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박하고 서민적인 선화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endif]-->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D1A3C5D2EC8AB06" class="txc-image" width="229"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29" exif="{}" data-filename="noname05.jpg" id="A_991D1A3C5D2EC8AB0670E7"/>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0827560"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325.01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19.54pt;width:171.60pt;height:220.41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1"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1.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공명조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완성의 문수를 부각시켜 우리와 동일시해 차별과 분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움과 좋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찾길 바라는 가르침도 전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도에 등장하는 소는 심우도의 소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는 곧 마음자리를 상징하는 것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강조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와 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명조가 한데 어우러진 스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결국 가장 좋은 글귀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렵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쉬운 글귀로 이웃들에게 문수도를 설명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욕심이 충천한 날이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如如</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결같이 청정한 날을 꿈꾸는 스님의 마음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nbsp;<!--[if !supportEmptyParas]-->&nbsp;<!--[endif]-->&nbsp; </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술평론가 김남수는 정현스님의 작품을 이렇게 평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물과 화조의 소재들이 등장하지만 기교보다는 사의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寫意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작가의 정신주의와 내재율이 작품의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피사체인 외연의 평면구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백의 합리적 분할 등기법과 표현방법론상의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화를 그린다는 중광스님이나 통도사의 수안스님들의 회화양식과는 완전히 차별성을 갖는 양식상의 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신문 서현욱 기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nbsp;<!--[if !supportEmptyParas]-->&nbsp;<!--[endif]-->&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과 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스승 전강대선사께서는 법문가운데 판치생모를 다음과 같이 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일 대중들에게 분명히 이르노니 백천만겁을 몸으로써 보시할지라도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소영영한 주인공인 본각을 얻은 것만 같지 못하리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년소실자허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九年小室自虛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니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쟁사당두일구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爭似當頭一句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리오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유가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猶可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데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석인답파사가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石人踏破謝家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니라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년을 소림에서 헛되이 머무름이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찌 당초에 일구 전한 것만 같으리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도 오히려 가히 일인데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사람이 사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謝家</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배를 답파했느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한 고인의 송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頌句</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사서래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이 이상 더 가까운 게송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일 산승은 모든 허물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붙이노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중들은 오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붙잡고 용맹을 다하여 의심할지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두만 붙잡고 용맹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919616"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515.2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20.74pt;width:173.40pt;height:245.16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2"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2.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F3D3A5D2EC9CC15" class="txc-image" width="231"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31" exif="{}" data-filename="noname06.jpg" id="A_998F3D3A5D2EC9CC15D45B"/></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宗</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는 고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古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公案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측을 가리켜 화두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家</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인정받아 통용되는 화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나라 고승들도 화두를 남기고 있으나 그 중 성철스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전 삼천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경봉스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장 많은 화두를 남긴 고승이 있다면 바로 중국의 조주선사이리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주선사는 조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趙州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방에서 오신 선지식 이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에게 있는 불성이 무엇입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조주선사가 대답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되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조주선사가 설명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대는 아직도 부족하여 편 가르는 마음을 내고 있지만 개에게는 그런 하찮은 분별망상이 아예 없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스님이 조주화상이 계시는 선원으로 찾아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스님을 찾았나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조주화상이 물으시기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너는 죽을 먹었느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 먹었느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스님이 대답하기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죽을 먹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주화상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나가 버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방에서는 아침 식사를 죽으로 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바리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밥그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스스로 씻게 마련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일러 소위 청규라고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주화상께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죽은 먹었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니 먹었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고 물었을 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 바리때를 씻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했으면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멀리서 조주선사를 찾아오신 학인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끽다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喫茶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나 한잔 들고 가시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책 제목으로도 유명한 이 말은 이렇게 화두에서 인용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사가 집을 떠나 멀리 서쪽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祖師西來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뜰 앞의 잣나무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庭前柏樹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사가 서쪽으로 와서 행한 것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니에 곰팡이가 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뜰 앞의 백수자 나무를 여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 년 동안 잣나무로 잘못 알고 지낸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잘못 알았던들 무슨 소용이냐 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마다 음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이 되면 어김없이 전국 어느 선원이나 하안거 결제에 들어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안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월 동안은 앞니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처절하게 침묵의 정진을 해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판자처럼 넓은 앞니를 가리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곰팡이 피고 털이 날 정도로 지독한 인내심이 요구된다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카페 육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쩌면 정현스님의 판치생모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전시된 그림들은 그러한 깨달음의 치열한 흔적인지도 모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도생활을 하며 틈틈이 작품을 그려온 정현스님이 그 화두를 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나긴 고행 끝에 도달한 깨달음의 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구도의 길을 선명한 색의 아크릴을 사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찰과 불상의 모습을 캔버스 위에 강렬하게 표현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연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고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나무 등 자연을 이용해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을 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술이란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행복의 양식이며 귀중한 신의 선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말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통해 스님의 그림을 많은 사람이 접하고 또 다양한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술가의 입장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자의 입장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다르겠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과 색이 보이는 형상이 아름답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앞에서 다가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 진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한 소감 일부를 엮어 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그림은 서양의 피카소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는 선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家</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생소한 문자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成佛</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화두로 쓰인지 오래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화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話頭</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하나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나는 예술적 감성을 통해서 무애와 무구의 정신으로 미술에 비유하여 해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929832"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370.2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112.04pt;width:161.40pt;height:224.96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3"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3.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627405D2ECA670D" class="txc-image" width="215" style="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15" exif="{}" data-filename="noname07.jpg" id="A_994627405D2ECA670DA588"/></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는 글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자에서 이빨이 나고 이빨에서 털이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이지만 매우 추상적이며 초현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화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체 명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銘根</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끊어버리는 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체를 쓸어버리는 쇠 빗자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등 해석이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나는 화가로서 그 답을 예술에서 찾으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의 제자로 수행정진 하면서 예술적 사유와 미감을 통해서 그림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초현실주의 작품을 제작하는 정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正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예술이 그림 판치생모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그림은 정상적인 사물의 표현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한 방법이며 새로운 불교선화로서 독창성을 내포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서양의 피카소와 같은 맥락으로 그림 판치생모라 하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작품에는 두개의 머리를 가진 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창공에서 노니는 물고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금색의 연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기를 타고 가는 문수보살 등이 모두 그림으로 화두를 던지는 판치생모나 같은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그림은 사물의 정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正形</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모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模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심상으로 원형을 재창조하는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인 예술행위이며 정신주의에 근거한 화두와 같은 독특한 예술의 모습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그림은 누구에게 사사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스로 그리면서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정신주의 회화방법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그림은 주로 연꽃과 물고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살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지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쌍두 공명조 등 불교적인 소재를 택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교적 단순한 소재를 이용해서 무거운 주제를 소화하는 것은 선적인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가에서 여가로 그림을 그리는 스님은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창조적 예술 활동을 하는 스님은 드물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현실적인 상업성을 뛰어넘어 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畵</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그리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상의 경지를 그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그림으로 대중을 교화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불교의 자비정신을 고취시키는 판치생모의 그림화두로 많은 업적을 남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카페 벽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話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板齒生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머리 둘 달린 어리석은 공명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음의 눈을 뜬 문수동자는 지혜를 얻고 진면목의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환희의 노란 연꽃은 금빛 광명 속에 피어나 사바의 고뇌를 불사르니 자유와 평온함을 얻어 날마다 좋은 날 우담바라로 피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正玄</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대주제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글로 그려낸 설명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정진하면서 예술적 사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思惟</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미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美感</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통해서 그린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바탕으로 한 초현실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곧 판치생모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술 전문가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그림은 정상적인 사물의 표현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한 방법이며 새로운 불교선화로서 독창성을 내포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서양의 피카소와 같은 맥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물의 정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定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단순히 모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模寫</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心想</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원형을 재창조하는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인 예술행위이며 정신주의에 근거한 화두와 같은 독특한 예술의 모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깨달음이 되어 새로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境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이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nbsp;</span><!--[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628080"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563.05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78.34pt;width:147.60pt;height:230.72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4"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4.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이한 것은 정현스님은 그 누구에게 사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師事</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적이 없다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엇을 그리겠다고 미리 생각하지 않고 붓을 들어 화폭에 대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경지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하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는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C70375D2ECA9113" class="txc-image" width="197" style="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97" exif="{}" data-filename="noname08.jpg" id="A_994C70375D2ECA91138D26"/></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그림은 주로 연꽃과 물고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살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후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後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쌍두 공명조 등 불교적인 소재를 택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교적 단순한 소재를 이용해서 무거운 주제를 소화하는 것은 선적인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창적인 자기어법에 순수와 신선감을 더해 세련미 넘치는 조형언어를 완성하고 있는 표현주의 성향의 예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화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畵風</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탄생한 것은 누구에게 그림을 배운 게 아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 스스로의 공부에 의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 남에게 그림을 배웠다면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 스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색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나라 전통 색인 화려한 오방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五方色</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작품에 흐드러지게 뿌려져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마디로 오방색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交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극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e People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세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http://www.ithepeople.kr)&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96924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420.0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01.54pt;width:208.70pt;height:170.24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5"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5.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동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일시호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日日是好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중국 운문선사의 너무나 유명한 선구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문선사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오일 이전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십오일 이후에 대해서는 어디 한 마디 해보아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자들 중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자 스님은 스스로 답하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日日是好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자문자답 형태의 선문답의 의미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십오일은 보름달과 깨달음을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오일 이전은 깨달음 이전이고 십오일 이후는 깨달음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깨달음만 이해한다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아가 이 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이면 날마다가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싫은 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일이라는 분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分別</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없이 있는 그대로 담담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세상의 실상에 가깝고 세상을 여실하게 보는 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일희일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一喜一悲</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아무 분별없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상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平常心</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를 매 순간 살아가자는 가르침으로 여겨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2em;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3EE405D2ECAB907" class="txc-image" width="278"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78" exif="{}" data-filename="noname09.jpg" id="A_99E3EE405D2ECAB907E274"/></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운문선사의 선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句</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화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畵題</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삼아 지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가까이 선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畵</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그려 무주상보시를 하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오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 그대로 이 보시는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엇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구에게 베풀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자만심 없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온전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선구는 위안을 주고 힘을 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의 기쁨과 행복을 발원하는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기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까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화 등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장을 배포하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께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전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98524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241.6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85.04pt;width:217.20pt;height:376.28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6"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6.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rect fillcolor="#ffffff" id="_x212989408" stroked="f" style="v-text-anchor:middle;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610.05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94.34pt;width:198.60pt;height:15.66pt;position:absolute;"><v:fill color2="#000000" opacity="1.00"/><v:textbox><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font-size:9.0pt;">&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9.0pt;">정현스님과 무초스님</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font-size:9.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font-size:8.0pt;">2019.4</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gt;</SPAN></P></div></v:textbox></v:rect><![endif]--> <!--[if !vml]--><img width="198" height="15"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DRW000008e03617.gif" v:shapes="_x212989408"><!--[endif]-->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실은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승려로서도 참선수행을 제대로 못했고 또 무엇인가 하나 내 놓을만한 것이 없어서 좀 내 나름대로 하나의 포교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포교의 방법을 생각했고 그렇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나도 복을 짓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주상보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無住相布施</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하면서 복을 짓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한 거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에서는 무주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無住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걸로 끝내야 할텐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일을 조그만큼 하면서도 대문짝만하게 자기 얼굴을 내미는 게 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相</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을 일은 했다는 상을 했는데 저는 무주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상이 없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좀 하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의미에서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것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도 복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질 수 있는 </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DBA3E5D2ECAEA1A" class="txc-image" width="290" style="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90" exif="{}" data-filename="noname10.jpg" id="A_99BDBA3E5D2ECAEA1A27A3"/></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마음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그 운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동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작한지 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했는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장뿐이 못 한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걸려서 만장을 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랬는데 내가 얼마를 살것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만장 한다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살을 살아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장뿐이 못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5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장은 하셔야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꾀를 낸 것이 판화를 찍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쇄를 해서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해서 채색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돼서 목판을 찍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두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식구들이 하고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인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운동을 내가 몸도 아프고 해서 무초스님을 총재로 모든 권한을 무초스님에게 인계를 해 준거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손대표를 위시해서 한두뼘 식구들이 같이 들 열심히 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그림 수행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9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공주 마곡사 태화산 토굴에서부터 현재 강화도 불은암에서 까지 이어지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그림을 그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스님께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냥 아무 일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날을 사는 비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도 말씀하시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누군가에게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스로 번뇌를 다스리면 매일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될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도 하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좋은 날이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이 우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하시는 가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은 어느 특정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날을 만들어 행복하고 기쁜 날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도 하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리석은 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매달리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은 좋은 날을 자신의 마음으로 만든다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존재한다는 말은 둘 다 똑같은 말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존재한다고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면 있는 것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없다고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체유심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一切唯心造</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이 있듯이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을 근원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禪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음 공부가 필요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부가 수승해지면 자기 속의 부처를 볼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가능하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욕심으로 꽉 찬 날이 아니라 여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如如</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날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작업노트를 살짝 열어 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동자나 달마선사를 그리는 일은 세상을 맑게 하는 일이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동자는 지혜를 상징하지 않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수도를 나누는 일은 지혜를 나눠 갖는 일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마도를 갖는 일은 깊은 사려와 깨달음을 나눠 갖는 일이 아닌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그림은 대체로 이렇게 구성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중앙에 소를 탄 문수동자가 자리 잡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옆에 전설의 새 공명조를 소의 등에 자연스럽게 앉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개 문수동자는 사자를 타고 있지만 소와 어울리게 한 것은 우리가 미완성의 문수이기 때문이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반드시 함께 어우러지는 글귀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단히 간단하면서 쉬운 문구이지만 깊이는 절대 얕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욕심으로 꽉 찬 날이 아니라 여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如如</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결같이 청정한 날을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하 하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e People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세희 </span><a href="http://www.ithepeople.kr/"><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u>http://www.ithepeople.kr</u></span></a><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스로 번뇌를 다스리면 매일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될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다면 정현스님이 말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어떤 날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 마디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신에 달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느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매달리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 날을 만든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항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대자비와 사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이웃을 돕고 불행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만드는 사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역설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說法</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은 좋은 날 보다 고통과 슬픔으로 이어지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 매일 나쁜 날이라고 할 수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은 길일을 선호하고 액일을 피하지만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날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은 집착심을 없애버리고 평안한 마음과 맑은 경지를 나타내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하루하루는 인간에게 최상의 날이며 소중한 날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울고 화날 때는 화를 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 생활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처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대응하면서 번뇌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매일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1pt; margin-lef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The People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세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http://www.ithepeople.k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행복한 삶은 마음의 평정에서 시작</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argin-right: 30pt; margin-lef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의 선화에 적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 되소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중생을 향한 스님의 가장 알기 쉽고 편한 법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法語</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꼭 필요한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나 많은 사람들은 이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행 등을 위해 길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吉日</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택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날을 위해 길일을 택하면 선택되지 못한 날은 좋은날이 아닌 나쁜 날이 되고 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길일과 흉일로 양분화 시켜놓고 날마다 좋은날이 되길 바란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은 어느 특정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마음에 있는 것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 날을 만들어 행복하고 기쁜 날들을 만들어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택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씀하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길일을 선호하고 액일을 피해서 얻는 날이 아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이웃을 돕고 불행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 날마다 좋은날은 찾아 올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말과 생각만 앞서는 사람보다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좋은 날은 다가 올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다시는 못 올 시간이기에 최상의 날이며 소중한 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좋은날이 될 것이며 진정한 의미도 찾게 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 카페 김영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다시 한 번 스님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무엇인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잡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날마다 좋은 날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께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말씀하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말씀을 들어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복잡한 현대인들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사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思善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사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不思惡</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 당대의 시인</span><!--[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57804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99.2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87.52pt;width:214.62pt;height:181.8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9"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9.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5193D5D2ECB1216" class="txc-image" width="420" height="242" style="width: 420px; height: 242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86" exif="{}" data-filename="noname11.jpg" id="A_9955193D5D2ECB1216ACB0"/></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nbs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백낙천이 스님을 찾아갔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오 하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말하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저한데 해주십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는 중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 문장가이고 정승까지 지낸 그런 벼슬을 한 사람한테 겨우 내려 준 것이 고작 착한 일을 하라는 것뿐이 없습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스님이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지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인도 행하지를 못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그때서사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을 누가 못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누가 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그것을 행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8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 노인도 행하지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쉬운 이야기지만 그것을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말이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쉬운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51396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355.96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285.94pt;width:223.20pt;height:264.73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a"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a.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EB83E5D2ECB3E13" class="txc-image" width="298"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98" exif="{}" data-filename="noname12.jpg" id="A_99BEB83E5D2ECB3E130BB5"/></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nbsp;&nbs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곡사 태화산 토굴에서의 수행생활은 어떠셨나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마곡사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을 살았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살다보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곡사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치생모 그림은 강화에서 그리고 마곡사 토굴에서도 그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날마다 좋은 날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을 그리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장을 그려줬다니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천장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을 그려줬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을 그린 것이 만장뿐이 못 그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음은 있지만 내 욕심에는 그것이 너무 적은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판화로 만들어가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판화로 해도 그것도 찍어서 나눠주면 그것도 힘들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인쇄를 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을 동참하게 그것을 채색하게 해서 나눠주고 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 한 장 그리기도 쉽지 않은데 다행이 울림이 주는 그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그려 놓고 그것을 보니 날마다 좋은 날에 딱 맞는 그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쳐야 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자기를 깨치기 이전에는 행복하지를 못 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희 같은 사람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날은 내일 올 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 좋은 날이 아니면 그 미래에 좋은 날은 오지 않는 것이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떻게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극락이라든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천당이라든지 내가 현실에 천당을 가보지 못하면 죽어서는 천당 못 간다 이 말이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떻게 현실에서 알지를 못하는데 죽어서 천당을 찾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극락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로 현실이 극락이 돼야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실이 천당이 돼야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을 이루지 못하고는 죽어서 찾아가지를 못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에 꼭 공명조가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명조는 선악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음양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공명조라는 새를 비유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야기 한 것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조석병이라 이 말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음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찰라병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찰라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변의 마음을 가져야 하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를 깨치지 않고서는 불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께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쉬워보여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기를 깨치기 위한 마음 공부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업을 쌓을 때 일상생활의 평정심도 오고 날마다 좋은 날도 온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두 좋은 마음자리를 갖고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년의 모든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시간을 좋은 날들이 되게 하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733632"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334.88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03.34pt;width:210.30pt;height:241.26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b"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b.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정현스님을 만나기 위해 무초스님과 함께 손윤경 한두뼘 대표와 작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이 부산 황룡산 자락을 찾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께서 강화도 불은암을 잠시 떠나오신 황룡산 절골에는 이름처럼 많은 암자와 사찰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미 봄꽃은 지고 초여름 신록이 짙어가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선 건강부터 살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팔순을 앞 둔 연세와 지병으로 인한 피곤함이 안색에 묻어났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표정만큼은 한결같이 </span><!--[if gte vml 1]><v:rect fillcolor="#ffffff" id="_x212739312" stroked="f" style="v-text-anchor:middle;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576.1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03.34pt;width:210.30pt;height:15.66pt;position:absolute;"><v:fill color2="#000000" opacity="1.00"/><v:textbox><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l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정현스님</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 2019.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월</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gt;</SPAN></P></div></v:textbox></v:rect><![endif]--> <!--[if !vml]--><img width="210" height="15"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DRW000008e0361c.gif" v:shapes="_x212739312"><!--[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인연의 황처사님이 마련해 준 임시거처에는 묵향과 차향이 그윽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달마도와 문수도 그림이 화선지에 겹겹이 쌓여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마당에는 양다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키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넝쿨이 차양이 될 정도로 무성히 뻗어 꽃 봉우리들도 막 올라와 터트릴 기회만 보고 있는 것 같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D1F395D2ECB610A" class="txc-image" width="280"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80" exif="{}" data-filename="noname13.jpg" id="A_998D1F395D2ECB610A469A"/></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 건강은 어떠세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건강은 괜찮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 와서 내가 여그 내려오게 된 동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진스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갑사라는 절이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 앞마당에 효행 공원을 만든다 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진스님을 만나고 효행공원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투석하고 바로 가기도 하다 보니 무척 피곤하기도 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에 용주사에서 효행교육원을 만들려다가 잘 안됐는데 그때 내가 부모은중경 동판을 제작해 놨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을 모씨에게 맡겼는데 초파일 쇠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중경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불사를 하라고 하고 싶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 찍으면 그 동판을 갔다가 모시라고 그러고 싶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은중경은 부모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 은혜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중경을 설하는 동기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이 뼈 무더기에 절을</span><!--[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748832"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99.2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87.34pt;width:308.36pt;height:177.4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1e"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1e.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nbs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께서 어째서 남들도 하지 않는 뼈 무덤에 절을 하십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뼈를 만져보고 들어봐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뼈가 무거우면 남자 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뼈가 가벼우면 여자 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서 은중경을 설하게 된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나중에 부모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느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럴 때 곤륜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높은 산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어깨에 메고 그 산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퀴를 돌아도 그 은혜를 못 갚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말씀을 하신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 은혜니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로</span><!--[if gte vml 1]><v:rect fillcolor="#ffffff" id="_x212757232" stroked="f" style="v-text-anchor:middle;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275.4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130.54pt;width:191.40pt;height:15.66pt;position:absolute;"><v:fill color2="#000000" opacity="1.00"/><v:textbox><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div></v:textbox></v:rect><![endif]-->&nbsp;&nbsp;<!--[if !vml]--><!--[endif]-->&nbsp;&nbs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표현을 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용주사가 원래 가랑사라는 신라시대 아주 쪼그만 토굴이었는데 용주사를 창건한 주지 이름을 잊어버렸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그 주지스님이 정조대왕 어가가 용주사 앞을 지날 때마다 앞에서 얼쩡거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정조대왕이 그 스님을 불렀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지인지 모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에도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하는 법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스님은 아무 말도 안하고 옆구리에 끼고 있던 은중경을 드렸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가를 타고 가면서 정조대왕이 은중경을 읽어보니 구구절절이 부모은혜에 대한 간절한 이야기가 쓰여 있거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불러가지고 소원이 뭐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용주사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절을 크게 짓는 게 소원이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정조대왕이 용꿈을 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용주사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과 무초스님</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주사는 내게도 인연이 깊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96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19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되던 해에 화엄사에 계시던 스님들이 대처승들에게 다 &#51922;겨 났을 때 전강조실스님께서는 흥복사로 해서 인천으로 가시게 되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당시 용화사가 처음에는 무당절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형인 누나가 무당이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실스님께 드린 것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실 스님이 사시면서 보니 거기에 일본 신사 터가 있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기가 구룡장주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홉 마리 용이 구슬을 다투는 그런 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화사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신사 터가 명당이라는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 사람들은 대학에서 그것을 배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풍수지리를 가리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을 전통적으로 배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전쟁에서 써먹은 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에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풍수가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무튼 나는 군대 첫 휴가 나와서 용주사 도반을 찾아갔더니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았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조실스님을 모시고 가서 용주사를 중앙선원으로 만들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때 조실스님이 용주사를 가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용주사는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이 전강스님을 용주사로 모시고 가지 않았으면 용주사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힘들었겠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실스님으로부터 선방도 하게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뒤에 용주사 주지했던 정대스님이 선방을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거기 선원으로 밑에서 선방을 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에 따로 짓기는 정대스님이 지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용주사에서 전강스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강문도들이 지금도 살고 그래서 용주사는 전강문도 절이라고도 할 수 있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법문을 많이 한 스님은 전강 조실스님뿐이 없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아있는 법문의 대다수가 용화사와 용주사에서 하신 법문이 녹음으로 남아 있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녁으로 법문을 하셨으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께서 따라 주시는 차를 마시면서 인터뷰를 하는 사이 여러 명의 보살이 다녀가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멀리서 가까이에서 스님은 또 그렇게 선연을 쌓아가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만들고 계시는 듯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룡산 절골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꽃보다 화려하게 연등이 여기 저기 피어나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쩌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가까이 나누어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림들이 전국의 사찰을 꽃피우는 연등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모두가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2</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의 나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2711232"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257.92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23.74pt;width:182.48pt;height:202.8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1"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1.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nbsp;<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57C405D2ECBAD0F" class="txc-image" width="243"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43" exif="{}" data-filename="noname14.jpg" id="A_99457C405D2ECBAD0F2799"/></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왜 이리 많은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병들어 신음하는 놈도 있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탐욕스런 도둑놈도 있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람둥이 건달놈도 있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벙어리와 장님도 있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양을 받는 수행자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문에 듣자니</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가운데 부처도 있다는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가 누구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방 가운데 앉아서 졸고 있는</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늙은이 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귀가 어두워 아이들이</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 뒤에서 흉을 보는</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의 멍청이 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0208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518.32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32.14pt;width:186.26pt;height:226.8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2"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2.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 <!--[if !vml]--><!--[endif]-->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 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머리 둘 달린 어리석은 공명조</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D5A385D2ECBCB22" class="txc-image" width="248"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48" exif="{}" data-filename="noname15.jpg" id="A_99DD5A385D2ECBCB22BC36"/></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담한 죽음은 눈을 감지 못한 물고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음에 눈을 떠 문수동자는 지혜를 얻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면목의 소를 타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환희의 노란 연꽃</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빛 광명 속에 피어나</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바의 고뇌를 불사르니</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와 평온함을 얻어</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날마다 좋은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담바라로 피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고자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은중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母恩重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설대보부모은중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佛說大報父母恩重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경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체적인 예로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되의 응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凝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흘리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말의 혈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血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먹인다고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須彌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백 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설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이 경은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십대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十大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대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①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懷耽守護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②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臨産受苦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③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生子忘憂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④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咽苦甘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⑤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廻乾就濕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⑥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乳哺養育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⑦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洗濁不淨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⑧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遠行憶念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⑨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爲造惡業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⑩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究意憐愍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해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53</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경기도 장단 화장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華藏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 개판한 것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變相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완벽함과 그 섬세함에 있어서는 정조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개간하도록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홍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金弘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그림이 첨가되어 있는 수원용주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龍珠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것을 꼽을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밖에도 수십 종의 판본이 전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은 모두 효도가 강조된 조선시대에 불교의 효를 강조함으로써 그 사회의 저변에서나마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였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출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이버 지식백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은중경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父母恩重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민족문화대백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학중앙연구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nbsp;<!--[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nbsp;&nbsp;<!--[if !supportEmptyParas]-->&nbsp;<!--[endif]-->&nbsp;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현스님 근황 사진 및 날마다 좋은날 운동 관련사진</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3552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589.0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65.14pt;width:269.97pt;height:167.8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3"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3.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nbsp;<!--[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3384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591.84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38.14pt;width:249.34pt;height:165.2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4"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4.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9683B5D2ECC211D" class="txc-image" width="442" height="340" style="width: 442px; height: 340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16" exif="{}" data-filename="noname21.jpg" id="A_9979683B5D2ECC211D3798"/><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004395D2ECC3615" class="txc-image" width="334" height="182" style="width: 334px; height: 182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76" exif="{}" data-filename="noname22.jpg" id="A_998004395D2ECC3615CC31"/></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3520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lin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465.0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text;mso-position-horizontal:absolute;width:237.16pt;height:178.96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5"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5.bmp"/><w:wrap type="topAndBottom"/></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nbsp;<!--[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3496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99.2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30.34pt;width:179.90pt;height:181.66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6"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6.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if !vml]--><!--[endif]-->&nbsp;&nbs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63F3F5D2ECC0D1F" class="txc-image" width="324" height="193" style="width: 324px; height: 193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84" exif="{}" data-filename="noname23.jpg" id="A_99863F3F5D2ECC0D1F4736"/><!--[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3504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432.36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84.34pt;width:425.40pt;height:186.00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7"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7.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nbsp;&nbsp;</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br></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811385D2ECD0A0A" class="txc-image" width="52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21" exif="{}" data-filename="noname24.jpg" id="A_998811385D2ECD0A0A14FF"/></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if !vml]--><!--[endif]--><!--[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211933448"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285.80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330.34pt;width:179.40pt;height:136.36pt;position: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08e03628" src="file:///C:\Users\own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8e03628.jpg"/><w:wrap type="square"/></v:shape><![endif]--><br></p>
<!-- -->
카페 게시글
♡←………문학♡이론
역사철학/한국불교의 맥을 찾아서/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일
이혜경
추천 0
조회 309
19.07.17 16:2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