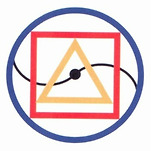<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name="user_contents"><!--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name="user_contents"><!--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P>
<TABLE title="사단법인 한국전례원 "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2>
<TBODY>
<TR>
<TD><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jeonyewon" target=blank>
<P align=center><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TRONG><FONT color=#5c7fb0>올바른 호칭의 사용</FONT> </STRONG></SPAN></FONT></P>
<P align=center><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TRONG></SPAN></FONT>&nbsp;</P>
<P><FONT color=#ff0000>1. 올바른 호칭의 사용 </FONT><BR>호칭은 특정한 사람을 불러 일컫는 말이다. 상대를 불러 일깨울 때, 상대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대화 중에 특정한 사람을 일컬을 때 호칭이 쓰인다. 서로간의 관계에 따라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다르고 아울러 제삼자를 일컫는 호칭도 달라진다. 따라서 호 칭은 가리키려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아야 한다. <BR></P>
<P><BR><FONT color=#ff0000>2.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호칭 </FONT><BR>
<P>(1) <FONT color=#9b18c1>자신</FONT>에 대한 호칭 <BR>저·제: 웃어른이나 대중에게 말할 때 <BR>나: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BR>우리:자기 쪽을 남에게 말할 때 <BR>아비, 어미: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할 때 <BR>할아비, 할미:조부모로서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 <BR>형, 누이:형이나 누이로서 동생에게 말할 때 <BR><BR>(2) <FONT color=#9b18c1>아버지</FONT>에 대한 호칭 <BR>아버지:직접 부르거나 대화 중 지칭할 때,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일컬 때 <BR>아버님: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상대방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BR>아비:아버지의 어른에게 아버지를 일컬을 때 <BR>아빠:말을 배우는 아이(초등 학교 취학 전)에게 그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BR>가친(家親):자기의 아버지를 남에게 일컫는 한문식 호칭 <BR>춘부장(椿府丈):상대방의 아버지를 일컫는 한문식 호칭 <BR>선친(先親), 선고(先考):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일컫는 한문식 호칭 <BR><BR>(3) <FONT color=#9b18c1>어머니</FONT>에 대한 호칭 <BR>어머니:직접 부르거나 대화 중 지칭할 때, 남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일컬 때 <BR>어머님: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상대방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BR>어미:어머니의 어른에게 어머니를 일컬을 때 <BR>엄마:말을 배우는 아이(초등 학교 취학 전)에게 그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BR>자친(慈親):자기의 어머니를 남에게 일컫는 한문식 호칭 <BR>자당(慈堂):상대방의 어머니를 일컫는 한문식 호칭 <BR>현비(현비):지방이나 축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쓸 때 <BR>대부인(大夫人):상대방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일컬을 때 <BR><BR>(4) <FONT color=#9b18c1>형제간</FONT>의 호칭 <BR>언니:미혼의 동생이 형을 부르는 호칭 <BR>형님:기혼의 동생이 형을 부르는 호칭 <BR>형:집안의 어른에게 형을 일컬을 때 <BR>백씨(伯氏), 중씨(仲氏), 사형(舍兄):남에게 자기의 형을 일컬을 때 <BR>백씨는 큰형, 중씨는 둘째형, 사형은 셋째 이하의 형 <BR><BR>(5) <FONT color=#9b18c1>형제, 자매간의 배우자</FONT> 호칭 <BR>아주머니:형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BR>아주미:형의 아내를 집안 어른에게 말할 때 <BR>형수씨:형의 아내를 남에게 일컬을 때 <BR>존형수씨:상대방의 형을 일컬을 때 <BR>제수씨, 수씨: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BR>제수: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일컬을 때 <BR><BR>(6) <FONT color=#9b18c1>시댁 가족</FONT>의 호칭 <BR>아버님, 어머님:남편의 부모를 직접 부를 때 <BR>아주버님:남편의 형을 부르거나 일컬을 때 <BR>형님:남편의 형수나 손위 시누이를 부를 때 <BR>시숙:남편의 형을 친족이 아닌 남에게 말할 때 <BR>동서:남에게 손위 동서를 말할 때 <BR>형:손위 동서보다 어른에게 손위 동서를 말할 때 <BR>도련님:미혼인 시동생을 말할 때 <BR>서방님:기혼인 시동생을 말할 때 <BR>작은 아씨:미혼인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 <BR><BR>(7) <FONT color=#9b18c1>처가 가족</FONT>의 호칭 <BR>장인 어른, 장모님:아내의 부모를 직접 부를 때 <BR>처남:처가의 가족에게 아내의 남자 동기를 말할 때 <BR>처남댁:처남의 아내를 부를 때 <BR><BR>(8) <FONT color=#9b18c1>기타 친척</FONT>의 호칭 <BR>큰아버지, 큰어머니:아버지의 큰 형님과 그 아내 <BR>○째 아버지, ○째 어머니:아버지의 큰형이 아닌 남자 동기와 그 아내 <BR>고모, 고모부:아버지의 누이와 그 남편 <BR>외숙,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동기와 그 아내 <BR>이모,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남편 <BR><BR>(9) <FONT color=#9b18c1>사회 생활</FONT>에서의 호칭 <BR>어르신네:부모의 친구 또는 부모같이 나이가 많은 어른 <BR>선생님:학교의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어른 <BR>노형(老兄):11년 이상 15년까지의 연상자 <BR>형:6년 이상 10년까지의 연상자 또는 아직 친구 사이가 되지 못한 10년 이내의 연상자 <BR>이름, 자네:10년 이내의 연하자로 친구같이 지내는 사이 <BR>○○○씨:친숙한 관계가 아닌 10년 이내의 연상자와 기혼, 성년의 연하자 <BR><BR>(10) <FONT color=#9b18c1>모르는 사람</FONT>의 호칭 <BR>노인 어른, 노인장: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연세가 많은 어른 <BR>어르신네:부모처럼 연세가 많은 어른 <BR>부인:자기의 부모보다는 젊은 기혼의 여자 <BR>댁:같은 또래의 남자와 여자 <BR>총각:미혼인 젊은 남자 <BR>아가씨:미혼인 젊은 여자 <BR>학생:학생 신분의 남녀 </P>
<P>&nbsp;</P>
<CENTER><FONT style="FONT-SIZE: 12pt" face=굴림 color=#133e89><B><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style="BACKGROUND-COLOR: #ff0000" color=#ffffff>족보</FONT> <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ff" color=#ffffff>호칭</FONT>]</FONT></B></CENTER>
<P align=center>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44%">
<P><FONT size=3>특별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34%">
<P><FONT size=3>관계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아버지 </FONT></P>
<P><FONT size=3>어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부친(父親) 가친(家親) </FONT></P>
<P><FONT size=3>모친(母親) 자친(慈親)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나를 낳아주신 분 </FONT></P>
<P><FONT size=3>나를 길러주신 분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할아버지 </FONT></P>
<P><FONT size=3>할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조부(祖父) </FONT></P>
<P><FONT size=3>조모(祖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아버지 </FONT></P>
<P><FONT size=3>아버지의 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증조 할아버지</FONT></P>
<P><FONT size=3>증조 할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증조부(曾祖父) 한 할아버지 </FONT></P>
<P><FONT size=3>증조모(曾祖母) 한 할머니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할아버지의 아버지 </FONT></P>
<P><FONT size=3>할아버지의 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고조 할아버지 </FONT></P>
<P><FONT size=3>고조 할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고조부(高祖父) 높은 할아버지 </FONT></P>
<P><FONT size=3>고조모(高祖母) 높은 할머니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FONT></P>
<P><FONT size=3>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남편 </FONT></P>
<P><FONT size=3>아내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부(夫) 가장(家丈) </FONT></P>
<P><FONT size=3>처(妻) 내자(內子)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지애비, 아비 </FONT></P>
<P><FONT size=3>지어미, 자기 부인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아들 </FONT></P>
<P><FONT size=3>며느리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가아(家兒) 돈아(豚兒) </FONT></P>
<P><FONT size=3>자부(子婦)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내가 낳은 사내아이 </FONT></P>
<P><FONT size=3>아들의 아내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딸 </FONT></P>
<P><FONT size=3>사위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여식(女息) </FONT></P>
<P><FONT size=3>서랑(胥郞)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내가 낳은 여자아이 </FONT></P>
<P><FONT size=3>딸의 남편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형 </FONT></P>
<P><FONT size=3>형수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장형(長兄) 사백(舍伯) 사중(舍仲) </FONT></P>
<P><FONT size=3>큰 형수(長兄嫂)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손위형제 </FONT></P>
<P><FONT size=3>형의 부인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아우 </FONT></P>
<P><FONT size=3>제수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사제(舍弟) 동생 </FONT></P>
<P><FONT size=3>제수(弟嫂)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손아래 동생 </FONT></P>
<P><FONT size=3>아우의 아내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누이 </FONT></P>
<P><FONT size=3>자형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가매(家妹) 언니 </FONT></P>
<P><FONT size=3>자형(姉兄) 매형(妹兄)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손위 남매 </FONT></P>
<P><FONT size=3>누이의 남편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누이동생 </FONT></P>
<P><FONT size=3>매제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매(妹) 가매(家妹) </FONT></P>
<P><FONT size=3>매부(妹夫) 매제(妹弟)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손아래 자매 </FONT></P>
<P><FONT size=3>누이동생의 남편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큰 아버지 </FONT></P>
<P><FONT size=3>큰 어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백부(伯父) 중백부(仲伯父) </FONT></P>
<P><FONT size=3>백모(伯母) 중백모(仲伯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큰형 </FONT></P>
<P><FONT size=3>아버지의 형수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작은 아버지 </FONT></P>
<P><FONT size=3>작은 어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숙부(叔父) 계부(季父) 삼촌(三寸) </FONT></P>
<P><FONT size=3>숙모(叔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동생 </FONT></P>
<P><FONT size=3>아버지의 제수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당숙 </FONT></P>
<P><FONT size=3>당숙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당숙(堂叔) 종숙(從叔) </FONT></P>
<P><FONT size=3>당숙모(堂叔母) 종숙모(從叔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사촌형제 </FONT></P>
<P><FONT size=3>아버지 사촌의 부인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재당숙 </FONT></P>
<P><FONT size=3>재당숙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재당숙(再堂叔) 재종숙(再從叔) </FONT></P>
<P><FONT size=3>재당숙모 재종숙모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육촌의 형제 </FONT></P>
<P><FONT size=3>아버지 육촌의 부인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종조부 </FONT></P>
<P><FONT size=3>종조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종조부(從祖父) </FONT></P>
<P><FONT size=3>종조모(從祖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할아버지의 형제 </FONT></P>
<P><FONT size=3>할아버지의 형수, 제수</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종형제 </FONT></P>
<P><FONT size=3>종수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사촌형제(四寸兄弟) </FONT></P>
<P><FONT size=3>사촌형수, 제수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조카 </FONT></P>
<P><FONT size=3>아버지의 조카며느리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재종형제 </FONT></P>
<P><FONT size=3>재종수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육촌형제(六寸兄弟) </FONT></P>
<P><FONT size=3>육촌형수, 제수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당숙의 아들 </FONT></P>
<P><FONT size=3>당숙의 며느리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조카 </FONT></P>
<P><FONT size=3>조카며느리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질(姪) 조카딸(조카사위) </FONT></P>
<P><FONT size=3>질부(姪婦)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형, 아우의 아들 딸 </FONT></P>
<P><FONT size=3>조카의 아내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당질 </FONT></P>
<P><FONT size=3>당질부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당질(堂姪) </FONT></P>
<P><FONT size=3>당질부(堂姪婦)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사촌의 아들 </FONT></P>
<P><FONT size=3>사촌아들의 아내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종손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종손(從孫)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조카의 아들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재종손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재종손(再從孫)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육촌의 손자 </FONT></P></TD></TR></TBODY></TABLE>
<P 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size=3><FONT style="FONT-SIZE: 10pt" face=굴림 color=#133e89><STRONG>시집의 호칭</STRONG></FONT> </FONT>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44%">
<P><FONT size=3>특별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34%">
<P><FONT size=3>관계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시아버님 </FONT></P>
<P><FONT size=3>시어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시부(媤父) 시아버지 </FONT></P>
<P><FONT size=3>시모(媤母) 시어머니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남편의 아버지 </FONT></P>
<P><FONT size=3>남편의 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시숙 </FONT></P>
<P><FONT size=3>동세 </FONT></P>
<P><FONT size=3>동서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시숙(媤叔) 서방님 </FONT></P>
<P><FONT size=3>동시(同媤) 형님 </FONT></P>
<P><FONT size=3>동서(同胥)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남편의 형, 시아주버니 </FONT></P>
<P><FONT size=3>남편의 형수 </FONT></P>
<P><FONT size=3>남편형제의 아내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시동생 </FONT></P>
<P><FONT size=3>시누이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기혼은 서방님, 미혼은 도련님 </FONT></P>
<P><FONT size=3>시매(媤妹), 기혼손위는 형님, 손아래는 아우, 미혼은 아가씨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남편의 아우 </FONT></P>
<P><FONT size=3>남편의 자매, 아가씨 </FONT></P></TD></TR></TBODY></TABLE>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FONT size=3><FONT style="FONT-SIZE: 10pt" face=굴림 color=#133e89><STRONG>외 가집 호칭</STRONG></FONT> </FONT>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44%">
<P><FONT size=3>특별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34%">
<P><FONT size=3>관계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외 할아버지 </FONT></P>
<P><FONT size=3>외 할머니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외조부(外祖父) </FONT></P>
<P><FONT size=3>외조모(外祖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어머니의 아버지 </FONT></P>
<P><FONT size=3>어머니의 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외 숙 </FONT></P>
<P><FONT size=3>외 숙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외숙(外叔) 외삼촌(外三寸) </FONT></P>
<P><FONT size=3>외숙모(外叔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어머니의 남자형제 </FONT></P>
<P><FONT size=3>외삼촌의 부인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외 사촌 </FONT></P>
<P><FONT size=3>외 종수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외 종(外 從)형제 </FONT></P>
<P><FONT size=3>외 종수(外 從嫂)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외삼촌의 아들 </FONT></P>
<P><FONT size=3>외삼촌의 며느리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외 당질 </FONT></P>
<P><FONT size=3>외 당질부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외 당질(外 堂姪) 외당질여</FONT></P>
<P><FONT size=3>외 당질부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외사촌의 아들 딸 </FONT></P>
<P><FONT size=3>외사촌의 며느리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진외 당숙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진외 당숙(陳外 堂叔)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외사촌 </FONT></P></TD></TR></TBODY></TABLE>
<P align=center> <FONT color=#e31600>* 위의 外字를 길게 발음하여야 한다 </FONT></P>
<P align=center><FONT color=#e31600></FONT>&nbsp;</P>
<P align=center><FONT size=3><FONT style="FONT-SIZE: 10pt" face=굴림 color=#133e89><STRONG>고모집안의 호칭</STRONG></FONT> </FONT>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44%">
<P><FONT size=3>특별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34%">
<P><FONT size=3>관계 </FONT></P></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고모 </FONT></P>
<P><FONT size=3>고모부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고모(姑母) </FONT></P>
<P><FONT size=3>고모부(姑母夫) 고숙(姑叔)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여자 형제 </FONT></P>
<P><FONT size=3>고모의 남편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당고모 </FONT></P>
<P><FONT size=3>재당고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당고모(堂姑母) </FONT></P>
<P><FONT size=3>재당고모(再堂姑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버지의 사촌누이 </FONT></P>
<P><FONT size=3>아버지의 육촌누이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외종형제 </FONT></P>
<P><FONT size=3>대고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외종사촌(外從四寸) </FONT></P>
<P><FONT size=3>대고모(大姑母) 왕고모</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고모의 아들 딸 </FONT></P>
<P><FONT size=3>아버지의 고모</FONT></P></TD></TR></TBODY></TABLE>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 face=굴림 color=#e31600 size=3></FONT>&nbsp;</P>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 face=굴림 color=#e31600 size=3>*위의 外字를 짧게 발음하여야 한다 </FONT></P>
<P align=center><FONT color=#e31600 size=2></FONT>&nbsp;</P>
<P align=center><FONT size=3><FONT style="FONT-SIZE: 10pt" face=굴림 color=#133e89><STRONG>처가집 호칭</STRONG></FONT> </FONT></P>
<P align=center>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44%">
<P><FONT size=3>특별호칭 </FONT></P></TD>
<TD align=left width="34%">
<P><FONT size=3>관계 </FONT></P></TD></TR></TBODY></TABLE></P>
<P align=center>
<TABL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장인 </FONT></P>
<P><FONT size=3>장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장인(丈人) 빙장 </FONT></P>
<P><FONT size=3>장모(丈母) 빙모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내의 아버지 </FONT></P>
<P><FONT size=3>아내의 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처백부 </FONT></P>
<P><FONT size=3>처백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처백부(妻伯父) </FONT></P>
<P><FONT size=3>처백모(妻伯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내의 큰아버지 </FONT></P>
<P><FONT size=3>아내의 큰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처숙부 </FONT></P>
<P><FONT size=3>처숙모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처숙부(妻叔父) </FONT></P>
<P><FONT size=3>처숙모(妻叔母)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내의 작은아버지 </FONT></P>
<P><FONT size=3>아내의 작은어머니 </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처남 </FONT></P>
<P><FONT size=3>처남댁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처남(妻男) </FONT></P>
<P><FONT size=3>처남댁(妻男宅) </FONT></P></TD>
<TD width="34%">
<P><FONT size=3>아내의 남자 형제</FONT></P>
<P><FONT size=3>처남의 부인</FONT></P></TD></TR>
<TR>
<TD align=left width="22%">
<P><FONT size=3>처조카 </FONT></P>
<P><FONT size=3>처조카며느리 </FONT></P></TD>
<TD width="44%">
<P><FONT size=3>처질(妻姪) 처조카딸 </FONT></P></TD></TR></TBODY></TABLE></P>
<P></FONT><FONT color=#000000></FONT><FONT size=3>&nbsp;</P>
<P align=center><STRONG><FONT size=3><FONT color=#000000><FONT face=HY신명조><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FAMILY: Gulim">외사촌이 내종(內從)이다</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7px; COLOR: #000000; LINE-HEIGHT: 28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FONT></FONT></FONT><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SPAN></STRONG></P>
<P style="FONT-SIZE: 17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8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7px; COLOR: #000000; LINE-HEIGHT: 28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cente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SPAN style="FONT-SIZE: 17px; COLOR: #000000; LINE-HEIGHT: 28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nbs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우리의 호칭어(呼稱語)에 내종(內從), 외종(外從)이란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내종(內從), 외종(外從)이란 말을 단독으로 쓰는 일은 별로 없고, 외사촌과 고종의 관계를 말하는 내외종간(內外從間)이란 말은 많이 쓰고 있다. 내외종간(內外從間)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도 외사촌과 고종 중에 어느 쪽이 내종(內從)이고 어느 쪽이 외종(外從)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외사촌과 고종을 묶어서 그냥 내외종간(內外從間)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내종(內從), 외종(外從)은 아들과 딸의 남매관계에서 연유한 말이다. 아들(=외숙)의 자녀가 외사촌이 되고, 딸(=고모)의 자녀가 고종사촌이 된다. 아들인 외숙은 가통(家統)을 이어가며 자기 집에서 살고, 딸인 고모는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어 집을 떠나 다른 가문의 사람이 된다. 외숙이 낳은 외사촌은 본집에서 나서 거기서 살므로 「안 사촌」즉 내종(內從)이 되고, 고모가 출가하여 밖(다른 가문)에서 낳은 고종은「바깥 사촌」이므로 외종(外從)이 된다.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보아, 남형제가 사는 친정과 여형제가 출가(出嫁)하여 사는 매가(妹家) 중에 어느 쪽을 안(內)으로 보아야 되겠는가? 고모는 친정 조카를 내질(內姪)이라고 하고, 외숙(外叔)은 생질(甥姪)을 외질(外姪)이라고 한다. 또 생질은 외숙을 내구(內舅)라고 한다. 이것을 보아도 남형제가 사는 친정이 안(內)이란 것을 알 수 있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국어사전에는「내종(內從): 고종(姑從), 외종(外從): 외사촌」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에도「내종(內從): 고종(姑從)」으로 되어 있어서, 필자가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 청원을 한 일이 있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교육부에서는 국어원(國語院)에 질의하고, 세 분의 교수와 한학자 및 성균관전례연구위원장에 자문하여 회신(回信)을 보내왔는데 “고종을 내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사람들이 국어사전과 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외종(外從)의 ‘외’자(‘外’字)가‘외사촌’의 ‘외’자(‘外’字)와 같은 줄 알고,「외종(外從): 외사촌(外四寸)」으로 오해(誤解)하기 때문이다. 외사촌(外四寸)을 외종(外從)으로 단정하고 나니, 남은 내종(內從)은 어쩔 수 없이 고종(姑從) 차지가 된 것이다. 고종을 내종(內從)이라고 해야 할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다. 출가외인이 된 딸의 자녀에게‘안, 중심’을 뜻하는 내(內)자를 붙여서 고종(姑從)을 내종(內從)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들의 자녀가 딸의 자녀에게 밀려나서 왜 바깥사촌(=外從)이 되어야 하는가?&nbsp;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외종(外從)의 외(外)와 외사촌(外四寸)의 외(外)는 쓰인 의미가 서로 다르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외조(外祖), 외숙(外叔)의 외(外)는 외가(外家)의 뜻이고, 외손(外孫), 외질(外姪), 외종(外從)의 외(外)는‘바깥’이라는 뜻이다. 외종은 고모가 출가하여 낳은 바깥사촌인 고종(姑從)을 지칭하는 말이고, 외가(外家)의 四寸인 外四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고종사촌→고종, 이종사촌→이종(姨從)이란 말은 있어도 외사촌→외종사촌→외종이란 말은 본래부터 없는 말이다. 외사촌(外四寸)이란 말이 있을 뿐이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외가(外家)의 호칭은 친가(親家)의 호칭어에 외(外)자를 앞에 붙이면 된다. 이를테면 숙부(叔父)→외숙부(外叔父), 사촌(四寸)→외사촌(外四寸)과 같다. 사촌(四寸)을 종(從)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외사촌(外四寸)을 외종(外從)이라고 할 수 없고, ‘외+사촌’인 외사촌이 있을 뿐이다.&nbsp;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외사촌(外四寸)을 외종(外從)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외사촌을 외종(外從)이라고 하더라도 이 외종(外從)의 대어(對語)는 고종(姑從)이지, 내종(內從)이 대어(對語)가 될 수 없다.(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졌는가?)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외종(外從)은 외사촌(外四寸)의 준말이 아니다. 외종(外從)은 외사촌(外四寸)과 아무 관계도 없는, 본래부터 딴 말이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외사촌형(外四寸兄)은 외-종형(外-從兄), 외사촌동생(外四寸同生)은 외-종제(外-從弟)로 發音한다. 외종-형(外從-兄),외종-제(外從-弟)는 고종형(姑從兄), 고종제(姑從弟)가 된다.&nbsp;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외는 외가(外家)이고 종(從)은 사촌(四寸)이니, 외사촌(外四寸)이 외종(外從)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사촌(外四寸)을‘외종(外從)’이라고 하지 않는다. 외종(外從)은 내종(內從)의 대어(對語)이며, 고종(姑從)을 지칭하는 말이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외숙, 외사촌은 외가(外家)의 숙(叔), 외가(外家)의 사촌(四寸)이란 뜻으로‘외(外)’는 ‘외가(外家)’의 뜻이고, 내종(內從), 외종(外從)의‘내(內), 외(外)’는‘안과 밖’을 뜻하는 상대관계(相對關係)의 말이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외사촌(外四寸)이 내종(內從)이고, 고종(姑從)이 외종(外從)임을 입증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정리해 보겠다.&nbsp;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1.『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 “內兄弟: 稱舅之子也” (내형제: 외숙의 아들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한문대자전(漢韓大字典)』(이상은 감수. 민중서림)에“외형제(外兄弟): 고모의 아들.”로 되었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2.『가례(家禮)』복제도(服制圖)에“舅之子曰 內兄弟, 姑之子曰 外兄弟”(외숙의 아들을 내형제라고 하고, 고모의 아들을 외형제라고 한다.) 로 되어 있다.&nbsp;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내형제(內兄弟)와 외형제(外兄弟)는 촌수가 사촌간(四寸間)이므로 내형제가 내종이고, 외형제가 외종이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3.『진양하씨세보(晉陽河氏世譜)』(1606. 海印寺 간행) 권수(卷首) 역대유록(歷代遺錄)에 있는 하자종(河自宗)의 행장(行狀)에 시(詩) 한 수가 있는데, “이 시는 하자종의 외종제(外從弟) 강회백이 지었다.”는 주석이 있다. 하씨 족보를 보면 강회백(姜淮伯)은 하자종(河自宗)의 고종(姑從)이다. 여기서도 고종이 외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4.정남(井南) 권오근(權五根) 선생의「정남선생문집」에서 외사촌형 묘갈명(墓碣銘)을 내종형(內從兄) 묘갈명(墓碣銘)이라고 했다.(791쪽)</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5.『신편척독대방(新編 尺牘大方)』(1913.)에 있는 서간문을 보면 고종(姑從)은 외사촌형을 내형(內兄), 내종형(內從兄)이라고 했고, 고종(姑從) 자신은 표제(表弟), 표종제(表從弟)라 했다. 표(表) 즉 외(外)의 뜻이니, 표제(表弟), 표종제(表從弟)는 외제(外弟), 외종제(外從弟)이다. 고종(姑從)을 외종(外從)이라고 하지만, 표(表) 즉(則) 외(外)이므로 고종(姑從)을 표종(表從)이라고도 한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6.『17세기 국어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에는 「내형제(內兄弟)는 외사촌, 외형제(外兄弟)는 고종」으로 뜻풀이되어 있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내형제(內兄弟)&#58480; 위(爲)하예니 닐온 구(舅)의 자(子)ㅣ라. 외형제(外兄弟)&#58480; 닐온 고(姑)</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의 자(子)</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ㅣ라】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7. 려증동 교수(전 경상대 교수)는『한국가정언어(韓國家庭言語)』에서 “… 여기에 근거하여 외사촌이 내종(內從)이 되고, 고종이 외종(外從)이 된다. 이와 같은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nbsp;&nbsp;&nbsp;&nbsp;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8. 고모는 친정 조카를 내질(內姪)이라고 하고, 외숙(外叔)은 생질을 외질(外姪)이라고 한다. 이것은 친정(外家) 쪽이 ‘내(內)’가 되고, 출가(出嫁)한 딸(고모)이 있는 쪽은 외(外)가 되기 때문이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9. 아들의 자(子)와 딸의 자(子)는 같은 손자(孫子)인데, 딸이 낳은 자녀는 외손(外孫)이라고 한다. 이 외손을 외숙은 외질(外姪)이라고 하고, 외사촌은 이들을&nbsp; 외종(外從)이라고 한다. 외손(外孫), 외질(外姪), 외종(外從)의 어형(語形)만 보아도 타당성(妥當性)이 보이는데, 교육부의 자문(諮問)에 답한 교수들은 외손(外孫), 외질(外姪), 내종(內從)이 옳다고 오답(誤答)했다. 외할아버지는 외손(外孫)이라 하고, 외숙(外叔)은 외질(外姪)이이라고 하는데, 외사촌(外四寸)한테 와서는 왜 고종(姑從)이‘내종(內從)’이 되어야 하는가?</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2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10.필자가 만나본, 호칭을 아는 대구의 한학자 중에 고종을 내종이라고 하는 분은 없었고, 그분들은 “내종(內從), 외종(外從)을 잘못 알고 망발(妄發)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2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BR></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2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서울의 어떤 단체(**敎育硏究會)의 교수들은‘외사촌을 내종(內從), 고종을 외종(外從)’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지방에서 통용되는 방언(方言)이라고 했다. 한자어는 불변성(不變性)과 보편성(普遍性)이 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조선시대의 내종(內從)과 오늘의 내종(內從)은 의미에 차이가 없고(不變性), 서울 내종(內從)과 시골 내종(內從)은 다르지 않다(普遍性). 대구에서도 외사촌을 외종(外從)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서울과 마찬가지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내(內)’자가 들어간 말은 내종(內從: 외사촌), 내질(內姪: 친정 조카), 내구(內舅: 외삼촌)가 있을 뿐인데, 어떤 예학자(禮學者-金得中)는“내종, 내종질, 내재종손, 내종숙부…”등등 이성(異姓)인 고모의 자손들에게 친가(親家) 칭호어(稱號語) 앞에 내(內)자를 접두어로 붙여 엉터리 호칭어를 많이 만들었다. 내종(內從), 외종(外從)을 잘못 알고, 그는 엉터리 칭호어(稱號語)를 양산하고 있다.</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웃을 때 볼이 옴폭하게 들어가는 것을‘보조개’라고 하는데, 이것을‘볼우물’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우물도 복수표준어로 인정했다(1988년). 그러나 피붙이간의 호칭은 경우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호칭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쳐야 한다.‘아비를 형’이라고 부르는 者가 있다면 패륜(悖倫)이다. 내종(內從) 아닌 사람을 보고 내종(內從)이라고 하고, 외종(外從) 아닌 사람을 보고 외종(外從)이라고 하면 이것 역시 패륜(悖倫)이다. </SPAN></SPAN></SPAN></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8;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HY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nbsp;내종(內從), 외종(外從)의 뜻풀이 때문에 관련된 14개 낱말이 국어사전에 잘못 뜻풀이 되어 있다. 어문(語文)을 맡은 기관은 원천적(源泉的)으로 국어사전을 수정하여 사람들이 칭호어(稱號語)를 바로 알고, 바로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lt;끝&gt;.</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 end clix_content --></FONT>
<P><FONT face=굴림><STRONG>1세(生)<BR></STRONG>농장(弄璋) : 득남(得男), 아들을 낳으면 구슬{璋} 장남감을 주는데서 유래. 아들을 낳은 경사 - 농장지경(弄璋之慶) <BR>농와(弄瓦) : 득녀(得女), 딸을 낳으면 실패{瓦} 장난감을 주는데서 유래. 딸을 낳은 경사 - 농와지경(弄瓦之慶) <BR><BR><STRONG>2세-3세</STRONG> <BR>제해(提孩) : 제(提)는 손으로 안음, 孩(해)는 어린아이, 유아가 처음 웃을 무렵(2-3세). *해아(孩兒)도 같은 의미로 사용.<BR><BR><STRONG>15세</STRONG> <BR>지학(志學) : 공자(孔子)가 15세에 학문(學問)에 뜻을 두었다는 데서 유래.<BR>육척(六尺) : 주(周)나라의 척도에 1척(尺)은 두 살반{二歲半} 나이의 아이 키를 의미.- 6척은 15세.* cf) 삼척동자(三尺童子)<BR><BR><STRONG>16세</STRONG> <BR>과년(瓜年) : 과(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므로 여자 나이 16세를 나타내고 결혼 정년기를 의미함.<BR>* 남자는 64세를 나타내면서 벼슬에서 물러날 때를 뜻함. - 파과(破瓜)<BR><BR><STRONG>20세</STRONG> <BR>약관(弱冠) : 20세를 전후한 남자. 원복(元服;어른 되는 성례 때 쓰던 관)식을 행한데서 유래. <BR>방년(芳年) : 20세를 전후한 왕성한 나이의 여자. 꽃다운{芳} 나이{年}를 의미.<BR><BR><STRONG>30세</STRONG> <BR>이립(而立) : 공자(孔子)가 30세에 자립(自立)했다는 데서 유래.<BR><BR><STRONG>40세</STRONG> <BR>불혹(不惑) : 공자(孔子)가 40세에 모든 것에 미혹(迷惑)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BR>강사(强仕) : &lt;예기 designtimesp=19502&gt;에 "四十曰强 而仕 - 40세을 강(强)이라 하는데, 이에 벼슬길에 나아감{仕}"에서 유래. * 强(강) 마흔살<BR><BR></FONT><FONT size=2><FONT face=굴림><STRONG>48세<BR></STRONG>상년(桑年) : 상(桑)의 속자(俗字)는 '十'자 세 개 밑에 나무 목(木)을 쓰는데, 이를 파자(破字)하면 '十'자 4개와 '八'자가 되기 때문.<BR><BR><STRONG>50세</STRONG> <BR>지명(知命) : 공자(孔子)가 50세에 천명(天命:인생의 의미)을 알았다는 데서 유래. "知天命"의 준말<BR><BR><STRONG>60세</STRONG> <BR>이순(耳順) : 공자(孔子)가 60세가 되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순화시켜 받아들였다는 데서 유래<BR><BR><STRONG>61세</STRONG> <BR>환갑(還甲),회갑(回甲),환력(還曆) :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되돌아 간다는 의미. 곧 60년이 지나 다시 본래 자신의 출생년의 간지로 되돌아가는 것. 풍습에 축복(祝福)해 주는 잔치를 벌임<BR>화갑(華甲) : 화(華)자를 파자(破字)하면 십(十)자 여섯 번과 일(一)자가 되어 61세라는 의미.<BR><BR><STRONG>62세</STRONG> <BR>진갑(進甲) : 우리나라에서 환갑 다음해의 생일날. 새로운 갑자(甲子)로 나아간다{進}는 의미<BR><BR><STRONG>70세</STRONG> <BR>종심(從心) : 공자(孔子)가 70세에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 從心所欲 不踰矩에서 준말.<BR>고희(古稀) :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의 구절 "人生七十古來稀(사람이 태어나 70세가 되기는 예로부터 드물었다)"에서 유래.<BR><BR><STRONG>71세</STRONG> <BR>망팔(望八) : 팔십살을 바라 본다는 의미. 70세를 넘어 71세가 되면 이제 80세까지 바라는 데서 유래.<BR><BR></FONT></FONT><FONT size=2><FONT face=굴림><STRONG>77세<BR></STRONG>희수(喜壽) : 희(喜)자를 초서(草書)로 쓸 때 "七十七"처럼 쓰는 데서 유래. 일종의 파자(破字)의 의미.<BR><BR><STRONG>80세</STRONG> <BR>산수(傘壽) : 산(傘)자의 약자(略字)가 팔(八)을 위에 쓰고 십(十)을 밑에 쓰는 것에서 유래.<BR><BR><STRONG>81세</STRONG> <BR>반수(半壽) : 반(半)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一"이 되는 데서 유래<BR>망구(望九) : 구십살을 바라 본다는 의미. 81세에서 90세까지를 기원하는 장수(長壽)의 의미를 내포함.<BR>* '할망구'로의 변천<BR><BR><STRONG>88세</STRONG> <BR>미수(米壽) : 미(米)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八"이 되는 데서 유래.<BR>혹은 농부가 모를 심어 추수를 할 때까지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서 유래.<BR><BR><STRONG>90세</STRONG> <BR>졸수(卒壽) : 졸(卒)의 속자(俗字)가 아홉 구(九)자 밑에 열 십(十)자로 사용하는 데서 유래<BR>동리(凍梨) : 언(凍) 배(梨)의 뜻. 90세가 되면 얼굴에 반점이 생겨 언 배 껍질 같다는 데서 유래.<BR><BR><STRONG>91세</STRONG> <BR>망백(望百) : 백살을 바라 본다는 의미. 역시 장수(長壽)의 축복,기원<BR><BR></FONT></FONT><FONT size=2><FONT face=굴림><STRONG>99세<BR></STRONG>백수(白壽) : 백(百)에서 일(一)을 빼면 백(白)자가 되므로 99세를 나타냄. 파자(破字)의 뜻</FONT></FONT></P>
<P>&nbsp;</P></A></TD></TR></TBODY></TABLE></P></TD></TR></TBODY></TABLE></P></TD></TR></TBODY></TABLE></P>
<!-- -->
카페 게시글
호칭(呼稱)예절
Re:올바른 호칭의 사용
根熙 김창호
추천 0
조회 295
09.02.27 13:4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