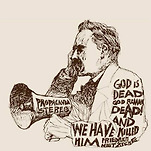<p>* 이하 자료 출처:&nbsp; 기초학문자료센터<br><a class="tx-link" style="color: rgb(0, 85, 255); font-size: 8pt;" href="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amp;m201_id=10026119&amp;res=y"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amp;m201_id=10026119&amp;res=y</a><br><br><br></p><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7px; padding: 17px 3px 8px 0px; border: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text-align: justify; clear: both;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span class="kfont09"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5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px; line-height: 24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8, 19, 13); letter-spacing: -1px;">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span></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li class="titleKrm"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9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 height: 30px; background-color: rgb(126, 191, 236);"><span class="kfont2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1px;">연구자가<span>&nbsp;</span><span class="kfont2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245, 104); letter-spacing: -1px;">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span>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font: inheri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034.gif"></span></li></ul><div class="wra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26, 191, 236);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div class="basicInfo"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class="basicInfo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border-top: 1px solid rgb(126, 191, 236); border-bottom: 2px solid rgb(203, 203, 203); width: 717.6px;'><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사업명</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 colspan="3">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span>&nbsp;</span><b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img title="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cursor: pointer;" alt="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hwpicon_16.gif"><span>&nbsp;</span></b><b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a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Gulim;" href="https://www.krm.or.kr/krmts/sdata/frbr/bizmap/2010/2010_332.pdf"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title="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cursor: pointer;" alt="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pdficon_16.gif"></a><span>&nbsp;</span></b>]</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과제번호</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2010-332-G00056</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선정년도</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2010 년</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기간</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책임자</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a title="연구자의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Gulim;">배상준</a><span>&nbsp;</span><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009.gif"><span>&nbsp;</span><span class="authorInfo" id="mgrCountInfo"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normal;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 word-spacing: -3.5px;">[ NRF 인문사회<span>&nbsp;</span><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33, 33, 33);">연구책임 3회 수행<span>&nbsp;</span></span>/<span>&nbsp;</span><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33, 33, 33);">공동연구 2회 수행<span>&nbsp;</span></span>/<span>&nbsp;</span><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33, 33, 33);">학술논문 36편 게재<span>&nbsp;</span></span>/<span>&nbsp;</span><span class="kfo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33, 33, 33);">총 피인용 80회<span>&nbsp;</span></span>]</span><span>&nbsp;</span><a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Gulim;" href="https://www.kci.go.kr/kciportal/po/citationindex/poCretDetail.kci?citationBean.cretId=CRT00026279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authorInfoKci.gif"></a></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연구수행기관</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a title="기관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Gulim;">성신여자대학교</a></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15, 115, 115); height: 27px; width: 115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과제진행현황</td><td class="kfont15"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5px 15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26, 226, 22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22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height: 30px;">종료</td></tr></tbody></table></div><div class="researchSum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20px; padding: 30px 0px 10px 2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text-align: justify;"><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7px; padding: 3px 3px 15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text-align: justify; clear: both;"><img class="paragraphIcon"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lef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title_011.gif">과제신청시 연구개요</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goal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연구목표</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div id="goal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의 한 명인 박찬욱의 최근작 &lt;박쥐&gt; (Thirst, 2009)의 영화미학, 특히 미장센과 색채 미학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키워드로서 본 연구는 필름 누아르의 대안적 개념인 ‘필름 블랑크 (Film blanc)’를 제시하고자 한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 분석의 매개체: 필름 블랑크 (Film blanc)<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필름 블랑크 - 개념의 이해<br><br style="box-sizing: border-box;">필름 블랑크는 토마스 엘제서 (Thomas Elsaesser)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R. W. Fassbinder)의 흑백영화 &lt;베로니카 포스의 갈망&gt; (Die Sehnsucht der Veronika Voss, 1982)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이 영화 속의 지나치게 밝은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영화와 큰 대조를 이루며 현실의 이중성 또는 복합성에 고통 받는 여주인공을 망각의 세계로 밀쳐내고 있는데, 이는 마치 그림자가 없는 인간에게는 삶 그 자체도 없으며 따라서 영혼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이렇게 영화에서 색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극단적인 ‘하양’으로 강조된 정신병원의 공간은 결국 인간성의 상실과 타락, 그리고 (성적) 도착과 그로 인한 죄의식의 형상화를 위한 실험실로 기능하고 있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필름 블랑크와 영화 &lt;박쥐&gt;<br><br style="box-sizing: border-box;">제 62회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lt;박쥐&gt;는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는 가톨릭 신부가 - 본의 아니게 - 뱀파이어가 되어 다른 인간에 기생하게 되고, 친구의 아내까지도 탐한다는 역설적인 내용으로 뱀파이어 장르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영화이다. 특히 이 영화는 염세주의적 색채를 강조하는 로우키와 명암의 대조를 통해 박찬욱 감독이 이제껏 탐구해 왔던 원죄와 죄의식에 대한 고뇌, 그리고 존재적 불확실성과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필름 느와르적 스타일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lt;박쥐&gt;는 ‘검은 영화’라는 의미의 필름 누아르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하얀 영화’, 즉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새하얀 병실의 벽 위로 나부끼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문이 열리면 신부 상현이 들어온다. 사면이 하얗게 칠해진 병실 창문을 통해 매우 밝지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빛이 들어오는데, 이 창백한 공간은 상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환유라 할 수 있다. 세상은 곧 병실이며, 그 누구라 한들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상현은 뱀파이어가 된 후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창을 봉하고 내부 공간을 온통 하얀 페인트로 칠해버리는데, 이렇게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 듯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신부임을 망각하고 다른 인간들을 살해하며, 결국 친구의 부인인 태주와 함께 피의 향연을 펼친다. 여기서 극단적인 하얀색이 지배하는 공간과 하이키 조명을 통한 미장센은 폭력성과 성적 욕망 및 쾌락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엄청난 빛을 발산하지만 따스함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시퀀스는 동시에 인간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죄의식에서 분출되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영화를 냉혹하게 광기어린 자기소멸의 장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공간들이 &lt;박쥐&gt;를 필름 누아르가 아닌, 바로 ‘필름 블랑크’로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필름 블랑크를 넘어 필름 블랭크 (Film blank)<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또한 이 시퀀스에서 바로 영화 자체는 일종의 망각의 매체가 되는 듯한데, 뱀파이어 커플은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삶을 피해 빛의 저편으로 몸을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퀀스는 필름 블랑크뿐만이 아닌, 망각의 영화 속의 여백의 공간, 즉 필름 블랭크 (Film blank)를 연상시키기까지 한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영화적 장치 (Filmic apparatus)로서의 필름 블랑크<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장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메소드로서, 즉 영화적 장치 (Filmic apparatus)로서의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을 통해 박찬욱의 &lt;박쥐&gt;의 미장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expectedEffect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기대효과</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div id="expectedEffect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 박찬욱의 재평가<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본 연구 ‘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를 통한 일차적 기대효과는 ‘2. 선행연구 사례와 분석’에서 지적한 바 있는 박찬욱 연구의 단면성에 균형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폭력성’이나 ‘복수’ 그리고 ‘욕망’이라는 영화의 주제적 분석에 치중되어있는 박찬욱의 연구는 영상 스타일의 측면과 영화 미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한 학문적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 &lt;박쥐&gt;에 관한 본 연구는 소격현상을 일으키는 영화 미학적 장치로서의 미장센 ‘필름 블랑크’라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대표적 영화감독인 박찬욱을 작가론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장센과 색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구의 결과물은 또한 박찬욱이 추구하는 다른 미학적 장치들, 즉 ‘카메라’, ‘편집’ 그리고 ‘사운드&amp;음악’ 등등에 관한 독창적이고도 창의적인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리라 믿는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 한국형 장르영화연구의 다양화 - ‘예술과 키치 사이’<br><br style="box-sizing: border-box;">&lt;박쥐&gt;는 주연 배우의 성기노출 논란과 같은 자극적인 이슈에서부터 뱀파이어라는 서구적 소재에 한국적 문화와 정서를 가미한 소위 ‘한국형 장르영화’의 탄생을 외치는 목소리까지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영화이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스스로를 “상업영화 감독”으로 인지하고, “무조건 상업영화”를 찍으며, “‘박쥐’는 특히 더욱 그랬다”고 (조현우 기자와의 인터뷰,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lt;박쥐&gt;는 영화사적으로 자주 장르영화의 소재가 되어왔던 뱀파이어-모티브를 통해 철저히 ‘상업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키치 (Kitsch)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영화는 제목이 ‘뱀파이어’가 아닌 ‘박쥐’이듯 - 그리고 영어제목 역시 ‘Vampire가 아닌 ‘갈망 (Thirst)’이듯 -, (인간으로서의) 과거에 대한 갈망과 (뱀파이어로서의) 현재의 증오라는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서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일 수도 있다. 따라서 &lt;박쥐&gt;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형 장르영화의 현 위치를 ‘예술과 키치사이에서의 외줄타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위한 키워드로서 ‘미장센 - 필름 블랑크’를 제시함으로서 한국 영화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br style="box-sizing: border-box;">■ 현대 영화이론적 개념의 확장<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본 연구는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에 관한 분석이지만, 이를 위한 핵심 매개체로서 ‘필름 블랑크’라는 - 그리고 ‘필름 블랭크’라는 -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영화이론의 확장이라는 측면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비록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을 유럽의 한 영화학자가 독일영화를 분석하면서 언급하였지만, 이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영화분석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시켜 그 학술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시도와 이 작업을 한국의 대표적 감독 박찬욱을 대상으로 실행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필름 누아르’의 파생개념으로 ‘홍콩 누아르 (Hongkong noir)’가 탄생되어 영화산업의 시대적 현상을 누렸듯이, 한국에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시도되는 ‘필름 블랑크’에 관한 연구가 현대 영화이론에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summary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1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연구요약</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div id="summary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토마스 엘제서가 제시한 이 개념은 필름 누아르의 전통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엘제서는 과거 전통적 필름 누아르의 그 어떠한 영화도 &lt;베로니카 포스&gt;의 흑백 영상처럼 정신분열증적이며 신경쇠약증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는데, 특히 베로니카에게 마약을 투여 하는 정신과 의사 카츠 박사의 병원 사무실의 위협적이고도 추상적인 하얀 영상은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면서 “[이 영화는] 흑백영화라기보다는 검은 또는 하얀 영화 (Film blanc)” (179쪽)임을 주장한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이와 같이 필름 누아르의 연장선상에서 영화 미학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은 &lt;박쥐&gt;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바이러스 실험 도중 정체불명의 피를 수혈 받아 흡혈귀가 되어버린 신부가 야수적인 성적이상자로 변신하고, 이성보다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에 의존한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이 평소 탐구해 왔던 인간의 원죄와 죄의식 그리고 그로 인한 고뇌와 고통이라는 필름 느와르적 주제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실의 이중성을 주인공의 허무주의적 자기모멸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주제의식은 전통적인 필름 누아르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하지만 &lt;박쥐&gt;는 필름 누아르라기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필름 블랑크의 개념을 통해 보다 더 깊이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부 상현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지켜보고만 있기에 성직자로서의 무기력감과 죄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신개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그가 머무는 병실은 베로니카 포스가 마약을 투여 받는 정신과 사무실 못지않게 창백한 하이키로 점철되어 세상의 모든 병자의 공간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체모를 피를 수혈 받고 뱀파이어가 되어 버린 상현은 결국 인간의 피를 원하는 원초적이면서도 생물학적인 욕구와 살인을 거부하는 성직자로서의 신앙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큰 자로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고, 마찬가지로 여주인공 태주도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그리고 성적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 쪽가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데, 이 두 캐릭터의 욕망이 무한히 발산되는 집의 거실이 바로 필름 블랑크의 공간이다. 뱀파이어의 피가 활성화된 후, 즉 인간성을 박탈당한 후 상현은 자연적인 빛을 차단하기 위해 태주와 함께 모든 창문을 막고 벽을 하얀 페인트로 장식하는데, 마치 영혼의 미로처럼 보이는 이 필름 블랑크의 미장센은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적인 존재들의 광기어린 피의 향연과 에로스의 극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원초적 욕망의 실현 후에 찾아오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 순교의 형식을 빌려 -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데, 따라서 이 곳의 극단적인 하얀색은 죽음의 전조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lt;박쥐&gt;의 필름 블랑크는 원죄와 구원 그리고 원초적 욕망과 죄의식이라는 종교적이고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어두운 그림자의 표면이 아닌, 그림자의 저편에, 그러니까 그림자 하나 허용하지 않는 무의 공간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또한 필름 블랑크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주제의식을 정신분열증적인 미장센을 통해 단순히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공포와 폭력이 발생하는 순간의 고통 그리고 폭력이 발생한 후의 죄의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그 진폭을 효과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양식화된 내러티브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따라서 영화 속의 색이 자연의 완벽한 재생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의 형상화와 내러티브의 전달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삽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리고 ‘높은 예술적 차원’의 칼라영화와 마치 염색된 흑백영화처럼 보이는 영화들 사이에는 영화 미학적으로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를 필름 블랑크라는 새로운 영화 미학적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함은 분명 가치 있는 시도일 것이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한글키워드</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박찬욱,박쥐,토마스 엘제서,필름 블랭크,필름 블랑크,색채 미학,미장센,필름 누아르,베로니카 포스의 갈망</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3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영문키워드</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 overflow-wrap: break-word;">Park Chan Wook,Film blanc,Film blank,Color-aesthetic,Die Sehnsucht der Veronik Voss,Rainer Werner Fassbinder,Thomas Elsaesser,mise-en-scene,Film noir,Thirst</li></ul></div><div class="resultRepor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2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text-align: justify;"><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30px 0px 17px; padding: 3px 3px 8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text-align: justify; clear: both;"><img class="paragraphIcon"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lef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title_011.gif">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digestKor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국문</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digestKor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는 주연 배우의 성기노출 논란과 같은 자극적인 이슈에서부터 뱀파이어라는 서구적 소재에 한국적 문화와 정서를 가미한 소위 &#65311;한국형 장르영화&#65311;의 탄생을 외치는 목소리까지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영화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65311;나의 종교적 성장환경이나 개인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65311;는 박찬욱 감독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다른 어느 영화보다도 자기 반영적인 작품이다. 하지만 신부라는 것은 일종의 직업일 뿐이며, 뱀파이어가 되었다는 것도 일종의 질병으로 이해해달라며 자신을 변호하던 상현의 대사는 마치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 그리고 감독도 단지 직업일 뿐, 영화의 종교적 과다해석은 삼가달라는 감독의 부탁으로도 들린다. 따라서 &lt;박쥐&gt;는 장르 영화에 대한 대중적 기대치와 감독의 작가주의적 열망 사이에서, 그리고 진지한 감정이입과 냉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일종의 불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내제되어 있는 가치구조의 모순을 비판과 저항의 담론으로 이끌고 있는 &lt;박쥐&gt;는 이렇게 장르 관습의 수용과 작가적 필체의 고수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찬반양론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digestEng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영문</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digestEng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This study's aim is to analyse &lt;Thirst&gt; (2009) by Chan Wook Park, who has drawed worldwide attention with the film &lt;Oldboy&gt; (2003). The previous studies on Park's works are focused on theme-analyse, so good and evil, desire and celibacy, and guilty conscience.<br><br style="box-sizing: border-box;">But the film forms, namely filmic apparatuses, that make this themes on his works apparent, have been neglected by the film studies. In other words, there is no attempt to analyse concrete images and frames or mise-en-sc&#65311;ne, that realize those characteristic themes by Park. The theme-biased study on Park's works ist not an exception for &lt;Thirst&gt;, a story of 'vampire of violent passions', that portrays the equal question on original sin and rescue of human.<br><br style="box-sizing: border-box;">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pproach Park's film from the perspective of style and visual analyse. The keyword is here 'film blanc', that Thomas Elsaesser suggested as an extension of the term 'film noir'. Because &lt;Thirst&gt; performs the specific theme of acute conflict between releasing of desire and self-repressing with the surrealistic white (also 'blanc') images and mise-en-scene.<br><br style="box-sizing: border-box;">So, this work tries to develop the concept of 'film blanc' and to apply it to analysing the form by &lt;Thirst&gt;. This will offer proof, that the term 'film blanc' is effective to represent the theme of film, thus corruption of human being and absence of soul.</div></li></ul><div class="title"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30px 0px 17px; padding: 3px 3px 8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text-align: justify; clear: both;"><img class="paragraphIcon"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lef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title_011.gif">연구결과보고서</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summ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초록</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summ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Ⅰ. 연구 목적 및 방법<br><br style="box-sizing: border-box;">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의 한 명인 박찬욱의 최근작 &lt;박쥐&gt; (Thirst, 2009)의 영화미학, 특히 미장센과 색채 미학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키워드로서 본 연구는 ‘필름 누아르 (Film noir)’의 대안적 개념인 ‘필름 블랑크 (Film blanc)’를 제시하고자 한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 분석의 매개체: ‘필름 블랑크 (Film blanc)’<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필름 블랑크’ - 개념의 이해<br><br style="box-sizing: border-box;">필름 블랑크는 토마스 엘제서 (Thomas Elsaesser)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Rainer Werner Fassbinder)의 흑백영화 &lt;베로니카 포스의 갈망&gt; (Die Sehnsucht der Veronika Voss, 1982)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이 영화 속의 지나치게 밝은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영화와 큰 대조를 이루며 현실의 이중성 또는 복합성에 고통 받는 여주인공을 망각의 세계로 밀쳐내고 있는데, 이는 마치 그림자가 없는 인간에게는 삶 그 자체도 없으며 따라서 영혼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이렇게 영화에서 색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극단적인 ‘하양’으로 강조된 정신병원의 공간은 결국 인간성의 상실과 타락, 그리고 (성적) 도착과 그로 인한 죄의식의 형상화를 위한 실험실로 기능하고 있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필름 블랑크’와 영화 &lt;박쥐&gt;<br><br style="box-sizing: border-box;">제 62회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lt;박쥐&gt;는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를 희생해야하는 가톨릭 신부가 - 본의 아니게 - 뱀파이어가 되어 다른 인간에 기생하게 되고, 친구의 아내까지도 탐한다는 역설적인 내용으로 뱀파이어 장르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영화이다. 특히 이 영화는 염세주의적 색채를 강조하는 로우키와 명암의 대조를 통해 박찬욱 감독이 이제껏 탐구해 왔던 원죄와 죄의식에 대한 고뇌, 그리고 존재적 불확실성과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필름 느와르적 스타일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lt;박쥐&gt;는 ‘검은 영화’라는 의미의 필름 누아르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하얀 영화’, 즉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새하얀 병실의 벽 위로 나부끼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문이 열리면 신부 상현이 들어온다. 사면이 하얗게 칠해진 병실 창문을 통해 매우 밝지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빛이 들어오는데, 이 창백한 공간은 상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환유라 할 수 있다. 세상은 곧 병실이며, 그 누구라 한들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상현은 뱀파이어가 된 후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창을 봉하고 내부 공간을 온통 하얀 페인트로 칠해버리는데, 이렇게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 듯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신부임을 망각하고 다른 인간들을 살해하며, 결국 친구의 부인인 태주와 함께 피의 향연을 펼친다. 여기서 극단적인 하얀색이 지배하는 공간과 하이키 조명을 통한 미장센은 폭력성과 성적 욕망 및 쾌락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엄청난 빛을 발산하지만 따스함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시퀀스는 동시에 인간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죄의식에서 분출되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영화를 냉혹하게 광기어린 자기소멸의 장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공간들이 &lt;박쥐&gt;를 필름 누아르가 아닌, 바로 ‘필름 블랑크’로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필름 블랑크’를 넘어 ‘필름 블랭크 (Film blank)’<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또한 이 시퀀스에서 바로 영화 자체는 일종의 망각의 매체가 되는 듯한데, 뱀파이어 커플은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삶을 피해 빛의 저편으로 몸을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퀀스는 필름 블랑크뿐만이 아닌, 망각의 영화 속의 여백의 공간, 즉 ‘필름 블랭크 (Film blank)’를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완전한 백색은 기억의 상실과 더불어 영혼의 상실과 자기 소멸,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사심과 원죄로부터의 자기 정화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9642; 영화적 장치 (Filmic apparatus)로서의 ‘필름 블랑크’<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lt;박쥐&gt;는 장르 영화에 대한 대중적 기대치와 감독들의 작가주의적 열망 사이에서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찬반양론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장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메소드로서, 즉 영화적 장치 (Filmic apparatus)로서의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을 통해 박찬욱의 &lt;박쥐&gt;의 미장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img id="resultAdvantage_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10px 2px 0px; font: inherit; float: right; cursor: pointer; display: block;"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btn_tight.gif" border="0">연구결과 및 활용방안</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div id="resultAdvantage_long"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display: block;">본 연구 ‘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를 통한 일차적 기대효과는 ‘2. 선행연구 사례와 분석’에서 지적한 바 있는 박찬욱 연구의 단면성에 균형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폭력성’이나 ‘복수’ 그리고 ‘욕망’이라는 영화의 주제적 분석에 치중되어있는 박찬욱의 연구는 영상 스타일의 측면과 영화 미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한 학문적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 &lt;박쥐&gt;에 관한 본 연구는 소격현상을 일으키는 영화 미학적 장치로서의 미장센 ‘필름 블랑크’라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대표적 영화감독인 박찬욱을 작가론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장센과 색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구의 결과물은 또한 박찬욱이 추구하는 다른 미학적 장치들, 즉 ‘카메라’, ‘편집’ 그리고 ‘사운드&amp;음악’ 등등에 관한 독창적이고도 창의적인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리라 믿는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 한국형 장르영화연구의 다양화 - ‘예술과 키치 사이’<br><br style="box-sizing: border-box;">&lt;박쥐&gt;는 주연 배우의 성기노출 논란과 같은 자극적인 이슈에서부터 뱀파이어라는 서구적 소재에 한국적 문화와 정서를 가미한 소위 ‘한국형 장르영화’의 탄생을 외치는 목소리까지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영화이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스스로를 "상업영화 감독"으로 인지하고, "무조건 상업영화"를 찍으며, "‘박쥐’는 특히 더욱 그랬다"고 (조현우 기자와의 인터뷰,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lt;박쥐&gt;는 영화사적으로 자주 장르영화의 소재가 되어왔던 뱀파이어-모티브를 통해 철저히 ‘상업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키치 (Kitsch)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영화는 제목이 ‘뱀파이어’가 아닌 ‘박쥐’이듯 - 그리고 영어제목 역시 ‘Vampire가 아닌 ‘갈망 (Thirst)’이듯 -, (인간으로서의) 과거에 대한 갈망과 (뱀파이어로서의) 현재의 증오라는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서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일 수도 있다. 따라서 &lt;박쥐&gt;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형 장르영화의 현 위치를 ‘예술과 키치사이에서의 외줄타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위한 키워드로서 ‘미장센 - 필름 블랑크’를 제시함으로서 한국 영화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br><br style="box-sizing: border-box;">■ 현대 영화이론적 개념의 확장<br><br style="box-sizing: border-box;">본 연구는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에 관한 분석이지만, 이를 위한 핵심 매개체로서 ‘필름 블랑크’라는 - 그리고 ‘필름 블랭크’라는 -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영화이론의 확장이라는 측면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비록 ‘필름 블랑크’라는 개념을 유럽의 한 영화학자가 독일영화를 분석하면서 언급하였지만, 이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영화분석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시켜 그 학술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시도와 이 작업을 한국의 대표적 감독 박찬욱을 대상으로 실행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필름 누아르’의 파생개념으로 ‘홍콩 누아르 (Hongkong noir)’가 탄생되어 영화산업의 시대적 현상을 누렸듯이, 한국에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시도되는 ‘필름 블랑크’에 관한 연구가 현대 영화이론에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div></li></ul><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0px 5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10px 0px 25px; padding: 3px 0px 15px 3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 background-image: url("/krmts/img/common/002.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0px 28px;'>색인어</li><li class="kfo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10px; padding: 3px 3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75, 75, 75);">film blanc, Thirst, Chan Wook Park, film noir, film apparatus, Thomas Elsaesser</li></ul></div><div class="classif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10px 0px 0px; padding: 10px 0px 5px 10px; 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initial;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rgb(226, 226, 226);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initial;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li class="kfo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5px 0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li><li class="kfo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5px 0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span class="kfont11Black"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5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black;">1순위 :<span>&nbsp;</span></span><a title="예술체육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00000">예술체육</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0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115,942)</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90000">영화</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3,106)</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일반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90100">영화일반</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02"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1,031)</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이론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90101">영화이론</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0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589)</span></li><li class="kfo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5px 0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span class="kfont11Black"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5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black;">2순위 :<span>&nbsp;</span></span><a title="예술체육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00000">예술체육</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1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115,942)</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90000">영화</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3,106)</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일반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90100">영화일반</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12"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1,031)</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비평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90103">영화비평</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1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108)</span></li><li class="kfont1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5px 0px 1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115, 115, 115);"><span class="kfont11Black"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5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black;">3순위 :<span>&nbsp;</span></span><a title="예술체육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00000">예술체육</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2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115,942)</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예술일반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10000">예술일반</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2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7,222)</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예술비평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10400">예술비평</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22"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332)</span><span>&nbsp;</span><span class="separato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 inherit; color: black;">&gt;</span><span>&nbsp;</span><a title="영화비평 분야 연구과제 및 논문, 연구업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href="https://www.krm.or.kr/krmts/search/classify.html?category=G010405">영화비평</a><span>&nbsp;</span><span class="dtClassifyCount" id="classifyCount23"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0px 0px 2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59)</span></li></ul></div></div><u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li class="titleOutcomeLis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30px 0px 0px; padding: 9px 10px 0px; vertical-align: middle; list-style: none; border: 0px; font: inherit; height: 30px; background-color: rgb(126, 191, 236);"><span class="kfont20"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1px;"><img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5px; font: inherit;"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034.gif"><span>&nbsp;</span>연구성과물 목록</span></li></ul><div id="innerHtml"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div class="innerExpList"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5px; border-width: 2px 0px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rgb(126, 191, 236);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126, 191, 236);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12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10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10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8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div title="SD Data" class="birdyellow"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1. 논문</div></td></tr></tbody></table></td><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10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2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img title="KCI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class="birdyellow"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alt="KCI등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icon_kci_reg.png"><span>&nbsp;</span><a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href="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ServHistIFrame.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58819&amp;sereArticleSearchBean.orteFileId=KCI_FI00155881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title="KCI 원문 PDF를 다운로드합니다." class="birdyellow"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alt="KCI 원문 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bt%2F014.gif"></a></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height: 30px;"><a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3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a></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배상준 | 한국영화학회 | 영화연구 | (48호) | pp.241~275 | 2011-06-01 | 영화<br style="box-sizing: border-box;">피인용횟수 : 5<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4"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75, 75, 75); width: 600px;">출처연구과제 : 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7"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height="1" background="https://www.krm.or.kr/include/bird/ko/images/krmts/common/002.gif"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12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10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10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8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1"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bold;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 color: rgb(19, 19, 19);"><div title="SD Data" class="birdyellow"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2. 보고서</div></td></tr></tbody></table></td><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valign="top"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width="10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img title="지원연구 결과물입니다" class="birdyellow"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alt="연구결과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krm.or.kr%2Finclude%2Fbird%2Fko%2Fimages%2Fkrmts%2Fcommon%2Ficon_nrf_final.png"></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 height: 30px;"><a class="kfont06"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outline: none; margin: 0px; padding: 3px 0px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Gulim;">(결과보고)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a></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width="600"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3px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Verdana; color: rgb(68, 68, 68);"><table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text-align: lef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4"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75, 75, 75);">배상준 | 2011-09-30 | 영화이론</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4"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color: rgb(75, 75, 75); width: 600px;">출처연구과제 : 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lt;박쥐&gt; (2009)</td></tr></tbody></table></td></tr><t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td class="kfont07" style="box-sizing: border-box; padding: 0px; margin: 0p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1px;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color: rgb(255, 102, 0);">PDF(1)</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p><br><br></p>
<!-- -->
카페 게시글
영화 극예술 사진 건축
[연구] 필름 누아르? 필름 블랑크! - 박찬욱 감독의 <박쥐> (2009)
Nella
추천 0
조회 93
20.03.01 23:1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