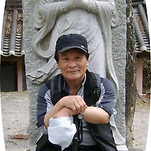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숭의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崇義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4pt;"> </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옐로우 하우스</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nbsp; </span><!--[if !supportEmptyParas]--><!--[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숭의동은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多所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속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천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川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불리던 곳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1871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나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부읍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府邑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보면 다소면 관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의 동네 가운데 장천리가 나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89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나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부읍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는 다소면 관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 동네 가운데 역시 장천리가 들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다란 개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뜻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을 한자 이름인 장천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말 이름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불렀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지금은 모두 매립과 복개가 되고 건물들이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92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바닷가에 맞닿아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네 앞으로 갯벌이 넓게 펴져 있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동네 가운데로 기다란 개천이 하나 흘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개천이 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 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꾸불꾸불 흐르는 모양이 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뱀 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양과 같아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는 그렇다 해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뱀처럼 흐르는 모양이 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불리게 됐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론 같은 말에서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서로 전혀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은 땅 이름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 만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蛇</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모양을 바꾼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하지만 일반적으로 뱀 모양으로 흐르는 물과 관련해 붙는 땅 이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뱀 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한자로 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蛇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泗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巳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뱀과는 전혀 다른 뜻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를테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옛시조에서 보듯 논이나 밭의 이랑을 뜻하는 순 우리말일 수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또 앞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뜻이 아니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잔가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단어에 쓰이는 것처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늘고 작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뜻을 가진 접두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발음이 바뀐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잔사래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뜻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작은 논밭들이 있는 동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동네 에서 오래 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까지도 지금의 숭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 행 정복지센텨 일대를 비롯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주변까지가 온통 밭이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사이로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더욱이 큰 밭은 없이 모두 조그만 밭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고 하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잔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장천리는 그 뒤 여의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如意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천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각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獨脚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 동네로 나누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1910</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나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지지자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仁川地誌資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보면 이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 동네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如意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川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獨脚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우리말 이름이 함께 표시돼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사람들이 각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평소에 부르는 이름을 한자로 바꿔 쓴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如意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川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獨脚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것을 뜻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따라서 이들 동네의 진짜 이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이 마을에 있던 한 절에서 소원을 빌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意</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너무 막연하고 억지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지금 미추홀구청 일대는 옛날 이 여의실에 들어가는 땅이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곳은 조선의 개국공신 인 경주 김 씨 계림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鷄林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金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34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537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398)</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임금으로부더 하사받은 땅이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이곳에서 살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제 강점기 때까지도 그 집안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현재 미추홀구청이 있는 자리에는 그 이전에 인천교육대학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학교는 원래 한국전쟁 때 이북에서 피란을 온 개성사범학교가 그 전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前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이 학교가 인천으로 와 학교를 지을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을 때 학교 지을 터로 이곳 땅을 내준 것도 바로 이 집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래서 미추홀구청 앞 꽃밭에는 이런 사실과 함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실 경주 김 씨 종가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쓴 표지석이 서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이들 집안의 이야기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의 유래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보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의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는 점으로 미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야트막한 언덕 마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도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동네에 자그마한 언덕들이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는 남동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림동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무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 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이 남긴 인터뷰 자료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은 그 중 한 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1948</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도에 승의동 장사래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때 동네는 전부 다 농토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높은 산은 별로 없었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큰 왕릉 크기의 비슷한 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그만 산들이지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재 남구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추홀구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문 자리에 그런 게 있었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릉이자 무덤 같은 산이에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게 조그만 산이었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근데 거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때 탱크들도 와서 숨어있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탱크 지나간 다음에 미군이 야포부대를 만들었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사범학교를 지으니까 그게 싹 나가버렸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를 보면 동네에 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기보다는 야트막한 언덕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이를 한자로 바꿀 때 대략 비슷한 발음에 뜻도 좋은 글자들을 따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如意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 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trong>독갑다리</strong></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각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지금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지명에 남아있는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숭의동 교차로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평양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화순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음식점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지 역 일대를 말하는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각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도 부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은 한때 속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니나노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했던 술집들이 여러 곳 모여 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동네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지금은 이들 니나노집이 있던 곳 대부분에 각종 공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工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파는 상가 등이 들어서 이전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또 비가 조금 많이 내리기라도 하면 물이 넘쳐서 주변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 놓은 개천도 있었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이 개천도 모두 복개돼 옛일을 떠올리기 어렵게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첫째는 우리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쪽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곧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 널조각 하나로 걸쳐놓은 외나무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어 외나무다리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獨脚</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동네 이름이 됐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둘째는 옛날 이곳이 바다에 닿아있다 보니 물건을 사고팔기가 쉬워 옹기장수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서 독을 사고 팔 때 주고받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와 달리 장독과 같은 독에 흙을 채운 뒤 이를 다리기둥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설명도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동네 주변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깨비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리던 산이 있었기 때문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깨비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까비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불리던 다리 이름이 바뀌어 독갑다리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이곳에 대한 이전의 기록을 보면 이 중 어느 것이 맞는다고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한 예로 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상봉 전 인천일보 고문이 남긴 기억은 이렇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가 어릴 적에 보면 숭의공설운동장 앞에 전부가 백사장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기가 전부 모래판이었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가 어렸을 적에 그 모래판에 항아리장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장수들이 많았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옛날에 숭의운동장 앞에서 승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 앞에도 물이 많아서 미나리광이 있었거든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니까 물이 독갑다리 쪽으로 내를 이루고 모래바닥 사이로 흘렀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는 거기를 건너다니기 위해 냇가 그 사이에 전부 다리를 놓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 기억으로는 그때 관뚜껑으로 많이 다리를 놨어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랬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독장수들이 많았다는 데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독갑이 그러니까 독 깨진 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항아리독 깨진 것들을 전부 밟고 다니게 그렇게 놨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독갑다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 촌로도 계셨는데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내용을 보면 이곳에 다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도 여러 개의 다리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그 다리를 대부분 관뚜껑으로 놓았다고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들이 장례식 때 쓰는 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뚜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덮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로 놓았다고 했으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들은 주로 널빤지 비슷한 나무였을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리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깨진 독으로 다리를 놓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것은 그 당시의 다른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이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신이 직접 보았다거나 그때 그랬다는 말은 아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렇게 보면 칫 번째 해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곧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 널조각 하나로 걸쳐놓은 외나무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말이 맞는 것도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외나무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개의 통나무로 놓은 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통나무가 아니어도 나무다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 단어를 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 이곳에는 관뚜껑으로 만든 다리가 여러 개 있었다고 했으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외나무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nbsp; 이래저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이름 유래는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런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앞에서 말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깨비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까비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이라는 주장이 재미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예전에 이곳은 시의 외곽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태범 박사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천 한 세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적어놓은 다음 구절을 보면 짐작이 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설운동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의 인친축구전용경기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 소방서가 있는 언덕에는 화장장과 전염병자 격 리병원인 덕생원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언덕 아래를 흐르고 있던 개천에 다리가 있었는지 이 근방을 독갑다리라고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는 서울의 수구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水口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구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밖 같은 음산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여기 보면 덕생원과 화장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火葬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야기가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덕생원은 전염병자들을 격리시켜 따로 수용하고 치료하던 병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흔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피병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避病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렸던 곳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래는 중구에 있다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2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이곳으로 옮겨 왔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건물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25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쟁 때 폭격으르 없어졌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곳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병원이나 화장터가 요즘과는 달라서 예전에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다 보니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텨에 묻혀 있던 뻣조각들이 드러나면서 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燐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내비치기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들은 이 빛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깨비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장터가 있는 언덕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깨비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이 도깨비산 쪽에 있는 다리라고 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깨비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까비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이 붙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말이 바뀌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갑다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됐다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쨌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사래말이나 독각리는 모두가 이곳에 다리를 놓아야 건널만한 개천이 흐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여의리와 장천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각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4</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에 새로 생긴 부천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富川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편입되며 한데 합쳐져 장의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長意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장천리와 여의리에서 한 글자씩 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장의리가 광복 뒤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6</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그간의 이름과는 관계없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숭의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숭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일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日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부티 벗어난 광복을 경축하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옛 신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神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숭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崇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 뜻을 이루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말뜻은 좋은지 모르나 곁국 이전의 역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trong>옐로우 하우스</strong></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strong></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한편 숭의동에는 인천의 대표적 사창가로 알려졌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옐로우하우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9</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까지도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일제 강점 기 때부터 중구 선화동 일대에서 기생들이 운영했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遊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옮겨와 생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196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들어선 군사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이들 유곽을 시내인 선화동에서 시 외곽이었던 숭의동으로 강제 이주시켰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들이 새로 건물을 짓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창가가 자리를 잡게 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bsp;&nbsp;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옐로우 하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은 이곳에 새로 지은 영업집들이 모두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전해 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nbsp;</span><!--[endif]--><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첫째는 당시 인천의 각 행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법 기관장들이 회의를 열고 사창가인 이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 짓기 위해 건물을 모두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째는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근처 미군부대에서 나무와 페인트 등을 많이 얻어 썼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때 미군부대에서 많이 갖고 있던 노란색 페인트를 주로 얻어 썼기 때문에 노란색 건물이 많아져 생긴 이름이라는 얘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이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건물이 대부분 노란색이 된 결과는 똑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그 뒤 이곳의 노란색 판잣집들이 지역의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든다며 구청이 붉은색 벽돌로 건물을 새로 짓게 함에 따라 노란색 집들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nbsp; 그래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옐로우하우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은 여전히 살아남아 지금도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br></p>
<!-- -->
카페 게시글
미추홀
[미추홀구편] 숭의동
천심
추천 0
조회 87
20.08.10 19:3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