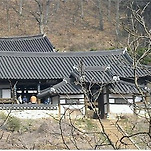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公遺墟久爲他人所有而去丙戌冬子孫還推將欲立碑故余將行鰲村門下以請碑文而&#30055;記其大致碑文在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我十三代祖考參議公以勝國之華閥聖朝之名家世居完山爲完山之著望而高麗平章事完山君諡文成諱阿卽公之曾祖考也公生於至正丙戌甫九歲孤而好學十七壬寅中司馬試仕內侍拜參官三十一洪武丁巳中文科不勝將母之念退于桑鄕極修孝道喜遯自樂不求宦達者二十年也我太祖大王五年丙子爲賢相所薦以奉常少卿應命供職於三年戊寅拜中訓知珍州事庚辰解組還鄕日以花木詩句爲事而優遊自適太宗朝丙申蒙聖上優老之恩拜檢校戶曹參議集賢殿提學時年七十一也氣力康强志保豪邁當龍興之世有鴻漸之儀立朝以義居家以禮與權陽村崔晩六諸先生爲文章道義之交年老退休&#38947;養林泉杖&#23656;所及鄕黨諄諄德度所垂子姓振振府城南鉢山陽梧臺之東有玉流洞爲卽公之棲息之址也左右圖書上下泉石居然爲自家八十九年遊賞之物而至今塗人耳目者也今去公四百有餘年石面之筆蹟迹池上之手&#28018;宛然如昨其曰醉裏乾坤閒中日月卽康節之志趣也其曰光風霽月亦周濂溪之氣像也其曰鳶飛魚躍盖有得於活潑潑之工夫而其他百華潭迎月臺樂水也水風也&#31799;烟也仙洞也者何莫非格物寓興之意東構寒碧之亭淸風如古中刻參議之井活字維新月塘上題詠家庭間諷功之詩合爲遺事一帙行于世而累經兵&#29177;雖未得其全播在於鄭坤之撰序及金宗瑞李安平鄭麟趾諸公之讚詩可見其大&#27113;矣於乎平泉之花石固知李承相之遺庄而輞川之風月乃昱王學士之別業則惟此玉流洞卽我先祖之遺墟也年代旣遠雲仍流寓神鬼守護址基尙存則非徒行路之指點而咨嗟其在子孫之追感而永慕果樹愛惜之歎桑梓敬止之心&#20504;如何哉此不肖之所以撫古傷今而眷眷於遺墟者也&#30413;我諸宗請得長者之文大人之筆表揚先祖之遺蹟而爲永世不忘之地豈非盛德事也耶於是乎悉次家狀以識之</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家狀不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后孫觀錫謹書</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께서 사시던 옛 터가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 간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지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82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순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6)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겨울에 자손들이 땅을 되찾아 비석을 세우기로 하였기로 내가 오촌 송치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선생 문하에 찾아가서 비문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여 받아 온 비문이 위에 수록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대 할아버지 참의공은 고려시대 유명한 문벌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의 명가 출신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대대로 전주에서 살아오면서 명망 높은 가문으로 만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고려 평장사 완산군 문성공 휘 아는 바로 공의 증조할아버지이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4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충목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태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가 되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6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공민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사마시에 급제하시어 내시부 참관으로 벼슬에 나가시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3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가 되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7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우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극진한 효도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은퇴한 선비로서 삶을 스스로 즐기시며 높은 벼슬에 올라 출세하려고 하지 않은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에 이르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우리 태조대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병자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9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어진 재상의 추천으로 봉상시 소경으로 벼슬에 나가 왕명을 받들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간 직무를 수행하시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98</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태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중훈대부 지진주사가 되시었으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0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날마다 꽃과 나무를 가꾸고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짓는 것을 일삼으며 우유자적하시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41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태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임금님으로부터 노인을 우대하는 은혜를 입어 검교 호조 참의 집현전 제학이 되시었는데 그 때 공의 나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7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 이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기력은 강건하셨고 호탕하고 뛰어난 인품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뜻을 굳건히 지켰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처럼 당당하게 일어났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상에는 차차 벼슬이 높아져 가는 질서가 있는 것이므로 조정에 나가서는 의리를 지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집에서는 예의를 지키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양촌 권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만육 최양 등 여러 선생들과 함께 문장과 도의로서 사귀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나이 들어 은퇴하여 자연 속에 숨어서 자신을 수양하며 머물렀던 자취를 남기셨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마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德</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 후대로 내려가 자손이 크게 떨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전주부 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남쪽 발산 아래 양지바른 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오목대 동쪽에 옥류동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공이 살았던 터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주변에 그림과 글씨가 있고 위 아래로 돌로 된 우물이 있는데 터를 잡아 살아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9</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동안 노닐면서 구경하신 물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지금 공이 떠나신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여년이 지났지만 바위에 새겨진 필적과 연못 위에 남은 자취가 어제 같이 완연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곳에 적혀 있기를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온 세상이 취해 있는 한가한 세월</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醉裏乾坤閒中日月</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고 하였으니 강철과 같은 의지와 취향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곳에 적혀 있기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광풍제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했으니 역시 주돈이와 같은 기상을 느낄 수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곳에 적혀 있기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비어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했으니 공부를 비롯한 모든 것이 얼마나 활발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백화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百華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적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영월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迎月臺</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 적혀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요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樂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라 적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수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水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적혀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첨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31799;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적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선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仙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적힌 것 등을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어찌 사물의 이치에 따르지 아니하고서야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서 우러나는 감흥을 깨달아 동쪽에 한벽당을 짖고 옛 성현들처럼 청풍을 즐기시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참의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 새기시어 살아 있는 글자로서 새롭게 하시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달빛 비치는 연못 위에서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읊었겠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일상생활 속에서 모습을 그린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모아 한 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유사</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로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안 겪은 여러 번의 전쟁으로 불타버려 그 모두를 찾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정곤이 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제공찬시병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와 김종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안평대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인지 등 여러 사람이 지은 찬시를 통하여 그 대강을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오호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평천의 화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 승상 이덕유의 별장으로 알려져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망천의 풍월은 학사 왕유의 별장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생각해 보면 이곳 옥류동은 바로 우리 선조님의 유허이지만 연대 또한 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멀리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버린 것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다행스럽게도 귀신이 지켜주어 비록 터가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더욱이 큰 길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 여겨 탄식하는 것이 자손으로서 할 수 있는 추모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영모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애석하게 한탄하며 선조들의 자취가 남은 곳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가지는 수밖에 없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렇게 불초한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옛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간직하지 않을 수 없는 유허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우리 여러 일가들은 장자로부터 글을 얻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대인의 글씨를 빌어 선조님의 유적을 높이 드러내어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덕을 쌓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러하므로 이 모든 것을 또한 가장으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만 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가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후손 관석 삼가 지음</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인물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관석</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觀錫</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782~186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중랑장공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부안종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처암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계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 근와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謹窩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 명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明原</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송치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宋穉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제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둔암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遯菴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형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권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權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52~1409)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안동권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초명 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 가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可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사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思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양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陽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소오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小烏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친명정책을 주장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 개국 후 사병 폐지를 주장하여 왕권확립에 공을 세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길창부원군에 봉해졌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대사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자좌빈객 등을 역임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장에 뛰어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경학에 밝아 사서오경의 구결을 정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 형제의 스승으로 전해 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종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金宗瑞</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83~145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순천김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 국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國卿</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절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節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0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 연촌공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진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수양대군에 의해 집에서 맞아 죽고 대역모반죄라는 누명을 쓰고 계유정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송치규</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宋穉圭</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759~1838)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진송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 기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奇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강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剛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형조판서를 지내고 노직으로 자헌대부가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당대의 거유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안평대군</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安平大君</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18~145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종의 셋째아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함경도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황보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종서 등과 함께 수양대군 세력과 맞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계유정난 후 강화도로 유배 되었다가 교동으로 옮겨진 후 사사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글과 글씨가 유명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왕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王維</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699?~759)</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중국 당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시인이자 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에 뛰어나 시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詩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라고 불리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수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水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산수화에도 뛰어나 남종문인화의 창시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덕유</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李德裕</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787~849)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중국 당나라의 재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필에 뛰어나 한림학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중서사인 등을 지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鄭坤</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동래정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복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復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김제 출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李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하에서 배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전주 교수관으로 생원 한성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향시의 법을 행하도록 건의하여 채택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성균관 대사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지제교를 지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은퇴 후 김제의 시골집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정인지</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鄭麟趾</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96~1478)</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하동정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 백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伯雎</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학역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學易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 초기 대표적 유학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종 대에는 문화 발전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단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성종 대에는 정치 안정에 기여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양</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崔瀁</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351~1424)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문충공계 전주최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자 백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伯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호 만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晩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장육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藏六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시호 충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忠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외삼촌 정몽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鄭夢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게 배워 이부 상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대제학 등을 지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이성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李成桂</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도와 서북면 정벌에 참여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전주 대승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大勝洞</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봉강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鳳崗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에 은거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태조가 친구로 대우하여 여러 차례에 관직과 논밭을 하사하였으나 받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저서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만육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각주</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저자의 스승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참의공유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를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월당공의 문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1437</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세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9)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연촌공이 만드신 것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平泉之花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평천은 당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때 이름난 재상 이덕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李德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의 별장 이름인데 여기서는 화석과 더불어서 건물 주위의 경관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보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원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l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전주최씨가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g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을 기록하면서 추가한 주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br></p>
<!-- -->
카페 게시글
월당집
4. 참의공유적(參議公遺蹟){전주최씨가장}
여수
추천 0
조회 99
19.02.08 06:2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