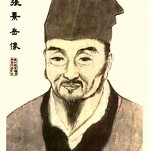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03. 치(治)를 논(論)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요통</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腰痛</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의&#160;<span style="color: #f200f2;">허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80~90%</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 단지 살펴서,&#160;<span style="color: #0000ff;">표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表邪</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없고 또 습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濕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없으면서</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나이로 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노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勞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였거나 주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酒色</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으로 착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26034;喪</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깎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였거나 칠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七情</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우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憂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로 되었으면 모두 진짜&#160;<span style="color: #f200f2;">음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에 속(屬)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허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후(候)는&#160;<span style="color: #0000ff;">형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形色</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반드시 청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淸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혹 여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黎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보이고</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맥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息</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반드시 화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和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혹 세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細微</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보이며</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행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行立</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부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支</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와식</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臥息</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 조금 나아지고</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피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疲倦</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무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無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노동</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勞動</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 더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게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ff;">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積</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점차 이른 것</span>이면 모두&#160;<span style="color: #f200f2;">부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足</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고,&#160;<span style="color: #0000ff;">갑자기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 경우는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유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有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품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稟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내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는 모두&#160;<span style="color: #f200f2;">부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足</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고&#160;<span style="color: #f200f2;">사실</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邪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외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外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면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유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有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치료(治)하는 자는 당연히 그 원인(因)을 변별(辨)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신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腎水</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진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眞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휴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虧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고 정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精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쇠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통(痛)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당귀지황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當歸地黃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좌귀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左歸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우귀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右歸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이 가장 좋으니라(: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病</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다소 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거나 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지 않거나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지 않으면</span>&#160;<span style="color: #00cc00;">청아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靑娥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외신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29032;腎散</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보수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補髓丹</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지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二至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통기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通氣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하여야 하니,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span data-ke-size="size18">一. 요통(腰痛)의&#160;<span style="color: #f200f2;">표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表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풍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風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나 습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滯</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사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邪</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태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太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나 소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少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經</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경우가 모두 그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풍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風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經</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있으면 그 증(證)은 반드시&#160;<span style="color: #0000ff;">한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寒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있고 그 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반드시 긴삭</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緊數</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나타나며</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반드시 빨리 오고</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그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은 반드시 구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拘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30176;</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겸하면서 대부분 척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脊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와 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 이는 당연히 그 음양(陰陽)을 변별(辨)하여야 하고 그 치료(治)는&#160;<span style="color: #00cc00;">해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解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양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160;<span style="color: #0000ff;">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많으면</span>&#160;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일시호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一柴胡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정시호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正柴胡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음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으로&#160;<span style="color: #0000ff;">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寒</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많으면</span>&#160;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이시호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二柴胡飮</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오적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五積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미진(未盡)한 바는 당연히 상한({傷寒})의 문(門)에서 변별(辨)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습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滯</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經</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 있어 요통(腰痛)하는 경우,&#160;<span style="color: #0000ff;">우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雨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로 인하거나 습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濕衣</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로 인하거나 습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濕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좌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坐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므로&#160;</span>인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습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外</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서 들어가면 결국 모두&#160;<span style="color: #f200f2;">표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表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속(屬)이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불환금정기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不換金正氣散</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평위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平胃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면서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겸</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독활기생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獨活寄生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습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滯</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160;<span style="color: #0000ff;">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면서 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불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위령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胃&#33491;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오령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五&#33491;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창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蒼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풍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風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을 서로 겸하여&#160;<span style="color: #0000ff;">일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一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진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盡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강활승습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羌活勝濕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을 겸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당귀염통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當歸拈痛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창출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蒼朮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습</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을 겸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제생출부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濟生朮附湯</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오적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五積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f0000;">요통</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腰痛</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는&#160;<span style="color: #f200f2;">한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寒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이 있으니&#160;<span style="color: #f200f2;">한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寒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은 두 가지가 있고&#160;<span style="color: #f200f2;">열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熱證</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에도 두 가지가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외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外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을 치료(治)하려면 마땅히 앞과 같이&#160;<span style="color: #00cc00;">온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溫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고 혹&#160;<span style="color: #00cc00;">열물</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熱物</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써서 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29096;</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도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내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內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으로 양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여 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치료(治)는 마땅히 앞과 같이&#160;<span style="color: #00cc00;">온보</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溫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f0000;">열</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熱</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에는 두 가지 증(證)이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간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肝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음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로 수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水虧</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화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치료(治)는 당연히&#160;<span style="color: #00cc00;">자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滋陰</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강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降火</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자음팔미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滋陰八味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사물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物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황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栢</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지모</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知母</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황금</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芩</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치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梔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를 가한 속(屬)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사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邪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축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蓄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160;<span style="color: #f200f2;">요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腰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본래 허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없으면</span>&#160;반드시&#160;<span style="color: #0000ff;">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반드시 번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煩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며 혹 대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인음</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引飮</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거나 이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二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열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熱澁</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불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한다. 당연히 그&#160;<span style="color: #00cc00;">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火</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를 직공</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直攻</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160;<span style="color: #00cc00;">대분청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分淸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가감(加減)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질박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跌撲傷</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넘어지거나 맞아서 된 손상)으로&#160;<span style="color: #0000ff;">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이는&#160;<span style="color: #f200f2;">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근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筋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있고 혈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응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凝滯</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한 것이다.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사물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物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도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桃仁</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홍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紅花</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우슬</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牛膝</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육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肉桂</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현호색</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玄胡索</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유향</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乳香</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몰약</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沒藥</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가한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혈역</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逆</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서&#160;<span style="color: #0000ff;">대변</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大便</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폐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閉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불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원융사물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元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物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외용(:外)으로&#160;<span style="color: #00cc00;">주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酒糟</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술지게미</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33905;</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생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生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짓찧어(:搗爛) 덮어주면(:&#32616;) 그 효(效)가 더 속(速)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0000ff;">단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丹溪</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가 이르기를 &quot;모든 요통(腰痛)은 인삼(人蔘)을 써서 보기(補氣)하면 안 되니, 보기(補氣)하면 동(疼)은 더 심(甚)하게 된다. 또한 한량(寒凉)을 준(峻)하게 쓰면 안 되니, 한(寒)을 얻으면 폐알(閉&#36943;)하여 통(痛)이 심(甚)하게 된다.&quot; 하였는데, 이 말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노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허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으로 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부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足</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대부분&#160;<span style="color: #f200f2;">기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증(證)이 있으니, 어찌 인삼(人蔘)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또&#160;<span style="color: #f200f2;">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하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下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160;<span style="color: #0000ff;">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극</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고 참을</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忍</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수 없으면</span>&#160;신속(速)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청화</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淸火</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는데, 어찌 한량(寒凉)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인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단지&#160;<span style="color: #0000ff;">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한 중에 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實</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을 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挾</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면 인삼(人蔘)을 쓰면 마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록&#160;<span style="color: #0000ff;">유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有火</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도 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지 않으면&#160;</span>한량(寒凉)을 과(過)하게 쓰면 마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그렇다고 개괄적으로 쓸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맞겠는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내가 예전에 나이가 60이 넘은 어떤 동씨(:董氏) 노인(:翁)을 치료(治)하였다. 자품(資稟)이 평소 장(壯)하였고&#160;<span style="color: #f200f2;">화주</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火酒</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飮</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160;<span style="color: #f200f2;">습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濕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태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太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갑자기 병(病)으로&#160;<span style="color: #0000ff;">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여 참을 수 없었고</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스스로&#160;</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목숨을</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다하기를 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求</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할 정도</span>까지 이르렀으니 그 심(甚)함을 알 수 있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내가 진(診)하여 보니&#160;<span style="color: #0000ff;">육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六脈</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에 홍활</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洪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심</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였고 또 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도 불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不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방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膀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이 창급</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脹急</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하였다. 결국&#160;<span style="color: #00cc00;">대분청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大分淸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에 황백</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栢</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span style="color: #00cc00;">용담초</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龍膽草</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를 배(倍)로 가한 것을 일제(一劑)로 하여 복용케 하였더니,&#160;<span style="color: #0000ff;">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갑자기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였고</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소수</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小水</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가 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通</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하면서 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도 소실</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失</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만약 단계(丹溪)의 말대로 썼더라면 잘못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웠으니(:鮮) 그의 말을 고집(:執)하면 안 된다. (신안(新按)에도 나온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一.&#160;<span style="color: #f200f2;">부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婦人</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은 태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胎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와 경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經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로 음</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함이 심</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甚</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므로 특히&#160;<span style="color: #0000ff;">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痛</span><span style="color: #0000ff;">)&#160;</span><span style="color: #0000ff;">각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脚&#30176;</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의 병(病)이 많다.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당귀지황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當歸地黃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주(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