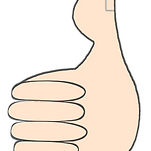<p><b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font-family:&quot;맑은 고딕&quot;;mso-ascii-theme-font: minor-latin;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bidi-font-family:&quot;Times New Roman&quot;;mso-bidi-theme-font:minor-bidi; mso-ansi-language:EN-US;mso-fareast-language:KO;mso-bidi-language:AR-SA"><span style="font-size: 24pt;">사단</span><span style="font-size: 24pt;">(</span><span style="font-size: 24pt;">四端&nbsp;</span></span></b><span style="font-size: 18pt; line-height: 107%; 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span><span style="font-size: 18pt; line-height: 107%; 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span><span style="font-size: 18pt; line-height: 107%; 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이성 理性</span><b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font-family:&quot;맑은 고딕&quot;;mso-ascii-theme-font: minor-latin;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latin; mso-bidi-font-family:&quot;Times New Roman&quot;;mso-bidi-theme-font:minor-bidi; mso-ansi-language:EN-US;mso-fareast-language:KO;mso-bidi-language:AR-SA"><span style="font-size: 24pt;">), 인간의 조건&nbsp;</span></span></b></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인</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仁</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無惻隱之心 非人也 무측은지심 비인야 </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nbsp;사람이 아니다</span></b></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의</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義</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無羞惡之心 非人也 무수오지심 비인야</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span></b></span><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b></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예</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禮</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無辭讓之心 非人也 무사양지심 비인야</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겸양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span></b></span><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b></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지</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智</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無是非之心 非人也 무시비지심 비인야</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span></b></span><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b></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07%; font-family: Verdana, sans-serif;">‘</span><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최고</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라고 침을 튀기며 맛있게
먹다가 뛰쳐 나가서 다른 집의 밥상을 받은 후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저 집 음식은 별로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고
한다면 </span><b style="mso-bidi-font-weight:normal"><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사단</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四端</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이성 理性</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을
잃은 자</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인 것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아니면 처음부터 없었거나</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DBE3A5E3B59D31E" class="txc-image" actualwidth="1024"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1024" exif="{}" data-filename="사단 四端.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DDBE3A5E3B59D31E5735"/></p><p style="text-align: center;"><br></p><p><br></p><p></p><p><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07%; font-family: Verdana, sans-serif;">4</span><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단</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四端</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말한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즉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지각에 의해 생기는 생각</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마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요건으로서의 마음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그러므로 </span><b style="mso-bidi-font-weight:normal"><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4</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단</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四端</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은 이성</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理性</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과 밀접하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b><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br></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blockquote class="tx-quote4"><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b><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 style="color: rgb(241, 95, 95);">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이성이 없는 자</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이성을 잃은 자를
사람이 아닌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말하는 짐승</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color: rgb(241, 95, 95);">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 style="color: rgb(241, 95, 95);">.</span> </span></span></b></span></p></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br></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성리학은 우주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고 성찰하는 철학이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성리학은 일반적으로 주자학</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朱子學</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이라고 하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주자</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朱子</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호</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이름 주희
朱熹</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1130</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년</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1200</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년 중국 남송시대</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본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주자학은 존재론</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存在論</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이기설 理氣說</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과
윤리학</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倫理學</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성즉리설 性卽理設</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과 방법론</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方法論</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격물규리설
格物窺理設</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거경설 居敬設</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로써 나타나 있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i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br></span></span></i></p><blockquote class="tx-quote5"><p><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8pt; line-height: 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성리학은 이</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理</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氣</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의 개념을 구사하면서
우주</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宇宙</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의 생성</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生成</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과 구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構造</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인간
심성</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心性</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의 구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姿勢</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한</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당의 훈고학이 다루지 못하였던 형이상학적</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形而上學的</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내성적</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內省的</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실천철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유학사상을 수립하였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 태극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太極說</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이기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理氣說</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심성론</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心性論</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성경론</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誠敬論</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으로 구별할 수 있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 </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출전:&nbsp;</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두산백과</span><span style=""><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2pt; color: rgb(76, 76, 76);">)</span></span></span></span><br></p></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주자학은 조선으로 와서
퇴계</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退溪</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이황</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退溪</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에 의해 정비된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퇴계는 주자의 이기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理氣設</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에서 나아가 이발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理發設</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을 개창하고 주자와는 다른 독자적 철학 체계를 확립한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nbsp;</span></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퇴계의 성리학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전파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근세 일본 유학의 개조로 불리는 후지와라 세이카</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藤原惺窩</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는 임진왜란의 포로였던 강항</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姜沆</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을 통해 주자학과 퇴계의 학문을 접하고 퇴계가 발문을 쓴</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연평문답</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延平問答</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을
높이 평가했으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막부</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幕府</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에서 벼슬을 앞두고 있던 제자 하야시 라잔</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林羅山</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에게도 적극 권해주었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 </span></span></p><br><p></p><p></p><p><span style="font-size:18.0pt;line-height:107%"><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대학에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퇴계학</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강좌를 개설하고 꾸준히</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그리고 깊이 성리학을 공부하며 전승하고 있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ans-serif; font-size: 14pt;">.</span> </span></span></p><br><p></p>
<!-- -->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_무수오지심비인야
바보
추천 0
조회 878
20.02.06 09:1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