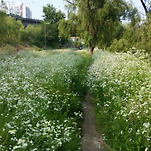<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nbsp;추억은 </span><span style="font-size: 12pt;">강물이 되어</span><br></strong></p><p class="cafe-editor-text"><span style="font-size: 12pt;">" 짝~짝~짝&nbsp;, &nbsp;짝~짝~짝 ,&nbsp; 짝~짝~짝~짝~짝~짝~짝 "&nbsp; " 나~아가라~&nbsp; 싸~아~워라, 대한의~도~옹 부~우~욱 " 성실한 꽃송이 피고 또 피여&nbsp; 세계에 날리세 길이 빛내세 "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을지로6가와 동대문 사이에 있는 서울운동장 축구장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소리입니다. 동북중고등학교 축구가 결승전을 치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응원을 갑니다.&nbsp;3 * 3 * 7&nbsp;박수를 손바닥 대신 나무 딱딱이로 대신합니다.&nbsp;딱딱이는 통행금지가 시행되던 시절에는 야경(夜警) 순찰자들이 따아딱 두드리며 다니던&nbsp;나무로&nbsp;만든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교가와 응원가는 목이 터져라 불러댑니다. 상대방의 학생들도 질새라 응원의 열기가 경기 못지 않게 불타오릅니다. HY공고와 JD고등학교가 결승에서 맞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북을 위시하여 HY공고와 JD고도 축구의 명문학교입니다. &nbsp;결과는 대부분 언제나 동북의 승리입니다. 가끔 흥분한 쌍방의 학생들이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손에 들고 응원하던 딱딱이가 하늘을 수놓으며 상대 응원 학생들에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서울운동장에서 부터 동북중고가 있는 장충동까지 1.6Km의 거리를 시가행진합니다.&nbsp;Brass band를 앞세우고&nbsp;우렁차고 신나는 장단에 발 맞추며 축하행진을 합니다.&nbsp;선수들을 세명의 학생들이 목말을 태우고 시가지를 누빕니다. 꽃봉우리 같은 10대 청소년들이 70대 중반의 노객(老客)이 되었습니다.&nbsp;60년이 흐른 지금도 아련하고 애틋한 추억들이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10월 1일(일) 09시 41분에 2,4,5호선 전철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에서 씨모우 서류바 조단서 패노우 위짜추 까토나 여섯명의 동북중고등학교 동기들이 만납니다. 역사문화공원을 탐방하고 남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곳은 지하 전철로 통과하던지 아니면 걸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던 곳입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에 경성운동장으로 설립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어서야 서울운동장이란 명칭을 가집니다. 1960년대 들어서는 군사독재의 선전용 전유물로 퇴색됩니다. 잠실운동장의 개설로 동대문운동장으로 개칭됩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nbsp;중고등학교 축구(蹴球)와 야구(野球)역사의&nbsp;산실(産室)이며 터전이기도 합니다. &nbsp;축구장과 야구장의 모습은 2009년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추후에 개장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지금 서울의 명소가 됩니다. 서울성곽의 물을 밖으로 유출시키는 이간수문(二間水門)을 비롯하여 1,000점이 넘는 조선시대 초기 중기의 유구와 유물들이 발굴됩니다. 조선시대 쌓은 서울성곽의 모습도 140여 미터에 걸쳐 모습을 찾습니다. 서울운동장 자체가&nbsp;유구와 유물이며&nbsp;역사문화의 산 증인입니다.&nbsp;축구응원의 삼삼칠(337) 박수소리와 함성은 사라졌습니다.&nbsp;우뚝 솟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nbsp;&nbsp;을지로 6가에 있던 옛 계림극장 방향을 바라보며 장충동족발 식당가를 통과합니다. 장충공원 입구로 들어서니 또 다시 가슴엔 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신나게 축구공을 차던 모습이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51922;겨나서 장충공원을 헤매던 초라함이 겹치고 있습니다. 60년이 흐른 오늘도 바로 엊그제 같은 비통함과 처절함이 노객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藥)이라고 그 누구 말을 했던가. 켜켜히 쌓여 있는 마음의 아픔은 아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가을비를 맞으며 남산자락으로 오릅니다. 팔각정에는 역시 관광객들로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봉화대에서 내려다 보는 서울시내는&nbsp; 비안개 속에서도&nbsp;시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을지로 5가 오장동에 중부시장의 모습도 아련히 들어옵니다. 30여개의 판자집들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피난민들의&nbsp;거처로 흑백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nbsp;다섯평 남짓한 판자집이&nbsp;1.4후퇴로 피난 나온 우리가족 여섯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공동변소 앞에는&nbsp;예닐곱명이 길게 차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쪼그려 앉은 내 모습도 보입니다.&nbsp;창백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nbsp;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영희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이 나누어준&nbsp;산토닌을&nbsp;&nbsp;복용해야 했습니다. 혹시 뱉을까봐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약에 마비된 회충들이 요동을 치며&nbsp;찢어지는 아픔은&nbsp;처절함마저 몰고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똥통으로 쏟아지는&nbsp;것은 변(便)이 아닌&nbsp;꿈틀대는 나무젓가락 굵기의 하얀 회충들의 무더기뿐입니다.&nbsp;하루 세끼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nbsp;어린 5학년 소년에게 기생충은 영양실조의 원흉입니다.&nbsp;화장실이래야 서까래 판자쪽으로 얼기설기 지어 놓은 공동변소가 한개 있을 뿐입니다. 1955년도 노객의 나이는 열두살로 국민학교(초등학교) 5학년입니다.&nbsp;아득한 그&nbsp;때&nbsp;그 날의&nbsp;비참한 삶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입니다. 죽지 못 해 살아야 한다는 그 절망감이 지금도 가슴엔 찬바람이 울씨년스럽게 일렁이고 있습니다.&nbsp;고객과 상인들로 붐비고 있는 왁자지껄한 남대문시장을 지납니다. 없는 물건이 없는 상품들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nbsp;녹슬은 드럼통에 담긴 꿀꿀이죽이 그토록 먹고 싶어 손가락을 빨던 창백한 어린 그 소년의 모습도 보입니다.&nbsp;쏟아지는 비를 온 몸으로 맞으며&nbsp;그 때 그&nbsp;소년이던 노객(老客)의&nbsp;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고 있습니다.&nbsp;지하도를 건너서 서둘러&nbsp;북창동 맛집으로 들어섭니다. 짜릿한 알콜의 향기가 무겁던 마음을 일거에 날려버립니다.&nbsp;지난 날의&nbsp;씻을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은 두번 다시 우리들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겠습니다. 굶주림과 아픔의&nbsp;상처는 아직도&nbsp;강물이 되어 노객의 마음 깊은 곳을 할퀴고 있습니다.</span></p><p class="cafe-editor-text"><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cafe-editor-text"><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17년 10월 13일&nbsp;&nbsp; 무&nbsp;&nbsp;&nbsp; 무&nbsp;&nbsp;&nbsp;&nbsp;&nbsp; 최&nbsp;&nbsp;&nbsp; 정&nbsp;&nbsp; 남</span><br></p><p class="cafe-editor-text"><br></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A1C3359D31F7A25"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F423359D31F7B24"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1523359D31F7D09"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D8C3359D31F7E22"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6143359D31F7F19"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87F3359D31F8023"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D813359D31F8122"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6EC3359D31F821E"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D283359D31F831F"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6763359D31F8423"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0AF3359D31F8527"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B963359D31F8626"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4263359D31F8727"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6FC3359D31F8821"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B7C3359D31F8911"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6E63359D31F8A24"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2B83359D31F8B1C"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6223359D31F8C27"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D603359D31F8D1A"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FCF3359D31F8E19"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0EF3359D31F8F1B"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3AE3359D31F900B"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C033359D31F910B"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5A73359D31F9218"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D403359D31F930E"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8143359D31F941E"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8AE3359D31F9423"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CAD3359D31F9528"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4793359D31F9721"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2CA3359D31F9819"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2503359D31F9922"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54B3359D31F9926"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02B3359D31F9A29"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34F3359D31F9C21"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2C3359D31F9D14"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5F43359D31F9E23"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5893359D31F9F12"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DEC3359D31F9F1A"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4B3359D31FA01F"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AD53359D31FA11E"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BE73359D31FA223"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3F63359D31FA322"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B673359D31FA424"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D053359D31FA525"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3F93359D31FA628"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1403359D31FA724"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F813359D31FA82B"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B263359D31FA922"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82C3359D31FAA24" class="txc-image" width="720"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AF53359D31FAB0B" class="txc-image" width="720" /></p>
<!-- -->
카페 게시글
우리들(산행) 이야기
추억은 강물이 되어 동대문역사문화현장과 남산을 오르며 20171001
무무
추천 0
조회 30
17.10.03 14:2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