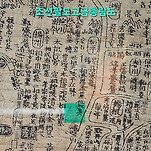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20">22世 諱 <span style="color: #006dd7;">希敎임희교</span> 선조님(<a href="https://blog.naver.com/yimcu/223140099309" target="_blank" class="ke-link">링크</a>)</span></p><p>&#160;</p><p><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b> 돈녕부</b>란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으로 태종 14년(1414)에 친척간의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span></p><p><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내용은 영조가 신하를 데리고 돈녕부를 방문하여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즐기면서 서로 화답한 시를 모은 것이다. 먼저 영조가 「今辰此饌從何至/追憶己年予懷深」이라고 시를 내리자 이 시의 운자인 「深」자에 맞추어 왕세손인 후일의 정조가 「春滿法樽邦永/禮成敦府聖思深」으로 화답한다. 이어 신하들이 각기 &quot;官職 人名 進&quot;의 형식으로 운자를 따라 화답하고 있다. 당시 영조와 시로 갱운한 신하들은 다음과 같다. <span style="color: #ef5369;">지돈녕부사</span> <span style="color: #409d00;">서명응(徐命膺)</span>, <span style="color: #ef5369;">병조판서</span> <span style="color: #409d00;">이경호(李景祜)</span>, <span style="color: #ef5369;">병조참판</span> <span style="color: #409d00;">윤득우(尹得雨)</span>, <span style="color: #ef5369;">부총관</span> <span style="color: #409d00;">윤동석(尹東晳)</span>, <span style="color: #ef5369;">행돈녕부도정</span> <span style="color: #409d00;">이양(李瀁)</span>, <span style="color: #ef5369;">행승정원도승지</span> <span style="color: #409d00;">김구주(金龜柱)</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좌승지</span> <span style="color: #006dd7;">임희교(任希敎)</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우승지</span> <span style="color: #409d00;">심이지(沈之)</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좌부승지</span> <span style="color: #409d00;">안겸제(安兼濟)</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우부승지</span> <span style="color: #409d00;">서유린(徐有隣)</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동부승지</span> <span style="color: #409d00;">임정원(林鼎遠)</span>, <span style="color: #ef5369;">병조참의</span> <span style="color: #409d00;">심이지(沈履之)</span>, <span style="color: #ef5369;">시강원겸문학</span> <span style="color: #409d00;">김보순(金普淳)</span>, <span style="color: #ef5369;">병조정랑</span> <span style="color: #409d00;">허유</span>, <span style="color: #ef5369;">병조좌랑</span> <span style="color: #409d00;">이형필(李衡弼)</span>, <span style="color: #ef5369;">병조좌랑</span> <span style="color: #409d00;">조정상(趙貞相)</span>, <span style="color: #ef5369;">시강원설서</span> <span style="color: #409d00;">박상갑(朴相甲)</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주서</span> <span style="color: #409d00;">이정규(李鼎揆)</span>, <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가주서</span> <span style="color: #409d00;">김효진(金孝眞)</span>, <span style="color: #ef5369;">예문관대교</span> <span style="color: #409d00;">이도묵(李度&#40665;)</span>, <span style="color: #ef5369;">예문관검열</span> <span style="color: #409d00;">이정훈(李正薰)</span> 등이다. </span></p><p><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형태적인 특징은 연화문양(蓮花紋樣)의 황색표지에 고급스런 외형, 옥색으로 인찰한 쌍변의 테두리와 정성스런 글씨, 영조와 왕세손의 시는 반엽(半葉)에 한 수, 나머지는 반엽에 두 수를 필사한 것 등 내외형상의 형식이 ≪기영관갱운첩≫과 동일하다. 곧 ≪기영관갱운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갱운시를 모아 같은 기관에서 정성 들여 필사하여 완성한 책이다.</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float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dd8ecc453a38f261f11365c907353f5b3822fa27" class="txc-image" width="337" height="47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bpA/dd8ecc453a38f261f11365c907353f5b3822fa27" data-origin-width="441" data-origin-height="627"></div><p>&#160;</p><p><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770 영조 46 돈녕부 갱운첩</span><br><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다투어 기원한 큰 복 냇물처럼 흘러오니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爭祈景福川方至 쟁기영복천방지</span><br><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모두를 포용한 크신 은혜 바다처럼 깊네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咸&#22271;洪恩海共深 함유홍은해공심</span></p><p><br><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ef5369;">승정원 좌승지</span> 신 <span style="color: #006dd7;">임희교</span> 갱진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ef5369;">承政院左承旨臣</span><span style="color: #006dd7;">任希敎</span>&#36065;進</span></p><p>&#160;</p><p><b>&#36065;韻</b><span style="color: #55555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b>갱운</b>은 갱재가(&#36065;載歌)에서 나온 말인데 임금이 시를 먼저 지으면 신하들이 차례로 임금의 시운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이나 그러한 작품을 말합니다.</span></p><p>&#160;</p><p>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39;한문고전번역서비스&#39; 도움을 받았습니다.(김민선 번역 김종태 감수)</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p>&#160;</p>
<!-- -->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규장각에서 만난 직계 선조님(敦寧府賡韻帖 돈녕부갱운첩)
임정혁
추천 0
조회 10
24.06.05 11:1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