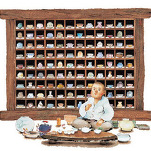<!--StartFragment--><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워하는 마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방하는 마음을 멈추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근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순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유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양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현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현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명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국 등</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양에서는 이지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돌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것이 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양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것이 있어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마녀사냥이란 것도 로마황제가 예수를 학대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후 중세유럽 목사들이 마녀사냥의 주도하는 역할을 하다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너무 아이러니 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상과 십자가에 얽힌 모순을 함께 생각해 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회적 악습이자 폐단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에도 마녀사냥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촛불혁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속에도 대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속에 묻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을 하고 있었던 무서운 집단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근혜 이하 우리나라에는 마녀사냥대에 오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양의 잔다르크 역시 마녀사냥으로 희생되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후대에 영웅으로 추대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제 강점기 명성황후 역시 마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냥으로 희생되었으나 광복 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명예회복이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처럼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악습으로 희생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민국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된장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xx</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빨갱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으로 바뀌었을 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은 현재진행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우리나라 정치문화도 이런 사회적 문화와 혼합되어서 민주주의의 장점이었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수결의 원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려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타인을 비방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깍아내리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의 목소리가 박근혜 정권 탄압이후 도를 지나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전의 문구를 알려주고 싶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죄 없는 순진한 사람에게 갖은 방법으로 해치는 자는 다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갚음을 만나게 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①</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한 고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②</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③</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육체의 상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④</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⑤</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신착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⑥</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독한 중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⑦</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친척의 멸망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⑧</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산의 파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⑨</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이 그의 집을 태움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⑩</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망과 비난만 남게 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쳐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죄 없는 사람을 더럽히진 못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omeone who harms an innocent person in every means will be paid back with one of the following ten ways.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evere suffering,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②</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decrepitude,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③</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physical injury,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erious illness,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mental disorder,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erious wound,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downfall of relatives,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ruin of property,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urning house. After death, there will be only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resentment and blame.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o matter how hard one damages the other as making up a story, if that person is innocent, then he/she can't be besmirched.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보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守寶寺</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a href="http://subo52.kr/"><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ttp://subo52.kr/</span></u></a></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a href="http://cafe.daum.net/temple2009"><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ttp://cafe.daum.net/temple2009</span></u></a></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cf.1.</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대중적 견해</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쫓아오던 햇빛인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 교회당 꼭대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괴로웠던 사나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자가가 허락된다면</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가지를 드리우고</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꽃처럼 피어나는 피를</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두워가는 하늘 밑에</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용히 흘리겠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윤동주의 십자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은 로마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처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제침략기에 일본군사들에게 젊은 나이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한국의 저항시인 윤동주의 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한국의 기독교 십자가에 대한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의 찬미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死</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죽음에 대한 찬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대체 그런 죽음이 뭐길래 찬미하며 칭송하는 것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죽음을 찬미하는 것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이유는 주변의 모함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교에서 죽음은 고통의 일부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상하다고 이야기 할 뿐 찬미하지는 않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물건으로 남겨서 기념하고 보관하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좋은 기억과 상징적인 물건들이 많을 텐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하는 생각에서 몇 자 적어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울의 밤하늘을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온으로 만든 교회의 십자가가 가득 메워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묘지의 무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자가는 당시 예수 뿐만이 아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른 죄수들이 매달려 처형당할 때 쓰는 물건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성스러운 상징물처럼 되어버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양에도 나쁜 짓을 한 죄수를 교수형 시킨 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시체를 매달아 마을어귀에 둠으로써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렇게 죄수를 매다는 물건이 지금까지 성스럽게 남겨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뿐 아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납골당의 십자가 표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악세사리 등등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많이 만들어서 남겨져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제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두대를 상징화 하는 격과 무엇이 다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프랑스 혁명으로 달라진 선진화되고 정돈된 사람들의 모습이나 정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문화 등을 기억하여 상징화 할 수도 있지 않은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스 건축물 중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국가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기둥으로 조각해서 남겨놓는 관습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카리아티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caryatid)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거운 기둥 속에 갖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패배한 민족은 점점 소멸되어 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좌선을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가 공포심을 주어 통치해야 하는 중생이라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의미의 십자가도 통했을 법하나 시대가 변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적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던 소녀상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은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약에 소녀상의 모습이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모습으로 남겨놨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와 유래를 잘 알아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제는 그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필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상징물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들은 전생에 예수를 몹시도 미워했던 로마황제의 후손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Public viewpoints on the symbolic meanings of Christ’s Cross</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sun rays that chased me</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Are now on the tip of the church</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anging on the cross.</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steeple is so high</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ow did it get on top?</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o ring can be heard,</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Only the whistling as it wanders,</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man who suffered,</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o the happy Jesus Chris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If the cross allows i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is head lolling</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And the blood that blooms like a flowe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Under the sky that grows darke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e will quietly shed</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Cross written by Yun Dong Ju)</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is is the poem by Yun Dong Ju, a Korean poet of resistance who was killed by Japanese soldiers in his young 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ike Jesus killed by the Roman soldiers. Also, it reflects the Korean sentiment on the Christian Cross.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Death Song is to praise the death. Why on earth do they praise the death what it is?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Do they praise Jesus Christ’s Holy death? The reason why Jesus nailed and died on the Cross was due to the sacrifice innocently from false incrimination. The death in Buddhism is a part of suffering and said to be impermanent, but not be praised.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enerally, people leave and keep the good things when they try to remember something. Although there might be lots of good memories and symbolic items that they can praise Jesus, I will write a few lines considering why that is Cross.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When we look up the nighttime sky in Seoul, sometimes it feels like the tombs of graveyards filling with crosses of the churches made of neon.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Cross was the item to be used on death penalty not only for Jesus but also for the other criminals. That became the holy symbol of Christianity now.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In Orient, there was a custom to warn the people by hanging the dead body in the edge of the village after hanging punishment of the criminal, too. The item to hang the criminal remained sacred up to now.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It remained as the symbol of Christ not only in the church but also in Bible, cross signal in the charnel house, tombstones, accessories, and so on.</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However, it has the problem.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What is it different from the symbolization of the guillotine commemorating French Revolution? Can’t they symbolize the appearance of the people who were advanced and well organized upon French Revolution, or politics and culture?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re used to be the custom in the ancient Greek architecture that they had made the defeated people from the war as the slaves and recorded them as the pillar of the sculpture (caryatid). Seeing the painful scenes captured in the heavy pillars, the people in the defeated country became extinguished more and more.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Jesus remains as the shape of nailed and bled to be painful on the Cross while Buddha remains as that of Zen meditation sitting with right posture.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If they were the people who were reigned with sense of fear, the Cross with this meaning could be accepted, however, times have changed.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atus of Peace that suffered from sexual abuse remains as the shape of right sitting posture on the chair. If they remained its shape as the scene of sexual abuse, how would it be in our mind now?</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ince we know the symbolic meaning and the origin of the Cross to remember Jesus well, I think we should change the image now.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writer thinks that those who hang around and enjoy the Cross hanging the symbolic item Jesus was nailed and felt painful seem to be the descendants of Roman Emperors who hated Him very much.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제로 나는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이탈리아 교황청에 수도 없이 보낸 바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럽 신학대 교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금 명퇴한 독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0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말에 따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십자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생명의 나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변할 거라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cf. 2</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경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상태에서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언어지시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경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말이 왜 나왔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당시 우매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강한언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는 이 말을 불교용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바꿔 표현하고자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랑 같이 살아야 하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절대 그렇지 않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닮아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처럼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언어에 너무 집착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시적 언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길들여진 현대인은 이러한 함축적인 언어로 오해를 살만한 일들과 만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우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參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일으키기 쉬운 일제 강점기 관련 역사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기 좋은 곳으로 짓는 것이 좋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되어 학살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일본군을 매우 미워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군이 행한 잔학한 일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는 나약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약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될 수도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늘 이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늘 투쟁해야 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립기념관에 가서 고문당하는 마네킹인형을 보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감정을 계속 상기하다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에 집중하다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일본에 대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들어오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면 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에게 고통을 준 일본군이 되고 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얼마나 불행한 일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는 불교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해 설명할 때 영어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he kills me’</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표현을 인용하곤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말로 표현하자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녀는 나를 죽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표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사실 그 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마음 속에 그녀 생각 밖에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풀이해야 맞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 내 마음속에 그녀 생각 밖에 없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 나를 밀어내고 그녀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을 미국인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녀가 나를 죽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he kills me)’</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언어구조를 쓰는 사람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초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알았던 것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상태의 사람들이 항상 경계하고 알아차려야 할 단계가 이 단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경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근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들어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빙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상 때문에 신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신보다 수승한 신이 들어오면 모를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부분이 자신보다 하근기 신이들어므로 고통스러운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기독교사상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대한 복종이 아닌 철저한 수행으로 자기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는 수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다 더 수승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成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하는 것이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경에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떤 사람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의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한한 사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구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의 구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도의 간절함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통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얻을 수는 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모르면 삿된 욕망과 어리석음에 허우적 대기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이 된다는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成佛</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사랑해 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스스로를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제강점기에 나와 내 조국에게 고통을 준 일본을 미워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움에 집착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미워하는 일본이 내 안에 들어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짓밟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죽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린하는 나쁜 세력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일제강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베트남 전에 가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반대로 베트남 여자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똑같은 가해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본군을 계속 미워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미워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고 마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아니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이 했던 나쁜 일들을 되풀이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그러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일제강점기 일본군과 멀어지기 위해서 미워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행위는 일본군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린 미움가득한 일본군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런 일본군이 되고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매우중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집착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수행자들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삼독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생각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철저하게 경계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혐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주는 대상이 아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자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학대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못살게 굴게 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로 막행막식을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함부로 행동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막된 언행을 하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대대손손 업보가 되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성격이 모질고 험하다는 평을 듣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한 업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을 미워하여 자신 안에 가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삶이 힘들어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업의 되물림이 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와 혐오의 기운에 집착하기 보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기운에 몰입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게 수승한 기운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불교에서 이런 표현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언발에 오줌누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식의 임시방편성에 불과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에너지로 강한 힘을 키울 수는 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모르면 또 다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리석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에 몰입하는 방법은 분노를 빨리 사그라들게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기운이 맴돌게까지 하는데 그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까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은 통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그 후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되기 위해서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에 이르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독교 명상가들이 간과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통찰하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일에 종종 엮이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예를 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가지 청산해야 할 국가적 보상문제를 애매모호 하게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기독교의 맹점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에 머물고 끝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상은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분노에 계속 몰입하면서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것에 몰입한 사람도 계속 분노와 악한 기운을 증가시키게 되고 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상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가라앉게도 하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너지를 키우기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명상 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에 몰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사람은 악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한 기운에 몰입한 사람은 선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제강점기의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처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가 치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께서 제시한 가장 좋은 방법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드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혼자 앉아있으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선정에 드는 기본자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전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선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독약보다 무서운 삼독심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올라왔을 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에 집중하면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 나를 파괴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든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주괴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법의 논리에 의해 반드시 사라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사실을 알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두렵지 않으며 상황이 더 쉽게 풀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가라앉으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생기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음할 일이 생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수를 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은 삼독심에 의한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군을 미워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미워하는 일본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들어오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군을 사랑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사랑하는 일본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들어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워하면 내 안에 독심이 생기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 나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부처님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도 아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전히 악한 상황에서 악해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상황에서 좋아지는 나약한 중생이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상황이 좋아지도록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이 이야기한 초발심자경문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쁜벗은 멀리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좋은 벗을 가까이하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고로 도올 김용옥 선생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하지 말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책을 펴내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통찰해 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을 사랑할 수 있는 지 생각해 보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tartFragment--><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왜 그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하지 말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했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로 분류하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첫 번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 고통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生老病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태어나는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늙음의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병듦의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죽음의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고 나머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 고통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愛別離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怨憎會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求不得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五陰盛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사랑하지 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워하지도 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너무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가 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생노병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고통은 혼자 겪어야 하는 고통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머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지 고통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생기는 고통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스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span><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랑하기 때문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말로 남을 속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속고 살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피해보상이 미뤄지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 지 짚고 넘어가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안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변명하면서 채워진 다른 사람들을 빼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無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이 지혜롭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cf.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魔女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Witch-hun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프랑스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Chasse aux sorci&#232;res)</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유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북아메리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북아프리카 일대에 행해졌던 마녀나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에서부터 형벌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에서는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럽에서의 마녀재판</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는 본래 사악하지 않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출산이나 질병치료 같은 의료 기능을 담당하거나 점을 치고 묘약을 만드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한 집단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던 그들은 어느 날 졸지에 악마와 놀아나면서 신앙을 해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낙인찍히기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부터 불어닥친 유럽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7</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까지 대략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명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5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대에 올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찍이 마녀재판이라고 하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 이후 기독교의 주도에 의해 행해져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고 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견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7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이후 마녀재판의 학술적인 연구의 진전 덕분에 수정되어 본래 민중 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재판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 후반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8</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 중반에 걸쳐 볼 수 있었으며 마빈 해리스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녀 혹은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고 기술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은 백년 전쟁이 끝난 다음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잔 다르크도 마녀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흥미로운 사실은 마법을 실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중에 절대 다수가 여성이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의 망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Malleus Maleficarum, witches' hammer)</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책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지식을 집대성한 완결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간주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책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들이 주로 마법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은 잘 속아 넘어가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은 정욕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서술 내용이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런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모두 잠재적인 마녀일 수밖에 없으며 남성을 유혹해서 마법이라는 죄악에 빠뜨리는 요물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완전히 발가벗겨진 여성이 산 채로 매달려 화형을 당하는 장면은 당시 남성들의 최고 흥행거리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적 상상력이 가미된 기술이며 추가적인 역사적 검증이 필요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가 악의 화신이 된 건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향이 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질타하기 위해 예수와 대립된 존재로 마녀를 만들어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세의 마녀사냥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8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교황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긴급 요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회칙을 발표해 마녀가 있다고 한 데 이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487</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하인리히 크레이머와 자콥 스프렝거라는 도미니코 수도회 성직자 두 명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의 망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마녀사냥 지침서를 내면서 본격화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책은 주술이나 마술을 믿는 민속 신앙은 있지만 실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사관들과 판사들이 마녀를 쉽게 구분하고 취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쓴 책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책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여자는 마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녀일지 모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무엇보다 마녀사냥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가톨릭교회가 가장 약했을 때였고 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근본주의의 창궐은 특정 체제에 위기가 닥쳤음을 반영하는 증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일환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이르러 시작된 자본과 화폐경제의 성장은 교회 중심의 중세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 이전의 종교 재판은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들의 회개와 전향을 이끌어내면 족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무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가톨릭교회는 상대해야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은 권위 또는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종교적 광기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세의 몰락으로 시작된 근대는 계몽주의와 합리성으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녀 프레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식별법을 담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의 망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책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 인쇄술이라는 최신 기술 덕분에 대량으로 제작돼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이는 마녀사냥을 가속화시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49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교황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38</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종교 재판 본부에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공식 비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의 망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던 당시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쇄를 거듭해서 발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의 망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득세의 이면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방조한 세속 권력과 교회가 도사리고 있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나긴 십자군전쟁의 패배로 혼란과 분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휩싸인 유럽 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희생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필요했던 세속 권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종교 개혁의 열풍과 극심한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앙의 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몰아갈 필요성이 있었던 교회가 그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프레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변화에 직면한 공동체의 가치관이 요동치고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자 대중들은 마녀만 제거하면 과거처럼 평온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식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만큼 지식과 과학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악마화하고 소멸시켜 버리려는 메커니즘도 활발히 작동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후 마녀사냥은 미신을 타파한 과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대 사법체계의 확립에 의해 사라지기 시작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의 기원</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세기에 들어서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독교 사회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로 이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서는 악마가 인간이나 동물 등을 이용해 악한 행위를 한다는 믿음이 생겨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이전부터의 민족 신앙에 대한 불신감이나 십자군 병사들에 의해 동방에서 가지고 온 사상 및 문화 등이 융합하여 생겨났다고 추측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고대 이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악마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람들은 그것을 근절하려고 애써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진 인간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은 스위스와 크로아티아의 민중 사회에서 시작되어 이윽고 민중 법정의 형태로 마녀를 단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단에 관해서는 깊이 개입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에 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던 로마 가톨릭이 이단 심문을 통해 마녀 재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업</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은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로 인식이 된 혐의자에게는 사형의 형벌을 내리는데 마녀는 그 혐의를 가리는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마녀가 지불해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문 도구 대여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를 고문하는 고문기술자 급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인건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를 체포할 때 소요된 모든 시간과 비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가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관값</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황에게 내야 하는 마녀세 등을 마녀 용의자가 모두 지불해야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지어는 마녀가 화형에 처해진 이후 다시 한번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 재산 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형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는 마녀재판 집행관과 교황에게 급여를 지불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신을 살해한 교황과 그 일당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꼴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용의자</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용의자는 주로 엄청나게 부유한 과부들과 무신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중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마녀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통적으로 과부들이 많이 잡혀갔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과부는 가족이 없기에 재판에 증인을 서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한 그리스 약초학을 공부한 자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북인도 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신비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프리카에서 숭배하는 부두교라는 종교를 믿는 자들 역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악마를 숭배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명목하에 마녀로 잡아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사냥꾼들은 마녀에 대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며 설명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들은 악마와 성교를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빗자루를 매개체로서 활용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의 전개와 쇠퇴</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시작된 이단 심문이 민사 재판으로 재판되었던 마법까지 취급하게 된 것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이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은 왈도파가 많았던 스위스나 프랑스의 알프스와 가까운 지방에서만 취급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맨 콘에 따르면 기록을 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28</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의 스위스 발레 주의 이단 심문소가 마녀 건을 취급한 것이 최고였다고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래 이 지방의 이단 심문소는 주로 왈도파를 추궁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윽고 이단자들의 집회 이미지가 마녀의 집회 이미지로 변용되어 간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악마 숭배 행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은 성물을 모독하는 행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이를 납치해 잡아먹는 행위 등의 마녀의 집회가 가지는 이미지는 일찍이 이단의 집회에서 행해졌다고 여긴 이미지 그대로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는 본래 군집생활을 했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숲에 혼자서 사는 마녀의 이미지는 그림 동화의 영향이 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발 더 나아가 마녀의 개념이 당시 유럽을 뒤덮고 있던 반유대주의와 결합하게 되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이를 잡아먹는 매부리코를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마녀상이 만들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의 집회가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은 명칭인 사바트로 불리게 된 것도 반유대주의의 산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마녀의 이미지가 완성된 것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에 들어가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와 마법에 관한 서적이 일종의 붐이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속설이나 소문을 근거로 집필된 것이었으며 마녀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물건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마녀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 행위도 이러한 풍설에 근거한 것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럽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차 세계대전 이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국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7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으로 마녀 재판이 사라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지만 전근대적인 문화나 고대부터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마녀재판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일이 가끔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0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한 바오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의 지시에 따라 교황청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억과 화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교회와 과거의 잘못</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해 과거 교회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때 마녀사냥에 대한 잘못도 인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의 이름으로 사죄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의 실제</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을 하는 방법</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로 눈물 시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raenenprobe)</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망치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혐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시험해보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 나와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눈물을 흘려서 혐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 번째는 바늘 시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adelprobe)</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바늘시험은 성경 구절의 예언서에서 유래된 것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이마에 먹이나 도장을 친다는 논리에서 유래됐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타락한 악마들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논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라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또 관찰의 용이성을 위해 몸의 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음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눈썹을 깎거나 태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찰에 의해 사마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융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스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근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형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피가 흐르는지 시험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바스에서의 난교에 의해 마녀는 피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 번째는 불시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Feuerprobe)</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판관은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위로 걸을 수 있는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리고 다치게 될지를 시험한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렇게 제안했을 때 혐의자가 승낙을 한다면 그는 마녀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는 이 난관을 악마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 번째는 물시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Wasserprobe)</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형리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다 빠뜨린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만약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는 혐의를 벗게 되겠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 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재판의 피해 사례</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잔 다르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년 전쟁 때 종교 재판에서 마녀 판결을 받았고 나중에 화형당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훗날 명예회복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일럼 마녀 재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국 뉴잉글랜드 세일럼에서 일어난 청교도들의 재판</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의 현대적 의미</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에 대해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의 산물로 보고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회학에서는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히틀러 나치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생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 제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불령선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미국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KKK'</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매카시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련과 아프리카 등에서 벌어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종학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이 근현대에 벌어진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현대인들은 스스로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합리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여기지만 오늘날에도 마녀사냥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민국에서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이름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된장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xx</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빨갱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으로 바뀌었을 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은 현재진행형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를 만들어내는 원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즉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프레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택광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은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치적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말하기도 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일성과 규격화를 요구하는 근대국가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상이 아닌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의 대상은 주로 여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유대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무슬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동성애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주노동자 등인 것이 그 예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상황에 따라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터넷의 발달로 마녀사냥의 양상도 진화하였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을 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격 살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프레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의 발달이 마녀사냥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식 여론재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련 서적</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Matilda Joslyn Gage.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Woman, Church and State; A Historical Account of the Status of Woman Through the Christian Ages</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General Books. 200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ISBN 9780217654661[13]</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실비아 페데리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황성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민철 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캘리번과 마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갈무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ISBN 9788961950428</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택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프레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음과 모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ISBN 9788957077290</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련 게임</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리포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호그와트 미스테리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련 영화</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더 헌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마스 빈터베르 연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작품</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설공주 살인사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Snow White Murder Case, 201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카무라 요시히로 연출</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련 영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집</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BS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것이 알고 싶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9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l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표현의 자유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터넷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방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당한 사람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gt;. 200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관련 기사</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경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댓글 여론형성 도구인가 마녀사냥 무기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0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희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동 전문가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슬람과 여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07</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수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 연예인 이혼 마녀사냥식 보도 언론책임도 크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07</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추은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본주의는 어떻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이용했는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나 다 라 마 황경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은 언제든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향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원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짜르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겨레신문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4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미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엔 책이 한 몫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깨진 링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거 내용 찾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북데일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나 조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가벗기고 찌르고 살육하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겨레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사입력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0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최종수정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0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조태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근대 베스트셀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울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나 다 표창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표창원의 단도직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망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향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8</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 오늘날 마녀의 이미지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형상이 된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엄기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 사냥의 진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을 노예로 만들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프레시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 나 이지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소한 거짓말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 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불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사저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6</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별기획취재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격살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앞에 경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포털 떠넘기기 급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세계일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7</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보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아이의 거짓말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추행 누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자 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겨레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우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번엔 국물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터넷 여론몰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험한 심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Archived 20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웨이백 머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일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환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00</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리포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급 인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어린이 성화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편까지 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UNDAY. 20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보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 아이의 거짓말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추행 누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남자 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겨레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3</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5.</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소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건이 왜곡되는 과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설공주 살인사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씨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1. 20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혜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알지에 히스 재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마녀사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네티즌을 향한 섬뜩한 경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헤럴드경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슬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NS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대의 진실을 꼬집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영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백설공주 살인사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독서신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1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외부 링크</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Stages of a Witch Trial ? a series of articles by Jenny Gibbons.</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13 Catholic Encyclopedia entry on "Witchcraf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Burning Times A Wiccan discusses what she considers the three myths of "The Burning Times"</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Jenny Gibbons (1998).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The Great European Witch Hunt. Retrieved 21 November 2006.</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Crises: Witch hun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The Decline and End of Witch Trials in Europe by James Hannam</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Witch Trials Documentary Archive and Transcription Projec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깨진 링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거 내용 찾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Witch Trials</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cf4.</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지메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따돌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왕따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いじめる</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인이 개인을 가해하는 행위와 집단이 개인을 가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본의 이지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いじめる</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가해자가 집단인 경우가 많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직장과 학교에서 동료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친구사이에서 이지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가정 내 폭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교거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신장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
<!-- -->
카페 게시글
나의 에세이
죄없는 순진한 사람을 괴롭혔을 때에 받는 과보(마녀사냥, 이지메)
익명
추천 0
조회 3
19.09.13 10:2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