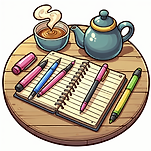<p><span data-ke-size="size18">한국인&#160;작가가&#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한글로&#160;쓴&#160;소설이</span><br><span data-ke-size="size18">노벨문학상을&#160;수상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기쁜일이지.</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스웨덴&#160;한림원의&#160;선정&#160;이유를&#160;이렇게&#160;밝혔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quot;for&#160;her&#160;intense&#160;poetic&#160;prose&#160;that&#160;confronts&#160;historical&#160;traumas&#160;and&#160;exposes&#160;the&#160;fragility&#160;of&#160;human&#160;life&quot;</span><br><span data-ke-size="size18">“역사적&#160;트라우마를&#160;직시하고&#160;인간&#160;삶의&#160;연약함을&#160;드러내는&#160;강렬한&#160;시적&#160;산문&quot;</span><br><br><span data-ke-size="size18">독서클럽의&#160;제일&#160;웃어르신이&#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금요일&#160;아침&#160;6시&#160;49분에&#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quot;속보입니다....&quot;</span><br><span data-ke-size="size18">카톡&#160;소리와&#160;함께,&#160;소식을&#160;접했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업무를&#160;막&#160;시작하려던&#160;참이었지</span><br><br><span data-ke-size="size18">그리고,&#160;짧은&#160;시간&#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작가와&#160;함께&#160;했던&#160;시간을&#160;추억한&#160;후,&#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160;이렇게&#160;반응했지.&#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160;시간이&#160;아침&#160;8시&#160;16분이었어.</span><br><br></p><blockquote data-ke-style="style2">소식을&#160;듣고&#160;접했던&#160;작품을&#160;<br>생각해&#160;보았습니다.<br><br>그의&#160;작품은&#160;늘&#160;<br>어둡고&#160;<br>우울하고&#160;<br>뿌였고&#160;<br>마음을&#160;무겁게&#160;했습니다.<br><br>그녀의&#160;태생,&#160;가족,&#160;환경이&#160;<br>작품의&#160;근간을&#160;이룬것이겠지요.<br><br>무엇보다도&#160;시인으로&#160;<br>작품&#160;세계를&#160;시작한&#160;것이&#160;<br>소설에도&#160;지대한&#160;영향을&#160;<br>주었을&#160;것이&#160;자명하구요.<br><br>그녀의&#160;작품을&#160;<br>단순&#160;감상용이&#160;아닌,&#160;<br>작품의&#160;탄생배경을&#160;<br>이해하고&#160;성찰하는&#160;<br>계기가&#160;되기를&#160;바래봅니다.</blockquote><p><br><span data-ke-size="size18">물론&#160;어르신의&#160;속보를&#160;읽자마자&#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의&#160;감정을&#160;큼직한&#160;이모티콘으로도&#160;올렸었고.&#160;</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작가의&#160;이름은&#160;너무도&#160;친근하고</span><br><span data-ke-size="size18">작품을&#160;원작&#160;그대로&#160;접하는</span><br><span data-ke-size="size18">이런&#160;세상이&#160;오기도&#160;하는구나&#160;하는&#160;생각.</span><br><br><span data-ke-size="size18">더&#160;가까이&#160;다가서려는</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구촌의&#160;어떤&#160;사람은</span><br><span data-ke-size="size18">한국어를&#160;공부할&#160;수&#160;밖에&#160;없고,</span><br><span data-ke-size="size18">번역된&#160;노인과&#160;바다를&#160;읽는&#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를&#160;이해할&#160;수&#160;있을까?</span><br><br><span data-ke-size="size18">토요일&#160;아침&#160;8시26분,&#160;그&#160;어르신이&#160;또&#160;다른&#160;소식을&#160;카톡에&#160;올리셨어.</span><br><br></p><blockquote data-ke-style="style2">한국계&#160;미국&#160;여류작가&#160;김주혜<br>미국&#160;톨스토이&#160;문학상&#160;수상&#160;!!<br>the&#160;beast&#160;of&#160;a&#160;little&#160;land<br>작은&#160;땅의&#160;야수들<br>일제강점기때&#160;폭정에&#160;맞서는&#160;<br>호랑이&#160;이야기<br>상금을&#160;호랑이&#160;보호기금에&#160;기증</blockquote><p><br><span data-ke-size="size18">*&#160;</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지금&#160;월요일&#160;아침이야.&#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소식을&#160;듣고&#160;사흘이&#160;지났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그동안&#160;적지&#160;않은&#160;뉴스를&#160;접했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다른&#160;사람들은&#160;어떻게&#160;느꼈는지&#160;모르겠지만,&#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160;많이&#160;불편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어떤&#160;뉴스는&#160;참을&#160;수&#160;없어서,&#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부러&#160;댓들을&#160;남기기도&#160;했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천박한&#160;글을&#160;쓸&#160;수&#160;밖에&#160;없는&#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기자가&#160;불쌍하게&#160;느껴졌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수상에&#160;대한&#160;논평다운&#160;논평을&#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직은&#160;접하지&#160;못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왜&#160;일까?&#160;하는&#160;생각은&#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너무&#160;자연스러운&#160;것이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historical&#160;traumas</span><br><span data-ke-size="size18">역사적&#160;상처로만&#160;번역하기는&#160;뭔가&#160;모자라.</span><br><br><span data-ke-size="size18">trauma의&#160;사전적&#160;의미를&#160;모두&#160;합해야&#160;할&#160;것이라고&#160;생각해</span><br><span data-ke-size="size18">1.외상(外傷)</span><br><span data-ke-size="size18">2.정신적&#160;충격</span><br><span data-ke-size="size18">3.외상성&#160;상해</span><br><span data-ke-size="size18">4.그&#160;체험</span><br><span data-ke-size="size18">5.(일반적으로)&#160;충격</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이&#160;트라우마를&#160;함께&#160;전해야&#160;하는데,&#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불편하거든.&#160;많이,&#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참&#160;많이&#160;불편한&#160;사람들이&#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스피커의&#160;위치에&#160;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지금까지&#160;뱉어낸&#160;말들이&#160;있으니</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녀를,&#160;그녀가&#160;소설에서&#160;이야기하는&#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바로&#160;그&#160;내용이&#160;불편할거야.</span><br><br><span data-ke-size="size18">거기에&#160;더해서,&#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는&#160;이런&#160;생각도&#160;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quot;작은&#160;땅의&#160;야수들&quot;</span><br><span data-ke-size="size18">이&#160;작품도&#160;불편할&#160;사람들이&#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어쩌면&#160;모두,&#160;그&#160;위치에&#160;있겠구나.</span><br><br><span data-ke-size="size18">불편한데,&#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뉴스로&#160;다루기는&#160;해야하고,&#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나름의&#160;고민을&#160;했으리라고&#160;이해했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이해해주면&#160;안되는데.</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일부는&#160;폄훼하는&#160;글을&#160;애써&#160;올리고,&#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어떤&#160;이들은&#160;이를&#160;받아서&#160;전하고</span><br><span data-ke-size="size18">다른&#160;뉴스들은&#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돈&#160;냄새로&#160;포장하는거야.</span><br><span data-ke-size="size18">모두에게&#160;관심있는&#160;것은&#160;&quot;돈&quot;이니까.</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외신을&#160;타고&#160;전해지는&#160;것이&#160;있을까?</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녀의&#160;문체,&#160;표현방법,&#160;그녀의&#160;천재성</span><br><span data-ke-size="size18">등을&#160;다루는&#160;것이&#160;대부분이었어.</span><br><br><span data-ke-size="size18">너무도&#160;당연하게</span><br><span data-ke-size="size18">작가의&#160;글을&#160;충분히&#160;이해하려면&#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한림원의&#160;지적을&#160;알아야만&#160;되잖아</span><br><span data-ke-size="size18">트라우마를,&#160;우리&#160;일부는&#160;너무&#160;잘&#160;알아</span><br><span data-ke-size="size18">우리의&#160;나머지는?&#160;글쎄?</span><br><br><span data-ke-size="size18">확실한&#160;것은&#160;스피커에서&#160;끊임없이</span><br><span data-ke-size="size18">울리는&#160;소리는</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런&#160;트라우마는&#160;없었거나&#160;</span><br><span data-ke-size="size18">만들어졌다고&#160;하지</span><br><span data-ke-size="size18">아직&#160;논란이&#160;끝나지&#160;않았다고</span><br><span data-ke-size="size18">표현의&#160;자유라고</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이익을&#160;위해서</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렇게&#160;이야기하는&#160;사람은</span><br><span data-ke-size="size18">이해할&#160;수&#160;있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하지만</span><br><span data-ke-size="size18">자기가&#160;무슨&#160;말을&#160;하고&#160;있는지</span><br><span data-ke-size="size18">모르고,&#160;지껄이는&#160;사람은</span><br><span data-ke-size="size18">정말&#160;가여워!&#160;</span><br><br><span data-ke-size="size18">*</span><br><br><span data-ke-size="size18">그&#160;일&#160;후,&#160;20년</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금부터&#160;24년&#160;전</span><br><span data-ke-size="size18">노벨은&#160;이&#160;땅에&#160;기회를&#160;줬어</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러나,&#160;그때나&#160;지금이나</span><br><span data-ke-size="size18">차이는&#160;없는&#160;것&#160;같아</span><br><br><span data-ke-size="size18">바라기는,&#160;언젠가</span><br><span data-ke-size="size18">고립되고,&#160;짓밟히고,&#160;훼손된</span><br><span data-ke-size="size18">광주를,&#160;가벼운&#160;발걸음들이</span><br><span data-ke-size="size18">지나가는&#160;것을&#160;보기를&#160;원해</span><br><span data-ke-size="size18">억지스럽지&#160;않게</span><br><br><span data-ke-size="size18">두렵기는,&#160;앞으로도</span><br><span data-ke-size="size18">답안지에&#160;적을&#160;단어만&#160;살리고</span><br><span data-ke-size="size18">죽은&#160;동호는&#160;땅에&#160;묻어버리는</span><br><span data-ke-size="size18">그럴까봐,&#160;두려워&#160;</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잠자는&#160;노벨이</span><br><span data-ke-size="size18">취한&#160;우리를&#160;깨우고&#160;있는데</span><br><br><span data-ke-size="size18">일어나!</span><br><span data-ke-size="size18">소년이&#160;오잖아!</span></p>
<!-- -->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노벨상, 그 후 사흘
평상심
추천 0
조회 4
24.10.15 02:2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