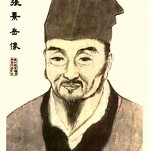<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26.&#160;자주 타태(墮胎)하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span data-ke-size="size18">태(胎)는 양(陽)이 생(生)하고 음(陰)이 장(長)하며, 기(氣)가 행(行)하고 혈(血)이 수(隨)하여 영위(榮衛)가 조화(調和)하면 기(期)에 이르러 산(産)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자양</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滋養</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의 기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에 조금이라도 간단</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間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이 있으면 원류(源流)가 불계(不繼)하면서 태(胎)가 불고(不固)하게 된다. 종식(種植)에 비유(:譬)하자면 진액(津液)이 하나라도 도(到)하지 않으면 지(枝)가 고(枯)하면서 과(果)가 낙(落)하고 등(藤)이 위(萎)하면서 화(花)가 추(墜)하는 것과 같으니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오상정대론(&lt;五常政大論&gt;)에 이르기를 &quot;중(中)에 근(根)한 것을 명(命)하여&#160;<span style="color: #ff0000;">신기</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神機</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라 하니, 신(神)이 거(去)하면 기(機)가 식(息)한다. 외(外)에 근(根)한 것을 명(命)하여&#160;<span style="color: #ff0000;">기립</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氣立</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이라 하니, 기(氣)가 지(止)하면 화(化)가 절(絶)한다.&quot; 하니, 바로 이를 말함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임신(姙娠)에 타태(墮胎)가 자주 나타나면 반드시&#160;<span style="color: #f200f2;">기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휴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虧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여 그러한 것이다. 휴손(虧損)의 이유(由)는&#160;<span style="color: #f200f2;">품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稟質</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평소 약</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거나,&#160;<span style="color: #f200f2;">연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年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쇠잔</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衰殘</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거나,&#160;<span style="color: #f200f2;">우노</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憂怒</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노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勞苦</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로 그 정력</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精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곤</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거나,&#160;<span style="color: #f200f2;">색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色慾</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을 불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不愼</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여 그 생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生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를 도손</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盜損</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기 때문이다. 이 외(外)에도&#160;<span style="color: #f200f2;">질박</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跌撲</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음식</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飮食</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의 종류(類)가 모두 그 기맥(氣脈)을 상(傷)할 수 있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기맥(氣脈)에 상(傷)이 있으면서 태(胎)에 양(恙: 병이나 근심)이 없는 경우는 선천(先天)이 매우 완고(完固)한 자가 아니면 안 되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또 태(胎)를 회(懷)한 10개월 동안에는&#160;<span style="color: #0000ff;">경</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經</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의 양</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養</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에 각 주(主)하는 바가 있으니, 소산(小産) 타태(墮胎)가 누차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160;<span style="color: #0000ff;">3</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span><span style="color: #0000ff;">, 5</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span><span style="color: #0000ff;">, 7</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월의 사이</span>에 있으면서 하(下)하니, 그 다음의 타(墮)도 반드시 그 기(期)에 다시 그러한다. 바로 앞서서 이 일경(一經)을 상(傷)하였으면 다시 이 경(經)을 만났을 때 빠뜨리고(:闕)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하물며 부인(婦人)의&#160;<span style="color: #0000ff;">신</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腎</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에는 포(胞)가 계(繫)하고&#160;<span style="color: #0000ff;">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는 신(腎)의 부(府)이므로 태임(胎妊)의 부(婦)는 가장&#160;<span style="color: #0000ff;">요통</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腰痛</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을 돌아보아야(:顧) 한다. 통(痛)이 심(甚)하면 추(墜)하니 예방(防)하지 않을 수 없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따라서 타태(墮胎)를 외(畏)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상(傷)한 이유(由)를 잘 살펴서 매우 계신(戒愼)하여야 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타태(墮胎)를 치(治)하려면 반드시 양태(養胎)의 원(源)을 살펴서&#160;<span style="color: #00cc00;">그 손</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損</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을 미리 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培</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하여야 하니, 보태(保胎)하는 법(法)은 이를 벗어나지 않다. 만약 임기(臨期)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미치지 못할까 우려된다.</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태잉(胎孕)이 불고(不固)하면&#160;<span style="color: #f200f2;">기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血</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손상</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損傷</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된 병(病)이 아님이 없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f200f2;">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제섭(提攝)이 불고(不固)하고, 혈(血)이 허(虛)하면 관개(灌漑)가 불주(不周)하니, 따라서 대부분 소산(小産)에 이르니라. 따라서 보태(保胎)를 잘 하려면 반드시 전적(專)으로&#160;<span style="color: #f200f2;">혈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를 고(顧)하여야 하니,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태원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胎元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을 위주로 가감(加減)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160;<span style="color: #00cc00;">작약궁귀탕</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芍藥芎歸湯</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고 그 다음은&#160;<span style="color: #00cc00;">태산반석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泰山盤石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이나 천금보잉환</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千金</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保孕丸</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여야 한다. 모두 조화(造化)를 탈(奪)하는 공(功)이 있으니, 당연히 참작(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또한&#160;<span style="color: #f200f2;">태</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혈(血)이 쉽게 동(動)하니 혈(血)이 동(動)하면 태(胎)가 불안(不安)한다. 따라서 내열(內熱)하면서 허(虛)하여 타(墮)하는 경우도 또한 항상 있다. 만약&#160;<span style="color: #f200f2;">비기</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脾氣</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면서 혈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사성산</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四聖散</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여야 한다.&#160;<span style="color: #f200f2;">간신</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肝腎</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이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면서 혈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양태음</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凉胎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여야 한다.&#160;<span style="color: #f200f2;">간비</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肝脾</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가 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虛</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하면서 혈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하면 마땅히&#160;<span style="color: #00cc00;">고태전</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固胎煎</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으로 하여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또 입재(立齋)의 법(法)에서,&#160;<span style="color: #f200f2;">혈허</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虛</span><span style="color: #f200f2;">)&#160;</span><span style="color: #f200f2;">혈열</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span style="color: #f200f2;">血熱</span><span style="color: #f200f2;">)</span>로 자주 타태(墮胎)하는 것을 치(治)할 때 조보(調補)하는 것 외(外)에도 초하(初夏)의 때에 이르면 교(敎)하기를 &#39;농(濃)하게 전(煎)한&#160;<span style="color: #00cc00;">백출</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白朮</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의 탕(湯)으로&#160;<span style="color: #00cc00;">황금</span><span style="color: #00cc00;">(</span><span style="color: #00cc00;">黃芩</span><span style="color: #00cc00;">)&#160;</span>가루 3전(錢)을 하(下)하니, 수십(數十) 첩(貼)을 투여(與)하면 보생(保生)할 수 있다.&#39;고 하였으니, 이 또한 본받을(:法) 수 있는 것이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 외에 다른 증(證)이 있으면서 태(胎)가 불안(不安)하면 당연히 안태(&lt;安胎&gt;)의 조(條) 중에서 참작(酌)하여 치(治)하여야 한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160;</p><p style="text-align: center;">&#160;</p>
<!-- -->
카페 게시글
부인규 (38-39)
26. 자주 타태(墮胎)하다
코코람보
추천 0
조회 3
24.01.31 11:36
댓글 0
다음검색